
식사와 커피를 나누는 데 거리낌이 없는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은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궁금증을 한국 특유의 ‘식구(食口)’라는 단어로 풀어봄직하다.
이 대통령이 취임 뒤 가진 오찬, 만찬은 다음과 같다.
*6월 4일 취임 첫날: 국회로 찾아가 국회의장 + 여야 대표와 오찬. 야당 대표 김용태, 천하람에게 “잘 모시도록 하겠다”고 인사했지만, 두 야당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쓴소리.
*6월 7일: 여당 지도부를 관저로 초청해 만찬.
*6월 22일: 여야 지도부를 관저로 초청해 오찬.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김민석 총리 후보 오만하다” 쓴소리.
*7월 3일: 비교섭단체 야당 대표들과 관저 오찬. 야당 대표들, 송미령 장관 인선 등에 대해 쓴소리.
*7월 7일: 여당 상임위원장들을 관저로 초청 만찬.
이런 공식 행사 외에도 대통령실 출입기자들과의 비공식 ‘식당 만남’도 이어졌다.
*취임 첫 주인 6월 10일과 11일: 기자들과 구내식당에서 만나 함께 식사 또는 커피
*7월 8일: 김 총리까지 대동해 기자들과 커피 만남.
이뿐이 아니다. 지난 3일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여름 휴가 계획을 묻자 이 대통령은 “휴가 때 여러분들 따로 한 번 자유롭게 뵈는 시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뽑기를 하든지”라고도 말했다.
이 멘트의 ‘뽑기’란 단어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현대 민주주의의 뿌리인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의 핵심은 뽑기였다. 성분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참여하는 방법은 뽑기만 한 게 없기 때문이다.
뽑기 탓에 뒤로 밀린 메이저 언론들
예컨대 이 대통령 위 멘트를 “주요 언론 기자들과 함께 휴가 때 대화를”이라고 했다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닌 엘리트주의가 된다. 엘리트주의는 현대판 귀족주의이다.

뽑기의 위력은 지난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도 발휘했다. 명함 뽑기와 즉석 지명을 통해 진행하다보니 조-중-동으로 통칭되는 역사 오랜 신문들, 그리고 KBS-MBC 등 방송 3사의 기자 질문이 없었다. 대신 뽑기를 통해 특히 지방 언론의 질문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덕분에 이 대통령은 자신의 ‘지방 균형 발전’ 구상에 대해 많이 발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뽑기를 통해 민주화된 대통령실 기자단 환경에서 기자단과 ‘식탁에 둘러앉기’를 주저않는 이 대통령 스타일은, 앞으로 야당에 엄청난 타격을 안길 것으로 필자는 예상해본다. 함께 밥을 나눈 대상을 공격하는 건 한국인에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기자들 사회에 내려오는 말로 ‘식이난타(食而亂打)’가 있다. ‘먹고 조진다’는 소리다. 먹는 대상은 밥-술이기도 하지만 돈이기도 했다. 아무리 비싼 술을 사주고 촌지(기자들에게 전해지던 돈 봉투)를 줘도 조질 일이 있으면 조진다는 이른바 ‘기자 곤조(근성)’를 나타낸 말이었다. 그런 곤조도 있었겠지만, 이런 말을 굳이 만든 데는 ‘식(食)을 나눈 사람’은 그만큼 조지기 힘들다는 사정 역시 존재했기 때문이라 본다.
이 대통령이 메이저, 마이너를 가리지 않고 기자들과 식사-차 테이블에 앉아 얘기를 나눌수록 밥을 공유한 기자들의 ‘식이난타’는 곤란해질 게 뻔하다.
한국 특유의 ‘함께 살자 식구주의’
여기서 생각나는 게 식구(食口)라는 한국 단어다. family에 해당하는 단어는 중국에서 가인(家人), 일본에선 가족(家族)이다. ‘식구’라는 단어를 일본에선 거의 듣기 힘들고, 중국에선 쓰긴 하지만 한국처럼 대중적이지 않단다.
한국어 ‘식구’는 의미가 넓다. 피를 나눈 가족 구성원(family members)을 지칭할 뿐 아니라 ‘검찰 식구’, ‘교회 식구’처럼 ‘한솥밥을 먹는 조직 구성원’ 모두를 지칭할 수도 있다.
식구란 말에 대해 사학자 전우용 교수는 이렇게 설명한다. “식구란 한 집에 함께 살며 한솥밥을 먹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가족과는 다른 뜻이다. 거느린 노비는 한 식구지만. 남의집에 양자 간 친아들은 다른 집 식구다. 본디 집은 식구 단위의 주거 공간이다.”(책 ‘내 안의 역사’ 14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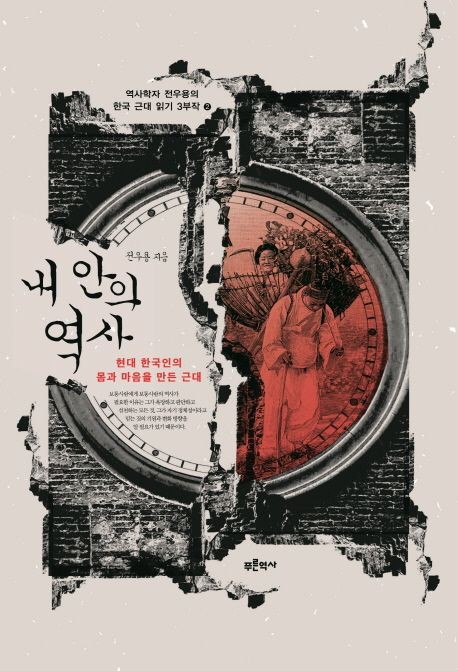
한솥밥을 먹는 구성원을 지칭하는 단어로 한국인 입에 붙은 단어가 ‘식구’다. ‘함께 살자’는 정신이 강하게 담긴 단어다. 이러니 ‘함께 먹는 일’은 한국인에게 무척 중요하다. 미국은 물론 일본, 중국에서도 ‘혼밥’은 기본이지만 한국에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혼자 밥 먹으러 가는 것은 거의 ‘죄 짓는 행동’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이 대통령이 비판을 들으면서도 야당 인사들을 적극 만나고, 기자들과도 거리낌없이 자리를 함께 하는 바탕에는 ‘정치하는 우리 식구’ ‘기사 쓰는 우리 식구’ 이런 의식이 있으리라 상상해본다.
적이라도 同食할 용기의 바탕은?
쓴소리를 날릴 게 뻔한 야당 정치인과 한 자리에 안는 용기에 대해선 심리학자 김태형 소장의 말을 들어보자. 그가 책 ‘이재명의 스피치’에 쓴 내용이다.
이재명은 욕먹는 걸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중략) 상대방의 비판이나 공격이 부당한 경우,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경우에는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130쪽)
공익추구형 정치인의 특징은 ‘① 권력을 잡기 위해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하기 위해 권력을 필요로 한다, ② 개인적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③ 대중과의 접촉과 소통이 활발하다, ④ 국민에 대한 연대감이 강하다’는 점이다. (169~7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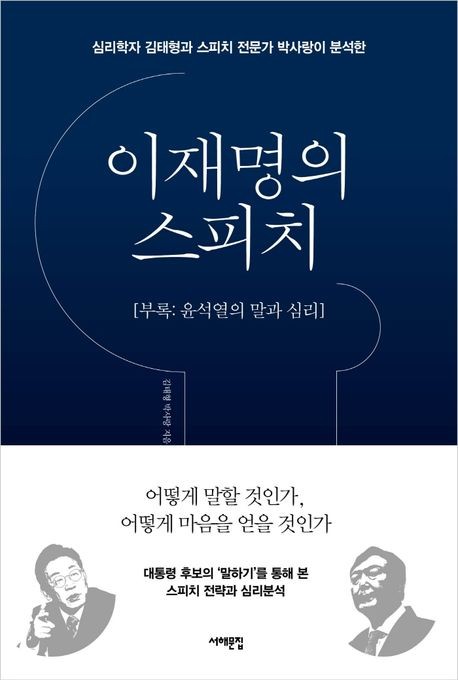
공익을 추구하기에, 또한 하고 싶은 일이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당하는 비판이나 손해에는 개의치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소장이 언급한 공익추구형 정치인의 특징은 바로 이 대통령의 최근 행동방식과 딱 들어맞는다.
이와는 반대로 ‘공익보다는 사익’을 추구하는 정치인이라면 아무리 공익에 도움이 된다고 해도 내 사익을 침범하는 쓴소리가 듣기 싫으므로 ‘적과의 동식(同食)’은 꺼려질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야당 정치인 중에는 ‘함께 식사’를 행하는 경우가 최근 극히 줄어든 듯하다. 대통령은 ‘내란 잔당’만 아니라면 정치인이든 또는 기자든 아주 폭넓게 만나고 밥-차를 나누는데, 야당 정치인들은 자기들끼리도 잘 만나지 않는 듯한 상태가 계속 이어진다면? 최근의 특검 수사와 함께 향후 한국의 정치 지형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한복판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