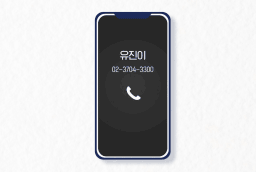고마움은 빚으로 남는다… 서울 도봉구의 역사 인물, 그리고 그의 흔적
우리 문화유산 지킴이 전형필의 얼이 서린 곳 ‘간송옛집’… 자유시인 김수영의 육필원고가 한가득 ‘김수영문학관’
 제767호 김응구⁄ 2024.03.11 13:27:21
제767호 김응구⁄ 2024.03.11 13:27:21
뛰어난 인물은 많다. 허나 역사적인 인물은 몇 안 된다. 그중에서도 이름 석 자를 들이밀었을 때 고개를 끄덕일 만한 이는 더욱 몇 되지 않는다. 그들을 기억해야 한다. 고마움이 잊히지 않도록. 닮고 싶은 이들이 끊임없도록.
서울 도봉구의 역사 인물 두 명을 소개한다. 우리 문화유산 지키기에 가진 재산을 쏟아부은 이가 있었고, 현대사 질곡의 시대에 온마음과 온몸을 글로 표현한 이가 있었다.

간송 전형필, 우리 문화유산 지킴이로 독립운동
전형필(全鎣弼·1906~62)은 서울 종로에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소문난 부자였다.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고, 책을 사 모으길 즐겼다. 운동신경도 뛰어났다. 휘문보고(지금의 휘문고등학교) 4학년 때는 야구부 주장을 맡기도 했다.
졸업 후에는 일본으로 건너가 와세다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다. 일제 치하에서 억울한 민족이 없도록 법을 공부해야 한다는 아버지의 가르침 때문이었다. 일찍이 할아버지, 작은아버지, 형을 떠나보냈던 그는 대학 졸업을 앞두곤 아버지마저 잃었다. 그러면서 종로 일대 상권과 전국 각지의 대토지 등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았다.
전형필은 독립운동가이자 서예가로 이름을 날린 오세창(吳世昌·1864~1953)을 만나면서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에 눈을 떴다. 오세창은 문화유산을 보는 눈이 남달랐다. 골동품 속에서도 ‘보물’을 가려낼 줄 알았고, 이 능력은 전형필에게 그대로 이어졌다. 일제가 앗아갈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 그는 이를 그만의 독립운동으로 생각했다.
전형필의 호는 간송(澗松)이다. 계곡 시내 ‘간(澗)’, 소나무 ‘송(松)’이다. 한겨울에도 얼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지키고 서 있는 소나무라는 뜻이다. 오세창이 지어준 것이다.
전형필은 서울 인사동의 고서점 ‘한남서림’을 인수한 후 오래된 옛날 책과 그림, 도자기 등을 사들였다. 값도 후하게 쳐주었다. 그래야 소문을 듣고 더 많은 문화유산이 들어올 걸 알았기 때문이다.
고려시대 상감청자 ‘청자상감운학문매병(靑磁象嵌雲鶴文梅甁)’. 말 그대로 푸른 사기그릇에 구름과 학 무늬를 상감기법으로 박아넣은 매병(梅甁)이다. 도자기 수집가이자 이 매병의 소유주였던 일본인 마에다 사이치로(前田佐一郎)는 이 매병을 2만 원에 팔고 싶었다. 당시 그 돈이면 기와집 스무 채를 살 수 있었다. 전형필은 별다른 고민 없이 그 매병을 사들였다. 이후 이 매병의 가치를 알아본 또 다른 일본인이 구매가의 두 배를 쳐줄 테니 자신에게 팔라고 하자 “이보다 더 좋은 청자를 내게 가져다주면 산 가격에 드리겠다”며 정중히 거절했다. 이 매병은 국보 제68호로 지정돼 있다.
1936년 서울에선 조선백자인 ‘청화철채동채초충문(靑畵鐵彩銅彩草蟲文)’을 두고 경매가 벌어졌다. 시작가는 1000원도 안 됐지만 순식간에 1만4000원을 넘겼다. 한 일본인과 전형필이 끝까지 남았다. 낙찰가는 1만4580원, 지금으로 치면 45억 원을 훌쩍 넘는 금액이다. 마지막에 이 백자를 손에 쥔 건 전형필이었다. 그리곤 ‘내 것이 됐다’는 뿌듯함보다 ‘우리 문화유산을 지켰다’는 사실에 더 큰 기쁨을 느꼈다.
그해에는 조선시대 신윤복이 그린 ‘미인도’가 일본에 있음을 알고 한걸음에 달려가 3만 원을 주고 사 오기도 했다. 1937년에는 일본에 있던 영국인 변호사로부터 고려청자 20점을 기와집 400여 채 값인 40만 원에 사들였다.
백미는 ‘훈민정음 해례본’이다. 1943년 여름, 경북 안동에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을 접하곤 서둘러 구매에 나섰다. 조선총독부가 알면 빼앗을 게 분명했기 때문이다. 우리 말과 글을 쓰지도 못하게 하는데 이를 가만두고 볼 그들이 아니었다. 소유주는 1000원을 불렀지만, 전형필은 이를 1만 원에 사들였다. 그리곤 이 사실을 비밀로 했다. 꼭꼭 숨겨두었다가 광복 이후 세상에 내놓았다.
전형필은 1962년 1월 26일, 자신이 태어난 종로4가 112번지 본가에서 급성신우염으로 급서했다. 그때 나이 57세. 생전 골동품 수집에 가산을 모두 탕진한다는 험한 소리도 종종 들었다. 그렇게 모은 회화, 도자, 금속공예, 불교조각 등에는 국보급 문화재가 수두룩하고, 지금까지 우리 미술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전형필이 평생을 모은 우리 문화유산은 그가 손수 지은 보물창고 ‘보화각(葆華閣)’에 보관했다. 이후 그가 세상을 떠난 뒤 ‘간송미술관’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 미술관이다. 현재 성북구 성북로에 자리하고 있다.


전형필의 마음을 기리는 ‘간송옛집’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는 100년 넘는 역사의 ‘간송옛집’이 자리하고 있다. 처음에는 전형필의 양부 전명기(全命基·1870~1919)가 인근 농장, 황해도 등에서 오는 곡식을 관리하고자 지은 집이었다. 양부 사망 후 전형필은 이 주변에 묘소를 만들고, 제사나 차례를 지낼 때 재실(齋室)로 이 집을 사용했다.
6·25 한국전쟁 당시 한옥, 담장, 대문 일부가 망가졌지만, 종로 본가와 보화각을 먼저 수리하느라 피해 복구가 늦어졌다. 1962년 전형필이 세상을 떠나고 종로 본가가 철거되면서 그곳의 자재를 활용해 부분적인 수리가 이뤄졌다.
간송옛집은 건축적으로도 가치가 높다. 목조기와지붕 구조에 본채(93㎡), 협문(11㎡), 담장(77㎡)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정면 칸과 측면 칸이 ㄱ자형이고, 단층 홑처마 팔작지붕이다. 2012년 12월 국가 등록문화재 제521호(서울 방학동 전형필 가옥)로 등재됐다. 도봉구와 간송미술문화재단은 이를 복원한 후 2015년 9월 11일 시민·구민에 공개했다.
간송옛집 왼쪽 언덕 위에는 묘소 2기가 있다. 정면으로 바라볼 때 오른쪽은 양부 전명기의 묘, 왼쪽은 전형필과 그의 부인 김점순의 합장묘다.
마당에는 ‘석정(石井)’이라는 이름의 우물도 있다. 상수도가 보급되기 전까지 음수용으로 사용했다. 자연석으로 매우 정교하게 만들었으며, 깊이는 6m 정도다. 간송옛집을 복원할 때 흙으로 메워있던 것을 파내고, 우물 내부를 볼 수 있게 유리 덮개와 조명을 설치했다.

김수영, 해방 후 한국詩의 새로운 방향 제시
자유시인 김수영(金洙暎·1921~1968)은 짧디짧은 생을 살다 갔다. 47년 세월이 편한 것만도 아녔다.
1921년 서울 종로구 관철동에서 태어났다. 8남매 중 장남이었다. 1942년 우수한 성적으로 선린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일본 유학차 도쿄로 건너갔다. 이후 대학 입시 준비를 위해 들어갔던 조후쿠(城北) 고등예비학교를 그만두고 미즈시나 하루키(水品春樹) 연극연구소에서 연출수업을 받았다.
1943년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조선 학병 징집을 피해 귀국했다. 그리곤 당시 연극계를 주도하던 안영일을 찾아가 그의 밑에서 조연출로 일했다. 광복 후 서울로 돌아온 그는 연극에서 문학으로 생의 방향을 바꿨다. 1946년에는 연희전문 영문과에 편입했지만 그만두고 영어 강사와 통역 일을 했다. 그러던 중 문예잡지 〈예술부락(藝術部落)〉에 시 ‘묘정의 노래’를 발표했다.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의용군에 강제 동원됐고, 평양 훈련소에서 탈출해 서울로 돌아왔다. 하지만 얼마 안 가 경찰에 붙잡혀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수감됐다. 거기선 야전병원의 영어통역관으로도 활동했다. 1952년 충남 온양 국립구호병원에서 석방됐다. 포로수용소에서의 생활은 그에게 자유의 의미를 뼛속 깊이 각인하는 계기가 됐다.
1958년 제1회 ‘한국시인협회상’을 수상했다. 다음 해에는 첫 시집 〈달나라의 장난〉(춘조사)을 출간했다. 처음이자 마지막 시집이다. 1968년에는 부산에서 열린 펜클럽 주최 문학세미나에서 ‘시여, 침을 뱉어라’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를 했다. 그해 6월 15일 귀가하던 길에 버스에 치여 의식을 잃었고, 다음 날 아침 8시 50분 숨을 거뒀다.
한국의 대표적인 문인인 김동리, 박목월 등은 김수영을 추모하고 그의 정신을 기리고자 서울 도봉산 기슭에 시비(詩碑)를 세웠다. 이는 문인과 독자 290명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건립한 것이다. 이 시비에는 다음 문장이 새겨졌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김수영이 죽기 얼마 전 쓴 시 ‘풀’ 가운데 일부다. 핵심어는 ‘풀’과 ‘바람’이다. 이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다. 쉽게 알 수 있는 건 풀과 바람의 대립 구도다. 암울한 시대, 그는 민중과 지배세력에 시선을 모으고, 이 둘을 그 시대에 대입시켰다. 풀은 바람보다 빨리 눕고 울고 일어난다고 했다. 굴욕으로 묘사한 듯 보인다.
이 시의 끝은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로 끝난다. 얼핏 모든 게 좌절된 듯 보이지만 여지는 남아있다. 굴복한 듯하지만 굴복되지 않았고, 쓰러진 듯하지만 쓰러지지 않았다. 그저 감내할 뿐, 절대 쓰러질 수 없다는 다짐이기도 하다.
김수영은 그의 평론 〈시여, 침을 뱉어라〉(1968)에서 “시는 온몸으로, 바로 온몸을 밀고 나가는 것이다… 시의 형식은 내용에 의지하지 않고 그 내용은 형식에 의지하지 않는다… 시는 문화를 염두에 두지 않고, 민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인류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것은 문화와 민족과 인류에 공헌하고 평화에 공헌한다”고 했다.
그에게 시는 고상한 예술이 아니다. 현실과 싸우는 양심이었다. 자유와 사랑을 꿈꿨던 그는 1960년대 이후의 후배들에게 단단한 뿌리가 됐다.


김수영의 詩作 동네 도봉구, 그리고 ‘김수영문학관’
도봉구는 김수영이 생전 시작(詩作) 생활을 했던 동네다. 그의 본가와 묘, 시비(詩碑)도 이곳에 있다. 도봉구는 김수영 시인을 기리고자 방학동에 ‘김수영문학관’을 건립하고 2013년 11월 27일 개관했다.
1층과 2층이 핵심이다. 1층 제1전시실에선 김수영의 삶의 궤적을 연대순으로 만난다. 또 6·25 한국전쟁, 4·19혁명, 5·16군사정변 등 현대사의 질곡을 겪으면서 그가 온몸으로 표현한 시와 산문의 육필원고를 전시해놓았다. 더불어 김수영이 시에 자주 썼던 단어들을 여러 막대에 새겨놓았는데, 관람객은 이를 이어가며 간단한 시를 만들어볼 수 있다. 특히, 김수영의 시 일곱 편을 직접 낭송해 녹음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다.
2층 제2전시실은 절대 자유를 추구한 김수영의 생활상을 들여다보는 공간이다. 주변 사람들과 주고받은 서신이나 작업하던 탁자 등에선 인간적인 면이 느껴진다. 그의 산문집이나 김수영 관련 서적·논문을 열람해봐도 된다.
관람 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가까운 곳에 원당샘 공원, 연산군 묘, 정의공주 묘 등이 있어 함께 둘러보는 것도 좋다.
스스로에게 묻는다. 억압의 시대에 난 무얼 할 수 있는지. 자유의 투쟁을 위해 맨 앞자리에 설 수 있는지.
지금의 풍요는 선인(先人)들에 대한 빚이다. 시를 읽고 가슴으로 기억하는 일. 더 많은 문화유산을 찾고 이를 알리는 일. 그러면 빚이 조금은 갚아질까 싶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
- 관련태그
- 도봉구 전형필 간송옛집 김수영 풀

















![[특징주]의료 AI '제이엘케이', 美 경쟁사 대비 정밀도 우위...18%대 강세](/data/cache/public/photos/20240520/art_160626_1715913033_170x110.jpg)

![[속보] HLB 간암신약, 美 FDA 승인 불발…진양곤 회장](/data/cache/public/photos/20240520/art_160616_1715907362_170x110.jpg)

![[특징주] HLB 신약 美 FDA 승인 발표 임박...HLB그룹주 '동반 상승'](/data/cache/public/photos/20240520/art_160587_1715824472_170x11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