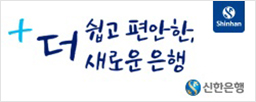“소처럼 느린 걸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며 사십시오.” 이런 연하장을 받아들고 몇 번을 눈여겨보았다. 내가 바쁘게 살아가는 것을 항상 못마땅하게 여기는 친구의 글귀이다. 그는 “이제 늙었으니 손에서 일을 떼고 한가하게 살아가자”고 권하는 사람이다. 소의 해를 만났으니 느린 걸음으로 뚜벅뚜벅 걸으며 살라는 그 친구의 말은 너무도 당연하다. 내가 달마다 문화예술에 관한 글을 쓰는 것을 보며 꿈같은 소리, 무지개 같은 말은 이제 집어치우라고 말하는 이 친구는 창작예술인이 직업인으로서 생존할 수 있느냐고 되묻는다. 그는 문화예술에 관계되는 대학을 아주 미워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더라도 4년제 대학 문을 나서는 음악 전공자가 6000명, 미술 전공자는 4000명, 연극·영화 전공자는 1500명, 무용 전공자는 1000명으로, 응용 분야까지 합치면 3만 명이 넘게 졸업생이 한 해 동안 배출된다. 아무리 따져도 문화예술계에 1년에 3만 명의 일자리가 있을 것 같지 않다. 사정이 이런데도 대학들은 제각기 몸집 불리기 경쟁을 하느라고 신입생을 자꾸만 뽑는다. 현실은 이런데도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문화예술을 중시하는 분위기는 점점 더 커진다. 새뮤얼 헌팅턴이란 세계적인 석학은 <문화가 중요하다>는 그의 책에서 “경제와 문화는 동반자적 관계에 있으므로 나라가 풍요로워지려면 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하였다. 세계의 60억 인구에서 선진국을 비롯한 10억 명 정도가 잘사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문화적으로 앞섰기 때문이란 게 결론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 점을 들어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와 문화예술의 선진화가 함께 가야 경제적 풍요로 빛날 것”이라고 취임사에서 말했다. 대통령의 문화에 대한 언급은 문화국가를 만들자는 절대적인 의지의 표명이기에 우리는 이 말을 믿어야 한다. 문화예술이 경제발전과 함께 이루어진다면 더 이상 좋을 게 없다. 작년 11월 26일에 충남 보령시에서 ‘한국문학 100주년 기념 강연’을 했다. 200여 명의 시민과 동호인들이 모여 진지하게 듣고 있었다. 이 자리에서 축사를 한 보령시장의 문학 사랑과 김정원 보령 시의원의 말을 나는 잊을 수 없다. 김정원 씨는 시인이다. 보령시 의회에는 또 한 명의 수필가가 시의원으로 있단다. 이들이 발의해서 만든 조례에 따라 보령시에 거주하는 문인들이 창작집을 내면 발간비의 70%를 지원한단다. 물론, 문인 두 사람이 시의원으로 있기 때문에 발의가 되었겠지만, 글을 쓰지 않는 다른 시의원들이나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여기에 찬성해주지 않았다면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겠는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발간 지원비를 지급하지만, 지자체에서 발간 지원비를 지급한다는 말은 처음 들었다. 이 말을 듣고 참으로 잘한 일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창작예술인이 직업인이 될 수 없는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들은 무엇인가를 만들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다. 영화 한 편이 자동차 수만 대를 수출하는 것과 맞먹는다고 말하면서 밥을 굶는 사람들이, 예술창작은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꿈같은 말을 하고 있으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2009년 소의 해가 밝았다. 밥을 굶는 창작예술인들을 도와야 한다는 여러 가지 방법을 내놓아도 누구 하나 귀담아듣는 사람이 없는 세상, 국회의사당 출입문을 망치로 부수고 전기톱으로 잘라내도 벌받을 사람이 없는 세상에서 부서진 것들을 수리하려면 또 얼마나 많은 돈을 허비할지, 그런 예산은 펑펑 써도 괜찮은 나라에 살면서 창작예술의 환경을 고쳐달라고 애원해도 들어주는 이가 없다. 그 지원 대상에 속하는 가난한 예술인들마저 관심이 없다. 120만 명이 넘는다는 우리나라의 예술인들은 모두 점잖아서 남부끄러운 일에는 고개를 돌리는지 모르지만, 정말 딱한 것은 우리 예술인들이다. 고통스럽고 험난한 길을 가면서도 입을 다무는 사람들의 심정을 헤아려 전국에서 최초라고 자랑하는 보령시의 창작지원금 같은 제도가 각 지자체에서 제정된다면 예술인들의 창작 의욕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새해부터 우는 소리를 해서 부끄럽지만, 작은 지자체의 밝은 결실이 한국문학의 발전에 씨앗이 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보면서 예술인에 대한 지원정책이 빨리 제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제101·102
제10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