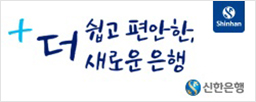▲‘삼국지연의도’ 4폭을 관람하는 관객. 사진 = 왕진오 기자
(CNB저널 = 왕진오 기자) 대학 시절부터 전국의 굿 현장을 찾았고, 무당들이 무업(巫業)을 그만두면서 소각하거나 땅에 묻기 전 무신도와 무구를 수집한 민속학자 남강(南剛) 김태곤(1936∼1996)의 노력이 국립민속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공개된다.
1960년대부터 굿 현장을 꾸준하게 기록하면서 멸실 위기에서 구해낸 ‘관운장군도(關雲將軍圖)’ 등 무신도, 북두칠성 명두 같은 무구와 무복, ‘삼국지연의도(三國志演義)’와 동해안굿 사진(1960~70년대 촬영), 남이장군 사당제(1972년 촬영) 동영상 등 300여 점의 자료들이다.
4월 22일∼6월 22일 진행되는 ‘민속학자 김태곤이 본 한국무속’ 기증전은 무속 연구에 힘을 쏟으면서 “모든 존재는 미분성(未分性)을 바탕으로 순환하면서 영구히 지속한다”는 원본사고(原本思考) 이론을 이끌어 낸 고 김태곤 교수가 몽골·시베리아까지 범위를 확대하면서 비교연구를 하던 중 1996년 61세의 이른 나이에 작고함으로써 멈춰버린 그의 연구를 한 자 리에서 조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태곤 교수.
무속은 신과 소통함으로써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신앙이다. 김태곤은 무속 현장으로 들어가 신과 인간의 소통이 어떻게 이뤄지는가를 주목하고, 이를 기록함으로서 무속의 본질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남이장군 사당제’ 되살린 김태곤
이번 전시에는 1972년 그가 촬영한 남이장군 사당제의 영상, 굿상 조사노트 등이 전시되고, 김태곤의 서재, 서울 용산구의 무녀 밤쥐 최인순(1912∼1983)의 신당이 재현된다. ‘밤쥐’는 최인순의 별명이다. 최인순은 김태곤이 집중적으로 조사한 문덕순 무녀(서울굿)의 신딸로서, 남이장군 사당제의 복원 때 당주무당 역할을 했다. 신당은 사라졌으나 김태곤의 촬영 사진에 당시 모습이 잘 담겨 있다.

▲노르베르트 베버의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 실린 삼국지연의도. 사진 = 왕진오 기자
민간신앙에서 신은 자연의 절대성을 인식하고 이를 인격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신은 볼 수 없는 존재이므로 인간은 신을 쉽게 보고 만날 수 있도록 신당(神堂, 민간신앙에서 신을 모셔 놓고 위하는 장소), 무신도(巫神圖, 무속 신을 그린 그림), 무구(巫具, 무당이 굿을 할 때 사용하는 신, 칼, 방울 등 도구)와 무복(巫服, 무당이 굿을 할 때 신을 상징하기 위해 입는 의례복), 무가(巫歌, 무속 의식에서 무당이 구연하는 사설이나 노래) 등으로 형상화했다.
굿은 신령의 형상을 그린 무신도가 걸린 신당 등에서 무당이 무복과 무구를 갖추고, 말과 행위로써 신령과 소통하는 과정이다.

▲굿에 사용된 무구들. 사진 = 왕진오 기자
제의에는 먼저 제의를 올려야 할 신앙 대상으로서의 신, 이 신을 신앙하여 제의를 올리는 신도, 신과 신도의 사이에서 제의를 조직적으로 진행할 전문적인 사제자(司祭者)로서의 무당이 있다.
이 셋은 제의를 구성하는 일차적 요건으로, 이 중 어느 하나가 없어도 제의는 성립될 수 없다. 무속의 제의는 규모에 따라 크게 ‘굿’과 ‘비손(또는 손빔, 비념)’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굿은 여러 명의 무당이 신에게 많은 제물을 올리고 재비(악공)의 무악 반주에 맞추어 무복(巫服)을 입고 가무와 실연(實演)을 위주로 제의를 하는 것이다. 비손은 한 사람의 무당이 신에게 간소한 제물을 바치고 가무 없이 앉아서 축원을 위주로 하는 약식 제의다.
제의 진행 때 서서 한다고 하여 전자를 ‘선굿’, 앉은 채로 한다 하여 후자를 ‘앉은굿’이라 칭하기도 한다.

▲전시된 무신도를 관람하는 관객. 사진 = 왕진오 기자
규모에 따른 분류와는 달리 굿의 목적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도 한다. 현재 전국에서 행해지는 굿을 목적에 따라 분류하면, 첫째 무당 자신의 신굿인 무신제(巫神祭), 둘째 민가의 개별적 제의인 가제(家祭), 셋째 마을 공동의 제의인 동제(洞祭)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신라왕 ‘차차웅’은 무당이란 뜻
굿에 관한 기록은 거의 없어 그 역사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문헌으로 전하는 가장 오래된 종교적 제의로는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전하는 부여의 영고(迎鼓), 고구려의 동맹(東盟), 예의 무천(舞天) 등의 제천의식이 있으나, 오늘날의 무당굿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당에 관한 직접적인 기록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전하는 남해왕조(南海王朝)의 것이 있다. 여기에서 신라 제2대 남해왕은 ‘차차웅’으로 불렸는데 이는 방언으로 ‘무당’의 뜻이었다고 한다. 남해왕이 시조 묘를 세워 친누이 동생 아로(阿老)로 하여금 제사를 주관하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고구려에서도 무당이 유리왕의 득병 원인을 알아내고 낫게 한 기록이 보인다.
그러나 당시의 구체적인 제의 내용은 알 수 없다. ‘고려사’에는 무격을 모아 기우제를 지낸 기록이 자주 보이는데, 굿에 관한 가장 직접적인 기록은 고려시대 문장가 이규보(李奎報, 1168∼1241)의 ‘동국이상국집’에 수록된 장시 ‘노무편(老巫篇)’에 나타난다.
즉, 무당이 신들려 공수를 내리고 도무(蹈舞, 몹시 좋아서 날뜀)하는 등의 굿 묘사는 오늘날 중부 지역의 무속과 상통해, 적어도 고려 시대에는 무속의 제의 체제가 갖춰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황춘성 작 ‘관운장군도’. 사진 = 국립민속박물관
유실된 ‘삼국지연의도’ 2점의 궁금증 풀어줘
민속학자 김태곤은 신령의 세계를 조사·기록하면서 사라질 뻔했던 무신도와 무구를 수습했다. 이렇게 수습된 무신도·무복·무구 등을 이번 전시에서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촉한의 장수 관우를 그린 무신도 ‘관우장군도’와, 관우 장군의 부인으로 알려진 신령을 그린 무신도 ‘정전부인도’ 뒷면에 황춘성이라는 화가 이름이 적혀 있어, 현재까지 무신도를 그린 채용신 외에 또 다른 화가의 실명을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1923)에 수록된 동관왕묘(東關王廟: 관우를 모신 사당으로 선조 34년/1601년에 준공)의 ‘삼국지연의도’ 4점이 공개돼 이목을 끈다. 이 4점은 ‘삼국지’의 중요 장면을 그린 그림으로, 중국 촉한의 관우 장군을 장군신·재복신(財福神)으로 모시는 동관왕묘에 걸렸었다.
노르베르트 베버(Norbert Weber)의 ‘고요한 아침의 나라’와 안드레 에카르트(Andre Eckardet)의 ‘조선 미술사’(1929)에 실린 동관왕묘 ‘삼국지연의도’ 2점은 그간 행방을 알 수 없었으나 김태곤이 수집한 ‘삼국지연의도’ 4점을 복원 처리하는 과정에서 ‘거한수조운구황충(據漢水趙雲救黃忠: 조운이 한수에서 황충을 구하다)’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 도판과 동일하고, ‘장장군대료장판교(張將軍大鬧長板橋: 장비가 장판교에서 조조 군사를 꾸짖다)’는 ‘조선미술사’ 도판과 같음이 밝혀졌다.
또 그림의 일부분이 떨어져 나간 ‘제천지도원결의(祭天地桃園結義: 유비, 관우, 장비가 천지에 제사 지내고 도원결의를 하다)’와 ‘장장군의석엄안(張將軍義釋嚴顔: 장비가 엄안을 의기롭게 풀어주다)’은 동일 계열로 추정돼 4점의 ‘삼국지연의도’는 동관왕묘 그림임이 밝혀졌다.
이번에 공개되는 서울과 황해도 지역의 무신도 70여 점은 수장고를 개방한 듯한 느낌을 관객에게 선사한다. 이번 전시는 사라져 가는 자료를 수집·연구하는 것이 우리의 민속문화를 풍성하게 하는 것이며, 무속이 멀고 낯선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늘 숨쉬며 살아 있는 문화현상이라는 점을 체험시키는 소중한 기회다.
- 관련태그
- CNB 씨앤비 시앤비 CNB뉴스 씨앤비뉴스










 제428호
제42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