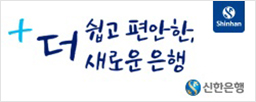▲작업실의 손종준 작가. 사진 = 손종준
(CNB저널 = 김연수 기자) 예전 세대가 영화 ‘로보캅’에 열광했다면 요즘 세대는 영화 ‘아이언맨’에 열광한다. 아직 한글도 채 깨치지 못한 아이까지 로봇을 뒤집어 쓴 인간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면, 인간은 본래 자신이 가진 것 이상의 힘을 바라는 본능을 가진 것도 같다. 그것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자신을 나약한 존재로 판단한다는 역설적인 증거일지도 모르겠다. 언제부터였는지도 모르지만 자라버린 콤플렉스와 그로 인한 불안함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 그것이 작가 손종준의 작업에서 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
나를 지켜줄 수 ‘없는’ 갑옷
디지털 프린트 된 이미지는 아무런 표정을 갖지 않은 인물의 모습을 담고 있다. 각각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금속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조형물을 팔, 머리 등에 부착하고 있다, 그 조형물들은 대부분 신체의 일부분에 맞춘 소규모의 크기이지만, 때로는 인간의 실제 크기에 상응해 몸 전체를 집어넣을 수 있는 휠체어 같은 형태로 등장하기도 한다. 손종준은 그가 만들어 낸 이미지에 등장하는 조형물을 ‘갑옷’이라 부른다.

▲‘Defensive Measure(디펜시브 메저)00066-여인숙’. 디지털 프린트, 110 x 73cm. 2006.
차디찬 갑옷 입혀줬더니 그녀는 “따뜻하다” 했고
그는 사진 속의 모델들에게 1:1 맞춤 갑옷을 제작해준다. 모델을 만나 설득의 과정을 거치고 2~3일 가량 같이 지내면서, 경험과 이야기 등을 나누고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를 끄집어내 갑옷의 형태로 형상화한다. 만일 모델이 너무 예민한 사람이라면, 2~3개월가량을 틈틈이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교류의 시간을 가진다.

▲‘Defensive Measure(디펜시브 메저)00030’. 디지털 프린트, 110 x 73cm. 2007.
외롭지만 따뜻한 색, 블루
디지털 이미지로 출력된 작업의 주조색은 파랑과 회색이다. 이 색은 영화 등의 시각이미지에서 도시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의 고독과 외로움을 상징한다. 그가 만들어 낸 이미지의 배경 역시 고층 빌딩과 오래된 단칸방, 병원 등 차가움과 외로움을 연상시키는 장소들이다. 이런 배경 속에서 조형물의 금속성은 더욱 서늘하게 느껴진다.

▲‘Defensive Measure(디펜시브 메저)00068-수술실’. 디지털 프린트, 110 x 73cm. 2014.

▲‘Defensive Measure(디펜시브 메저)00069-신사동’. 디지털 프린트, 110 x 73cm. 2006.
그는 자신의 작업이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을 위한 의수-의족의 제작이 그렇듯, 처음부터 끝까지 손작업만으로 한 사람만의 몸에 맞춘 개인 갑옷을 제작한다. 여타의 금속을 다루는 작가들이 작업을 공장에 맡기는 것과 비교된다. 그는 “공장의 손을 빌리면 온전한 모델과 지냈던 교류의 시간, 즉 마음을 전달하는 과정에 방해가 될 것 같은 느낌”이라고 했다. 그런 노력 덕분일까. 작가가 들려 준 작업과정의 에피소드는 사진 이미지가 전달하는 차갑고 외로운 이미지와는 정반대의 이야기들이다.

▲‘Defensive Measure(디펜시브 메저)00072’. 디지털 프린트, 110 x 85cm. 2014.

▲‘Defensive Measure(디펜시브 메저)00071’. 디지털 프린트, 110 x 85cm. 2014.
“톱니가 되고 싶다면 왜 그런지 알고 되라”
“소위 ‘평범한 사람들’. 이들은 타의에 의해 확장·축소되는 거대한 사회와 작은 개인의 경계에서 사회에 대한 존속과 회피를 모두 경험하고 그 두 개념을 갈구하기도 한다. 그 안에서 마치 춤을 추고 있는 듯한 자신이, 사실 도대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자각하지 못하는 존재이자, 지속되어지는 삶 속에서 이제는 그런 춤에 익숙해져버린 존재라고 생각한다.” (작가 노트 중)
손 작가는 자신이 속한 사회가 “구성원의 1%가 내는 목소리에 집중하는 사회”라고 정의했다. 예를 들면 정치인들과 연예인 등 발언 기회를 확보한 소수 집단, 또는 사회·문화적 권력과 연관돼 있지 않아도,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들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문화지형 역시 그 1%에 해당한다. 작가는 목소리를 크게 낼 기회가 없는 혹은 크게 낼 필요성을 느껴본 적 없는 나머지 99%에 집중한다. 그는 그렇게 ‘평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톱니바퀴에 비유한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기능이 있는 톱니바퀴가 되도록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성실한 톱니바퀴가 되려고 노력한다.

▲‘Defensive Measure(디펜시브 메저)00070’. 디지털 프린트, 110 x 85cm. 2014.
“금속 작업만 해왔지만 다른 재료도 재밌어져”
지금까지의 작업에서 손종준은 금속을 다뤘다. 제일 잘 만질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콤플렉스와 관련된 작품의 주제와도 잘 어울린다. 하지만 작년 어린이 미술관에서 했던 전시는 그의 작품 과정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어린이들의 전시인 만큼 금속으로 만들어진 작품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에 스펀지로 갑옷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다양한 재료들이 가진 고유의 특성을 발견하게 됐다. 정신적 갑옷인 만큼 모델들의 개성에 어울리는 재료의 특성 또한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양한 재료로 변화를 시도할 예정이다.

▲‘Defensive Measure(디펜시브 메저)00010’. 디지털 프린트, 110 x 73cm. 2006.
- 관련태그
- CNB 씨앤비 시앤비 CNB뉴스 씨앤비뉴스










 제477호
제47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