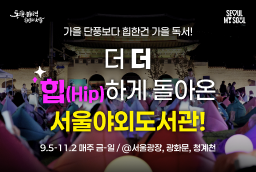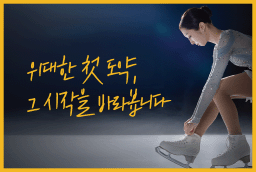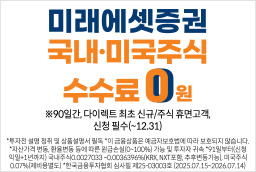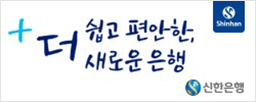(CNB저널 = 이철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고려대 명예교수) 1970년대초 유럽을 휩쓸었던 히피 운동은 제도권의 속박에서 풀려나기 위한 젊은이들의 자유 운동으로 현대사에 큰 획을 그은 사건이었다. 단정한 머리와 넥타이 맨 정장에 반짝이는 구두를 벗어버리고 긴 머리에 깍지 않은 수염과 헐렁한 옷에 슬리퍼를 신은 젊은이들이 런던과 암스텔담의 거리에 널려 있었다. 이들은 가공음식을 배척하고 익히지 않은 곡물과 말린 과채류를 먹으며 가장 자연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자부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영양실조와 각종 질병으로 입원하는 사람들이 속출했다. 영국의 한 젊은이는 당근 주스로 몇 개월 살다가 결국 사망했다. 음식에 대한 패디즘(faddism, 허황된 유행 따르기)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CNB저널 = 이철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고려대 명예교수) 1970년대초 유럽을 휩쓸었던 히피 운동은 제도권의 속박에서 풀려나기 위한 젊은이들의 자유 운동으로 현대사에 큰 획을 그은 사건이었다. 단정한 머리와 넥타이 맨 정장에 반짝이는 구두를 벗어버리고 긴 머리에 깍지 않은 수염과 헐렁한 옷에 슬리퍼를 신은 젊은이들이 런던과 암스텔담의 거리에 널려 있었다. 이들은 가공음식을 배척하고 익히지 않은 곡물과 말린 과채류를 먹으며 가장 자연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자부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영양실조와 각종 질병으로 입원하는 사람들이 속출했다. 영국의 한 젊은이는 당근 주스로 몇 개월 살다가 결국 사망했다. 음식에 대한 패디즘(faddism, 허황된 유행 따르기)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자연식(natural food)에 대한 편견은 1960년대의 녹색혁명으로 식량이 풍성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녹색혁명은 난쟁이 작물에 농약과 비료를 충분히 주어 수확량을 2배 이상 올린 현대 농업의 혁신적 성과였다. 이때부터 전 세계의 식량부족은 크게 해소되었고 우리나라는 쌀을 자급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농약의 잔류량이 인체에 해를 입힐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왔다. 각 나라들은 서둘러 농산물의 농약 잔류량에 대한 기준들을 만들어 관리하기 시작했다. 1970/80년대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수입 자몽의 알라 파동, 수입 밀의 농약 오염, 농약 콩나물 등 기준치를 넘는 잔류농약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났다. 당시 일본과 한국에서 조사된 소비자 식품위생 의식에는 잔류농약에 대한 우려가 항상 1위를 차지했다.
‘GMO프리’ 표시 운동은
식품 값 올리기 위한 작전?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성장한 것이 유기농식품(organic food)에 대한 선호이다. 유기농법은 유럽의 히피 운동 시대에 크게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식량 생산 방식이다. 녹색혁명과 정반대로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재배하자는 것이다. 결과는 일반 농법보다 수량이 현저히 낮고 병해충에 상처받은 농산물의 상품성은 대단히 낮다. 그러면서 값은 2, 3배를 호가하니 잘 팔리지 않는다. 더구나 우수관리농산물(GAP) 생산제도가 정착되고 관리당국의 철저한 잔류농약 검사로 우리가 일상 먹는 음식에서 잔류농약의 문제는 거의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유기농식품의 설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유기농 업체들이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반대 운동에 앞장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다. 미국의 3억 인구가 지난 20년간 아무런 표시 없이 먹어 왔고 중국의 13억 인구가 부분적으로 표시하고 먹고 있는 생명공학 신품종을 ‘괴물GMO’라며 겁을 주고 있다. 유기농식품업체들은 GMO표시제를 확대하고 ‘GMO프리(free)’ 표시를 허가해 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GMO프리 표시가 허가되면 사람들이 찾지 않는 유기농 매장을 GMO프리 유기농식품 매장으로 만들어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있다는 속셈이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놓고 모두가 먹으려고 달려드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거기 독이 들어있을지 몰라요’라고 하면 아무도 먹지 못한다. 같은 음식이라도 몸에 좋다고 믿고 맛있게 먹으면 보약이 되지만 불안하고 께름칙하게 생각하면 체하기 마련이다. 식품에 대한 불필요한 불안감과 편견을 유포하는 것은 큰 죄악이다. 더구나 거기에 상업적인 의도가 있다면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
내 자식만은 특별히 키우겠다고 비싼 값을 주고라도 특별한 음식을 찾는 부모들도 오만과 편견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편식과 식품 불안증으로 허약하고 의심 많고 어울리지 않는 선민의식에 빠진 인간을 만들 수 있다. 보통사람들과 어울려 안심하고 먹고 즐기는 것이야 말로 행복의 기본요소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정리 = 최영태 기자)
- 관련태그
- CNB 씨앤비 시앤비 CNB뉴스 씨앤비뉴스










 제511호
제5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