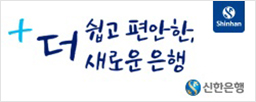[이문정의 요즘 미술 읽기 (44)] ‘시대의 옷’ 입는 명작들…어떤 고흐 보게될지 아무도 몰라
 제574-575호 이문정(미술평론가, 컨템포러리 미술연구소 리포에틱 소장)⁄ 2018.02.12 09:41:45
제574-575호 이문정(미술평론가, 컨템포러리 미술연구소 리포에틱 소장)⁄ 2018.02.12 09:41:45

(CNB저널 = 이문정(미술평론가, 컨템포러리 미술연구소 리포에틱 소장))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는 지역과 세대를 초월해 사랑받는 대표적인 예술가다. ‘지금 생각나는 미술가가 누구인가?’ 혹은 ‘좋아하는 작가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름이 반 고흐다. 미술사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는 유명한 거장들은 많다. 그러나 반 고흐처럼 한결같이, 널리,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미술가는 많지 않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정신 질환, 가난, 동생 테오(Theo)와의 관계, 의문이 제기되는 죽음처럼 불운했던 예술가의 삶과 그 모두를 담아내는 것처럼 표현성 짙은 작업이 관객에게 깊은 공감을 일으키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 반 고흐는 사망한 후 재평가된 대표적 작가다. 만약 그가 조금만 더 오래 살았다면 자신의 성공을 마주했을지도 모른다. 굳이 예술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역경과 불행을 극복하는 삶은 대중의 주목을 끌고 다양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반 고흐의 작품에서 개성과 예술적 실험이 돋보이지만 감상하기에 난해하지 않다는 점도 중요한 이유일 것이다. 강렬한 색채, 형태의 변형, 물감을 두텁게 올려 화면의 재질감을 강조하는 임파스토(impasto) 기법은 미술에서 작가의 내면을 표현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가능해졌음을 보여준다.
높은 인기와 관심을 증명하듯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그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통로는 -미술관의 전시에서부터 출판물, 아트상품, 심지어 광고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그와 관련된 다양한 문화적 생산품들을 보면 명화가 재창조, 재해석되는 방식 대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후대 작가들에 의해 차용되는 명작 작가들
오늘날 과거의 명작, 명작을 창조한 미술가를 만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작품, 혹은 미술가의 삶을 연구하고 그 결과물을 선보이는 것이 가장 전통적인 방식이다. 결과물은 주로 글이나 전시로 소개된다. 아무리 오래 전에 활동했고,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미술가라 해도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접근은 늘 필요하고 유의미하다. 관점, 새로운 역사적 증거,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동일한 작품이라도 전시에 따라 전혀 다른 느낌을 전할 수 있다. 미술사의 상징적인 작품들은 후대의 작가들에 의해 재탄생하기도 한다. 차용의 방법이 대표적이다. 페르난도 보테로(Fernando Botero), 신디 셔먼(Cindy Sherman), 야수마사 모리무라(Yasumasa Morimura)는 고전 명화를 차용하는 작업으로 유명하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Leonardo da Vinci), 프란시스코 고야(Francisco Goya), 앤디 워홀(Andy Warhol) 등은 후대의 작가들에게 자주 차용되는 미술가다.
-재미를 위해 역사적 사실이 일부 과장되거나 변조되어 논란이 일기도 하지만- 오늘날 명작을 다시 보게 하는 또 하나의 주요한 통로는 대중문화다. 다큐멘터리, 영화나 드라마, 공연 등을 통해 예술가의 삶을 재현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반 고흐의 드라마틱한 삶 역시 영화로 여러 번 재조명되었다. 작년 연말 개봉한 애니메이션 ‘러빙 빈센트(Loving Vincent)’(2017)는 반 고흐의 삶과 예술 세계를 종합적으로 경험하게 한다. 반 고흐의 죽음과 말년의 삶을 추적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작품은 107명의 화가가 반 고흐의 화풍을 따라 그린 62,450점의 유화로 완성되었다. 커다란 화면을 채운 붓질은 반 고흐의 화풍을 더 생생하게 느끼게 한다. 기술력과 자본, 그리고 작가를 향한 오마주(hommage)가 합쳐져 살아 움직이는 반 고흐의 세계를 만들어낸 것이다.

명작을 다루는 전시장의 풍경도 다양해졌다. 전통적인 미술을 다루는 전시라 해서 회화, 조각 작품만 놓이는 시대는 지났다. 매체와 장르를 넘나들며 응용하고 첨단의 과학 기술을 이용해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을 제공한다.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고 흥미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동영상이나 디지털 기술이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꽤 오래 전의 일이다. 최근으로 올수록 명화를 재해석한 디지털 이미지가 주인공이 되는 전시가 늘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 달라지는 작품 전달법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전시, ‘나의 뮤즈 - 반 고흐 to 마티스(2017.12.28~2018.03.11)’는 ‘기술과 상상을 더해 명작 속의 장소, 작품이 창조된 순간으로 관람객을 초대한다’는 주제로 기획되었다. 전시장을 가득 채운 움직이는 명화들은 실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경험을 제공한다. 반 고흐의 작품 속 꽃잎이 관객의 몸 위로 떨어지고 구스타프 클림트(Gustav Klimt)의 황금빛이 관객을 감싼다. 관객의 움직임에 반응하거나, 2차원 평면인 원작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숨겨진 공간들을 보여주는 이미지들은 관객의 적극적인 감상을 유도한다. 정지된 이미지보다 동영상에 익숙한 21세기의 현대인들에게 잘 어울리는 방식으로 거장의 작품들을 재해석한 전시라 하겠다.
한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리고 있는 ‘다빈치 얼라이브: 천재의 공간(2017.11.03~2018.03.18.)’에서는 디지털 이미지뿐 아니라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스케치들이 실제 입체물로 재현되어 전시장에 놓였다. 평면적 이미지였을 때에는 막연하게 느껴졌던 다 빈치의 기발함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누군가는 테크놀로지를 이용해 재창조된 이미지들이 색다른 재미를 줄 수는 있지만 원작의 가치를 온전히 전달할 수 없다고 말할 것이다. 깊이가 부족하다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원본을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늘 감상할 수는 없는 일이다. 어떤 작품은 그 작품이 소장되어 있는 국가 밖으로의 반출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한 누군가에게는 과학 기술을 이용해 재창조된 이미지들이 더 흥미롭게, 감동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멀고 어렵게 느껴지는 미술을 가깝게 느끼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완성도가 부족한 전시는 관객들에게 비판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어느 하나의 전시 방식이 더 좋다, 나쁘다 속단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예술 영화와 상업 영화가 공존하고,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이 대중에게 사랑받고 가치를 존중받듯이 작품을 보여주는 방식도 여러 개일 수 있다.
분명 미술을 감상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다. 요즘 미술에만 해당되는 사실은 아니다. 다양한 선택지가 생긴 것이다. 우리가 지금 만나는 이 작품들이 다음 세기에는 어떻게 전시될까? 문뜩 궁금해진다. 분명 지금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전혀 새로운 방식의 전시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가 만났던 전시들과 함께할 것이다.

- 관련태그
- CNB 씨앤비 시앤비 CNB뉴스 씨앤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