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y in Glass] 우린 술잔에도 인생을 담았구나
차면 넘침을 알려주는 ‘계영배’… 와인·위스키·맥주 글라스는 향 모으는 역할에 충실
 제745호 김응구⁄ 2023.04.11 11:10:08
제745호 김응구⁄ 2023.04.11 11:10:08

결국, 입술과 부딪히는 건 술잔이다. 손가락으로 잡는 잔이든 손아귀로 꼭 쥐는 두꺼운 컵이든, 술은 술잔에 담겨 일렁이다 입안으로 들어간다. 그렇듯 술잔은 술과 입을 연결해주는 고마운 주기(酒器)다.
술잔은 다양하다. 주종(酒種) 따라 다르고, 같은 주종이어도 타입에 따라 다르다. 우리의 술이 그렇고 전 세계의 술이 그렇다. 막걸리는 막걸리 사발에 따라 마셔야 제맛이고, 맥주나 와인은 그에 맞는 글라스에 부어야 향과 맛을 제대로 느낀다. 각각의 술에 잘 맞는 ‘옷’이 있다는 얘기니 참 재밌다.
과유불급, 인생을 가르치는 ‘계영배’
한국인은 소주를 마신다. 당연히 소주잔이 필요하다. 여기에 소주를 흘러넘치기 전까지 따르면 대략 70㎖ 분량이 된다. 보통 7~8부 능선까지 따르니 ‘원샷’을 한다면 50~60㎖쯤 마시는 셈이다. 소주 한 병의 용량은 360㎖. 소주잔으로 일곱 잔 정도다. 좀 더 여유 있게 마시면 8~9잔까지도 가능하다. 한 잔, 한 잔이 인생을 보는 듯하다.
소주잔 입구는 원형이지만 맨 밑부분은 팔각형 모양이다. 자주 들었다가 놓으니 깨지지 않도록 밑부분은 두꺼운 편이다. 음식점이나 주점에서 사용하는 소주잔은 거의 소주회사가 제공한다. 당연히 자사의 로고나 브랜드가 새겨져 있다.
우리나라 술잔의 압권은 ‘계영배(戒盈杯)’다. 이 잔은 술이 70%쯤 차면 밑으로 흘러내린다. 가득 차 넘침(盈)을 경계(戒)한다는 의미다. 과음(過飮) 내지는 과욕(過慾)하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인 셈이다.
조선시대 도공(陶工) 우삼돌은 큰 뜻을 품고 고향인 강원도 홍천을 떠났다. 그리곤 궁중에 그릇을 만들어 진상하던 경기도 광주분원(分院)으로 들어가 당대 최고 명인의 제자가 됐다. 그의 도예기술은 날로 좋아졌고, 마침내 스승을 뛰어넘는 경지에 이르렀다. 우삼돌이 만든 순백색의 ‘설백자기(雪白磁器)’는 궁중에 진상되기까지 했다. 그의 반상기(飯床器)에 반한 순조는 치하를 아끼지 않았다. 스승은 그의 촌스러운 이름 대신 명옥이라는 이름도 지어줬다.
부와 명성이 쌓였다. 자연스럽게 주색잡기(酒色雜技)에 빠졌다. 하루도 빠짐없이 기생집을 드나들었다. 한가하게 뱃놀이도 즐겼다. 그러다 폭풍우를 만나 죽을 고비를 넘긴 끝에 혼자만 살아남았다. 초라해져 돌아온 우명옥을 스승은 반갑게 맞았다.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그에게 스승은 다시 시작할 것을 권했다. 이젠 그릇이 아닌 너를 빚어보라고 했다. 곰곰이 생각했다. 언젠가 실학자 하백원(河百源·1781~1844)에게 전해 들었던 방법대로 술잔 하나를 만들었다.
우명옥이 스승을 찾아갔다. 스승이 물었다. “무슨 잔이냐.” 그가 답했다. “계영배라고 하옵니다.” 스승은 다시 물었다. “무슨 뜻이 담긴 잔이냐.” 우명옥이 조용히 답했다. “지나침을 경계하는 잔입니다.” 그가 배운 인생을 모두 담아낸 술잔이니, 스승은 우명옥이 얼마나 대견했을까.
이 잔은 훗날 임상옥(林尙沃·1779~1855)의 손으로 넘어갔다. 그리고는 평생을 정신적 지주로 삼았다. 임상옥은 전무후무한 조선시대 최고의 거상(巨商)이 됐다.
계영배는 애주가들에게 가르침을 준다. 단순히 과음을 경계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닌, 인간의 끝없는 욕심을 경계하라고 일러준다. 욕심을 채우고 또 채우다가는 결국엔 모두 잃을 수 있다고 가르쳐주는 선생님이다.

와인·위스키·맥주 글라스는 쓰임새 강조
외국의 술잔들은 깨나 실용적이다. 그 쓰임새에 집중한다. 어떻게 하면 향을 더 잘 모을 수 있을지, 술을 더 잘 볼 수 있을지, 쉽게 잡을 수 있을지를 고민한 흔적이 뚜렷이 보인다. 와인, 위스키, 맥주 등은 모두 외국 술이니 잔 대신 글라스라는 표현을 써본다.
와인 글라스는 대개가 입구와 가까워질수록 좁아진다. 와인 향이 글라스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보통 레드와인용과 화이트와인용으로 구분돼 있다. 대부분 볼과 밑받침을 잇는 긴 다리(혹은 줄기)가 있어 ‘스템웨어(stemware)’로도 부른다.
와인은 입으로 마시지만 눈과 코로도 즐긴다. 마시기 전 코를 글라스 입구에 바싹 갖다 대고 향을 느낀 후, 글라스를 들어 색을 확인해보기도 한다. 그래서 무색투명하다. 당연한 말이지만 지문이나 더러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늘 깨끗하게 보관해야 한다.
보르도 와인글라스는 흔히 사용하는 레드와인 글라스로 이해하면 편하다. 일반적인 와인을 즐기기에 알맞은 크기지만, 최상급 보르도 와인을 마실 땐 좀 더 커다란 글라스를 쓰기도 한다. 부르고뉴 와인글라스는 귀한 향을 좀 더 잘 모으도록 볼 쪽이 넓고 입구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특징이 있다.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파티를 즐길 때 자주 보이는 술잔이 있다. 샴페인 글라스다. ‘플루트(flute)’라고 한다. 무척 길고 가늘다. 다른 글라스에 비해 눈에 띄게 입구가 좁다. 그래서 탄산이 적게 빠져나가고 기포가 올라가는 걸 잘 볼 수 있다.
입구가 아주 넓은 샴페인 글라스도 있다. ‘쿠페(coupe)’라고 부른다. 알려진 바로는 1800년대 후반 프랑스 벨에포크(Belle Epoque) 시대에 이 글라스가 유행했다. 체코 출신의 화가 알폰스 무하(Alphonse Mucha·1860~1939)가 그린 포스터 ‘루이나르 샴페인’(Champagne Ruinart·1896)을 보면 그림 속 사람이 이 잔을 들고 있다.
와인을 증류한 브랜디 글라스라고 크게 다르진 않다. 와인글라스처럼 튤립 모양이긴 해도 입구가 더 좁고 배가 더 부른 모양이다. 그 덕에 귀한 향이 글라스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 안에 갇혀선 휘감아 돈다. 마실 땐 손으로 볼을 감싸듯 쥐고 서서히 돌리며 향을 느낀 후 입안에 넣고 굴리듯 음미하면 된다.
위스키 역시 글라스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통 샷(shot)을 떠올린다. 헐리우드 영화 탓이다. 바(bar)에서 바텐더가 손님에게 작은 잔에 위스키를 따라주는데 그게 바로 샷이다. 한입에 털어낼 정도의 양인데, 약 1온스(oz) 그러니까 30㎖ 정도다.
올드패션드(old fashioned)는 흔히 보는 글라스다. 대개 넓고 낮다. 우리가 자주 들은 ‘온더락(on the rock)’이 바로 이 글라스다. 여기에 조각얼음을 넣고 위스키를 따라 마신다. 하이볼(high ball) 글라스도 있다. 하이볼이나 피츠 등의 칵테일을 마실 때 사용한다. 용량은 180㎖에서 300㎖까지 다양하다. 보통 업소에선 240㎖를 사용한다. 이보다 조금 더 긴 글라스는 콜린스(Collins)라고 한다. 300㎖에서 450㎖가량 된다.
작은 램프 모양의 글렌캐런(glencairn)은 젊은 층에 인기다. 밑부분이 아저씨 배처럼 볼록 튀어나와 있고 입구로 올라갈수록 좁아진다. 역시 향을 한껏 모아주기 위해서다. 최근 들어 싱글몰트위스키가 인기인데, 이를 즐기는 애주가들에겐 필수품으로 꼽힌다. 코피타(copita)도 위스키 애호가에겐 잘 알려져 있다. 글라스 폭이 좁아 향을 잘 가둔다. 와인글라스처럼 다리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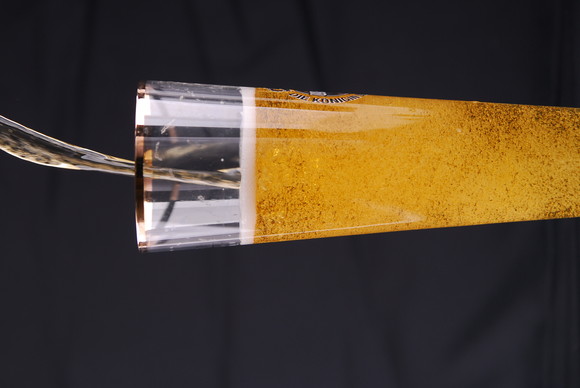
‘맥주 맛은 글라스에서 비롯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맥주는 필스너(pilsner), 에일(ale) 등 타입에 맞는 글라스가 따로 있다.
먼저, 파인트(pint)는 가장 흔한 글라스다. 입구 쪽이 밑 부분보다 살짝 넓다. 위에서 아래는 직선이거나 곡선을 넣기도 한다. 페일에일(pale ale)은 물론 포터(porter)나 스타우트(stout) 등 에일 계열 흑맥주와도 아주 잘 어울린다. 바에서 ‘기네스’를 주문할 때 나오는 전용 잔을 생각하면 형태를 이해하기 쉽다.
바이젠(weisen)은 대체로 가늘고 길며, 손으로 잡는 가운데 부분이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형태다. 이름처럼 독일의 밀맥주 계열이 이 글라스를 사용한다. 윗부분은 조금 넓은 편이지만 밑으로 내려갈수록 좁아지는 특징이 있다. 밀맥주 향을 글라스 안에 가둬놓기 위한 것이다.
필스너 글라스의 형태와 크기는 다양하지만 대개 필스너의 풍부한 홉(hop) 아로마가 코로 잘 전달되도록 고안됐다. 약간 긴 형태와 투명한 유리는 필스너의 반짝이는 황금색과 계속 올라가는 기포의 흐름을 한눈에 잘 볼 수 있게 한다.
고블릿(goblet)은 볼 형태의 글라스인데 다리가 있는 게 특징이다. 홉 아로마는 약하지만 맛이 진한 맥주에 적합하다. 넓은 입구 덕분에 미세한 향을 깊이 들이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튤립(tulip)은 말 그대로 튤립 모양에 다리도 달려있다. 고블릿의 일종이다. 향이 좋은 맥주에 어울린다. 향을 한데 모아주기 때문. 그래서 벨지언 에일(belgian ale)을 마실 때 많이 찾는다.
알고 마시는 것과 그냥 마시는 건 아주 큰 차이가 있다. 한 번 알고 나면 향이 보이고 맛도 보인다. 당연히 더 맛있게 느껴진다. ‘소확행’이라고 했던가? 일종의 작은 행복이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
- 관련태그
- 술잔 계영배 맥주 위스키 와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