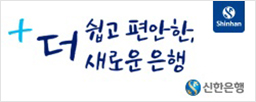[인터뷰] “버팔로 트레이스 증류소, 5~6번은 더 다녀와야죠” BEX 스피리츠 코리아 브랜드 앰배서더 문민수
버팔로 트레이스 증류소, 일찌감치 온도조절장치 개발해 ‘엔젤스 셰어’ 콘트롤… 랩실에선 꾸준히 실험, 좋은 결과는 제품화… 버번위스키 3년 넘게 공부 중… “브랜드 앰배서더는 브랜드의 얼굴”
 제777호 김응구⁄ 2024.08.09 14:06:28
제777호 김응구⁄ 2024.08.09 14:06:28

미국 버번위스키를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브랜드가 ‘버팔로 트레이스(Buffalo Trace)’다. 말 지어내기 좋아하는 사람들 덕에 ‘버번 입문 3대장’ 중 하나로 알려졌다. 수입·유통사 비이엑스(BEX) 스피리츠 코리아는 ‘미국에서 가장 전통적인 프리미엄 버번위스키’로 소개한다.
비이엑스 마케팅팀에는 버팔로 트레이스 브랜드 앰배서더가 있다. 주인공은 문민수다.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더현대 서울에서 열린 버팔로 트레이스 팝업스토어에서 첫인사를 나눴다. 한 달 뒤, 비이엑스 사무실이 있는 성수동에서 그와 마주 앉았다. 그날, 버번위스키를 제대로 공부했다.
- 우선 버팔로 트레이스부터 잠깐 소개해주시죠.
“아주 간단히 말하면 버팔로 트레이스 증류소에서 생산하는 주력 브랜드예요. 미국 켄터키주 리스 타운(Lee’s Town)이라는 곳에 증류소가 있어요. 핸콕 리(Hancock Lee)와 윌리스 리(Willis Lee) 형제가 지금의 부지에서 위스키를 처음 만들었다고 해요. 증류소에선 1700년대에 시작했다고 얘기하고요. 버팔로 트레이스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됐고, 가장 크고, 헤리티지가 가장 높은 증류소 중 하납니다. 미국 증류소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운영하면서 단 하루도 가동을 멈춘 적이 없는 유일한 곳으로 기록돼 있기도 하죠. 출시 제품은 버팔로 트레이스 외에도 ‘이글 레어(Eagle Rare)’라든지 전 세계 모든 위스키 애호가가 갖고 싶어 하는 ‘패피 반 윙클(Pappy Van Winkle)’, 하이엔드 버전인 ‘버팔로 트레이스 앤티크 컬렉션(Antique Collection)’ 그리고 세계 최초의 싱글 배럴 버번위스키인 ‘블랑톤(Blanton)’ 등 라인업이 정말 다양해요.”
- 버팔로 트레이스를 볼 때마다 생각나는 건데, 라벨에 그려진 강렬한 들소 있잖아요. 어떤 의미인 거죠?
“영국 청교도들이 미국에 정착했을 당시에는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대륙이었잖아요. 그래서 버팔로 같은 짐승들이 다녔던 길을 통해 개척을 시작했어요. 바로 그 개척 정신을 헤리티지로 이어받아 버팔로 트레이스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 아메리칸 위스키에 입문하는 사람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켄터키위스키가 뭐고 테네시위스키가 뭐고, 결국 다 똑같은 것 아니냐는 거죠.
“아메리칸 위스키를 세분화하면 테네시위스키, 버번위스키, 콘위스키, 라이위스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요. 테네시위스키는 말 그대로 테네시(Tennessee) 지역에서 생산하는 위스키여서 테네시위스키로 따로 분류해요. 버번위스키는 원재료인 옥수수를 51% 이상 사용하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안을 새카맣게 그을린 새 배럴(barrel·나무통)만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 캔터키위스키나 테네시위스키 모두 버번위스키로 보는 건 무리일까요?
“정확히는 테네시에서 만든 제품들은 테네시위스키로 따로 분류하는 게 맞습니다. 버번위스키가 아닌 테네시위스키로 말이죠. 제품 라벨을 보면 버팔로 트레이스, 패피 반 윙클, 이글 레어 모두 ‘켄터키 스트레이트 버번위스키(Kentucky Straight Bourbon Whiskey)’ 이렇게 쓰여 있어요. 테네시위스키로 유명한 제품에는 아예 ‘테네시위스키’라고 명시돼 있고요.”

- 위스키라고 하면 보통 스코틀랜드를 먼저 생각하게 돼요. 유명하다고 알려진 것 중 많은 수가 스코틀랜드 위스키여서 그럴 수도 있겠어요. 아메리칸 위스키와 스코틀랜드 위스키, 딱 둘만 놓고 봤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일단 원재료 자체가 다르죠. 스코틀랜드에서 만드는 스카치위스키는 잘 아시다시피 보리, 그러니까 맥아(麥芽)가 주원료죠. 미국의 버번위스키는 옥수수가 주재료고요.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캐스크(cask)를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통, 배럴이라고도 하죠. 스코틀랜드 위스키는 이 캐스크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어떤 캐스크든 다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미국에선 단 하나의 캐스크만 사용해요. 안을 새카맣게 그을린 새 캐스크만으로 위스키를 숙성하는 게 기준이죠.”
- 그거 하나를 쓰고 나면 버리는 건가요?
“원칙상으론 폐기가 맞는데 그렇다고 버리진 않죠. 왜냐면 스코틀랜드나 일본, 대만 등 많은 나라에서 위스키를 만들잖아요. 심지어 우리나라도 쓰리소사이어티스나 김창수위스키 같은 곳에서 위스키를 만들죠. 한국을 포함해 스코틀랜드 등은 캐스크에 대한 제한이 없고 어떤 배럴이나 캐스크를 써도 되니까 미국에선 폐기해야 할 배럴을 이들 나라에 팔아요.”
- 통 안을 태운다고 하니까 하는 말인데, 그 향이 너무 세지 않을까요? 이를테면 태운 향이 위스키 원액에 너무 깊게 개입되는 건 아닌가 하는 거죠.
“저흰 그걸 ‘찰링(charring)’이라고 하는데, 초(秒) 단위로 레벨 1부터 5까지 세분화해 나눠요. 이를테면 10초부터 25초까진 레벨 1, 25초부터 45초까진 레벨 2,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보통 아메리칸 배럴은 레벨 4가 대부분이에요. 한 1분 정도 태운다고 보면 돼요.”
- 어떻게 태우나요.
“불기둥 같은 곳에다가 통을 해놓고(씌워놓고) 안을 새카맣게 그을려요. 그러면 숯처럼 되죠. 이 안쪽 표면을 저흰 ‘앨리게이터 스킨(alligator skin)’이라고 불러요. 악어가죽처럼 갈라져 있으니까요. 그러면 알코올 침투가 더 잘 되겠죠. 나무 본래의 향과 맛을 빼면서 필터링 역할도 하고요. 비 내린 숲을 가보면 피톤치드라든지 나무 향이 막 느껴지잖아요. 그건 나무 겉껍질에서 나오는 향이고, 캐스크를 태우면 나무의 중심에 있는 향까지 빼내요. 알코올과 그 나무 성분이 만나면 정말 다채로운 향과 풍미가 일어나는 거죠.”
- 캐스크는 물론 참나무죠?
“그렇죠. 거기도 참나무가 많아요. 미국의 캐스크는 좀 재밌어요. 스코틀랜드의 대형 증류소들은 캐스크 만드는 회사를 각자 가지고 있든지 하잖아요. 미국은 캐스크를 만드는 회사가 따로 있어요. ‘쿠퍼리지(cooperage)’라고 하는데 그 회사에다 오더(주문)를 냅니다. 보통 단일 표준 사이즈로 똑같은 제품을 공급하는데, 증류소마다 통 안을 태우는 정도, 아까 얘기한 그 레벨을 따로 주문하는 거죠. 예를 들어 어느 증류소는 레벨 3으로 해달라, 또 다른 증류소는 레벨 5로 해달라는 식이죠.”
- 아메리칸 위스키도 전통·정통적이면서 한편으론 깨나 실험적인 면도 있고, 그렇게 지금까지 발전해 온 듯싶어요.
“버팔로 트레이스 증류소는 그 역사만큼 헤리티지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전통만 고집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실험도 많이 해요. 실제로 미국의 증류소들을 가보면 웬만한 빌딩보다 큰 숙성 창고가 몇십 개씩 있어요. 버팔로 트레이스는 숙성 창고를 A, B, C, D 같이 알파벳 순으로 나열하는데, 그중 X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긴 랩(lab)이에요. 일종의 실험실 같은 건데, 평소 만들어보지 않았던 제품들을 개발해보는 거죠. 마스터 디스틸러(master distiller)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괜찮은 결과물이 나오면 이걸 제품화합니다.”

- 자꾸 스코틀랜드와 비교해서 그렇긴 한데, 이 지역의 위스키와 아메리칸 위스키의 숙성 연도가 같아도 실제로는 한 3~4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들었어요.
“사실 버번위스키를 얘기하면 스코틀랜드와 당연히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종종 클래스를 진행하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비교해가며 얘기해요. 스코틀랜드와 미국은 기후나 만드는 방식이 워낙 달라요. 일단 스코틀랜드는 비가 내릴 듯 안 내릴 듯하고 안개가 껴 있기도 하면서 습하죠. 또 덥지도 춥지도 않잖아요. 그런 기후 조건은 알코올, 즉 위스키를 장기 숙성하기에 좋습니다. 왜냐면 날씨가 덥지 않고 선선하고 습도가 있으니 증발이 잘 안 돼요.”
- 증발한다는 게 흔히 말하는 ‘엔젤스 셰어(Angel’s Share)’를 뜻하죠?
“맞아요. 1년에 날아가는 그 퍼센티지가 스코틀랜드는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켄터키의 기후는 분명하게 나뉘어요. 여름에는 정말 덥고요, 겨울에는 엄청 춥습니다. 온도 차가 심해요. 그러다 보니 엔젤스 셰어도 심할 수밖에 없어요. 날씨가 더울 때 숙성은 더 빨리 진행됩니다. 알코올 온도가 올라가면 나무통에 침투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죠. 스코틀랜드에서 만드는 15년, 20년 제품은 증발하고 나서도 안을 들여다보면 원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하지만 미국에선 한 20년 정도 숙성한 제품은 잘 안 보일 정도예요.”
- 그럼 몇 퍼센트가 빠지는 거예요?
“1년에 보통 4% 정도 빠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 미국은 장기 숙성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증발량이 너무 많아서요. 그런 이유로 미국에서 10년 이상 혹은 15년 이상 숙성한 제품들은 가격이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곤 해요. 사실 원액이 날아가면 날아갈수록 그것에 대한 손실은 증류소가 떠안아요. 당연히 원액을 꺼냈을 때 양이 적으면 이에 대한 프라이스(가격)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 천사들이 너무 많이 가져가는데요?
“아주 많이 가져가죠. 하지만 지금은 과거에 비해 기술이 많이 발전됐잖아요. 숙성 창고를 만드는 방식도 업그레이드됐을 거고, 숙성 기술도 더 좋아졌죠. 버팔로 트레이스는 3.7~4.2%가량 빠진다고 보면 되는데 이것도 콘트롤해서 이 정도인 겁니다. 버팔로 트레이스가 다른 증류소와 다른 점 중 하나가 뭐냐면 일찌감치 온도 조절 장치를 개발해서 숙성 창고에 도입했다는 거예요.”
- 그게 언제 얘기죠?
“1800년대 후반 조지 스태그(George T. Stagg)라는 사람이 숙성 창고 안에다가 스팀기를 달았어요. 그걸로 습도를 조절했죠. 이건 지금도 때마다 개량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걸 그들은 아주 강조해요. 이렇게 습도를 조절하면 엔젤스 셰어를 어느 정도 콘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덕분에 다른 증류소보다 고(高)숙성 원액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보유량이 다른 증류소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아요. 저희 제품 중에 ‘스태그(Stagg)’라고 있거든요. 조지 스태그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겁니다.”

-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요새 하이볼 인기가 대단해요.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론 위스키 시장을 넓히는 데 가장 크게 공헌한 카테고리라고 생각해요. 위스키는 알코올도수가 아무리 낮아도 40도예요. 이건 사실 일반 여성이나 술을 잘 못 마시는 사람에겐 쉽지 않죠. 주로 소주나 맥주를 마시는 남성 중에도 못 마시겠다고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고요. 근데 하이볼이란 카테고리가 붐이 일면서 위스키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줬어요. 그렇다 보니 어느 순간 하이볼의 기주(基酒·베이스)가 궁금해져 그걸 따로 찾아서 마시게 되고, 그와 비슷한 다른 위스키도 마셔보는 거죠.”
-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 주류문화 중 하나가 ‘소맥’(소주+맥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이미 하이볼이라는 카테고리를 계속 즐겼던 겁니다. 탄산 있는 맥주에 소주를 타서 마셨잖아요. 거기서 재료만 바뀐 거예요. 게다가 우린 맥주와 위스키를 섞은 ‘폭탄주’도 있죠. 그렇듯 섞어 마시는 것에 이미 적응이 돼 있었던 거예요.”
- 그럼 당분간 그 인기는 지속할 거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오래 갈 거라고 봐요. 실제로 제가 시음회를 진행하다 보면 위스키를 좋아하게 됐는데 여전히 독주(毒酒)로 인식하거나 빨리 취하는 사람은 좋은 위스키여도 하이볼로 마시는 경우가 있어요. 몇몇은 이렇게 마셨을 때 오히려 위스키의 맛과 향이 더 잘 잡혀서 좋다고 해요. 그런 걸 봤을 때도 하이볼은 없어지지 않고 쭉 갈 듯합니다.”
- 개인적으론 좀 보수적인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기주 고유의 정통성이라든지 독자적인 아이덴티티라든지 이런 게 점점 사라지는 건 아닌가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대로면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국내에 위스키가 유행한다고 해도 아직 그 시장은 가까운 대만이나 일본에 비할 바가 안 돼요. 저는 어떻게든 위스키를 즐기는 방식이 들어와 자리를 잘 잡았다? 그럼 시장이 일단 커진다고 생각해요. 하이볼을 먼저 접해본 사람들이 좀 더 위스키에 딥하게(깊게) 들어가고, 그렇게 원액의 맛도 즐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시장에는 더 득이 된다고 봐요.”
- 왜 음악도 어떤 것이든 계속 듣다 보면 그 원류인 블루스라든지 재즈를 찾아 듣게 되듯이 말이죠?
“우리가 재즈를 듣는다고 해서 갑자기 처음부터 루이 암스트롱의 바이닐(LP)을 사서 듣진 않잖아요. 그냥 유튜브로 검색해서 나오는 재즈들을 듣다가 차츰 누가 좋네, 아니면 누가 더 좋네 하면서 그때부터 깊게 들어가죠.”
- 누군가 브랜드 앰배서더가 뭐예요?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브랜드의 얼굴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브랜드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야 하니까요. 누구에게든 자신 있게 내보일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브랜드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하죠. 지금도 공부 많이 해요. 예전에 싱글몰트위스키를 공부할 땐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았고, 그래도 어느 정돈 습득했다 생각했는데, 지금 버팔로 트레이스라든지 버번위스키는 3년 넘도록 계속 공부 중이에요.”
- 마지막으로 버팔로 트레이스를 아주 맛있게 마시는 방법을 소개해주세요.
“이건 개인적인 방법 중 하난데요. 그대로 마시는 것도 좋지만 만약 기회가 된다면 맥주 ‘기네스’ 있잖아요. 같이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예를 들어 버팔로 트레이스 한 샷이 있고 기네스 한 잔이 있으면, 기네스를 한두 모금 정도 마시고 나서 버팔로 트레이스 한 샷을 마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는 소맥 같은 폭탄주 개념인데, 이 음용법을 좋아해요.”

브랜드 앰배서더는 무조건 한 번 이상은 현지 증류소를 다녀와야 한다는 게 문민수의 지론이다. 그래야 내가 맡은 브랜드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 수 있단다. 세상에 떠다니는 온갖 정보 외에, 더불어 누구도 알려주지 않은 귀한 정보를 꼭 얻게 된다는 것이다.
버팔로 트레이스 증류소는 그 역사와 명성만큼 규모가 대단하다. 하루에 다 돌아본다는 건 실제로 불가능하다. 문민수는 이제껏 두 번을 다녀왔다. 앞으로 5~6번은 더 가야 한 바퀴 제대로 돌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다 했다. 켄터키주 직항이 없어 대기하고 비행기 타고 차 타고 하다 보면 하루를 넘긴다. 그 시간마저 설렌다는 게 그의 말이다. 보고 싶은 게 천지고, 저쪽에선 보여주고 싶은 게 천지다. 환상의 조합 아닌가.
브랜드 앰배서더는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전용인 줄만 알았다. 그들의 얼굴이 곧 브랜드인 셈이니. 이제 알았다. 적어도 주류 쪽에선, 특히 위스키 쪽에선 ‘위친자’(위스키+미친자)도 브랜드 앰배서더가 될 수 있단 사실을.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
- 관련태그
- 버팔로 트레이스 버번위스키 브랜드 앰배서더 문민수 B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