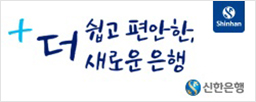[이문정의 요즘 미술 읽기 - 새로운 재료] 버려져, 안 보여, 사라지기에 미술재료 되다
 제518호 이문정(미술평론가, 이화여대/중앙대 겸임교수)⁄ 2017.01.16 09:29:46
제518호 이문정(미술평론가, 이화여대/중앙대 겸임교수)⁄ 2017.01.16 09:29:46
 (CNB저널 = 이문정(미술평론가, 이화여대/중앙대 겸임교수)) 2017년에는 어떤 전시들이 관객을 맞이할 채비를 하고 있을까? 국내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 회화의 시작을 알렸던 장 미쉘 바스키아(Jean Michel Basquiat), 한국 근대 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중 한 사람인 김환기, 2016년 ‘토털리 템스(Totally Thames)’의 메인 작가로 참여했던 강익중 등, 올해에도 정말 다양한 전시가 예정되어 있다. 2017년은 각각 2년, 5년, 10년의 주기로 열리는 베니스 비엔날레(Venezia Biennale), 카셀 도큐멘타(Kassel Documenta), 뮌스터 조각 프로젝트(Skulptur-Projekte Muenster)가 동시에 열리는 해이기도 하다. 이러한 국제 미술 행사는 동시대 미술의 주요 흐름과 이슈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생생한 현장이다. 물론 여기에는 아직 - 혹은 여전히 - 난해해 보이는 작품들도 포함된다. 낯선 재료의 사용은 이러한 경험에 일조한다. 비단 비엔날레가 아니라 하더라도, 현재 진행형의 미술 전시회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미술 안으로 들어온 다양한, 때로는 기상천외한 재료(매체)들을 보고 당황하거나 재미있어 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요즘 미술을 대표하는 특징으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재료의 다양성이기 때문이다. ‘회화에는 캔버스와 물감, 조각에는 나무와 돌, 흙’이라는 장르별로 사용되던 재료에 대한 경계가 해체된 것은 이미 오래 전의 일이다. ‘요즘 미술’의 이전 칼럼들 중 ‘장르 해체, 작은 물건, 부드러운 재료’ 등의 주제에서도 언급했듯이 미술에서는 절대 만날 수 없을 줄 알았던 재료들이 넘쳐난다.
(CNB저널 = 이문정(미술평론가, 이화여대/중앙대 겸임교수)) 2017년에는 어떤 전시들이 관객을 맞이할 채비를 하고 있을까? 국내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 회화의 시작을 알렸던 장 미쉘 바스키아(Jean Michel Basquiat), 한국 근대 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중 한 사람인 김환기, 2016년 ‘토털리 템스(Totally Thames)’의 메인 작가로 참여했던 강익중 등, 올해에도 정말 다양한 전시가 예정되어 있다. 2017년은 각각 2년, 5년, 10년의 주기로 열리는 베니스 비엔날레(Venezia Biennale), 카셀 도큐멘타(Kassel Documenta), 뮌스터 조각 프로젝트(Skulptur-Projekte Muenster)가 동시에 열리는 해이기도 하다. 이러한 국제 미술 행사는 동시대 미술의 주요 흐름과 이슈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생생한 현장이다. 물론 여기에는 아직 - 혹은 여전히 - 난해해 보이는 작품들도 포함된다. 낯선 재료의 사용은 이러한 경험에 일조한다. 비단 비엔날레가 아니라 하더라도, 현재 진행형의 미술 전시회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미술 안으로 들어온 다양한, 때로는 기상천외한 재료(매체)들을 보고 당황하거나 재미있어 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요즘 미술을 대표하는 특징으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재료의 다양성이기 때문이다. ‘회화에는 캔버스와 물감, 조각에는 나무와 돌, 흙’이라는 장르별로 사용되던 재료에 대한 경계가 해체된 것은 이미 오래 전의 일이다. ‘요즘 미술’의 이전 칼럼들 중 ‘장르 해체, 작은 물건, 부드러운 재료’ 등의 주제에서도 언급했듯이 미술에서는 절대 만날 수 없을 줄 알았던 재료들이 넘쳐난다. 오늘은 비(非)미술적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뜨린, 요즘 미술에 사용되는 재료들 중 버려진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사라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버려지는 것들
버려진 것들이 미술에 본격적으로 선을 보이게 된 것은 1960년대 들어서면서 과거와는 달라진, 산업화된 현실을 보여주고자 했던 일련의 작가들이 활동했던 누보 레알리즘 Nouveau Réalisme) 이후이다. 예술의 사회성을 강조하며 현실에 두 발을 딛는 미술을 원했던 자크 빌레글레(Jacques Villeglé)와 레이몽 앵스(Raymond Hains)는 도시의 벽에 여러 겹으로 붙어 있던 포스터들을 활용했고, 장 팅겔리(Jean Tinguely)는 버려진 엄청난 양의 고철들을 가져다 움직이는 조각을 만들어냈다. 세자르(César Baldiccini) 역시 버려진 기계, 폐차된 자동차들을 압축했다. 아르망(Armand Fernandez)은 ‘여인의 조건 I(Condition of Woman I)’(1960)에서 화장 솜, 화장품의 빈 용기, 포장지 등을 투명한 박스 안에 가득 담았다. 굳이 정크 아트(Junk Art)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더라도 버려진 물건을 작업의 주재료로 사용하는 작가들은 많다.

▲신미경, ‘Translation-Vase Series’, 비누, 바니쉬, 크레이트, 가변설치, 2006~ongoing, 스페이스 K에서 열렸던 신미경 개인전(2016) 설치 모습. 사진제공 = 스페이스K
보이지 않는 것들
비물질적인 빛이나 공기, 바람, 소리, 그저 비어있는 공간 그 자체가 미술의 재료가 되기도 한다. 1970년대에 이미 크리스토(Christo Javacheff), 월터 드 마리아(Walter De Maria)는 자연 환경 그 자체를 재료로 선택했다. 이승택은 1960년대부터 바람처럼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는 것들, 불이나 연기처럼 명확한 형태를 규정할 수 없는 것들에 주목했다. 이러한 시도들은 영원성을 갖는 작품, 누군가의 소유물이 되어 보관되는 작품이라는 규범을 깨뜨린다. 그저 전등이 깜박이기만 하는 ‘작품 227번, 점멸하는 불빛(Work No. 227, The Lights Going on And off)’(2000)으로 터너상(Turner Prize)을 수상해서 이슈가 되었던 마틴 크리드(Martin Creed)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그에 맞추어 남녀의 목소리가 화음을 만들어내는 ‘작품 371번: 엘리베이터 우/아 업/다운 Work No. 371: Elevator ooh/aah up/down(2004)’을 제작하기도 했다. 층이 높아지는 만큼 고음으로 올라가는 화음이 엘리베이터 안에 울려 퍼지면서 무미건조하던 공간은 유쾌하고 활기 넘치는 특별한 공간으로 전환되었다.
사라지는 것들
한편 어떤 작품들은 이내 닳고 없어지는, 영구성을 갖지 못하는 재료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대표 작가로 신미경을 들 수 있다. 신미경은 비누로 전통 조각과 불상, 다양한 나라의 도자기 등을 만든다. 작업 과정을 보여주는 동영상을 보지 않는다면 비누로 만든 것이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진짜 대리석 조각 같고 도자기 같다. 서구의 박물관에서 대리석 조각을 보고 비누 같은 조밀함과 부드러움을 느꼈던 자신의 경험을 반영한 이 작업에 작가는 ‘번역(Translation)’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이는 국가 혹은 민족마다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소통하려 노력해도 완벽히 공감할 수 없는 진공 같은 영역이 존재함을 은유하는 것이다.

▲신미경, ‘Painting Series’, 비누, 프레임, 가변설치, 2014, 스페이스 K에서 열렸던 신미경 개인전(2016) 설치 모습. 사진제공 = 스페이스K
사실 비누나 얼음으로 만든 작품들만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단단하고 튼튼한 재료로 만들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 작품은 사라질 수 있다.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고대 그리스 시대의 조각들 역시 영원불멸하지 못했다. 예술을 포함한 인간의 문명이 영원할 것이라는 고정관념, 그것은 깨질 수밖에 없는 희망사항일지 모른다.
(정리 = 최영태 기자)
- 관련태그
- CNB 씨앤비 시앤비 CNB뉴스 씨앤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