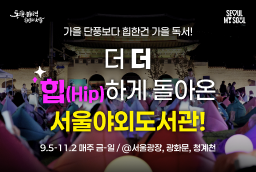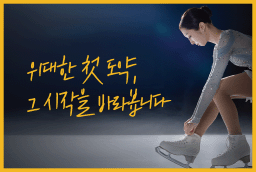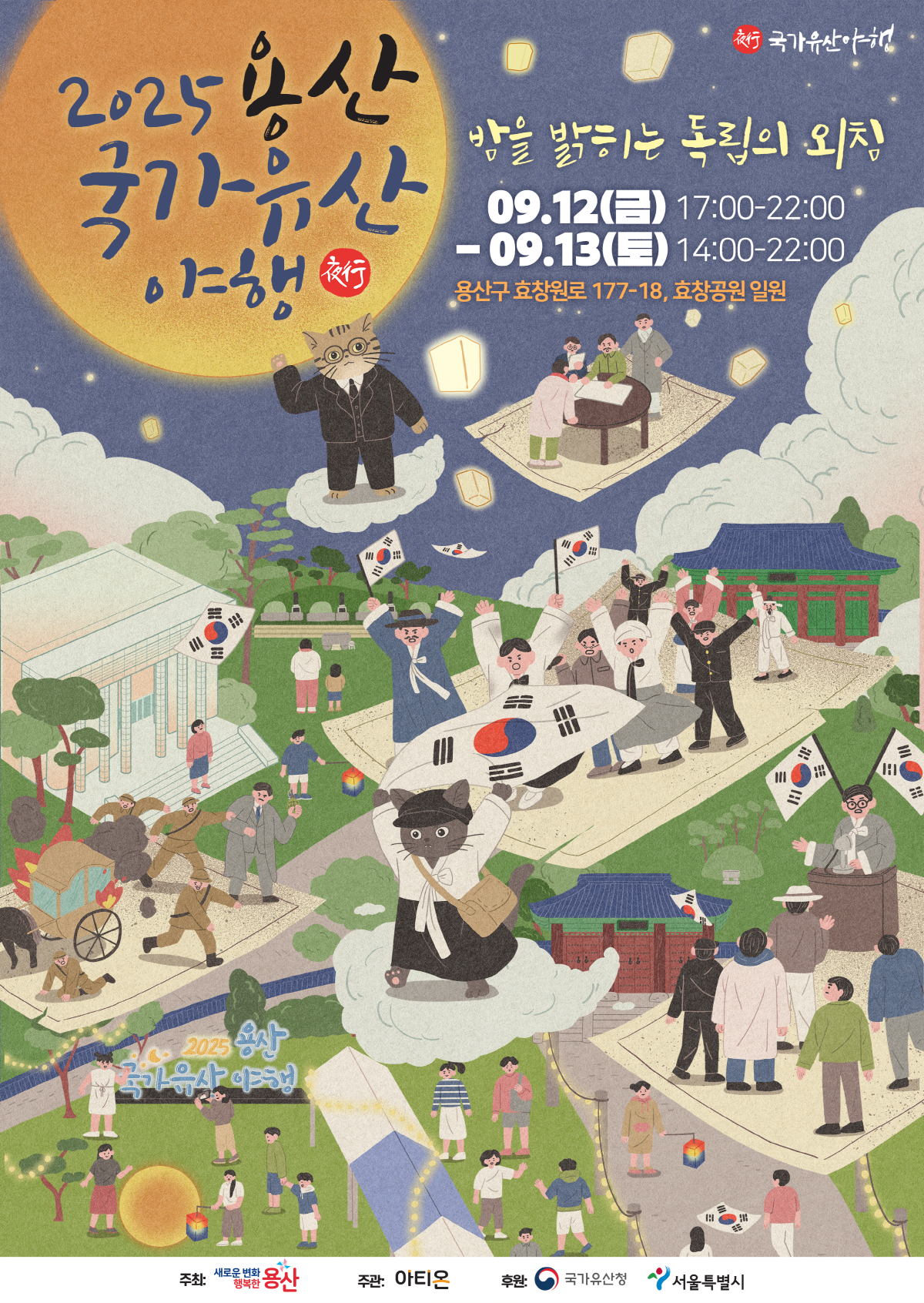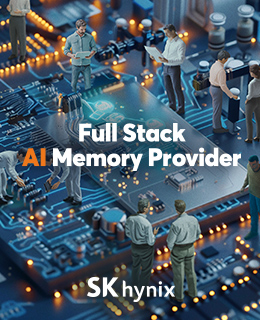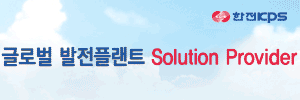(문화경제 = 이한성 옛길 답사가)
각림사를 출발한 매월당은 멀리 오대산을 향해 길을 떠난다. 길은 주천강을 끼고 동북쪽으로 이어진다. 이윽고 도착한 곳이 작은 산촌 마을 안흥(安興)이다. 원주에서 이어온 관동대로와 횡성에서 내려온 길이 만나 지금의 42번 국도가 되어 안흥으로 들어온다. 매월당 시대에는 대관령으로 이어지는 큰길이었다. 영동고속도로가 생기기 전, 우리 시대에도 대관령 넘어 강릉으로 가는 길이었다. 그런데 영동고속도로가 생기고 나서는 평창읍으로 가거나 이 길 중간지점이 목적지가 아니면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길이 되었다.

‘안흥 찐빵’의 고장
다행히 안흥 찐빵이 이름을 얻어 사람들은 안흥이라는 지명을 알게 되었지만 안흥이 어디인지 들러본 이들은 많지 않다. 치악산 주변에는 찐빵으로 이름을 얻은 두 마을이 있다. 이곳 안흥과 치악산 남쪽 신림면의 황둔(黃屯)이다. 두 곳 다 먹을 만한데 아쉬운 것은 앙꼬(팥소)가 부족하여 풍미가 떨어진다는 점이다. 팥소 가득한 팥빵에 길들여진 신세대들은 맛있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프리미엄급을 출시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며 안흥을 지나다가 문득 매월당께 죄송스러운 생각이 든다. 허기지고 고단한 먼 길을 걸었을 매월당은 안흥역을 지나며 끼니는 제대로 드셨을까?

안흥을 지나면 이제부터 길은 서서히 고도를 높인다. 산을 넘어가는 큰 고개가 기다리고 있다. 언제부터인가는 문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실록이나 지리서에는 독현, 독령(禿峴, 禿嶺)으로 기록돼 있다. 지금은 고개 아래로 문재터널이 뚫려 수월하게 지나는 길이 되었지만 매월당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다. 세종 3년 신축(1421) 3월 1일 실록 기록을 보자. 지난달 글에 소개했듯이 태종과 세종의 강무(講武) 길 기록이다.
“가마가 독령(禿嶺)을 넘어가는데, 길이 매우 험하고, 또 진눈깨비로 인하여 길이 질어, 짐꾼들이 넘어지는 자가 열에 8, 9명이 되었고, 말이 지쳐서, 호종하는 사람이 모두 애를 먹었다. 상왕(태종)이 고개 위에서 군졸과 짐꾼이 넘어진 것을 보고 말을 멈추고 내시에게 명하여 이들을 싣고 가게 하였다. 저녁에 행차가 강릉 방림역(方林驛) 들에 머물렀다.”
駕踰禿嶺, 路甚險阻, 又値雨雪泥濘, 輜重顚仆十八九, 人馬疲困, 扈從者皆苦之. 上王在嶺上, 見衛士輜重顚仆者, 駐馬命內竪載之. 夕次江陵 方林驛之原.
이곳뿐 아니라 조선의 길들이 대개 이렇게 힘들다 보니 세조는 전국의 역참을 정비한다. 1462년(세조 8년) 실록의 기록이다.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이보다 먼저 여러 도(諸道)의 참-역(站驛)을 혹은 역승(驛丞)을 파(罷)하고 각각 그 부근에 합하여 하나의 길[道]을 만들어서 찰방(察訪)을 두었으나, 관할하는 역(驛)이 많고 길이 멀리 떨어져서 찰방이 두루 살피기가 어려우므로 역로(驛路)가 조잔(凋殘)하니, 이제 다시 마감(磨勘)하여 대(大)-중(中)-소(小)의 역로 및 원근(遠近)을 나누어서 그 전의 역승을 각 역로에 차견(差遣)하여 1찰방마다 역승 1명을 더 두게 하소서. 삼가 뒤에 갖추어 아룁니다.”
兵曹啓: 在先諸道站驛或罷, 驛丞各以附近合爲一道置察訪, 然所管驛多道里遙隔, 察訪未易遍察, 驛路凋殘, 今更磨勘分大中小驛路及遠近, 已前驛丞差遣各路, 每一察訪加設驛丞一. 謹開具于後.
이때 운교역, 방림역, 대화역, 진부역, 횡계역(雲交驛, 方林驛, 大和驛, 珍富驛, 橫溪驛)도 정비되었다. 아쉽게도 매월당이 지나간 2년 뒤이니 매월당은 힘든 길을 갔을 것이다.
그 뒤(1490년, 성종 21년) 이 길을 넘은 사헌부감찰 권오복도 이 고개가 많이 힘들었던가 보다.
안흥에서 새벽밥 먹고 대환으로 갔는데, 높고 높은 독령고개 부여잡고 올랐네
(蓐食安興至大還 崎嶇禿嶺强躋攀)
매월당도 독령을 넘느라고 힘들었을 것이다. 다행히 봄이었으니 길이 미끄럽지는 않았겠지. 시대는 참 많이 바뀌어 이리도 힘든 고개가 우리 시대에 와서는 멋진 고갯길 트레킹 코스가 되고, 산줄기를 타는 산객(山客)들에게는 백덕지맥이라는 환상의 종주 코스가 되었다. 조선 시대에 이 고개를 대머리 고개(禿嶺)로 부른 것을 보면 아마도 나무 없는 민둥산 고개였던 모양이다. 이제는 산 꽃도 가득하고 단풍취도 향기로운 숲길로 변해 있다.
이 고개를 넘어서면 예전에는 강릉 땅이 시작되었다. 지금은 평창 땅이다. 영서(嶺西: 대관령 서쪽) 지방의 시작인데 이 고개에서 대관령까지가 영서(嶺西), 대관령을 넘으면 비로소 영동(嶺東)이 된다. 문재(독령)를 넘어 언덕길을 내려가 만나는 작은 삼거리 마을이 운교리이다. 옛날 이곳에 역(驛)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이제는 거의 아무것도 없다. 세월이 흘러 이곳에 머물다 갈 나그네가 없어지니 역 마을은 자연으로 돌아왔다. 택리지를 쓴 이중환도 어린 나이에 이곳을 지나갔다. 팔도총론 강원도 편에 그의 추억의 길이 남아 있다.
“한양 동쪽에서 용진을 건너면 양근 지평인데 갈현(葛峴)을 넘으면 강원도와 경계가 되고 또 동으로 하루쯤 가면 강릉부의 동쪽 경계 운교역(雲橋驛)에 이른다. 옛날 내 선대부께서 계미년(1703년 숙종 29년) 강릉 수령이 되셨는데 그때 내 나이 열네 살이었다. 가마를 따라 운교에서 강릉부의 서쪽 대관령에 이르는 연도는 평지와 높은 고개를 막론하고 모두 수목으로 덮여 우러러보아도 해가 보이지 않았는데 약 사흘간의 노정이 그러하였다. 이제 수십 년 전부터 산야가 모두 개간되어 경작지가 되고 집들이 이어져 산에는 작은 나무도 없어졌다. 이런 일로 미루어 보아 다른 고을도 이와 같은 상태임을 알겠다. 이는 성대(聖代)에 백성 수가 점점 번성함을 알 수 있으나 산천은 많이 피곤해졌다. 인삼의 옛 산지는 영서의 깊은 골짜기였는데 산속 아이들이 불을 태워 산출이 점점 줄게 되고 홍수가 나고 산이 무너져 한강으로 유입되니 한강은 점점 얕아진다.”
율곡도 여름 장마에 운교역을 지나갔다.
장맛비 산길은 여울이 되었는데 아침나절 지나 돌다리 건너네
쓸쓸한 역점(驛店)은 멀어 수심은 일고 말이 좋아하는 들은 펼쳐졌구나
積雨瀨山路 終朝行石梁 人愁荒店遠 馬愛綠坪長
길은 운교 ~ 방림 ~ 대화 ~ 진부 ~ 횡계로 이어지는데 조선 중기 이전까지는 이곳 영서의 길은 숲이 우거지고 인총은 드문 지역이었던 모양이다. 이들보다 이전 시대에 매월당은 이 길을 지나갔다. 숲은 우거지고 사람 찾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필자도 매월당이 갔을 길을 따라간다. 이제는 42번 국도로 정비된 길과 푸른 농지, 깨끗한 농가 주택이 간간이 자리 잡고 있다. 매월당이 지났던 산과 들에 숲과 들꽃만 가득한 길은 아니다. 방림(芳林)에 다다르기 전 오래된 나무를 만난다. 전국에서 제일 나이 많은, 400년 가까이 된 재래종 밤나무라 한다. 천연기념물이다. 카메오 출연하여 사진 한 장 찍어 보았더니 필자의 모습이 조금 과장하면 큰 나무에 붙은 매미 같다. 매월당이 지나던 때에는 없었던 나무다.
곧 방림(芳林)면에 도착한다. 지리지에는 강릉읍치에서 170리라 기록된 마을인데 깨끗한 면소재지에 사람은 보기 힘들다. 특별한 관광지가 아니면 이제 전국의 면소재지에서 사람 구경하기 힘들다. 560여 년 전 매월당은 이 길 방림역에 머물며 시 한 수 읊었다. 산과 숲과 꽃이 만발한 마을이라서 방림(芳林)이었나 보다.
방림역에서
옛 역은 산 깊이 있고
초정(草亭)은 한적하네
냉이꽃 보리밭둑에 폈는데
사초 풀은 이끼 낀 마당을 둘렀구나
여린 녹색(綠色) 맑은 물결에 정갈한데
삥 두른 산은 짙은 녹음 어둡네
절집 찾아 나서 보려는데
멋진 경치는 형언하기 어렵구나
芳林驛
古驛深山裏. 蕭條有草亭. 薺花生麥壟. 莎草擁苔庭. 嫩綠澄波淨. 堆靑列岫暝. 爲尋雲水窟. 佳景妙難形.
면사무소 앞 정자는 이름이 방민정(芳民亭)이다. 강릉이 고향이며 삼척부사를 지낸 허균이 방림을 읊은 시가 걸려 있다. 역시 산과 숲을 읊는 가운데 인생의 고뇌를 얹었다.
산협(山峽)에 들었는데 봄은 아직 남아 있네
시냇가에 풀꽃은 바야흐로 한창일세
잠시 안장 풀고 옛 고을에 머무는데
나지막한 침상 빌어 베개에 기대었네
낯선 새는 그윽하게 짹짹이고
높은 숲은 저녁 숲향 풍기는군
고단한 인생 어느 때 쉬게 될까
귀밑머리 흐르는 세월이 아쉬워라
入峽春猶在 沿溪草正芳 歇鞍投古驛 欹枕借匡床
怪鳥多幽響 高林有晩香 勞生幾時息 雙鬢惜流光

방림을 지나면 길은 대화(大和)로 이어진다. 평창강과 대화천을 연(沿)하는 들 길이다. 평창강과 대화천이 만나는 사거리 길이 하안미인데 옛 주막거리였다 한다. 강릉과 원주의 중간 지점이라 하여 반정(半程: 여정의 반)이라는 돌비석이 서 있다. 주변은 들이 넓고 물길도 풍부하다 보니 예부터 부촌이었을 것 같다.
42번 국도와 이어지는 31번 국도(옛 관동대로) 옆으로는 세 개의 정려각(旌閭閣)이 있다. 효자, 열녀를 기리는 비각이다. 먹고살 만하면 인륜을 찾게 되니 자연 넉넉한 고장에는 이런 비각들을 만난다. 대화는 큰 고을이었다. 지금도 큰 고을인데 사람들이 없다. 흔히 하던 말로 동대문 밖 큰 장(場)이 대화장이었다 한다. 이곳에 오면 ‘메밀꽃 필 무렵’이 생각난다.

“길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 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즘생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 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왼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혀 하얳었다.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길이 좁은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외줄로 늘어섰다. 방울 소리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메밀밭께로 흘러간다.”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중)

허 생원, 동이, 조선달 이 세 사람이 봉평장에서 달빛 속에 산 넘고 개울 건너 70리를 가던 곳이 대화장이었다. 봉평장, 대화장, 진부장이 이곳 산골 마을에 장(場)이 서는 곳이고, 그 중에도 대화장이 으뜸이었다. 지금도 대화는 큰 고을이다. 그런데 사람이 없다. 현대화된 장은 5일 장날에도 사람이 뜸하고 학교에도 학생들이 귀하다. 미소다방, 흙다방, 수다방…. 마담들은 할머니가 되어 함께 나이 드는 손님이 들르면 오빠 보듯 반가워한다.
매월당이 들렀을 때 대화고을은 산과 구름과 들꽃만 가득한 고을이었다. 그러던 고을이 번성한 장(場)을 거쳐 다시 한적한 지방 면 소재지로 돌아가고 있다.
대화역에서
나그네 길 아득하구나
산봉우리 푸르고 수심(愁心)은 밀려오네
끊긴 다리 관로(官路)에 버들은 우거지고
옛길에는 들꽃 홀짝 피었네
천산(千山) 속 탁발(托鉢) 길
강호(江湖)에는 이 한 몸
흰 구름 한가히 가는 모습은
일찍이 내 오랜 친구라네
大和驛
客路多迢遞. 蒼峯愁殺人. 斷橋官柳暗. 古道野花嚬. 甁錫千山裏. 江湖一隻身. 白雲閑適態. 曾是舊雷陳.
대화장을 지나 31번 국도를 따라 잠시 북쪽으로 길머리를 잡으면 대화천 건너 유서깊은 석회암 동굴이 있다. 이름이 없었는데 근래에 광천선굴(廣川仙窟)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매월당이 들렀는지 기록은 없지만, 이 길을 지난 많은 이들이 굴에 들어가 보고 글을 남겼다. 그 중 미수 허목의 미수기언을 보자.
“대화역 북쪽에서 석굴을 구경하였다. 큰 횃불을 앞뒤에서 연이어 들고 그 속으로 들어갔는데 험준한 구멍이 사방으로 통하여 막힌 데가 없었다. 동북쪽으로 수십 보를 가면 굴이 점점 높아져서 손으로 잡고 몸을 붙이고서야 오를 수 있었다. 깊이 들어가도 끝이 없고 시냇물이 그곳에서 흘러나와 돌 아래로 세차게 흘러가는데 물소리가 요란하였다. 그곳의 돌은 기괴한 모양이 많아 어떤 것은 꿈틀대는 이무기 같은 것이 있어 발로 낚아채는 것 같기도 하고 똬리를 틀고 있는 것 같기도 하며, 어떤 것은 무쇠가 녹아 흐르다 엉겨 붙어 괴상한 모양이 된 것 같기도 하는 등 이루 다 기록할 수가 없었다. 유자후(柳子厚)가 영주(永州)에서 서산(西山)의 고무담(鈷鉧潭)을 유람하고 석굴에 대해 기록하면서 유석(流石)의 기괴한 형상을 말하였는데 이런 유였던 것일까. 생산되는 종유석은 품질이 좋아서 발로 밟으면 돌마다 종이나 북소리가 난다.”
大和北觀石窟. 連大炬入其中. 嵁竇四通如一. 東北行數十步. 窟漸高. 可拚傅而躋. 深入則無窮. 川水出焉. 奔流石下. 水聲亂耳. 其石多奇怪. 或如蟠螭虯結. 若挐者. 若蟠屈者. 或如金鐵流凝成怪狀. 不可殫記. 柳子厚於永州遊西山鈷鉧潭. 記石竇. 言流石怪形. 如此類耶. 產石鍾乳良. 蹈足則石皆出鍾鼓響.
이 동굴은 미수 선생이 기록했듯이 충분히 매력적이다. 좁은 동굴을 갑갑해 하는 필자도 이 길을 지날 때면 들러보곤 한다. 그런데 미수의 글을 읽으며 덜컥 걱정이 된다. 옛사람들은 바닥에 형성된 종류석을 밟아 보았던 것이다. 아마도 약한 것은 푸석 뭉개졌겠지. 다행히 이곳 종류석은 단단하여 쟁그렁 종 소리가 났던 모양이다. 또 하나 걱정, 산 석종유(産 石鍾乳: 생산된 종유석)이라니? 혹시 조선시대 사람들이 종유석을 떼어다가 장식물로 쓴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시간을 거슬러 가 말려야겠다. 석회암 동굴에 가면 이곳저곳 잘려 나간 종유석을 보며 마음 상했던 기억이 새롭기 때문이다.
동굴을 나서 31번 국도를 따라 올라간다. 잠시 후 신리 삼거리에 닿는다. 삼거리에는 신리초등학교가 있는데 학생 14명, 교직원 15명이라 한다. 그 많던 병아리들은 모두 어디로 간 것일까?
여기에서 우측으로 갈라지는 6번 지방도가 옛 관동대로다. 이제 만만치 않은 또 하나의 고개 모릿재(모노치: 毛老峙)가 우리를 기다린다. 요즈음에는 터널이 생겨 쉽게 고개를 통과하지만, 그 시절 매월당도 허 생원도 허균도 난설헌도 사임당도 모두 이 고개를 넘었을 것이다. 모릿재 아랫마을은 마평리(馬坪里)다. 옛 마방(馬房)이 있던 곳인데 관동대로 교통의 요지였던 셈이다.
이 마을 개울가 기암절벽이 빼어난 절경을 청심대(淸心臺)라 한다. 기녀 청심이 이곳에서 몸을 던져 자진했다는 전설이 있다. 태종 때 강릉부사를 지낸 양수라는 이가 어린 기녀의 마음을 빼앗고 떠나면서 챙기지 못했던 모양이었다. 마음 둘 곳 없는 청심이가…. 후세에 단원은 정조의 어명으로 금강사군첩을 그렸는데 사실적 필치로 이곳 풍광을 그렸다.
청심의 일이 있은 후 얼마 되지 않은 때 이곳을 지나갔을 매월당은 이 일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세상사를 잊은 그에게는 티끌 같은 일이었을 것이다.
이제 청심대를 지나 오대천을 따라 오르면 닿는 고장이 진부다. 나그네 쉬어갈 진부역(珍富驛, 珍阜驛)이 있던 곳이다. 우리 시대에는 KTX 진부역이 생겼다. 허 생원이 대화장 지나 들르던 시장이 진부장이었다. 오대산 등산 가며 들르던 그 진부장은 이제 쇠락한 장(場)이 되었다. 산나물이며 버섯이며 온갖 임산물이 가득하던 진부장은 마트 그늘 아래 몇몇 구멍가게만 남았다. 매월당의 진부(珍阜)는 어떠했을까?
진부역에서
봄 산 속으로 가고 또 가네
봄 산 꽃은 정말 짙다오
병 하나 발우 하나 들고
여윈 몸에 볼품없는 죽장 메었네
인가에는 연기 아득하고
(진부)역 가는 길 풀은 흐드러졌는데
어느 곳에서 진정한 은자(隱者)로 지내볼까
푸른 봉우리는 천만 겹 둘렀구나
珍阜驛
去去春山裏. 春山花正濃. 一甁擎一鉢. 瘦影荷瘦筇. 人家煙渺渺. 驛路草茸茸. 何處堪眞隱. 碧峯千萬重.
매월당의 진부는 그랬었구나. 봄 산꽃 가득한 산마을이었구나.










 제803호
제8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