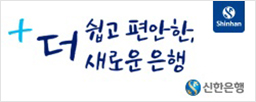▲박찬용 '우상' 작업 설치 모습.
(CNB=왕진오 기자) '투견', '박제', '서커스' 연작과 신작 '동굴의 우상'을 통해 한국 현대 사회를 집어삼킨 폭력을 영원불멸한 박제물로 변이시킨 대형 조각을 통해 인간의 폭력성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작업을 선보이는 조각가 박찬용이 경기도 파주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에 대형 조각들을 펼쳐놓는다.
열두 마리 투견의 머리가 각각의 철창에 갇힌 채 벽에 걸려 있다. 이 투견은 상대가 죽음에 이를때까지 싸우게끔 호전성이 개량된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다.
박찬용은 몇 년간 따라다닌 투경장의 경험을 형상화한 전시 '투쟁, 그 영원함'을 시작으로 일련의 투견 시리즈를 선보였다.
"싸움 개들은 희한한 게, 남의 집 개하고 싸울 때보다 같은 농장에서 자란 개들끼리 싸울 때 더 잔인해요. '너 이 새끼, 줄만 한 번 플려 봐라, 어찌 되는지 두고 보자' 이러다가 한 번 붙으면 죽을 때까지 싸우죠"

▲박찬용, '개들의 침묵'.
박찬용이 만드는 세계는 폭력이 극대화된 거친 공간이다. 개는 죽을힘을 다해 싸우고, 인간은 그 죽음에 돈을 건다. "인류라는 종이 무언가를 성취해 온 데에는 폭력의 힘이 크게 작용했다"는 작가의 시선처럼, 인간은 생존을 위한 싸움을 통해 진화했고, 인간의 싸움과 폭력성은 다른 종들에게 투영된다.
작가가 만드는 세계는 폭력과 고통이 난무한다. 폭력을 가하는 이가 당하는 이에게 고통을 주고, 그 고통은 다시 가하는 이에게 되돌아간다. 이런 폭력의 연쇄 고리는 여러 독립된 상들이 모여 상황을 연출하고 내러티브를 구축하는 박찬용의 작품에 일관되게 표현된다.
신작 '동굴의 우상'은 알타미라 원시 벽화에 등장하는 상상 속 거대 동물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약 2만 년 전 선사 시대에 크로마뇽인이 그렸다는 이 동물들은 사냥의 성공과 풍요를 기원하는 주술적 의미를 담고 있다. 과학이나 종교가 발달하지 않은 원시 사회에서의 인간의 원시 상태가 오히려 '인간적'이라고 작가는 말한다.

▲박찬용, '동굴의 우상-들소'. 설치 모습.
박찬용이 표현하는 인간은 폭력으로 일궈 낸 문명을 고뇌하는 주체의 형상이다. 곰브리치는 "고대 이집트 시대의 조각가를 일컫는 말에는 '계속 살아 있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박 작가가 집중하고 있는 구상 조각들은 한국 현대 사회를 집어삼킨 폭력을 영원불멸한 박제물로 변이시킨다. 그의 작품들은 오늘 한국 사회는 인간의 세계가 아니라 여전히 동물의 왕국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번 박찬용의 전시는 고대 그리스 사원이나 인도의 신전이 주술적 대상이나 신상의 보호처였다면, 이번 전시는 폭력성이라는 한국의 신을 미술관에 새겨 넣는다. 전시는 5월 11일까지. 문의 031-955-400.
- 관련태그
- CNB 씨앤비 시앤비 CNB뉴스 씨앤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