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 아티스트 - 송경혜]특별한 일상, 그것이 피워낸 꽃
자연을 마주한 조우의 시간들이 피워낸 꽃 ‘의미의 메타포’
 제372호 김종렬 한양여자대학교 교수⁄ 2014.03.31 13:40:03
제372호 김종렬 한양여자대학교 교수⁄ 2014.03.31 13:40:03

▲송경혜 작가
처음으로 꽃을 만난 시원(始原)의 어느 인간을 생각해본다. 들판에 혹은 산에 피어있는 꽃들의 그 선명한 빛 앞에서 인간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그 꽃잎으로 한번 가져가서는 조심스럽게 맛을 보았을지도 모르겠다.
혹은 그 향기를 맡으며, 잠시 달콤한 꿈을 꾸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아마도 그 중 누군가는 그것을 그의 뜨거운 손 안에 꼭 쥐고, 빛을 가진 듯이 그의 공간으로 서둘러 돌아갔을지도 모르겠다.
어김없이 꽃이 피고 있다. 빛이 잘 드는 양지가 아니어도, 곧게 난 길이 아닌 가파른 언덕에서도, 강가에, 발이 닿지 않는 고원의 끝에서도. 그리고 꽃은 피는 것만이 아니라, 지어버리는 것이기도, 꺾이기도, 떨어지기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 손에 의해 그려진 꽃이 있다. 그렇게 작가 송경혜에게로 그려진 꽃은 흙과 빛과 바람이 피워낸 꽃이 아니라, 작가 개인이 그 동안 자연을 마주한 조우의 시간들이 피워낸 꽃이라고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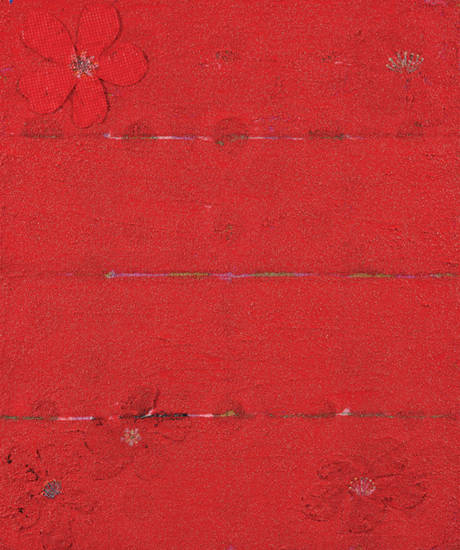
▲Unusual things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든다. 꽃의 형상을 한 그것은, 꽃이라는 대상의 형상을 빌린 또 다른 무엇인가는 아니었을까…. 내부에서 자라난 마음들, 쌓여진 시간들이 키워낸 어떤 것들이, 형상을 가지지 못했던 어떤 것들의 꽃의 모양을 빌어 드러난 것은 아닐까.
작가는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대상화하여 외부의 화면으로 드러낸다. 그곳에 드러난 빛과 형상은 그렇게 대상화된, 자연스러운 ‘의미의 메타포’라고 할 수 있겠다.

▲Unusual things
의미가 대상을 찾아가는 과정, 때로는 그 사이에서 직접적인 대상을 찾지 못한 의미들 또한 존재하는 것임이 당연하다. 어느 먼 공간에서 말없이 피었다가 져버리는 수많은 야생화들처럼, 누군가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바람조차도 닿지 않았던 곳에서 혼자서 피어주었던 것들. 하지만 꽃이었던 것들…. 그래서 한번쯤은 언뜻 생각해볼 수 있겠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고, 닿지 못한 수많은 것들에 대하여, 그래서 어떻게도 문자화 되거나 형상화 되지 않았던 수많은 것들에 대하여….

▲Unusual things
몇 해 전 신작을 펼쳐 보인 개인전에서 작가는 중국에서 생활하며 보낸 얼마간의 시간이 있은 후, 꽃이라는 것을 작업하게 되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무엇이 작가에서 꽃이라는 형상으로 나타난 것일까.
오랜 시간 색면화를 그려왔던 작가의 추상된 의미들이 지금 구체적인 대상의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다. ‘Unusual Things’, 그것은 꽃이 아닌, 그 꽃을 자라게 만든 그 시간, 그 태양과 바람과 어느 흙의 향기가 그 화면에 있음에 다름 아니다.
그 안에는 그려진 꽃과 그리고 그녀가 모아온 낡은 천 조각들이 가진 기억과 숨결이, 오려지거나 다시 이곳에 붙여져서 ‘꽃’이 되었다.
일상이 피워낸 꽃이란, 그 안에서 부딪기며 닳아버린 소매처럼, 바래어지고 이젠 너무나 작아져 버린 옷처럼, 지나온 일상의 한 조각들이 삶에서 떨어져 나와 하나의 꽃잎이 되는 것과 같다.
그 꽃잎들이 다시 꽃잎을 만들어 내는 일, 그리고 우리들에게 일상이란, 그렇게 새로운 꽃을 피우고, 다시 피워내며 비로소 자연의 모습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Unusual things
중국에서 얼마 간 생활하며 ‘꽃 작업’ 시작
하이데거는 예술이란 존재자의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며, ‘진리의 작품 속으로의 자기정립’이라고 했다. 꽃이라는 존재를 다시 대지로 돌려보내는 것, 그곳이 비록 흙이나 바람 찬 대지가 아니라고 하여도, 작품 안에 존재하는 이 꽃은 다시 누구에게로 돌아가서 그곳에 자리를 잡고 피어있을 것이다.

▲Unusual things
작가의 손에 의해 피어난 꽃이, 어떤 존재로서의 꽃으로 피어가는 과정, 그 꽃의 길, 작가가 우리에게 보여 내는 이 꽃의 형상이 어느 공간에서 다시 무엇으로 존재해 갈 것인지를, 우리는 이곳에 그려진 꽃들을 통해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태양을 머금은 들판 위에, 투명한 화병에, 누군가의 손에, 그 가슴 언저리에, 그 어느 곳에 이 꽃을 두어야 할 것인가 하고.
- 김종렬 한양여자대학교 교수 (정리 = 왕진오 기자)
- 관련태그
- CNB 씨앤비 시앤비 CNB뉴스 씨앤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