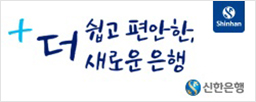▲갤러리 원앤제이의 지하 전시장 입구. (사진=김연수 기자)
전형적인 화이트 큐브의 갤러리였을 것이다. 입구를 들어서면 반지하의 전시실과 복층의 구조로 2층의 난간이 동시에 보인다. 이 공간이 더 이상 화이트 큐브가 될 수 없는 이유는 2층의 난간으로부터 떨어진 황토 빛의 흙과 그것이 튀어 만들어낸 파편들이 지하의 전시장 입구와 벽을 뒤덮고 있기 때문이다.

▲퍼포머 1은 지하 전시장에서 홀로 빙빙 도는 움직임을 반복한다.(사진= 김연수 기자)
1. 움직임의 시작
잠시의 무료함을 견디지 못해 스마트폰의 앱을 열고 이런저런 장난을 치고 있을 때 어느 샌가 위층에서 내려온 퍼포머(배우)와 마주쳤다. 동선을 방해할까 재빨리 옆으로 비켰다. 그는 지하의 전시장으로 들어가 하얀 가루를 모아 쥐고 마치 컴퍼스가 된 것 같은 모양새로, 천천히 돌기 시작했다. 몸을 조금 움직여 작은 원을 그리든 크게 움직여 큰 원을 그려내든지 간에 그가 남긴 하얀 가루의 흔적들은 가장 큰 원의 틀에 갇혀 각각의 회전을 하고 있는 시계태엽의 모양을 하고 있다.
그가 비슷한 움직임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 챌 때쯤, 위쪽의 전시장에서도 다른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을 거라는 짐작이 된다. 부지런히 올라가면 이미 시작돼버린 움직임들이 보인다. 2층에서는 두 개의 그룹이 움직인다. 몸이 세 개가 아닌 이상 이들의 움직임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두 개의 그룹 중 한 그룹은 다섯 명의 퍼포머가 서로의 몸을 밀착시킨 채 몸부림 같은, 패턴이 없는 움직임을 하고 있다. 아니, 자세히 보면 서로의 몸 어디도 밀착된 곳은 없다. 그들은 손목, 무릎, 어깨 등 서로의 관절을 부딪치려 하고 있을 뿐이다. 관절만 부딪혀야 한다는 것은 그들 움직임의 유일한 동력이자 약속일 것이다. 그 약속은 몸들이 바닥을 뒹굴게도, 다른 사람의 몸을 타고 넘게도 만들며 서로 엉키게 한다.

▲2층 전시 공간으로 올라가자 마주치는 첫번째 그룹이다.(사진=김연수 기자)
2. 퍼포머 10
2층 안쪽 전시 공간에 있던 퍼포머들은 전시장 바닥에 놓인 흙이 담긴 양동이들 사이로 줄지어 다니다가 강강술래를 하듯 서로의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기도 한다. 이들 그룹은 이 세 개의 그룹에서 유일하게 정해진 장소를 벗어나는 그룹이다. 맞은편 그룹에 합류해 서로의 관절을 맞대며 몸이 엉키다가도 아래층으로 내려가 흰 가루로 만들어진 원 안에 들어가 같이 원 운동에 합류하기도 한다.
가장 눈에 띄는 퍼포머는 이 그룹이 이동할 때마다 그룹의 대열에서 빠져나와 2층의 난간에서 흙을 떨어뜨리는 사람이다. 손을 맞잡고 같이 빙빙 돌던 퍼포머 10은 이 그룹이 이동을 시작할 때마다 대열에서 빠져나와 진흙이 가득 찬 양동이에서 흙을 퍼내 2층 난간에서 떨어뜨린다. 꽤 높은 높이에서 떨어진 진흙은 지하의 지면과 부딪히며 ‘퍽’ 소리를 낸다.
소리는 하나의 신호와 같다. 이 전시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모든 반복되는 움직임의 마디에 경계가 되는 이 소리는 결과의 신호인지 시작의 신호인지 알 수 없다.

▲퍼포머 10은 반복적으로 진흙을 아래로 떨어뜨린다.(사진=김연수)
3. 머릿속에 일어나는 파장
북촌의 갤러리 원앤제이에서 벌어지는 이 퍼포먼스는 작가 조은지의 ‘떨어지는 계란’전이다. 한 시간 동안 이어지는 이 퍼포먼스는 반복되는 움직임에 집중한다면 지루하기 그지없지만, 다른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움직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다보면 어느새 관람자의 머릿속에서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관람자 스스로 각 그룹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및 특이점을 찾으려 하고, 연계성을 찾으며 끊임없는 계산과 은유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다.
조은지는 “직접적인 은유를 전제하고 공연의 플롯(plot)을 짜진 않았다”며, “최소한의 역할과 조건만 제시한 채 모든 연기는 퍼포머에게 맞긴다”고 밝혔다. 공연의 구조와 역할에서 느끼는 감정과 그것에 관한 해석은 퍼포머의 것이다. 이와 함께 퍼포머들과 같은 공간에서 비켜나고, 좁은 통로에서 맞닥뜨려 당황하거나 쫓아가기도 하는 관객들의 감정과 해석 역시 공연의 결과로 온전히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작가는 “공연이 끝날 때마다 관객들로부터 새로운 해석을 듣게 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전했다. 이 전시를 기획한 큐레이터 이경민 역시 “쓱 지나치듯 보는 전시가 아니라, 진득하게 생각하는 전시를 선보이고 싶었다”고 말한다. 참고로, 그는 전시의 서문에서 "공연의 구성으로부터 ‘낙하하는 죽음’을 떠올렸다"고 밝혔다.
공연의 구성은 물론 주름진 린넨 재질의 하얀 옷을 입고, 아직 채 10대의 티를 벗어내지도 않은 퍼포머들을 비롯해, 커다란 소리를 만들며 낙하하는 진흙, 양동이, 흰 가루 등 이 공연은 단순하고 반복적으로 보이는 데 비해 얼마든지 은유적으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소재들이 넘쳐난다. 하지만 그것들의 틀이 되는 이야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구조에 대한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2층 전시장 안쪽에서 만날 수 있는 두번째 그룹은 유일하게 전 층을 이동하는 그룹이다.(사진=김연수 기자)
4. 인간이 작품이 될 때
이와 맥락을 같이 해, 조은지는 이번 작업의 가장 흥미로운 점의 하나로 ‘가변성’을 꼽는다. 퍼포머들은 공연을 하며 서로의 몸과 호흡을 맞춘다. 움직임은 회차를 거듭할수록 변화하고 그들의 안에 있던 감정과 생각 역시 능숙하게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작가는 ‘퍼포먼스가 가지는 주체성’ 즉, 공연자와 관객이 함께하는 시간 동안 살아 움직이듯 알아서 변화하는 퍼포먼스의 매력을 강조한다.
이 전시가 눈길을 끄는 다른 한 가지 부분은 상업 갤러리에서는 보기 드문 퍼포먼스 전시라는 점이다. 큐레이터와 작가는 기획 단계서부터 소재의 선택까지 공간에 관한 세밀한 조율을 거듭하며, 전시를 완성한 듯싶었다. 결코 가볍지 않게 다가오는 공연 자체의 무게감은 떨어지는 흙의 무게감과 일치하는 한편, 그들의 만남이 만들어내는 시너지는 완벽하게 희었을, 더럽혀진 전시 공간과 함께 묘한 즐거움을 준다.
전시는 18일까지. 퍼포먼스를 제때 관람하기 위해서는 원앤제이의 홈페이지에서 공연 일정을 필수로 확인해야 한다.

▲이동하는 무리를 따르면, 고정되어 있던 상황이 변한다는 것을 눈치챈다.(사진=김연수 기자)
- 관련태그
- CNB 씨앤비 시앤비 CNB뉴스 씨앤비뉴스










 제496호
제49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