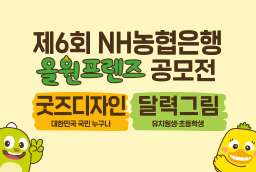(CNB저널 =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CNB저널 =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1일차 (서울 → 도쿄 하네다 환승 → 캐나다 밴쿠버 도착)
변덕스런 밴쿠버 여름 날씨
ANA(All Nippon Airways, 全日本空輸) 항공기를 타고 김포공항을 떠나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 6시간을 기다려 밴쿠버행 항공기에 오른다. ANA항공은 쾌적한 항공기와 친절한 서비스, 저렴한 한국발 미주행 항공 요금도 그렇지만, 돌아오는 길에 일본 혼슈를 일주할 계획이 있는 나로서는 최상의 선택이다. 도쿄 출발 9시간 만에 항공기는 뒤로는 장엄한 해안 산맥이 감싸고 앞으로는 태평양을 품은 밴쿠버에 도착한다. 공항 근처 호텔에 여장을 풀고 저녁 산책을 하는 사이 비가 오더니 금세 한국의 늦가을, 초겨울 쌀쌀한 날씨로 바뀐다. 겨울철 우기에는 몇 달씩 쉬지 않고 비가 온다는 북미 대륙 북서부 해안의 변덕스런 기후를 확인한다. 내일 장거리 운전을 앞두고 시차 적응을 시도하며 일찌감치 잠자리에 든다.
2일차 (밴쿠버 → 브리티시 컬럼비아 → 베일마운트)
아름다운 99번 해안도로
이른 아침, 차가운 빗속에 공항으로 나가 렌터카를 빌려 99번 해안도로를 타고 북행을 시작한다. 렌트비와 연료 비용을 아끼기 위하여 예약한 닛산 소형차는 산이 많은 브리티시 컬럼비아(British Columbia)를 다니기에는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음을 금세 깨닫는다. 오른쪽으로는 가파른 해안절벽, 왼쪽으로는 점점이 이어지는 해안 마을들을 보며 두 시간 주행하니 휘슬러(Whistler)에 닿는다. 2010년 동계올림픽 스키 경기가 열렸던 곳이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대자연
휘슬러를 지나니 본격적으로 대자연과 원시림이 펼쳐진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하나만으로도 우리나라의 9배. 국토 면적이 남한의 110배에 달하는 캐나다의 방대한 자연 앞에 할 말을 잃는다. 이 거대한 땅이 산출하는 삼림자원과 지하자원은 또한 얼마나 막대한 것인가? 해안 산맥을 넘어 내륙 교통의 요지인 캠룹스(Kamloops)를 지난다. 높새바람 때문에 건조하고 덥다. 도시명이 말해 주듯 선주민(先住民, Aboriginal people)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참고로, 캐나다의 선주민은 140만 명(4%)으로 미국보다 비율이 높다.

▲반프 레이크 루이스(Lake Louise). 사진 = 김현주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99번 해안도로. 사진 = 김현주

▲캐나다 대륙횡단 철도(Canadian Pacific Railway). 사진 = 김현주
캠룹스를 지나니 오락가락하던 비가 완전히 멎고 뭉게구름과 함께 파란 하늘이 나타난다. 찬란하게 아름다운 여름 날씨다. 그러나 그 여름 날씨를 온전히 즐기기에는 몸이 무척 힘들어한다. 어제 늦은 오후 밴쿠버에 도착하여 새벽부터 운전을 시작했으니 무거워지는 눈꺼풀을 이길 수 없어 차를 세워 잠을 잔 후 다시 달리기를 두세 번은 반복한 것 같다. 게다가 휘슬러로 돌아오느라고 200km쯤 더 운전을 하고 있으니 대자연이 아니었다면 도저히 올 수 없었고, 올 이유도 없는 머나먼 길이다.
적막강산 캐나다 산중 마을
그렇게 달리는 사이 눈 덮인 산들이 가까이 다가온다. 자스퍼(Jasper) 국립공원이 멀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미 충분히 장엄한데 자스퍼와 반프(Banff)는 얼마나 더 장엄하다는 말인가? 단숨에 달려가 보고 싶은 마음이지만 오늘 밴쿠버 출발 800km, 12시간… 충분히 멀리 왔으니 일단 베일마운트(Valemount)에서 숙박한다. 호텔 부근에 중국 음식점이 있어서 놀란다. 인구 1000명이 채 안되는 깊숙한 산중 마을에 중국 음식점이 있다니… 주인에게 물어보니 몇해 전 중국 광저우에서 이민 왔는데 식당은 그럭저럭 잘된다고 한다. 비단 이 중국 음식점만이 아니다. 밴쿠버에서 열 시간 이상 떨어진 이곳에 한국 음식점이 두 개나 있으니 그저 놀랄 뿐이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산중 마을은 밤이 되자 적막강산으로 변한다. 가끔 기적을 울리며 지나는 화물열차만이 밤에 움직이는 전부인 것 같다. 화물열차는 보통 한 편성이 300량쯤 되니 그것조차도 참으로 대륙적인 풍경이다.
3일차 (베일마운트 → 자스퍼, 반프, 요호 국립공원 → 골든)
공원 국가 캐나다
한국의 늦가을 날씨에 해당하는 쌀쌀한 아침, 자스퍼 국립공원을 항하여 다시 시동을 건다. 비경이 시작된다. 한번 사는 우리 인생에서 이런 비경을 만날 수 있도록 건강과 용기를 주신 절대자께 감사드린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는 여러 모로 축복받은 땅이다. 오늘 방문할 자스퍼와 반프 국립공원은 물론이고 주립공원은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리고 그 많은 공원마다 원시림 속에 화장실과 피크닉 공간, 캠프사이트가 준비되어 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민말고도 모든 캐나다인들은 자연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언제라도 누릴 수 있으니 따지고 보면 보통 행복이 아니다.
미세 먼지, 소음, 바가지 상혼(商魂: 더 많은 이익을 취하려는 상인의 정신), 교통 전쟁 등과 전혀 관련 없는 삶을 사는 그들이다. 그러한 자연을 만나러 다니는 캠핑 차량들과 수없이 마주친다. 놀라운 것은 70세는 족히 넘었을 노부부가 집채만한 대형 캠핑 차량을 운전하여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험한 산길을 다니는 모습이다. 일흔 살이 되었을 때 나도 저들과 같은 여유를 즐길 수 있을까?

▲자스퍼 가는 길. 사진 = 김현주

▲요호 국립공원의 캠프 사이트. 사진 = 김현주
베일마운트를 떠난 지 한 시간 반, 드디어 자스퍼 국립공원 서문(west gate)에 도착했다. 자스퍼는 거대한 바위산과 설산, 계곡, 강과 호수, 원시림으로 이루어진 국립공원으로서 동서 방향은 16번 도로, 남북으로는 93번 도로, 일명 아이스필즈 파크웨이(Icefields Parkway)가 가로지르니 접근성도 좋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이기도 하다. 오늘 출발지 날씨가 좋아 안심했으나 국립공원 입구에 도착하니 거세게 비가 내린다. 산봉우리들은 모두 안개구름 속으로 숨어 버렸다. 일부러 늑장을 부려가며 해가 나기를 기다리지만 오전 내내 비가 멈출 줄 모른다. 악전고투하며 이 먼 곳까지 찾아왔으나 잿빛 추억만을 남기려는 비가 야속하기만 하다.
숨막히는 비경 반프
자스퍼 빌리지(Jasper Village)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공원 지역 탐방을 접고 반프 방향으로 뚫린 아이스필즈 파크웨이에 오른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남쪽으로 전진하는 사이 하늘이 맑아지기 시작한다. 캐나다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반프는 숨을 멈추게 하는 비경의 연속이다. 전 세계의 아름다운 곳을 제법 다녀본 나로서도 일찍이,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풍경에 저절로 탄성을 지른다.
자스퍼와 마찬가지로 반프도 동서 방향은 캐나다 대륙횡단 1번 도로가 관통하고, 남북 방향은 93번 도로가 종단한다. 하이킹이나 등산, 캠핑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동차로 지나가면서 곳곳의 조망 지점에서 감상하기에 좋은 곳이다. 반프 국립공원은 페이토 호수(Peyto Lake)에 이를 즈음에 아름다움의 절정을 이룬다. 장엄한 바위산과 울창한 수풀, 그리고 깊은 계곡이 만나는 곳에 자리 잡은 호수는 광물질을 품은 듯 파란색으로 빛난다. 시간이 더 많다면 승마, 낚시, 래프팅, 카야킹(kayaking), 암벽 등반, 스키 등 자연과 진정으로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무한정 있으나 각박한 반나절 드라이브로 반프를 떠나야만 하니 아쉽다.

▲아름다운 브리티시 컬럼비아. 어디를 가도 이런 풍경이다. 사진 = 김현주

▲반프 국립공원. 사진 = 김현주
록키 산맥을 넘어 서쪽 밴쿠버 방향으로 차를 꺾는다. 요호(Yoho) 국립공원도 규모는 작지만 자스퍼나 반프에 뒤지지 않게 멋지다. 앨버타(Alberta) 주에 반프가 있다면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는 요호가 있다고 할 정도다. 1번 도로를 따라 국립공원을 가로지르면 나오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첫 마을, 산중마을 골든(Golden)에 여장을 풀었다. 으슬으슬 찬비가 내리는 캐나다 록키 산중마을에서 인생을 생각한다. ‘재미있는 헬조선’이 내가 살 곳인지 ‘재미없는 천국’ 여기가 살 곳인지 누구도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던져 본다.
4일차 (골든 → 글래시어 국립공원 → 밴쿠버)
캐나다 개척사는 곧 교통 발달사
오늘 아침에도 찬비가 내린다. 밴쿠버를 향하여 차를 달리니 곧 빙하공원(Glacier National Park)으로 들어선다. 높은 거대 봉우리와 빙하, 삼림이 풍부한 이 지역은 특히 겨울에 눈이 많이 온다고 한다. 예전에는 접근이 불가능한 오지였으나 1885년 캐나다 횡단철도(CPR, Canadian Pacific Railroad)가 뚫리고 1963년에는 횡단도로(Trans Canadian Highway)가 완성되면서 가까워졌다. 나도 바로 그 도로를 따라 산길을 돌아 오르니 해발 1300m 지점 로저스 고개(Rogers Pass) 정상에 닿는다. 정상에 건립한 캐나다 횡단도로 완성 조형물은 ‘캐나다 개척사는 곧 교통 발달사’라고 기록하고 있다. 험준한 록키 산맥을 뚫고 동서를 이은 크나큰 성취이다.
어느 캐나다인의 노익장
마침 자신이 손수 만든 모터사이클에 미니 캠퍼까지 견인하여 동서횡단 중인 한 캐나다인이 반갑게 인사를 건네 온다. 그의 형이 사는 서스캐처원(Saskatchewan)에 다녀오는 길이라고 하니 왕복 3000마일(4800km)의 먼 길을 이동하는 중이다. 평생 장거리 트럭을 운전하고 3년 전에 은퇴했으니 우리로 치면 환갑을 넘긴 나이지만 오토바이로 빗길을 질주하는 모습을 보니 그에게는 이 대륙도 작아 보인다. 그의 노익장에 경의를 표하고 작별 인사를 나눈다.

▲어느 노익장이 모터바이크로 수제 미니 캠퍼를 견인하고 있다. 사진 = 김현주
밴쿠버로 돌아가는 길은 조금 우회하더라도 고속도로를 피해서 남쪽 루트를 택했다. 미국 워싱턴 주(州) 국경이 멀지 않은 곳을 지난다. 초원, 목장, 바위산, 골짜기, 계류, 연못, 호수… 어제 지나온 록키와 비교하니 풍경은 물론이고 날씨까지 전혀 다르다. 설명이 어려울 정도로 아름다운 길을 달리다 보니 어느덧 저녁 무렵이다. 수없이 지나는 캠프장마다 가족들이 옹기종기 둘러앉아 야외 식사를 즐긴다. 아름답고 평화로운 풍경에 홀로 여행자는 갑자기 고독해진다. 캐나다는 곧 자연이고, 캐나다인들의 삶은 곧 무릉도원의 안빈낙도처럼 보인다. 소박한 사람들이지만 부러운 삶의 방식이다.
두 개의 캐나다
그러는 사이 오늘도 12시간, 850km를 달려 밴쿠버에 도착한다. 무리한 일정인 줄 알지만 대륙은 넓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각박하니 그렇게라도 해야 오랫동안 마음에 품었던 곳들을 방문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밴쿠버는 아시아인들의 도시다. 지난 사흘 동안 누비고 다녔던 캐나다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다. 두 개의 캐나다를 본 것이다. 공항에 도착하여 차를 반납하니 지난 사흘 쌓였던 긴장이 눈 녹듯 풀린다.
(정리 = 김광현 기자)
- 관련태그
- CNB 씨앤비 시앤비 CNB뉴스 씨앤비뉴스










 제540호
제540호 ![[인터뷰] 안희덕 엠라인스튜디오 대표 “최첨단 VR, XR기술로 산업 안전교육 시장 주도”](/data/cache/public/photos/20250731/art_184783_1753774392_170x11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