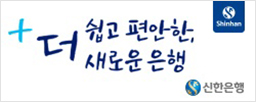[김현주의 나홀로 세계여행 (158) 북아일랜드] 가톨릭 땅에 개신교 식민지 세웠다는 ‘광란의 밤’
 제573호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2018.02.05 09:42:13
제573호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2018.02.05 09:42:13
 (CNB저널 =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CNB저널 =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10일차 (부시밀즈 → 벨파스트 도착)
하루 16시간 일하느라 지친 사람들
숙소 주인 레이몬드(Raymond)는 새벽부터 나와 부지런히 손님들의 아침식사를 준비한다. 그런데 아쉽게도 목 좋은 이곳을 내놓는다고 한다. 그의 나이 55세. 평생 하루 16시간씩 일하느라 지쳤다고 한다. 사는 게 만만치 않는 것은 지구촌 누구도 예외가 아닌가 보다. 따뜻한 사람들이 사는 마을 부시밀즈를 떠난다. 올 때와는 달리 가장 빠른 길로 쉬지 않고 달리니 벨파스트까지 한 시간 남짓 걸렸다.
북아일랜드 갈등의 현장
샨킬 거리(Shankill Road)부터 찾는다. 벨파스트 서부, 주로 영국인 노동자 계층의 주거 지역이다. 집집마다 걸린 유니언잭(Union Jack) 국기와 각종 페넌트, 거리 담벼락에 그려진 낙서(그래피티, graffiti)가 여기가 어떤 곳인지 말해 준다. 북아일랜드 분쟁(The Troubles, 1969~1998) 동안 통합주의자(Unionist 또는 Loyalist) 중에서도 가장 극렬한 세력이 활동했던 곳이다. 이제는 평화로워진 이 거리에서 갈등의 흔적을 찾는 내 모습이 오히려 이상해 보일 정도다.
여기서 두세 블록 떨어진 팔스로드(Falls Road), 아이리쉬(Irish, 가톨릭 또는 Republican/공화주의자, Nationalist/민족주의자) 지역을 이어서 찾는다. 아일랜드 국기가 걸려 있고 거리 간판은 이미 켈틱(Celtic, Gaelic) 언어로 바뀌어 있다.

이 좁은 지역에서 일어난 갈등의 역사를 돌아본다. 영국 본토에서 건너온 사람들에게 살던 땅을 빼앗긴 아일랜드인, 이미 수백 년 전 이 땅으로 건너와 이제는 고향이 돼버린 영국인, 어느 입장이 돼도 양보할 수 없는 한 판이다.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밀타운 시립묘지(Milltown Cemetery)에 들른다. 아름답게 가꾸어진 공원묘지이지만 북아일랜드 분쟁의 희생자들이 많이 묻혀 있는 사연 많은 곳이다.

공업 도시 벨파스트
항구 지역을 찾는다. 타이타닉 호를 형상화한 타이타닉 벨파스트(Titanic Belfast)의 거대 구조물이 풍경을 압도하며 서 있다. 타이타닉 호가 건조됐을 만큼 한때 융성했던 조선업의 본거지임을 상징하듯 노란 골리앗 크레인이 분주히 작업을 하고 있다.
공항으로 돌아가 렌터카를 무사히 반납하니 이번에는 200km 주행했다. 숙소에 체크인하고 곧장 도시 도보 탐방에 나선다. 시청(City Hall), 성 안느 성당(St. Anne Cathedral), 도서관(British Central Library) 등 대형 건축물들이 늘어선 도심을 둘러본 후 퀸즈 대학(Queen’s University of Belfast)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골든마일(Golden Mile)을 걷는다.


도시 산책
유니버시티 스퀘어(University Square, 대학 광장) 지역에는 크레센트 교회(Crescent Church), 빅토리아 홀(Victoria Hall), 그리고 퀸즈 대학 등 멋진 빅토리아 고딕 양식의 건축물이 즐비하다. 대학 캠퍼스 뒤 잔디 광장은 토요일 오후, 지구상에서 가장 평화로워 보이는 모습을 연출한다. 어디를 가도 그린으로 넘쳐나는 영국 북아일랜드는 회색 도시에서 온 여행자를 황홀하게 만든다.

오렌지멘즈 데이 축제
여행기를 정리하는 지금 시각 밤 9시 반, 숙소 바로 바깥에는 영국인이 모여 길거리 맥주 파티를 벌이고 있다. 알아들을 수 없는 행진곡 풍 노래도 함께 들려온다. 7월 12일 명절, 이른바 오렌지멘즈 데이(Orangemen’s Day)를 앞두고 축제가 시작된 것이다. 1688년 개신교도인 윌리엄 오렌지 공이 가톨릭 왕 제임스 2세를 물리침으로써 아일랜드에 개신교가 뿌리내린 사건을 기념하는 북아일랜드인의 오래된 전통이다. 자정 넘도록 술 마시고 고함지르고 노래하는 풍습은 엄숙하고 점잖은 것으로 알려진 영국에서는 낯선 일이다.
11일차 (벨파스트 → 더블린 도착)
젊은 도시, IT 도시 더블린
버스는 벨파스트를 떠난 지 두 시간 남짓, 신분증 검사도 없이 눈 깜짝할 새 더블린에 도착했다. 다만 도로 표지가 영어와 아일랜드어의 이중 표기로 바뀌었고 거리 단위가 마일(mile)에서 킬로미터(km)로 바뀌었을 뿐이다. 인구 110만의 더블린은 인구의 50%가 25세 미만인 ‘젊은 도시’로서 약품, IT, 금융 산업 등 3차 산업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아마존, 이베이 등 세계 굴지의 다국적 IT 기업들도 여기에 유럽 본사를 두고 있다. 숙소에 짐을 맡기고 곧바로 도보 시티투어를 시작한다.

해외 거주 아일랜드계 8000만 명
리피 강(River Liffey)을 따라 하구를 향해 걷는다. 가장 먼저 세관(Customs House)이 나타난다. 네오클래식 양식의 거대한 18세기(1791) 건축물로서 현재는 주택부를 비롯해 여러 행정 관청이 입주해 있다. 원래는 이름 그대로 세관이었으나 훗날 더블린 항구가 하류 쪽으로 옮겨 가면서 용도가 바뀐 것이다.
곧 이민 박물관(Irish Emigration Museum)이다. 가난한 아일랜드를 떠나는 이민은 이미 대기근 이전부터 시작돼 영국 또는 미국으로 이민자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오랜 이민 역사로 오늘날 아일랜드 민족은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다. 미국인의 10%, 캐나다인의 14%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아일랜드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80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유대인이나 아르메니아인처럼 본토보다 해외 거주 인구가 훨씬 더 많은 민족이다. 작지만 세계무대에서 무시하지 못하는 영향력을 가진 나라다. 케네디(Kennedy) 전 미국 대통령도 아일랜드 이민자의 후손 아닌가?

대기근
아일랜드는 아일랜드 섬의 5/6를 차지하고, 면적은 우리나라의 85%, 인구 638만 명의 다정다감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이지만 역사는 파란만장하다. 5세기에 가톨릭을 받아들인 이후, 11세기에는 노르만의 침입, 16세기부터는 영국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다가 1801년에는 아예 영국에 편입, 1922년 독립으로 이어진 피침의 역사를 가졌다.
이민 박물관 앞길 건너편에는 대기근(Great Potato Famine, 1845~1852) 희생자들을 추념하는 조형물이 있다. 1840년대 유럽 전역에서 감자가 흉년이 든 사건이다. 그중에서도 감자 의존도가 매우 높은 아일랜드가 가장 큰 치명타를 입었다. 100만 명이 아사했고, 100만 명은 해외 이민 길에 오르게 한 사건이다.
캐나다 장 크레티앙(Jean Chretian) 총리의 제막 글이 눈길을 끈다. 아일랜드 이민자 후손들이 캐나다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칭송하는 내용이다. 바로 인근에는 지니 존스톤(Jeanie Johnston) 호의 실물 크기 모형이 관광 명소가 돼 손님들을 기다린다. 대기근 이후 16회 대서양을 왕복하며 수천 명의 이민자들을 미국으로 실어 나른 증기선이다.

여전히 도약 중인 셀틱 타이거
항구 쪽으로 향하는 거리에는 옛 창고가 현대식 건물로 새단장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빠르게 이뤄졌던 경제 성장이 2007년 글로벌 금융 위기로 조금은 꺾였다지만 여전히 ‘셀틱 타이거’(Celtic Tiger)가 도약하고 있다. 도시 전역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건물 신축 현장이 그 증거 중 하나다.
유럽의 옛 도시치고는 과거와 현재, 중세와 현대가 공존하는 흔치 않은 곳이다. 마침 오늘 일요일, 한적한 거리에 날씨까지 선선하니 걷기에 그만이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도시의 도보 여행을 즐긴다. 이곳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예상하지 못했던 여유로운 오전이다.
트리니티 대학
방향을 돌려 시내 중심으로 향한다. 트리니티 대학(Trinity College of Dublin) 캠퍼스 타운을 지난다. 1592년 창설된, 아일랜드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대학이다. 영국 통치 시절, 옥스퍼드와 캠브리지를 모델로 설립됐으니 영국과 아일랜드를 통틀어 유서 깊은 중세 대학 중 하나다.
아일랜드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명사인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Oscar Wilde), 사뮤엘 베케트(Samuel Becket), ‘걸리버 여행기’의 소설가 조나단 스위프트(Jonathan Swift), 정치 철학자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 등이 모두 이 학교를 다녔다. 이 도시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이기도 한 캠퍼스는 세계 각국 방문자들로 무척 붐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대학 하나쯤 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절로 든다.
(정리 = 김금영 기자)
- 관련태그
- CNB 씨앤비 시앤비 CNB뉴스 씨앤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