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경제 = 이한성 옛길 답사가) 겸재의 관악산 그림은 두 점이 전해지고 있다. 선문대 소장의 관악청람(冠岳淸嵐)과 일본 야마또문화관 소장의 관악석람(冠岳夕嵐) 도(圖)이다. 두 그림 모두 관악산에 가서 그린 그림은 아니고 덕양산(德陽山: 행주산성) 동쪽 기슭 또는 행주산성 앞 강에서 그린 그림으로 보인다. 따라서 관악산은 원경의 실루엣으로 처리되었다. 관악산에 올라 연주대나 관악의 준봉들을 그렸으면 참으로 멋있었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 밖에도 겸재의 다른 그림 속에도 관악산이 등장하는데 모두 다른 피사체를 그린 그림에서 원경의 배경으로 등장하고 있다. 필운상화, 양화환도, 동작진, 장안연우 등의 배경이다.
원경만 그린 그림을 가지고 무슨 글을 쓸까 고민이 된다. 그러다가 다행히 옛 분들의 산행기(遊山記)를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 미수 허목, 성호 이익, 번암 채재공 선생이 관악산 정상 연주대까지 오른 유산기(遊山記)를 살펴보면서 길을 가려 한다.
우선 겸재의 관악청람도를 보자. 한강 물줄기가 굽이굽이 흐르는 아래쪽에는 일엽편주(一葉片舟)가 떠 있어 그림의 멋을 더한다. 배의 좌측 기슭은 덕양산, 우측 기슭은 양천현아의 뒷산 궁산으로 보인다. 멀리 원경으로 관악산을 잡았는데 번호 1은 우면산, 번호 2는 관악산이다. 솟아오른 준봉들이 관악의 위용을 더하고 있다.


이어지는 번호3은 군포의 수리산일 것 같다. 4는 삼성산, 5는 선유봉이다. 관악석람도에서도 산의 배경은 같은데 다만 앞쪽으로 올망졸망 세 개의 작은 암봉이 강 위로 솟아올라 있다. 무엇을 그린 것일까? 광주바위다. 이 바위 삼형제는 지금도 양천 허준박물관 뒤 구암공원 연못에 남아 있다. (겸재 그림 길 48 궁산 탑산 참조)
‘무등타다’의 어원은 ‘무동 타다’
자 이제 겸재의 그림 속으로 들어가 보자. 겸재의 그림 속 좌측 능선에서 시작하여 우측 능선 끝까지 가 보는 길이다. 좌측 능선 출발 지점은 지금의 사당동인데 여기에서 시작하여 관음사 경유하여 관악 능선 타고 관악산 정상 찍고, 연주대, 연주암, 관악사지(다시 지은 관악사), 기상 레이더 기지, 송신소 통과하여 계속 관악 능선 타고 남행(南行)하여 학바위 능선 갈림길, 팔봉 능선 갈림길 지나 불성사, 무너미 고개, 서울대 옆 계곡길(서자하동천)을 통과하여 신림선 서울대역까지 오는 길이다. 이렇게 하면 옛 분들 유산록에 기록된 산행길을 포함하여 관악산을 종주할 수 있으며 겸재의 그림에 그려진 산 길도 대부분 지나게 된다.

지하철 4호선 사당역 4번 출구에서 출발이다. 이곳의 옛 지명은 승방평(僧房坪)이었다. 승방이란 절집이란 말인데 특히 비구니의 절을 승방이라 불렀다. 사당네거리를 승방평이라 부른 것은 관음사 가는 길목이었기 때문이었으리라. 이 승방평에는 개울을 건너는 다리 승방교(僧房橋)가 있었다 한다. 이 승방교에서는 무동답교(舞童踏橋) 놀이가 볼만한 구경거리였다고 한다. 무동이란 춤추는 어린 광대를 이르는 말로, 어른 광대가 어린 광대를 어깨에 얹고 춤추는 놀이였다. 일제 강점기에 사라졌는데 과천에서 다시 리바이벌하여 공연되고 있다.
요즈음 우리가 쓰는 ‘무등타다’라는 말은 ‘무동(舞童) 타다’에서 온 말임을 알 수 있다. 승방평 앞으로는 과천으로 넘어가는 남태령(南太嶺) 고갯길이 언제 여기가 고개였나 싶게 넓은 차도로 변해 오가는 차량이 길을 메우고 있다. 옛 지도를 보면 이 고개를 호현(狐峴: 여우고개)이라 기록하고 있다. 여우가 출몰하는 고개라는 말이다. 이 고개 이름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를 모신 수원 현륭원으로 행차할 때에 이 고개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이 고개의 이름을 물었더니 과천현 이방 변씨가 옆에 있다가 “남태령입니다”라고 아뢰었다고 한다. 이때 “여우고개라는 예부터 전해오는 이름이 있는데 어찌 거짓 이름을 아뢰는 것이냐?”라고 옆의 신하가 질책하니, “임금님께 여우고개라는 속된 이름을 아뢰기가 민망해서, 한양에서 오는 큰 고개이기에 그랬습니다”라고 대답했다 한다. 임금님께서 이방의 뜻과 기지를 칭찬하여 그 후부터 남태령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사당역 4번 출구에서 남태령을 향해 잠시 오르다가 남현동 골목 주택가를 통과하면 이내 관악산 길로 접어들면서 옛 지도에 기록된 관음사(觀音寺)가 나타난다. 반계(磻溪) 유형원(柳馨遠)의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 과천현 조에 따르면 관악산에는 관음사, 관악사, 불성사가 기록되어 있다. 관악산을 대표하는 세 절 중 하나였던 것이다. 지금은 조계사의 말사인데 절을 안내하는 자료에 따르면 진성여왕 9년(895년) 도선국사가 창건했다 한다.
많은 옛절이 원효, 의상, 도선에 뿌리를 둔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역사적 사실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동국여지승람, 범우고, 가람고에도 관음사가 기록된 것으로 보아 절의 내력은 상당히 깊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조 말 절들이 피폐해지고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아쉽게도 문화재로 기록될 만한 유산이 남아 있지 못하다.

서울 근교 최고의 암릉 길
절 뒤로 돌아가면 겸재의 그림이 보여주듯 관악능선길이 시작된다. 서울 근교 어느 산에서도 볼 수 없는 멋진 암릉(岩稜) 길이다. 멀리는 연주대가 바라보이고 남북으로 뻗어나간 능선들이 이어진다. 관악의 공룡능선이라 해야 할까? 위험 구간도 여러 곳 있는데 이제는 대부분 나무로 데크를 만들어 접근성과 위험을 줄였고 일부 구간에서만 악산의 수고로움을 거치면 최고의 호사를 맛볼 수 있다.
드디어 마지막 가파른 능선을 올라서면 관악산 정상이다. 겸재의 그림과는 달리 이제는 기상청 레이다와 높이 선 안테나가 위용을 자랑한다. 높이는 그다지 높지 않은 632m이지만 서울을 밖으로 호위하는 외사산(外四山: 북한산, 아차산, 관악산, 덕양산)의 남쪽 산으로 주위를 내려다보는 일망무제의 경관을 자랑한다. 북동 방향으로는 한양도성의 사대문 안이 훤히 내려다 보이고, 동으로는 남태령과 우면산, 강남, 잠실, 광주 방향이 잡힐 듯하다. 남으로는 바로 앞이 청계산이며 과천 너머로 매봉과 모악산이 보인다. 서쪽은 삼성산과 호암산이다. 실로 한강 남쪽에 큰형님 같은 산이다.
그런데 관악산은 한양도성 특히 경복궁에서 바로 볼 때는 걱정을 끼치는 산이기도 했다. 음양오행(陰陽五行) 사상이 생활에 깊이 박혀 있던 그 시대에 관악산은 불의 방향에 자리한 데다가 그 모양도 걱정을 끼치기에 충분했다. 음양 사상에서는 동방 목국(東方 木局: 동쪽은 나무 기운), 서방 금국(西方 金局: 서쪽은 쇠 기운), 남방 화국(南方 火局: 남쪽은 불 기운), 북방 수국(北方 水局: 북쪽은 물 기운), 중앙 토국(中央 土局: 중앙은 땅 기운)이라 했으니 경복궁이나 한양의 화재는 관악산의 조화로 보기에 충분했다. 게다가 이중환의 택리지(擇里志)의 복거총론에서 보듯 관악산의 우뚝우뚝 솟은 봉우리들이 불을 연상시켜 화성(火星)이라 했으니 어떻게 하든 관악산의 화기(火氣)를 누르고 싶어 했다.

관악산 정상 큰 바위에는 (소금)물을 채워 두었던 공간을 팠는데 지금도 그때 판 그 모습 그대로 남아 있다. 또한 경회루에는 연못을 파서 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아울러 불 기운을 누르기 위해 두 마리 용을 제작하여 연못에 넣고, 1000개의 龍(용) 자(字)를 모아 水(수)를 그린 부적을 만들기도 했으니 관악산 화기가 무척 신경을 건드렸던 것이다.
흔히들 말하는 광화문 앞에 해치(獬豸, 해태) 상은 사헌부를 상징하는 법과 정의의 징표로 관악산 화기와는 무관한 석상이며, 남대문 앞 연못 남지(南池)도 관악산 화기를 누르려고 만들었다고 하는데 서대문 밖에는 서지(西池)가, 동대문 밖에는 동지(東池)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믿을 만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한편 숭례문(崇禮門)의 편액도 다른 문과는 달리 세로로 세워진 이유가 관악의 화기를 누르려 했다 하는데 이 이야기도 근거가 희박하다. 아무튼 관악산의 화기(火氣) 때문이었을까, 경복궁은 임진란에 불타 270여 년 간 빈터로 있어야 했으니 용(龍)도, 바위 구멍도, 부국강병(富國强兵)을 준비하느니만 못했던 것 같다.
84세의 정상 등정 놀라워
그런데 이곳 관악산 정상에 오면 조선시대 노익장(老益壯)들이 떠오른다. 첫째는 미수 허목 선생이다. 미수는 84세 나이로 관악산 정상에 올랐다.
‘기수기언’ 별집에는 그때의 일이 간략히 기록되어 있다. 1678년(숙종 4년) 4월이었다. 미수는 “서자하동(西紫霞洞)의 수마제(須摩題)에서 출발하여 불성암(佛性庵)을 지나 영주대(靈珠臺)에 올랐다. 영주대는 우리 세조(世祖)께서 예불하던 곳으로 관악산의 깎아지른 절벽 위에 있는데 멀리 바다를 바라다보면 중국 연나라, 제나라(燕齊)의 앞바다까지 보인다. 그 아래 동자하동(東紫霞洞) 금수굴(金水窟)로 내려오니 골짜기가 붉은색이었다.(自西紫霞須摩題過佛性. 登靈珠臺。靈珠臺者. 我光聖禮佛處也. 爲冠岳絶頂。望海潮. 極燕齊之海. 其下東紫霞下金水窟洞赤)”라고 썼다.
이 기록을 보면 미수는 서울대 옆 계곡길 서자하동(西紫霞洞) 수마제(무너미 고개?)를 출발하여 팔봉능선 아래 불성암을 지나 관악의 남쪽 능선을 타고 연주대(영주대: 迎珠臺)에 올랐다. 여기에서 서해를 바라보았는데 연나라, 제나라의 앞바다가 보인다고 했으니 산동반도 방향을 바라보았던 것이다. 그리고 내려가는 길은 연주암에서 과천으로 내려가는 길(東紫霞洞)을 하산로로 잡았다. 우리 시대 기준으로 보아도 서울대 앞에서 계곡길을 타고 학바위 능선 아래, 팔봉능선 아래를 넘어 불성사에 이르고 이어서 관악능선을 타고 연주대에 올랐다가 과천으로 내려갔다. 만만한 코스가 아니다. 멋진 미수 선생.
그다음으로 떠오르는 이는 성호 이익이다. 선생의 유관악산기(遊冠岳山記)에 전하는 내용을 보면,
불성암(佛成菴)에 이르러 노승(老僧)과 이야기하였는데, 산승(山僧)이 말하기를, “관악산은 영주대(靈珠臺)가 실로 가장 높은 봉우리인데 산의 승경(勝景)이 이보다 뛰어난 곳이 없습니다. 그다음이 자하동(紫霞洞)인데, 자하동이라고 이름 붙인 곳이 네 곳입니다. 불성암의 남쪽 아래가 남자하(南紫霞), 남쪽에서 방향을 틀어 서쪽으로 들어간 것을 서자하(西紫霞)라고 하는데, 모두 특별히 칭할 만한 점이 없습니다. 영주대 북쪽에 있는 북자하(北紫霞)는 자못 맑고 깨끗하지만 그래도 동자하(東紫霞)의 기이한 경관만은 못하니 거기에는 못도 있고 폭포도 있어서 영주대의 다음이 됩니다. 그 외에도 절이나 봉우리 등 여러 가지 볼거리가 있습니다” 하였다. 나는 곧 해질녘에 서암(西巖)에 올라 일몰(日沒)을 보고 암자에서 잤다.
해가 돋기를 기다리며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봉우리로는 용각봉(龍角峯)과 비호봉(飛虎峯), 바위로는 문암(門巖)과 옹암(甕巖)이 있었으니, 모두 지나온 곳이다. 의상봉(義上峯)에 이르렀는데, 옛날 의상(義上)이 살았던 곳이다. 관악사(冠岳寺)와 원각사(圓覺寺) 두 절을 지나서 영주대 아래에 이르러 영주암(靈珠菴) 터에서 쉬고, 마침내 대에 올랐다. 돌을 뚫어서 층계를 만들었는데 사람 하나 들어갈 만한 바위틈을 따라서 가장자리를 붙잡고 조금씩 올라가 빙 돌아서 대의 꼭대기에 이르니, 삼면은 막힘없이 전부 바라보이고 서쪽에는 깎아지른 벽이 서 있었다. 벽에는 불상(佛像)이 새겨져 있고 다시 돌로 처마를 만들어 불상을 덮었다. 바위에 의지하여 단(壇)을 쌓았는데 돌을 쌓고 흙을 채워서 50여 명은 앉을 만하였으며, 바위 머리에 또 구멍을 파 등불 밝힐 곳을 만들어서 성중(城中)에 통지할 수 있었으니, 대개 나라에서 불교를 숭상하던 때에 한 일이라고 한다. 다시 차일봉(遮日峯)을 거쳐 북자하를 굽어보고 동자하를 지나서 폭포를 구경하고 돌아왔다. (원문 생략, 기존번역문 전재)
이 기록을 보면 성호도 역시 불성암에서 출발하여 연주대를 올랐고 과천으로 내려갔다. 재미있는 사실은 불성사 노승이 관악산에 4개의 자하동이 있다고 한 점이다. 지금의 연주암과 과천을 오가는 골짜기를 동자하(東紫霞)라 했고, 서울대 입구에서 무너미고개 사이를 서자하(西紫霞), 무너미고개에서 안양 방향으로 흐르는 계곡을 남자하(南紫霞), 학바위 능선 아래에서 서울대로 내려가는 골짜기를 북자하(北紫霞)로 부르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불성사 뒤 능선 즉 팔봉능선의 봉우리와 바위들 이름도 언급하고 있다. 오히려 우리 시대에는 팔봉능선 봉우리의 번듯한 이름이 없다. 불성사 뒷봉은 의상봉, 주변 봉우리는 비호봉, 용각봉, 개별 바위는 그 형세를 살펴 옹암(독바위), 문암(문바위)이라 했다. 생각해 보면 관악산 기슭에서 한 때를 보낸 자하(紫霞) 신위(申緯)가 호를 자하로 삼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마저 살펴보고자 하는 유산기는 번암 채제공이다. 그는 67세에 연주대에 오르면서 84세에 오른 미수에 대해 경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코스는 역시 불성사에서 젊은 승려 몇을 앞세우고 연주대에 올랐는데 길이 험해 엉금엉금 기고 옷도 찢어가면서 올랐다. 그리고는 관악산 정상에서 한양을 바라보면서 한 때 관악산에 머물렀다는 양녕과 효녕대군을 돌아본 뒤 다시 불성사로 돌아가는 코스를 택하였다. 필자도 번함 선생처럼 북쪽 능선도 바라보고 옛 한양 방향도 바라본다. 관악의 한 줄기가 북으로 구불구불 뻗어 숭실대 옆 언덕을 넘어 국립현충원 서달산으로 이어나갔다. 아하 그렇구나. 옛 창빈안씨의 이장할 음택을 고르던 지관(地官)이 관악산 북쪽 능선이 뻗어나간 혈(穴) 자리에 터를 잡았나 보구나.

성호 방문기 그대로 남아 있는 감실들
이제 관악산 정상석을 둘러본 후 남쪽 절벽 쪽에 숨어 앉은 연주대로 돌아간다. 백척간두 절벽 위에 작은 터를 고르고 한 칸 법당을 앉혔는데 응진전(應眞殿)이다. 아랫절 연주암의 나한전(羅漢殿)인 셈이다. 이곳의 예전 명칭은 의상대였다. 돌벽에는 성호의 방문기 때처럼 벽에 감실을 파고 모신 작은 불상이 있다. 언제나 이곳은 많은 이들의 기도 터이다. 장소가 특별하다 보니 기도가 잘 이루어지는가 보다. 이제 아랫절로 내려간다. 관악사지에는 새로 건물이 들어섰다. 이른 봄 따스한 볕이 내려올 때 관악사지(冠岳寺址)에 오면 북풍은 연주대와 주변 봉우리가 막아주고 햇볕은 따스하게 내려와 언제나 아늑하던 곳이었다. 새로 지은 관악사는 참으로 낯설다. 이층 건물에 유리 창문을 달고 서 있다. 어허 무슨 일이래?
여말선초(麗末鮮初)의 문신 춘정 변계량은 일찍이 고즈넉한 관악사에 오르며 시 한 수 남겼다. 관악사의 역사는 적어도 고려 때부터 이어졌음을 어림할 수 있다.
관악사(冠岳寺)에 올라 登冠岳寺
절집 한가롭게 푸르를 무렵 찾았는데 蘭若閒尋薄暮時
저 멀리 층층바위에 이끼 속 사립문 重巖遙見亞苔扉
오솔길은 옛벽 공중에 뻗어 있고 徑緣古壁盤空上
등나무 새 긴 가지 자리에 늘어졌네 藤長新枝入座垂
뜰에 심은 나무 학 꿈을 흔들고 庭樹靜搖孤鶴夢
산구름 나지막히 入定 僧의 옷깃 터는데 嶂雲低拂定僧衣
십 년 공부는 끝내 무엇 하러 하는 걸까 十年螢雪終何事
산은 좋건만 일찍이 시 한 수 없구나 山好曾無一首詩
얼른 연주암(戀主菴)으로 넘어온다. 투박한 고려 삼층탑이 언제나 그 자리에 서 있어서 오래전 친구 만난 것 같다. 미수와 성호도 이곳에 와서 이 탑을 보고 과천 방향 동자하(東紫霞)로 내려가셨을 것이다. 겸재의 그림 길을 걸어야 하는 필자는 연주암을 뒤로 하고 다시 능선길로 오른다. 오르는 길 중간에는 효녕각(孝寧閣)이 자리하고 있다. 이곳 관악사 연주암과의 인연으로 여기에 세운 것이다. 한 칸 집 효녕각에는 주련이 걸려 있고 안에는 비록 복사본이지만 효녕대군의 영정이 걸려 있다.


出自王宮通佛域, 仰瞻天國上仙臺(출자왕궁통불역 앙첨천국상선대).
왕궁을 나와 부처님 세계와 통하고 하늘을 우러러 신선 세계에 오르네
이후 효녕이 세속적 영화를 누리고 산 모습을 생각하면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 다시 겸재의 그림 속 관악 능선으로 돌아온다. 겸재 그림 속 관악의 정상 오른쪽 능선은 원경의 실루엣이다 보니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자운암 능선, 학바위 능선, 팔봉능선이 중첩된 모습일 것이다. 그중에서도 능선길 제일 뒤로 우뚝한 능선인 팔봉능선이 주로 그려졌을 것으로 보인다.
중계소 안테나 봉을 지나 관악능선을 계속 남행한다. 노년기의 화강암 바위들이 부서져 길 위에 왕모래가 있는 불편함도 있지만 삐죽삐죽 솟은 암봉들은 또 하나의 장관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길이 관악 연주대에 오르며 유산기(遊山記)를 남겼던 옛 분들의 유산 길이다. 드디어 팔봉능선 갈림길이다. 기암의 봉우리 능선은 놓아두고 뒤 골짜기 불성사 계곡으로 내려간다. 불성사에서 출발한 옛 분들이 오르던 길이다. 드디어 불성사 도착. 새로운 불사(佛事)는 조금 있었지만 옛 모습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절이다.
한양에서 관악산 연주대를 오르려면 옛 사람들은 사당에서 출발하여 암릉길로 오를 수는 없었다. 가장 현실적 대안이 지금의 서울대 옆 골짜기 서자하(西紫霞)로 들어와 불성사에 베이스 캠프를 두고 다녀가는 길이었다. 우리 시대의 불성사는 거의 잊혀 관악산 오지의 절로 남았으니 그것도 아이러니다. 불성사에 대해서는 필자의 졸고 옛절터 가는 길 59를 인용하려 한다.
옛 기록에는 불성사 뒤 팔봉능선 봉우리를 불성봉(佛成峰, 佛聖峰), 의상대(義湘臺)라 불렀다. 봉은본말사지(奉恩本末寺誌) 불성사 편에는 불성사의 동봉(東峯)은 인봉(金+刃 峰), 나한봉(羅漢峰)이며 남봉은 문필봉(文筆峰) 원효대(元曉臺)라 하였다. 봉은본말사지에 전하는 불성사약지에는 신라 문무왕 15년(675년) 의상대사가 소암을 짓고 자리했다 한다(新羅文武王十五年也 巨智義湘祖師 傳授淸淨心法 未見其性故 乃棲於漢陽之南 果川冠岳山中)
이쯤 되면 왜 불성사 뒷봉이 의상대인지 짐작되는 바가 있다. 의상이 뒤에 앉으셨으니 어찌 원효가 아니 오시랴? 앞 봉은 원대대가 되어 짝이 맞는다. 함허득통 화상도 관악산 의상암에서 득도하였다 하는데 모름지기 이곳이 아니었을까? 봉은본말사지를 집필한 안진효 법사는 그렇게 생각했다.
또한 세종실록에는 불성봉이 무너져 5명의 승려가 압사한 슬픈 기록도 전한다(果川縣冠岳山佛成峯, 崩壓僧舍, 五人死. 1428년 5월)
관악이라서 그랬나? 화재 잦았던 불성사
선조 때(1590년)에는 절이 불타 재창하였고, 1905년에는 또다시 절에 불이 나 연로한 비구니 스님 한 분이 소사(燒死)했으며, 1936년에도 절이 불타는 아픔을 겪었다. 택리지(擇里志)에서 관악산을 화성산(火星山)이라 한 것이 유독 불성사에는 더 많은 화재를 가져왔나 보다. 그 결과 문화재로 등록될 만한 옛것은 남아 있는 것이 없는 듯하다.
용주유고(龍洲遺稿, 선조~효종 때 학자인 용주 趙絅 선생의 유고집)에 의하면 이곳 불성사에는 관악사에서 가져온 높이가 수척이나 되는 큰 옛 향로가 있었다 한다(冠岳寺古銅罏跋). 남아 있었다면 모름지기 큰 보배가 되었을 것을….
봉은본말사지 기록에 남아 있는 석가상, 아미타불상, 나한상, 독성상, 여의관음상, 입암사(立巖寺)에서 옮겨 왔다는 천불탱, 그밖에 신중탱, 칠성탱, 산신탱들도 한국전쟁 중에 일실된 듯하다. 특히 나말려초 작품으로 추정된다는 독성과 여의륜관음은 향로 못지않게 아쉬움을 남긴다.
불성사는 시인 묵객이 찾아 몸과 마음을 쉬던 곳이기도 했으며 과거시험을 준비하는, 요새 말로 하면 고시생이 공부하던 곳이기도 했던 모양이다. 이렇게 불성사와 인연을 맺은 이들의 글들이 그들의 문집에 많이 남아 있다.
선조 때 우의정을 지낸 청천당(聽天堂) 심수경 선생은 75세, 81세에 득남했다는 전설적 인물인데 그의 시집에 불성사에 대한 3편의 시를 남겼다. 호(號)처럼 하늘의 뜻에 따르고(聽天) 불성사 산길을 자주 오르며 몸과 마음을 닦으셨던 모양이다. 옥담시집(이응회), 동악집(이안눌), 관양집(이광덕), 본암집(김종후), 존재집(박윤묵), 난곡집(정길)에도 불성사에 대한 시편이 남아 있다. 불성사는 지금 잊혀진 절이지만 당시는 핫한 곳이었다. 잠시 시 한 줄 읽고 가자.
방 속 누워 있기 진력나기에 서봉에 올랐네
(厭卧深房西上峰)
기분 좋게 밝은 달 꿰차고 솔바람 속에 섰네
(好携明月立松風)
아득한 바다색 하늘 끝은 어디일까?
(微茫海色天何際)
한밤 고요히 내리는 가을 소리
(寥落秋聲夜正中)
조선 후기 학자 김종후의 본암집에 실려 있는 불성사의 달밤(佛聖寺月夜)이라는 시의 앞부분이다.
이제 불성사를 떠나 환속(還俗)의 길로 들어선다. 불성사에서 서자하(西紫霞)로 가는 길은 구불구불 산길이 조선시대 모습 그대로 남아 있다. 미수 선생도, 성호 선생도, 번암 선생도 지났을 불성사 가는 길을 걸어 서울대 옆 계곡 길(서자하)을 지나 신림선 서울대역으로 나온다. 겸재도, 옛 유산기를 쓰신 분들도 기뻐하셨을 늦가을 날이다. (다음 회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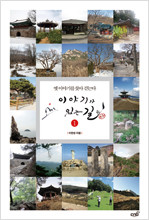
<이야기 길에의 초대>: 2016년 CNB미디어에서 ‘이야기가 있는 길’ 시리즈 제1권(사진)을 펴낸 바 있는 이한성 교수의 이야기길 답사에 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매달 마지막 토요일에 3~4시간 이 교수가 그 동안 연재했던 이야기 길을 함께 걷습니다. 회비는 없으며 걷는 속도는 다소 느리게 진행합니다. 참여하실 분은 문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간사 연락처 010-2730-7785.










 제735호
제73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