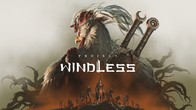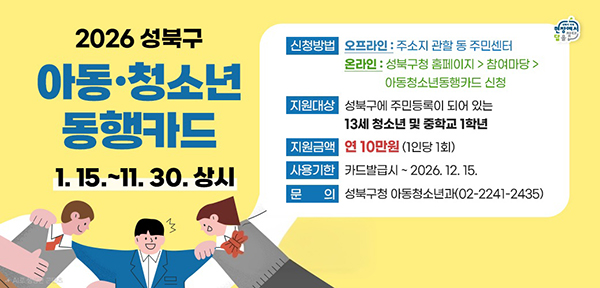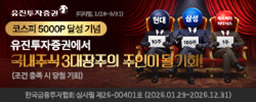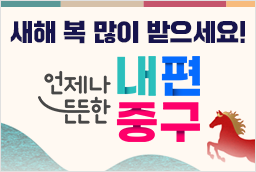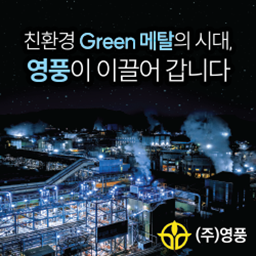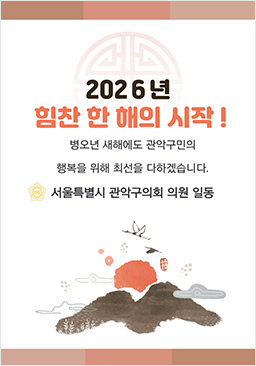[칼럼] 한국 헌법은 왜 ‘양심 따라 판결' 시키나? 양심에 털 났으면 어쩌려고?
'양심 따라 판결'은 한국과 일본뿐 … 유럽 선진국은 '법과 직무 따라 판결 않으면 처벌'
 최영태⁄ 2025.03.12 15:33:20
최영태⁄ 2025.03.12 15:3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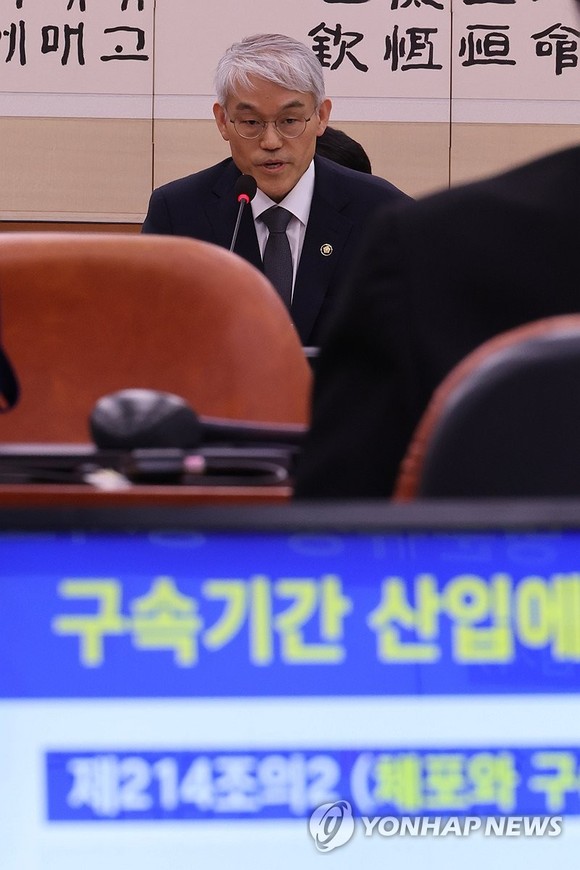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 판결로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여기서 생각나는 게 바로 대한민국 헌법 103조의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서 특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양심에 따라 ’입니다.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결하면 되지, 왜 판사의 양심을 끼워 넣느냐는 것입니다. ‘양심 = 착한 속마음’이라면, 착하지 않은 판사, 시쳇말로 양심에 털 난 판사는 그렇다면 자신의 털 난 양심에 따라 극우 또는 극좌적으로 판결을 내려도 된다는 말이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국제적으로 판사의 의무에 대해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외부의 영향을 받지 말고)’ 심판하라는 것은 국제 공통사항이지만, ‘양심에 따라’라는 문구를 별도로 넣은 것은 주요국 중 한국과 일본뿐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양심이란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제19조에서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고, 103조는 “법관은 … 양심에 따라 … 심판한다”고 했지요. 이에 대해 헌법 전문가들은 19조의 양심은 ‘주관적 양심’이며, 103조의 양심은 ’객관적 양심’이라고 설명해줍니다.
한국 판사들의 고민이라는 ‘두 양심 사이’
하지만 이렇게 설명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양심이란 단어가 워낙 평상어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이다 보니, 실제 재판에서도 판사들이 “주관적-비법조적 양심과 객관적-법조적 양심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는 고민이 자주 토로 된답니다. 내 속마음으로는 죄가 되는데 법 조문 상으로는 벌을 주면 안 되거나. 또는 반대로 내 속마음으로는 분명 무죄인데 법 조항 상으로는 벌을 줘야 하는 상황이 가끔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특히 요즘처럼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중간층이 사라지고 좌우가 극심하게 대결할 때는, 다른 선진국의 헌법과는 달리 유별나게 한국 헌법에만 들어가 있는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는 문구 탓에 한쪽으로 치우친 판사가 ‘불법 판결’을 내리면서도 “나는 내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결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까지 있는 형편입니다.
일본 헌법의 양심은 그래도 한국보다는 낫다
양심이란 단어가 한국과 일본 헌법에 모두 들어가 있다지만, 일본 헌법 제76조 즉, “모든 법관은 법률에 구속되며,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행한다”가 한국 헌법 103조의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더 규제적입니다. 일본 헌법은 판사가 ‘법률에 구속’된다고 했고, ‘직무를 행한다’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앞의 구속된다는 표현은 곧 ‘법을 벗어나서 판결하면 죄를 묻겠다’는 의미가 되고, 뒤의 ‘직무’라는 단어는 ‘미리 정해진 규정을 벗어나지 말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에 비한다면 한국의 헌법에는 판사의 직무 또는 법에 구속된다는 내용을 넣지 않아 판사 개인의 재량권을 더 많이 허용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판사에게 보다 넓은 재량권을 허용하면 자칫 ‘판사 지옥’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모든 한국인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듯, 법의 판결이란 모든 사안에 대한 최종 해결책입니다. 어떤 판결이 내려지냐에 따라 개인이든 국가든 그 운명의 방향타가 심하게 꺾이고, 한번 꺾인 방향타는 엔간해서는 제 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오랜 기간 개인-국가의 운명을 결정해버립니다.

이렇게 판사의 판결이 중요하기 때문에 판-검사가 법률의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개인-국가의 운명을 망치지 못하도록 독일과 일본의 헌법은 ‘법관은 법률에 구속된다’는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법의 범위를 마음대로 벗어나면 반드시 처벌한다는 정신을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선 헌법에 이런 ‘법관 구속’ 단어를 넣어 놓은 것은 물론, 형법에 ‘법 왜곡 죄’ 조항도 있답니다. 독일 형법 제339조는 ‘법을 왜곡하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즉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또는 공직자(검사)가 법의 본래 취지와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징역형에 처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헌법과 형법에 ‘판사가 법에서 못 벗어나도록 구속하는’ 조항을 만들어놓는 한편, 실제 법정 현장에서도 여러 민주적 요소가 포함되도록 선진국들은 하고 있습니다. 영-미계 국가에선 일반 시민을 무작위로 골라 판결에 참여시키는 배심원 제도를, 유럽 대륙 국가들에선 일반 시민 중 법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참여시키는 참심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판이란 게 검사와 판사 사이에서만 이뤄지는 대결(민주적 참여가 봉쇄되면 둘 사이의 짬짜미도 가능)이 돼서는 안 되고, 일반 시민의 뜻에 따라 결정되는, 즉 사법에도 민주적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도록 한 것이지요.
판결문을 왜 ‘국민의 이름으로’ 쓰게 하나
이뿐 아닙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나라들의 최종 판결문의 첫 문장은 반드시 ‘국민의 이름으로’로 시작합니다. 독일에서는 ‘Im Namen des Volkes’가, 프랑스에선 ‘Au nom du peuple français’라는 문구입니다. 이런 관행은, 판사 개인의 주관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이름으로 판결을 내린다”, “국민 일반 의지의 결과로서의 판결이다”라는 의미를 담은 것이지요.

이런 선진국들에 비한다면 현재 한국의 사법 시스템은 지나치게 판사와 검사의 ‘마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재량권을 허용하면 반드시 부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저렇게 할 수도 있는 재량권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다른 선진국에서는 법 조항으로 묶고, 일반 시민을 법정에 의무 참석시키고, 판결문 쓰는 관행에도 민주적 요소가 들어가도록 확립해 놓은 것이지요.
현재 일부에서 개헌을 말하고 있지만, 앞으로 개헌이 이뤄진다면 제왕적 대통령제도 손봐야 하겠지만, 나라 운명의 최종 결정 장소인 법정이 좀 더 민주화될 수 있도록 헌법 103조의 문구도 반드시 손봤으면 좋겠습니다.
- 관련태그
- 지귀연 개헌 헌법 103조 헌법재판소 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