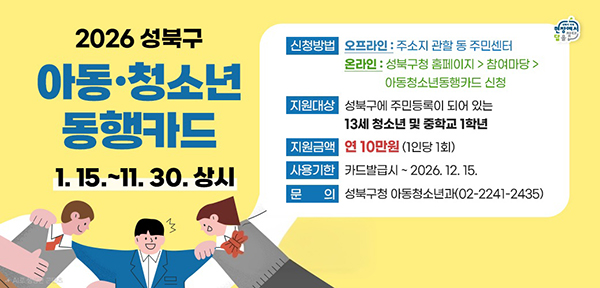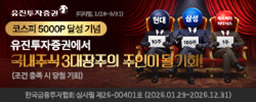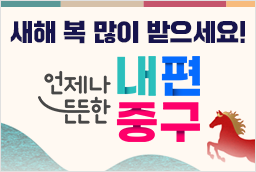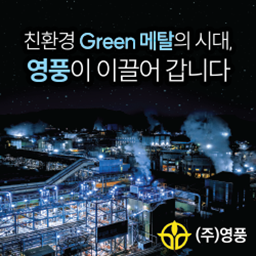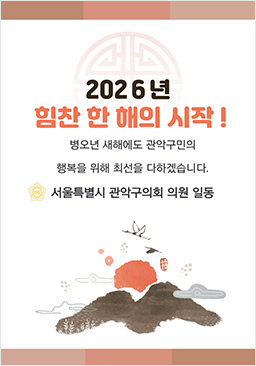(문화경제 = 이한성 옛길 답사가)
용문사 만행(漫行)을 끝내고 매월당은 발길을 남으로 돌려 여주 신륵사로 향한다. 1460년(세조 6년) 그의 나이 26세 봄이었다. 길은 그때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으니 용문천을 따라 내려오면 우리 시대에 용문역이 자리 잡은 용문(龍門)에 닿는다.
여기에서 동남 방향으로 이어지는 옛 관동대로는 342번 지방도가 되어 지평면(砥平面)에 닿는다. 지제(砥堤), 지현(砥峴)을 거쳐 지평이라는 지명으로 굳어진 곳이다. 작은 고을이지만 고구려 시대부터 자리 잡은 곳이다. 오랜 역사를 가진 지평막걸리의 산실이기도 한데 쌀이 귀하던 시절 텁텁한 밀가루 막걸리로 유명세를 탔다. 지금은 서울의 장수막걸리와 함께 수도권의 대표 막걸리가 되었다. 매월당이 이곳을 지날 때 텁텁한 목은 무엇으로 달랬을까?
우리 시대에는 경의중앙선 열차가 전철화 되어 지평역까지 이어지고, 중앙선은 직선화되면서 석불역, 일신역, 매곡역, 양동역으로 달린다. 이 과정에서 구둔역(九屯驛)은 폐역이 되어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양동으로 넘어가는 구둔치(구질고개, 구존고개)는 사람의 발길이 끊긴 트레킹 코스로 남았다.

아마 매월당도 이 구둔치 앞에서 남으로 발길을 돌려 여주로 내려왔을 것이다. 이 길은 지금 금당천을 끼고 내려오는 345번 지방도가 되었고 주암사거리에 닿는다. 이곳 주암사거리 서쪽 2km 지점에는 고려를 대표하는 대찰 중 하나인 고달사(高達寺)가 있었다. 지금은 넓고 넓은 절터만 남고 근래에 같은 이름으로 지은 작은 절이 있다. ‘봉은본말사지’에 따르면 신라 경덕왕 23년(764년)에 창건되었다고 전한다.
신라 말 고승 원감국사(圓鑑國師) 현욱(玄昱: 788~869년)이 중국에서 귀국하여 이곳에 28년 간 머물면서 사세가 커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新羅景德王二十三年, 甲辰刱 圓鑑國師自華歸國 居于慧目山).
원감국사 현욱은 신라 귀족 출신으로 중국에 유학하여 마조(馬祖)계의 백암장경(百巖章敬)의 심인(心印)을 전수받은 법사(法嗣: 정식 법통을 이은 後嗣)이다. 원종대사가 이곳에서 주석할 당시인 고려 광종 22년(971년)에 황제는 조칙을 내려 ‘국내 사원 중에 도봉원(도봉사), 고달원(고달사), 희양원(봉암사) 오직 3곳은 전통을 지켜 문하의 제자들이 상속하여 대대로 주지가 되도록’ 하였다. 이른바 황제의 칙령을 받은 부동사찰(不動寺刹)로서 중요성이 인정된 사찰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빈터와 아래의 문화유산만이 남아 고달사의 어제를 증언하고 있다.
*국보 4호와 보물 7호로 지정된 승탑(僧塔, 浮屠) 2기(基)
*보물 6호로 뛰어난 솜씨의 비석의 귀부(龜趺) 및 이수(螭首)와 소박한 귀부(龜趺). 파손되어 중앙박물관에서 복원된 원종대사탑비
*보물 8호로 부처의 앉을 자리인 석조좌대(石造臺座)
*중앙박물관 뜰로 옮겨진 보물 282호 쌍사자석등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석조(石槽) 2기(基)
그런데 매월당이 이 근처를 지나갈 때 비록 사세(寺勢)는 예전 같지 않았으나 여전히 현존했던 고달사를 그냥 지나쳤을까? 아쉽게도 기록을 찾을 수 없다. ‘매월당집’의 기록들은 흩어져 있던 자료들을 후세에 모아서 편집한 문집이다 보니 훨씬 많은 자료들이 일실되었을 것이다. 아쉬울 뿐이다.
이윽고 매월당은 여강(驪江)에 닿는다. 여강이란 여주시(驪州市) 앞을 흐르는 남한강을 부르는 말이다. 동국여지승람에 보면 여주를 부르는 이름은 다양하게 바뀌어 왔다. 골내근(骨乃斤), 황효(黃驍), 영의(永義), 황려(黃驪), 여강(驪江), 여흥(驪興), 여성(驪城), 황리(黃利) 등을 거쳐 여주(驪州)가 되었다.

지명의 유래가 된 말 바위
이곳 지명에서 공통으로 쓰이는 글자가 여(驪) 자이다. ‘검은 말’을 뜻하는 글자라 한다. 검은 말과 여주는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까. 다행히 동국여지승람에 힌트가 있다. 여주목 고적(古跡) 조에는 마암(馬巖: 말 바위)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말 바위는 주 동쪽 1리에 있다. 이야기에 전하기를 황마(黃馬; 누런 말)와 여마(驪馬; 검은 말)가 물에서 나왔기에 이로 인해 군 이름 붙이기를 황려라 하였고 바위도 마암(말 바위)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馬巖: 在州東一里 談傳; 黃馬驪馬出水 因名郡爲黃驪 巖之得名以此)
이규보(李奎報)의 시에
두 말이 웅건, 기이하게 물가에서 나오니
현 이름은 이를 따라 황려(黃驪)라 했다네
시인은 옛것 좋아하여 까탈스럽게 증거를 따지지만
오가는 늙은 어부 어찌 제 알리요
雙馬雄奇出水涯(쌍마웅기출수애)
縣名從此得黃驪(현명종차득황려)
詩人好古煩徵詰(시인호고번징힐)
來往漁翁豈自知(래왕어옹기자지)
이규보가 살던 800여 년 전 고려 시대에도 황려(黃驪)라는 지명에 대해 이것저것 캐묻던 지식인들이 있었던 모양이다. 이색(李穡)의 시에도 마암(馬巖)이 등장한다.
“물을 막는 공은 마암석(馬巖石)이 높고, 하늘에 뜬 형세는 용문산(龍門山)이 크구나.” (捍水功高馬巖石 浮天勢大龍門山)
마암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여흥 민씨 시조와 관련된 전설에도 등장한다. 깎아지른 듯한 벼랑에 괴이하게 생긴 바위가 바로 마암(馬巖)인데, 근처 암혈에서 여흥 민씨의 시조가 태어났다는 구전의 이야기가 있다 한다. 이래저래 여주라는 지명은 마암(馬巖)과 그곳 물가에서 나타났다는 두 마리 전설의 말로 귀착된다.

마암 건너 봉미산 자락의 고찰 신륵사(神勒寺)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벌써 눈치채신 독자도 있을 것이다. 어찌해서 고삐를 나타내는 글자 륵(勒)을 절 이름에 쓴 것일까? 누군가가 만들어 낸 구전의 전설에는 마암(馬巖)에서 나와 날뛰는 용마(龍馬)에게 재갈(勒)을 물린 신륵사 스님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곳에서 열반한 나옹선사라고도 하고 다른 선사 이름도 오르내린다. 어쩌면 신륵사의 륵(勒) 자는 미륵불(彌勒佛)의 륵(勒)이 아니라 황려에게 물린 재갈일지도 모른다. 불교의 나라 고려에서는 신륵사가 여주를 편안하게 지켜 주었던 것이다. 이제 매월당은 신륵사에 닿는다.
신륵사
산사의 소나무 회화나무는 등 넝쿨에 그늘지고
산문 밖 푸른 강가엔 뱃노래 들려오네
학 깃든 나뭇가지 산 달은 밝고
용 숨은 바윗가엔 물안개 자욱하다
종소리는 멀리 푸른 단풍께로 퍼져 나가고
산사에서 바라보니 저 멀리 흰 새는 물결 짓네
으스름 난간에 기대 고개 돌려 바라보니
저녁 바람이 흔들어 떨구는 푸른 마름꽃
*蒲牢(포뢰): 범종 머리 부분에 앉힌 용 모양의 동물. 포뢰는 고래 모양의 물고기(경어/鯨魚)를 두려워해서 경어가 다가오면 소리를 지른다 함. 따라서 범종을 치는 당목(撞木)은 경어 모양의 물고기 형태임.
神勒寺
梵宮松檜暗藤蘿. 門外滄洲聽棹歌. 巢鶴枝邊山月白. 蟄龍巖畔渚雲多. 蒲牢遠渡靑楓岸. 金刹遙看白鳥波. 薄暮倚欄回首望. 晚風搖落綠蘋花.
매월당이 도착한 으스름 저녁 무렵에 신륵사는 저녁 바람 속에 평화로웠다. 평화로운 신륵사의 느낌을 전대(前代)의 이색도 이렇게 읊었다.
먼 산은 긴 강 밖이요, 성긴 솔은 푸른 돌 곁이구나.
절은 복된 땅에 열렸고 깨달음은 법당에서 트였구나.
遠岫長江外 疎松翠石傍 招提開福地 普濟敞眞堂
신륵사는 어떤 절이었을까? 봉미산 아래 남한강변에 자리 잡은 이 절은 전해지기로는 신라 진평왕 때 원효대사가 창건했다 하나 근거는 분명하지 않다. 문화유산으로 보면 고려 중기 이후부터 번창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려 공민왕 때 나옹선사가 밀양 영원사로 가는 길에 이곳에 머물다 입적한 뒤로 이 지역을 대표하는 사찰이 되었다. 같은 영덕 출신이었던 목은 이색은 나옹이 입적하자 그의 부도탑 비문을 지었다. 또 대장각(大藏閣)에는 이숭인(李崇仁)이 기(記)를 지었다.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조선 “예종(睿宗) 때에 세종대왕의 영릉을 절 서쪽 10리에 옮기고, 드디어 고쳐서 큰 절을 짓고, 보은사(報恩寺)라는 액(額)을 내렸다”고 한다.

신륵사는 한때 이름을 고치고 세종대왕 영릉의 능침사찰이 되었다. 절 곳곳에는 문화유산이 많다. 대부분 보물로 지정되었다. 매월당이 들렀을 때도 그 문화유산이 그 자리에 있었다. 절의 이름은 아직은 신륵사였다.
나옹선사와 관련하여 아담한 건물 조사당(祖師堂)이 있다. 지눌, 나옹, 무학 세 화상(和尙)을 모시고 있는데 조선 전기 예종 때 건물로 보이는 귀중한 건축 문화유산이다.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매월당이 신륵사에 왔을 때는 아직 세워지지 않은 건물이다.
조사당 뒤 언덕에는 나옹선사의 석종형 승탑, 석등, 탑비가 있다. 제자들이 세웠는데 모두 보물로 지정된, 소박하지만 한 시대를 대표하는 걸작이다.

아미타불을 모신 극락보전 앞에는 대리석으로 조성된 조선 전기의 다층탑(7층?)이 서 있다. 탑신에 새긴 조각도 훌륭하고 조선의 탑으로는 독보적이다. 역시 보물로 지정되었다. 또한 강가 언덕에는 남한강을 내려다보는 전탑(塼塔: 벽돌을 구워 만든 탑)이 있다. 다층(7층?) 탑으로 경기도에는 유일한 전탑이다. 희귀성이나 빼어난 완성도가 있어 국가 유산 보물로 지정되었다. 전탑 뒤 언덕에는 대장경을 봉안했다는 내용을 담은 비기(碑記)가 깨어진 형태로 보존되어 있다. 역시나 보물로 지정된 문화유산이다. 그밖에 문화유산도 신륵사에는 산재해 있다.

이제 매월당은 강가에서 낚시를 드리운 어부를 보며 자신이 속마음을 싣는다.
여강에서 어부에게
여강 강물은 맑고 잔잔한데
투명하고 물결 없어 푸른 하늘 잠겼구나
저 멀리 포구에는 저녁놀 비겼는데
어부의 노랫소리 찬 강 물안개에 젖어드네
찬 강 물안개는 옅고 먼 산은 붉은데
저녁 해 잦아드는 곳에 푸른 물결 비늘 같네
부들 사립 도롱이 입고 낚싯대를 잡았는데
늙은 모습에 떠드는 말 귀에 들려온다.
왕조의 흥망을 어느 것도 알지 못하고
밝은 달에 낚싯대 하나 푸른 물결 속에 있네
작은 물가 망망하고 마름은 자랐는데
버드나무 바윗가에서 상리어(鱨鯉魚)를 낚는구나
기심(機心)은 이미 그치고 어하(魚蝦)와 짝하노니
강물은 출렁출렁
도도히 흘러 바다로 들어가네
하늘 보고 땅 보아도 한 가지인 듯
물안개 물결 속 낚싯꾼과 말 나눌 만하니
세상 공명이란 다만 그렇고 그런 것
*機心: 무언가 하려고 낌새를 담은 마음, 여기에서는 고기 잡으려는 마음.
驪江. 贈漁父
驪江之水淸且漣. 澄淨無波涵碧天. 遙遙遠浦暮靄橫. 漁歌聲入寒江煙. 寒江煙淡遠山紫. 日暮漣漣碧鱗起. 蒻笠蓑衣把釣竿. 貌古言哤儋兩耳. 朝代興亡兩不知. 一竿明月蒼波裏. 小渚茫茫蒲荇長. 楊柳磯中釣鱨鯉. 機心已息侶魚蝦. 瀲瀲灎灎江之水. 江水滔滔入海門. 俯仰堪輿如一指. 煙波釣徒可與言. 世上功名徒爾爾.
낚시를 드리운 이가 이미 고기 잡을 마음(機心)을 그쳤다 하니 그가 잡으려는 것은 달인지, 세상 공명도 버린 마음인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스물여섯 매월당의 봄은 가고 있었다.










 제795호
제795호 ![[무비] ‘왕과 사는 남자’ 300만 관객 눈앞](/data/cache/public/photos/20260208/art_206181_1771287891_170x110.jpg)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유승은, 두 번째 메달 노린다](/data/cache/public/photos/20260208/art_206180_1771287803_170x110.jpg)
![[날씨] 설날 아침 쌀쌀… 오후에는 기온 올라](/data/cache/public/photos/20260208/art_206179_1771287695_170x11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