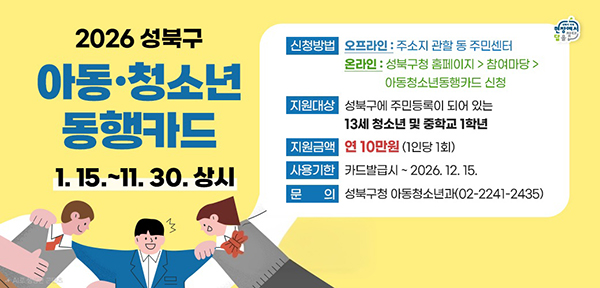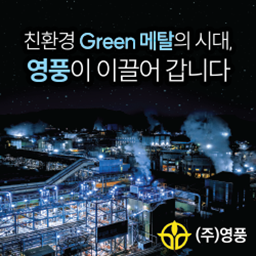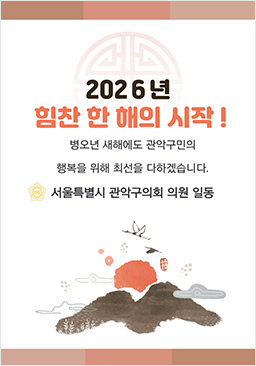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국내 주식 시장이 과감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며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그간 해외 주식에만 투자하던 ‘서학개미’ 투자자들이 급하게 국내 증시로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지난 6월 한달간 국내 주식 투자자의 평균 수익률이 미국 주식 투자자의 평균 수익률을 앞질렀다는 통계도 나왔다.
자신이 당선되는 것만으로도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돌파할 것이라던 이재명 대통령의 예언은 취임과 동시에 현실이 됐고, 이젠 그가 공약했던 5000선 돌파가 가능할지 여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다만 국내 증시가 정상화된다해서 ‘서학개미’의 시대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요즘처럼 기술과 자본이 국경을 넘나드는 시대에 글로벌 증시를 외면하는 투자자는 ‘우물안 개구리’에 다름아니기 때문이다.
글로벌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위험 분산이다. 한국 증시는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등 특정 산업에 집중돼 있어, 외풍에 극히 취약하다. 반면, 미국 S&P 500 지수처럼 다양한 산업군이 포함된 글로벌 시장에 투자하면 특정 섹터의 충격이 와도 전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성장성 측면에서도 글로벌 시장은 훨씬 매력적이다. 미국은 기술 혁신의 중심지다. 애플, 구글, 엔비디아 등은 전 세계 기술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기업들이다. BYD, 화웨이 등 쟁쟁한 기업들을 내세워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는 중국 역시 잠재력 높은 시장을 갖고 있다. 인도는 빠르게 성장하는 중산층과 디지털 인프라 덕에 장기 성장 잠재력이 크고,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은 젊은 인구 구조와 제조업 확대에 힘입어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높은 성장률을 가진 이 나라들의 잠재력을 외면해서는 높은 투자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등 여러 요인으로 글로벌 경제에 불확실성이 가득한 상황이지만, 올해도 각국의 증시는 견고한 상승세를 보였다. 주춤했던 S&P 500 지수도 5월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캐나다, 유럽, 홍콩, 중국 증시 모두 우상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가는 가운데 문화경제는 ‘글로벌 자산배분’ 특집을 준비했다. 1600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경기부양책을 추진 중인 독일과 AI,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 등 다양한 첨단 산업에서 미국과 경쟁하는 중국,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가운데 첨단 기술 제조업으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는 인도 등 특히 주목할만한 세 나라의 증시 상황과 핵심 기업들을 짚어봤다.
국내 증시가 그렇듯 해외 투자 역시 마냥 긍정적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각국의 정치·경제 리스크와 세금 체계, 환율 변화 등 신경써야 할 요소가 생각보다 많다. 하지만 그것을 ‘두려움’이 아닌 ‘공부할 이유’로 바꿀 수 있다면, 어느 순간 ‘글로벌 플레이어’가 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제799호
제79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