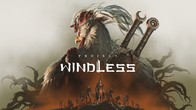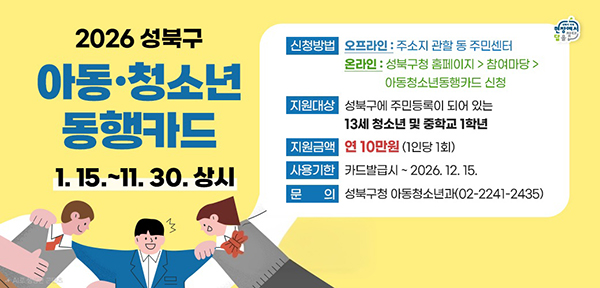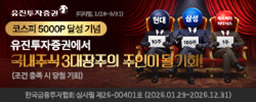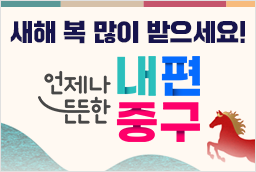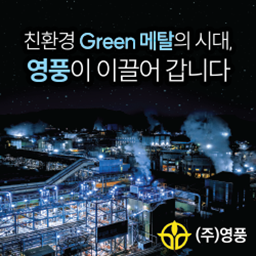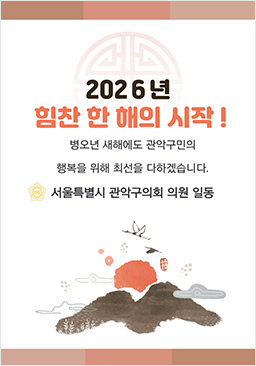[서울옥션 정태희 경매사의 작가 탐색] 끝나지 않은 이야기…다시, 이불
‘현대’와 ‘미래’ 동시에 응시하는 작가
 제807호 정태희 서울옥션 경매사 겸 경매사업팀장⁄ 2025.11.05 09:36:34
제807호 정태희 서울옥션 경매사 겸 경매사업팀장⁄ 2025.11.05 09:36:34

작품을 마주하다 보면, 작가가 전하는 이야기의 서막이 과거로부터 시작됐음을 은연중에 인식하게 될 때가 있다. 특히 한국 현대미술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지니는 단색화 주요 작가들의 대표작들은 근래에 제작된 작품이라도 1970~80년대 과거에 그려진 것에서 그 작업의 의미가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 국민화가로 대표되는 이중섭과 박수근의 작품은 그보다 더 이른 1950~60년대의 시대상을 품고 있다.
이런 작품들을 마주할 때, 감상자는 자연스레 작가의 철학과 당시의 시대적 맥락을 염두에 두며, 그 속에서 현재의 나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를 읽어내려 한다. 하지만 동시대미술, 혹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예술 담론을 마주하면 관객들은 여전히 낯설고 어렵게 느낀다.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미술의 영역 밖에서는 인공지능이 주도할 미래사회에 대한 이야기가 세상을 가득 메우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꾸준히 ‘현대’와 ‘미래’를 동시에 응시하며 시대를 예견하는 작가가 있다. 바로 이불이다.
최근 리움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이불의 대규모 개인전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관람객이 몰리고 있다. 이번 전시는 이불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유기적으로 잇는 구성으로 주목받고 있다. 초기의 조형적 실험이 돋보였던 ‘사이보그’와 ‘아나그램’ 시리즈부터, 작가의 세계관이 응축된 ‘몽그랑레시’까지, 이불의 시간은 하나의 흐름으로 관통된다.
몽그랑레시는 프랑스 철학자 장-프랑수아 리오타르가 제시한 ‘거대 서사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한다. 이불은 단일한 서사를 대신해 개인과 집단의 기억, 역사적 흔적, 사회와 문화의 다양한 요소를 뒤섞어 새로운 내러티브를 구성한다. 전시 동선 역시 이러한 작가의 사유를 시각적으로 구현한다. 신작과 구작이 방대한 공간 속에서 서로 독립된 듯 이어지며, 관람자는 전체가 하나로 연결된 거대한 흐름 속을 걸어가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된다.
이번 전시는 리움미술관과 홍콩 M+ 미술관이 공동으로 기획한 프로젝트로, 내년 3월 M+에서 국제 순회전 형태로 이후 유럽에서도 전시될 예정이다. 한국에서 시작된 이 전시가 세계로 확장되며, 이불의 예술세계를 보다 폭넓은 맥락에서 조명하게 될 것이다.
전시장에는 40~50대 미술 애호가뿐 아니라 10~20대 젊은 관객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젊은 세대는 이불이 말하는 ‘현대’와 ‘미래 사회’의 조형 언어를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며, 작품의 물리적 형상보다 그 이면의 상징을 스스로 해석하고 있었다. 이불의 작품은 그렇게 세대를 넘어, 각기 다른 감각으로 읽히고 있었다.
과거의 이불

이불이 국내외 미술계에 강렬하게 이름을 알린 시점은 1997년, 뉴욕현대미술관(MoMA)에서 열린 전시에 ‘장엄한 광채(Majestic Splendor)’를 선보이면서였다. 1987년 홍익대학교를 졸업한 이후, 성(性)과 젠더의 고정관념을 전복하는 작업을 지속해온 그는 이 전시를 통해 국제무대에 본격적으로 데뷔했다. 당시 출품작은 부패 중인 생선에 스팽글, 시퀸으로 장식한 뒤 투명 비닐봉지에 넣어 전시장 벽에 매단 설치 작품이었다. 미술관 안은 썩어가는 냄새로 가득 찼고, 결국 미술관 측은 작가의 동의 없이 작품을 철거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역설적으로 작가에게 더 큰 주목을 안겼다. 이 작품은 눈부시게 번쩍이는 사회의 이면에 숨겨진 부패와 위선을 폭로하는 동시에, 희생과 억압의 상징으로 여성을 ‘날생선’에 비유한 작품이었다. 강한 악취로 작품은 비록 철거됐지만, 이후 리옹 비엔날레에 출품되며 글로벌 작가로의 전환점을 맞았다.
MoMA 전시 이후, 이불은 인간의 신체와 기계문명, 그리고 사회적 권력 구조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기 시작했다. 그녀에게 ‘여성의 몸’은 생물학적 존재를 넘어 사회적·문화적·정치적 의미의 집합체였다. 작품 속 여성의 형상은 때로 과장되거나 기괴하게 변형돼, 고정된 미적 기준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전복시켰다. 대표작인 사이보그와 아나그램 시리즈는 이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이불의 사이보그는 서양 고전조각이 상징하는 ‘아름다운 비례’의 신체를 로봇 형태로 재구성했다. 하지만 그 몸은 종종 머리나 팔, 다리가 결여돼 있었다. 이는 ‘완전한 인간’에 대한 근대적 환상을 무너뜨리고, 불완전한 존재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제시했다. 이 작품들은 도나 해러웨이의 ‘사이보그 페미니즘’과 맞닿아 있으며, 인간과 기계의 경계를 흐리는 포스트 휴먼적 사유를 시각화한 작업으로 평가된다.
런던 헤이워드 갤러리 전시를 기획한 큐레이터 스테파니 로젠탈은 2018년 전시 서문에서 이렇게 적었다. “이불의 작업은 관객을 유토피아의 가능성을 탐사하는 여정으로 초대한다.” 그녀의 말처럼, 이불의 사이보그는 단순히 미래의 신체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근대가 약속했던 더 나은 세계는 왜 불완전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존재였다.
미래의 이불

이번 리움 전시는 이불의 초기작뿐 아니라, 2010년대 이후의 작업세계를 폭넓게 조망한다. ‘취약할 의향’과 ‘퍼듀’ 연작, 그리고 다수의 드로잉과 입체 조형물들은 이불의 사유가 인간과 세계, 그리고 기술의 관계를 어떻게 확장해왔는지를 보여준다.
2025년 현재, 이불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 그의 작품 속 이야기들은 더 이상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들은 여전히 현재를 관통하며, 미래의 우리에게도 이어지는 사유의 연장선이다. 최근 그가 선보이고 있는 평면 회화들은 작가의 사유가 담긴 새로운 시각적 언어로의 전환을 예고하며, 앞으로 그가 어떤 방식으로 미래를 그려낼지 기대하게 한다.
한편, 이불은 2000년대 이후 미술관뿐 아니라 미술시장에서도 활발히 소개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외 유수의 갤러리를 통해 다양한 작품들을 컬렉터들에게 선보인다. 과거 미술관 중심으로만 인식되던 작가의 작품은 이제 글로벌 아트페어인 프리즈 서울과 아트바젤 홍콩 등에서도 주요 섹션에 등장하며, 입체 조형뿐 아니라 회화 작품까지도 주목을 받는다.
리움 전시를 마주하고 나오며,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른다. ‘이불의 작품을 하나로 규정할 수 있을까?’ 아마 쉽게 답할 수 없을 것이다. 정의 내릴 수 없는 세계, 불안정하지만 역동적인 2025년의 사회처럼, 이불의 작품 또한 경계와 질서가 무너진 세계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상상하게 한다.
이불은 역사 속에서 누군가가 규정해온 ‘이상적 형상’을 해체하며, 우리 각자가 어떤 미래를 그릴 수 있을지를 묻는다. 결국, 완벽치 않은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이 만든 사회가 단일한 정의로 규정할 수 없음을 곱씹게 한다. 불안정함이 뒤섞여 있는 시대에서 이불의 작품을 통해 잠시나마 불확실한 미래사회의 방향을 그려본다.
- 관련태그
- 서울옥션 리움미술관 이불 전시 프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