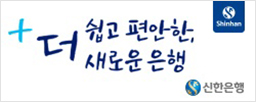김훈의 <남한산성>의 핵심적 화두는 ‘역사에서 치욕은 죽음보다는 낫다’는데 있다. 속된 말로 ‘쪽팔림은 순간이지만, 삶은 길다’는 말을 김훈은 치욕으로 치환하여 <남한산성>을 읊조린 것이다. 사실 <남한산성>을 읽으면서 역시 김훈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난 김훈의 삶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안다면, 언론매체를 통해서 획득된 단편적인 정보, 그리고 김훈이 한겨레에 잠시 몸담고 있을 때 옆에서 본 기자들로부터 들은 애기가 전부이다. 어차피 그와 같은 공간에서 부대끼면서 얻은 정보가 아니기에 무슨 소용이겠나. 그렇더라도 김훈과 <남한산성>은 내가 갖고 있는 제한적인 정보를 갖고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나. 김훈의 매력은 화자의 입장을 무서우리만치 견지하는데 있다고 본다. ■ 살아있는 치욕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김훈 혹한이 몰아닥친 46일간의 ‘남한산성 농성전’ 기간 동안 우리 역사상 치욕의 역사의 한 장면으로 몇 손가락 안에 꼽힐 것이다. 이를 으뜸으로 삼는 자도 있을 거고, 열 손가락 안에 꼽는 이도 있을 것이고, 보는 이마다 다르기에 순위는 그다지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치욕스런 역사였다는데 있다. 살아있는 치욕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김훈. 흔히들 김훈을 두고 리버럴한 보수주의자라고들 한다. 리버럴과 보수주의가 어떻게 융화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말이다. 어째든 김훈의 소설들에서 보면 리버럴과 보수주의가 느껴지니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싶다. 남한산성 안의 그들. 산성 밖과 산성 안이라는 공간적 차이야말로 그 시대적 상황을 읽는 키워드다. 산성 안의 그들에겐 산성 밖은 청나라군에 의해 민중들이 죽든지 말든지, 산성 안의 그들의 백성이 청군에 유린당하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여리디 여린 조선의 처녀들이 청으로 끌려가는 온갖 굴욕과 치욕을 당하든 말든 산성 안의 그들에겐 관심 밖의 일이다. 김훈은 바로 이것을 의도적으로 외면해 버린다. 왜냐면 김훈은 늘 거대한 권력이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순응하는 보수주의자이다. 그러면서 자신은 자신의 삶만큼은 속박당하지 않으려는 리버럴한 의식체계를 지키고자 하는 리벌러리스트다. 그렇기에 파편화된 개인에 대해선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만, 개개인이 연결된 공동체에 대해선 고개를 돌려 버린다. 그것은 개개인이 연결된 삶을 갖는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 앞에선 스스로 질식해버리기 때문이다. ■ 산성 안과 산성 밖, 그리고 ‘저들’의 ‘그들’ <남한산성>은 역시나 남한산성 밖과 안의 상황을 초래한 산성 안의 ‘그들’에게 인간적 동정심을 드러내는 게 핵심이다. 산성 밖은 뒈지든 말든. 산성 밖의 민중들이 치욕을 부끄러워 죽든 말든, 죽기 힘들어서 치욕을 알고 살던 말든, 중요한 것은 산성 안의 그들은 죽음보다 치욕을 택하는 것이 현실이고 불가피한 역사적 선택이라고 한다. 이 선택이야말로 죽음보다 더 어려운 결단으로 보는 작가의 입장에 일정 정도 동의한다. 어차피 산성 안의 그들은 백기투항을 하지 않으면 상당수가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상황이니, 한 순간의 쪽팔림일지언정 살아야 하는 절박함 앞에선 당연한 선택이다. 김훈이 굳이 주전파의 김상헌, 주화파의 최명길을 내세우지 않더라도 죽음보다 치욕을 선택하는 것에 고개를 끄덕여지게끔 되어 있다. 산성 안의 그들은 현실을 너무도 몰라도 모르는 이들만의 공간이다. 혹한이 몰아치는 그 겨울날 산성 안에 농성전 아닌 농성전을 벌이게 된 것은 바로 그 당시 조선시대의 지배세력들의 세상물정을 전혀 모르는 지배계급과 선비들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의도적으로 눈감아 버린 게 바로 김훈의 <남한산성>이다. 산성 안에 있는 ‘그들.’ 밖의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있어도 그들과 같을 수 없다. 이는 현재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그들’을 존재케 하는 민중을 ‘저들’로 통칭한다. 그 좋아하는 ‘우리’라는 말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오직 ‘저들’이거나 ‘나의 저들’일 뿐이다. 이게 과거와 현재에도 변하지 않는 치욕이다. 주전파 김상헌을 통해서 그토록 죽고자 한 자도 결국 살고자 했던 것이라면서 ‘죽음’보다 ‘치욕스런’ 삶을 더 힘겹고 어려운 것이라고 말하고자 하는 김훈의 눈물겨운 인간애. 주전이냐 주화냐가 핵심일까. 대의와 명분을 위해서 죽음을 택할 수도 있고 치욕을 택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인조와 그의 신하들이 치욕을 택한 것은 현실적인 판단이다. 하지만, 그들은 사실상 죽었다. 광해군을 몰아낸 인조반정의 정당성과 명분과 대의를 스스로 죽였음을 김훈은 간과하고 있다. 조선조 중종 이래 권력투쟁이 광해군에 이르러 위기에 몰린 서인들이 반정을 도모하여 인조를 옹립한 인조반정. 난 김훈이 치욕보다 더 어려운 것이 없다고 억지를 부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다. 남한산성에서 치욕을 어루만져 주지 않으면, 인조반정이 설 땅을 잃기 때문이다. ■ 김훈이 잃어버린 것들 삼배 구고두례. 인조가 삼전도에서 청 태종에게 한 항복례이다. 한번 절할 때마다 세 번 머리팍을 땅바닥에 쳐 박아야 했고 쳐 박을 때마다 소리가 크게 나야했다. 청 태종은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다시 할 것을 요구해, 인조의 이마팍은 피투성이가 됐다고들 한다. 하지만 김훈은 <남한산성>에 그 같은 장면을 그리지 않았다. 삼배만 있고 구고두례는 없다. 아주 간단하게 삼배를 마치고 항복례가 끝난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여기에서 김훈이 그토록 치욕이 죽음보다 더 귀하고 어려운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죽음보다 더 어려운 치욕이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치욕이 있게 한 그 모든 것을 죽여야 하는 것이다. 결국 역사에서 치욕은 지울 수도 없고 정당하지 않을 뿐더러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임을 김훈은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왜, 죽음보다 더 어려운 치욕을 선택했지만, 그 치욕으로 인해 치욕을 불러들인 ‘그들’과 ‘그들의 것’에 대해선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이다. 죽음보다 견디기 힘든 치욕이 생각보다 짧을 줄 알았던 ‘그들.’ 하지만 진정 견디기 힘든 것은 치욕이 아니라 ‘죽음’이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조선 인조 때 ‘그들’에게 요구하는 게 무리일까. 그 당시 인조를 비롯한 신하들 즉 ‘그들’이 청과의 정면대결에서 상당수가 죽었다고 해서 조선이 죽었을까. ‘그들’이 죽음 대신 치욕을 선택함으로써 ‘그들’은 죽음보다 견디기 힘들지만 살았다. 하지만 그들의 ‘저들’은 살아 있으되 치욕보다 더 견디기 힘든 죽음과 같은 삶을 살아야 했다. 인조의 삼배 구고두례로 항복함으로써 전쟁은 일단락되었지만, 그들의 ‘저들’에겐 전쟁의 시작일 뿐이었다. 청군에 끌려가는 조선 처녀들. 청으로 끌려가는 조선 처녀들이 가족들에게 손을 흔드는 대목에 대체 김훈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그들의 치욕으로 인해 그들이 감당해야 할 것을 고스란히 ‘저들’에게 떠넘긴 것을 눈감아 버리고 그들에게 한없는 인간적 애정과 동정심을 표하는 김훈. 죽음보다 견디기 힘든 치욕을 택한 그들은 순간의 쪽팔림으로 대대손손 영화를 누렸지만, 그들이 책임져야 하고 감당해야 할 그 죽음은 그들이 말하는 ‘저들’, 바로 ‘민중’의 몫이 된 것은 지극히 당연하게 여기는 김훈에게서 전형적인 지식인의 냉소주의를 볼 수 있다. 김훈은 애초 ‘남한산성 밖’에 대해선 관심이 없다. 또한 ‘남한산성 안’의 그들의 ‘저들’도 마찬가지다. 시대를 살아갔고 살아가는 인간들 개개인의 삶엔 늘 ‘치욕’ 또는 ‘굴욕’과 맞부딪히게 마련이다. 그리고 쉽지 않지만, 치욕과 굴욕을 받아들이는 것을 순간의 쪽팔림으로 여길 수 있다. 하지만, 역사에서 치욕은 죽음일 수밖에 없다. 역사의 치욕이 순환되는 것은 바로 ‘그들’만이 있고 그들이 말하는 ‘저들(민중)’을 배제하기 때문이다. -천성민 문화칼럼니스트










 제21호
제2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