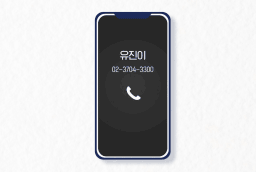같은 점을 사랑하고, 크게 다른 점은 존경하며, 조금 다른 점은 이해하고 용서하고 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부부의 길이다. 정해광 아프리카미술관 관장·갤러리통큰 대표 아프리카로 향하는 알 수 없는 힘의 정체 누군가를 만나서 아프리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받는 질문이 있다. 그곳에 왜 자주 가고 어떤 매력이 있느냐고…. 1989년 이래 지금까지 틈만 나면 아프리카를 찾았다. 횟수로는 30여 회가 족히 넘을 것 같은데, 나는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안 했던 것 같다. 치사율이 50%가 되는 중증 말라리아에 걸려 사경을 헤매면서도, 정원의 두 배가 넘는 차를 20시간씩 타고 가면서도, 그리고 화물처럼 차 지붕에 얹혀 가면서도 아프리카로 향하는 마음의 정체를 잘 알지 못했다. 그러나 힘든 여행의 틈새에서 빠져나오는 묘한 빛을 발견했을 때, 무엇인가 알 수 없는 힘을 느끼면서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님을 알았다. 긴 시간 동안 줄을 섰음에도 운전석 옆의 좋은 좌석을 쉽게 양보하는 아저씨들, 비좁은 자리가 상대에게 불편을 줄까봐 엉덩이를 의자의 끝자락에 걸치고 가는 아줌마들, 맑고 커다란 눈망울로 상대방을 스스럼없이 담아내는 아이들, 그리고 물리적인 거리와 상관없어 보이는 시간, 사람 수에 그다지 구애받지 않는 공간, 그런 아프리카에서 사람의 마음을 보았고 세상의 가슴을 보았다. 상대에 대한 배려에서 인간의 의미 발견하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그들의 현실이 녹녹치 않음을 잘 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전체 드라마는 상대에 대한 배려에서 갱신되고 활력을 찾는다. 특히 실존의 초점이 되는 혼인식은 더욱더 그러하다. 부르키나파소 로비(Lobi)족의 혼례에 쓰이는 의자를 보면 어느 정도 그 내용을 짐작해볼 수도 있다. 길이 40cm에 폭이 15cm인 아주 작고 낮은 의자에 앉아 신랑·신부는 긴 시간 동안 의식을 진행한다. 그러나 그곳에는 두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조상신들 역시 살아 있는 사자(死者)로서 그곳에 있고, 또 앞으로 태어날 아기 역시 그곳에 있다. 의자의 한편에 조각되어 있는 두 남녀가 바로 신랑·신부를 지키는 부모 혹은 조상신일 수 있고, 앞으로 태어날 새로운 생명 혹은 희망일 수 있다. 오지 못한 그리운 친척의 모습일 수도 있다. 이렇듯 공동체라는 삶의 드라마는 그다지 크지 않은 의자에서 모두 함께 하나가 된다. 그러니 차 안의 공간이 아무리 비좁다 한들, 또한 목적지까지의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한들 그게 무슨 문제가 될 수 있으랴! 옆에 앉아 있는 아저씨나 아주머니 그리고 아이는 서로 멀지 않은 사이라는 것을 이미 부부됨의 의식(儀式)에서 무의식적으로 학습하였으니,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인간의 도리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여자 배려하는 차원의 ‘일부다처제’ 현재라는 뜻을 지닌 사사(sasa)는 남자보다도 여자에게 더욱더 힘든 시간이다. 특히 수렵이나 목축 내지는 어업을 위주로 하는 사회일수록 더욱 그렇다. 사냥하거나 가축을 돌보러, 혹은 물고기를 잡으러 멀리 집을 떠나는 일이 아프리카에는 비일비재하기에 남편을 기다리는 여자의 삶이란 그리 유쾌하지가 않다. 그런 점에서 일부다처제는 남자가 아닌 남아 있는 여자에게 큰 위안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남겨진 부인들은 한 남자의 아내이자 서로의 친구로, 또 남겨진 아이들은 한 아버지의 자식이자 서로의 친구로 기다림과 그리움 혹은 외로움을 함께 하는 공동의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병에 걸리거나 죽더라도 남겨진 사람은 결코 혼자가 되지 않는다. 가족의 일원으로서 계속 남게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일부다처제는 종족 번식이라는 측면 이외에 열악한 환경 속에 놓인 여자와 아이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형제의 아내를 맞아들이는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죽은 형제를 대신해서 남은 사람들을 보살피는 취지의 복혼제(polygamy)는 인간의 삶이 지닌 육체적 차원과 정신적 차원 모두를 포괄하는 기본적인 예의로서, 불안전한 세계를 살아가는 아프리카 사람들, 특히 여자에게 보다 깊은 안전감을 주는 보험제도와도 같은 것이다.

Forgive & Forget 혹은 Win-win 한국의 1980년대 시내버스와 비슷한 가나의 고속버스를 타고 수도 아크라에 들어갔을 때, 길거리 가판대에 씌어 있는 문구가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Forgive & Forget”. 과연 아프리카에서는 무엇을 용서하고 무엇을 망각하라는 것일까? 가나에 세 번째 갔을 때, 아프리카적인 관점에서 그 말을 생각하게 되었다. 생명의 흐름을 차단하는 불임이 부부의 죄악임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죄악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내를 용서하지 않거나 그러한 잘못을 망각하지 않는 것이었다. ‘Forgive!’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쉬움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그 사랑을 지키고자 다시 혼인하는 남자의 마음과 처지를 용서하라는 말로 들렸다. ‘Forget!’ 다시 혼인하는 것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내의 아픔을 보듬거나 혹은 임신한 아내를 잘 보살피기 위한 배려이지 욕구를 발산시키려는 방편이 아니라는 사실, 즉 욕구를 망각하라는 것이었다. 생명의 확대라는 ‘Zero-sum’의 전통 속에서 사랑을 지켜가는 방법으로서의 “Forgive & Forget”이라는 말이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Win-win’의 관계로 해석되는 곳, 그곳이 바로 아프리카였다.














 제180호
제180호 

![[특징주]의료 AI '제이엘케이', 美 경쟁사 대비 정밀도 우위...18%대 강세](/data/cache/public/photos/20240520/art_160626_1715913033_170x110.jpg)

![[속보] HLB 간암신약, 美 FDA 승인 불발…진양곤 회장](/data/cache/public/photos/20240520/art_160616_1715907362_170x110.jpg)

![[특징주] HLB 신약 美 FDA 승인 발표 임박...HLB그룹주 '동반 상승'](/data/cache/public/photos/20240520/art_160587_1715824472_170x11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