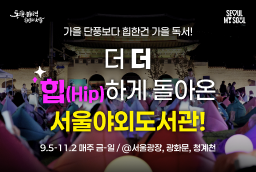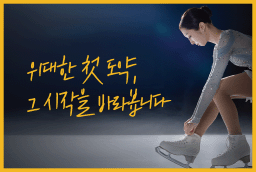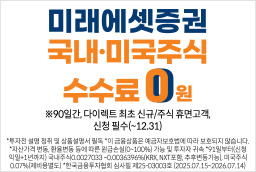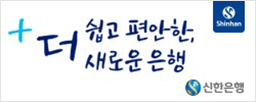[이문정의 요즘 미술 읽기 - 혐오스러운 재료] 고개돌렸지만 또 되돌아보게 만드는 혐오와 매력의 이중주
 제521호 이문정(미술평론가, 컨템포러리 미술연구소 리포에틱 소장)⁄ 2017.02.06 09:51:24
제521호 이문정(미술평론가, 컨템포러리 미술연구소 리포에틱 소장)⁄ 2017.02.06 09:51:24
 (CNB저널 = 이문정(미술평론가, 컨템포러리 미술연구소 리포에틱 소장)) 지난 칼럼에서 버려진 쓰레기, 눈에 보이지 않거나 없어지는 것들처럼 요즘 미술에서 새롭게 부상한 재료(매체)들을 살펴보았다. 아직 익숙한 것이 아니기에 이러한 재료들로 만들어진 작품들 앞에 선 관객들은 당황하거나 황당해하지만, 대부분은 웃으며 즐겁게 감상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미술 중에는 우리를 절대 웃을 수 없게 하는 재료, 특히 공포와 충격,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들로 만들어진 작품들도 있다. 과연 미술에서 사용될 수 있는 재료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무언이든 재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시대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무엇이든’이라는 단어로도 수용하기 힘든 것들이 있다. 동물과 곤충의 시체, 대소변과 같은 배설물, 피, 머리카락과 손톱, 곰팡이. 글자로만 보아도 미간이 찌푸려진다.
(CNB저널 = 이문정(미술평론가, 컨템포러리 미술연구소 리포에틱 소장)) 지난 칼럼에서 버려진 쓰레기, 눈에 보이지 않거나 없어지는 것들처럼 요즘 미술에서 새롭게 부상한 재료(매체)들을 살펴보았다. 아직 익숙한 것이 아니기에 이러한 재료들로 만들어진 작품들 앞에 선 관객들은 당황하거나 황당해하지만, 대부분은 웃으며 즐겁게 감상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미술 중에는 우리를 절대 웃을 수 없게 하는 재료, 특히 공포와 충격,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들로 만들어진 작품들도 있다. 과연 미술에서 사용될 수 있는 재료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무언이든 재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시대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무엇이든’이라는 단어로도 수용하기 힘든 것들이 있다. 동물과 곤충의 시체, 대소변과 같은 배설물, 피, 머리카락과 손톱, 곰팡이. 글자로만 보아도 미간이 찌푸려진다. 예술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이 모두는 이미 오래전 미술 안으로 들어왔다. 그 중 가장 유명한 데미안 허스트(Damien Hirst)의 ‘천년(A Thousand Years)’(1990)은 두 공간으로 나뉜 유리장의 한 쪽 바닥에 잘려 피가 흐르는 소머리를 놓고, 반대편에는 구더기를 넣은 하얀 상자를 놓아둔 설치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구더기는 성충이 되어 생을 유지하다가 수명이 다하여, 혹은 유리장의 천장에 매달린 전기 살충기에 타서 죽는다. 일반적으로 ‘천년’은 탄생, 성장, 소멸이라는 자연의 순리를 압축해서 보여준 것이라 해석된다. 그러나, 그 의미가 아무리 심오하다 해도 유튜브(Youtube)에 올라와 있는 이 작품의 설치 영상,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작품 이미지는 -진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언제 봐도 끔찍하다. ‘천년’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 윤리적 비난에 휩싸였던 것도 당연해 보인다. 자신을 향한 비난에 대해 허스트는 일상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상하면서 왜 이 작품을 잔인하다고 말하는 것인지 생각해보라고 반문했다.
썩는 시체와 구더기에 이어 작가의 변까지…
‘천년’ 외의 많은 작품들에서 허스트는 다양한 동물들의 시체를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에 담아 전시했다. ‘버터플라이 컬러 페인팅(Butterfly Colour Paintings)’ 시리즈에서는 캔버스 위에 나비를 붙여놓았다. 전시장에 번데기를 가져다 놓아 관객들은 애벌레가 우화(羽化)의 과정을 거쳐 나비가 되고 죽어가는 과정을 볼 수 있었다. 곤충은 다른 생명체보다 수명이 짧아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을 보여주기에 적절하다는 것이 파리나 나비와 같은 곤충을 재료를 선택한 주된 이유라 한다.

▲윤진영 ‘Fungal Animalia 024’, 작가가 배양한 곰팡이, Digital C Print, 2016. 사진제공= 윤진영 작가
배설물과 관련하여 가장 유명한 요즘의 미술가로는 크리스 오필리(Chris Ofili)를 들 수 있다. ‘성모 마리아(The Holy Virgin Mary)’(1996), ‘여인이여 울지 말아요(No Woman, No Cry)’(1998) 등의 작품에서 오필리는 코끼리 똥을 사용했다. 코끼리 똥은 동그랗게 빚어져 바니쉬(varnish)와 같은 재료로 코팅된 후 캔버스 위에 붙여지거나 캔버스를 받치고 있는 것처럼 바닥에 놓이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오필리는 배설물조차도 문화와 세계관, 지역과 시대에 따라 그 가치와 의미가 바뀐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우리 사회에 만연한 흑백논리와 편견, 불합리한 위계질서 등을 생각하게 한다. 사실 배설물은 그렇게 대단히 더럽거나 끔찍한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는 몸에서 배설물을 내보낸다. 배설 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은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특정한 지역에서는 배설물이 연료나 약재로 사용되기도 한다.
질병과 죽음 떠올리면서도 아름다움에 빠지게 되는 윤진영의 작품들
안드레 세라노(Andres Serrano)는 배설물, 혈액 등을 사진으로 담아냈다. 심지어 세라노는 ‘시체 안치소(The Morgue)’(1993) 연작에서 시체 안치소에 냉동 보관되어 있던 인간의 시체를 촬영했다. 이것이 벌써 20여 년 전의 일이니 당시 사람들이 받았던 충격의 정도를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세라노는 자신의 사진을 보는 관객들이 분노하고 혼란에 빠지게 된 이유로 자신이 그들을 너무 빨리 시체 안치소로 데려갔기 때문이라 주장했다. 실제로 세라노는 인간의 존엄을 해치거나 논란을 유도하기 위해 시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었다. <시체 안치소> 연작은 매우 고요하고 숙연하다. 세라노는 죽음을 가식 없이 대면시킴으로써 삶과 죽음,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불러오고자 했던 것이다.

▲윤진영 ‘The Boundary 033’, 작가가 배양한 곰팡이, Digital C Print, 2016. 사진제공 = 윤진영 작가
오늘 칼럼에서 다루었던 작품들처럼 불편한 재료를 사용한 작품들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판단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미술 감상에서 취향도 중요한 부분이다. 일부 작업에서 불거진 윤리적 논란, 폭력성에 대한 비판도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작품을 마주한 관객들은 ‘아름답다는 것의 기준은 무엇인가? 왜 미술은 추하고 혐오스러운 것을 보여주어서는 안 되는가? 미와 추를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이고 누가 정했는가?’와 같은 질문의 답변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다. 고정된 가치 체계와 규칙에 대해 자연스럽게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다.
(정리 = 최영태 기자)
- 관련태그
- CNB 씨앤비 시앤비 CNB뉴스 씨앤비뉴스










![[속보] 김동명 LG엔솔 대표 “석방 근로자들 안정적인 복귀 끝까지 지원할 것”](/data/cache/public/photos/20250937/art_189764_1757664398_170x11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