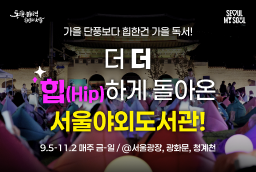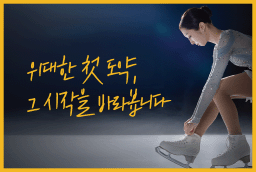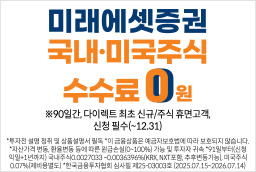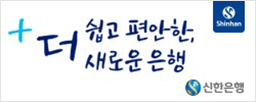(CNB저널 = 김금영 기자) 일민미술관에 세 작가가 모였다. 10년 이상 탄탄한 커리어를 쌓아 온 30~40대 작가들을 조명하는 ‘이마 픽스’전에 김아영, 이문주, 정윤석 작가가 참여해 4월 29일까지 작품을 선보인다. 저마다의 개성과 가치관이 들어간 작업들을 펼쳐온 작가들을 한데 모은 주제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다소 포괄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이 주제 아래 세 작가는 각자 ‘이주’, ‘도시계획’, ‘인간과 꼭 닮은 마네킹’에 주목해 이야기를 풀어냈다.

폐허가 된 현장 앞에서 화려한 유람선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 이게 같은 시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인가 싶을 정도로 이질적인 모습에 눈길이 간다. 이 풍경은 작가가 실제 존재하는 풍경들을 합쳐서 재구성한 것이다. 화려함과 초라함이 공존하는 화면에서 작가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
작가는 도시개발 정책이 이뤄지는 현장들에 주목해 왔다. 1990년대 중반부터 서울, 보스턴, 디트로이트, 베를린 등 다양한 도시가 변해가는 과정을 직접 지켜봤는데 공통점을 발견했다. 세계 곳곳에서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 논리 아래 어제 있던 건물이 다음날 아침엔 순식간에 철거돼 없어지는 등 빠른 부흥과 퇴락이 반복되는 모습을 본 것.

발전을 위해 본래 있던 것을 없애는 것이 과연 좋은 결과만을 가져올까? 한국에서는 홍대 젠트리피케이션이 대표적 사례다. 예술가들이 작업을 위해 임대료가 저렴한 홍대 지역에 밀집했다가 오히려 임대료가 상승해 쫓겨나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 홍대 지역에 세월을 머금은 건물들이 점차 사라지고 새 건물들이 들어섰다.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다. 하지만 이건 홍대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작가는 이미 2000년 락스베리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을 지켜봤다.
작가는 “2000년 보스턴에 유학 갔을 때 처음엔 대학도시, 아름다운 항구도시 이미지를 떠올렸다. 그런데 실제 내가 거주했던 락스베리는 여러 복합적인 도시문제를 담은 동네였다. 저소득층 흑인 인구가 많이 살았고, 황량한 거리 풍경을 봤다.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까지, 겉보기와는 다르게 속에 많은 문제들을 품고 있었다”고 말했다.

유학 당시 락스베리가 겪은 젠트리피케이션을 작가는 10년 후 서울에서 또 마주했다. 이때 작가는 도시재개발 문제가 특정 시간과 공간에서 하나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전 세계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았다. 작가는 “도시의 쇠락과 재건이 빠른 시간 안에 지금도 되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작가는 이런 문제를 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림을 그렸을까? 작가는 사회 문제에 ‘거리를 둔 관찰자’로 자신을 이야기했다. 작가는 “특정 장소를 그릴 때 조사를 거친다. 도시 구석구석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 한정된 시공간에 그친 기록이 아닌, 과거 어느 시점에도 있었을 수 있는 현상을 보여주는 데 집중한다”며 “사회 고발을 폭로하는 작업도 의미 있고, 보는 것도 좋아하지만 한 개인의 눈으로 바라본 도시, 그 도시 안에 담긴 문제들을 보여주는 것, 그 과정을 통해 전 세계의 도시계획이 지닌 메커니즘을 읽어내는 것 또한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모래산 건설’전에서 작가는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여러 도시를 이동하며 관찰해 온 경로를 30여 점의 대형 회화와 드로잉, 아카이브 자료를 통해 선보인다. 특히 주목되는 작업은 낙동강 주변과 베를린의 크루즈 관광을 콜라주한 ‘유람선’이다. 4대강 사업 명목으로 만들어진 엄청난 규모의 모래산. 당시 정부는 개발 이후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실제의 현실도 그렇게 찬란했을까? 폐허가 된 모래산을 배경으로 신나게 관광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은 화려함 뒤 숨겨져 있는 차가운 현실을 들춰내는 느낌이다.
작가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여에 걸쳐 현장 연구를 진행하고, 그 관찰 기록을 실크스크린과 특유의 콜라주 기법으로 재구성한다. 그래서인지 철저한 연구를 바탕으로 그려진 화면이 마냥 허구같이 느껴지지는 않는다. 간담이 서늘해지는 현실의 이면에 더 관심을 갖게 만든다고나 할까.

특히 근작에서는 풍경에서 발견되는 사람의 모습이 눈길을 끈다. 대부분의 그림에서 작가는 의도적으로 사람을 배제시켰다. 쓰레기 더미나 부서진 건물의 잔해 등 사람이 만든 풍경에 집중했다. 그런데 이번 전시에서 근작 ‘오랜 커플’엔 손을 잡고 걸어가는 노부부의 모습이 보인다. 작가는 “처음엔 도시에 남겨진 인간의 흔적에 관심이 많았다. 멋대로 파괴하고 다시 짓는 행위의 흔적들이 흥미로웠다. 거리를 두고 장소를 관찰하는 데 집중했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풍경을 바라보다보니 그 안에서 작은 몸짓으로 풍경과 교류하는 인간의 미세한 움직임에 눈길이 갔다”고 말했다.
‘오랜 커플’은 2008년 베를린 장벽을 방문했던 작가가 2010년 다시 그 장소로 찾아갔을 때 마주한 사람들을 담은 작품이다. 도시 재개발 계획으로 2008년엔 있었던 벽화가 2010년엔 다 지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앞을 걸어가는 노부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고. 작가는 “벽화가 사라진 흰 벽을 배경으로 노부부가 지나가는데 중요한 순간이라고 느꼈다. 저들이야말로 도시의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경험한 사람들이 아닌가. 그동안 건축적인 부분으로 도시의 이야기에 접근해왔는데, 이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 있었고 또 현재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도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두 소년’ 작업에서도 건물이 부서지고 파헤쳐진 장소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소년들의 모습이 눈길을 끈다. 인간과 생태적 관점에서 도시를 바라보는 작가의 확대된 시선을 이번 전시에서 느낄 수 있다.

- 관련태그
- CNB 씨앤비 시앤비 CNB뉴스 씨앤비뉴스










 제580호
제58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