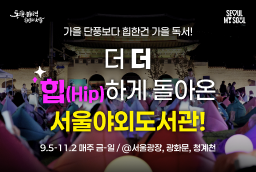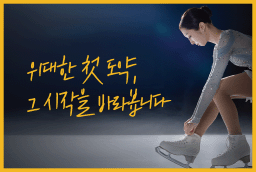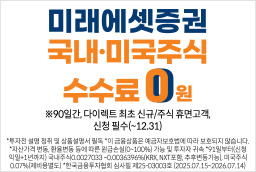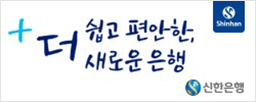(CNB저널 = 김금영 기자) 발라당 드러누웠다. 내 방도 아닌 전시장에서. 나름대로의 타당한 이유가 있다. 작품을 더 잘 보기 위해서.
제주 출신 설치 작가 부지현의 개인전 ‘궁극공간’이 열리는 아라리오뮤지엄 인 스페이스를 방문했다. 전시장을 방문하면 작가의 작업 감상뿐 아니라 흥미로운 경험도 할 수 있다. 밝은 대낮에 바깥을 돌아다니다가 칠흑 같은 어둠으로 인도하는 전시장 입구는 마치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듯 오묘한 느낌을 준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아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손으로 더듬어가면서 조심스레 걸어야 한다.
어색하고 낯설어 두려움까지 살짝 느껴졌던 감정은 이내 평온함으로 바뀐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불편함은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해방감을 주고, 평소엔 잘 느끼지 못했던 발자국 소리마저 들릴 만큼 촉각을 곤두세우게 하는 조용한 전시장은 시끄러운 소음에서 나를 보호해주는 느낌이다. 그리고 이 전시장이 바로 작가가 찾은 궁극공간이다.

궁극공간은 건축가 김수근(1931~1986)이 추구한 건축 개념이다. 김수근은 1976년 범태평양건축상 수상기념 강연에서 궁극공간을 언급했다. 그는 우리 자신을 물리적으로 보호하는 생존을 위한 주거 공간을 제 1공간, 그리고 창고, 공장, 사무실 등 생산 활동 또는 경제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 2공간으로 정의했다.
그리고 제 3공간이 있다. 바로 인간성을 유지하고 표현하기 위한 공간, 사색을 위한 공간, 평정의 공간이다. 김수근은 “상실된 인간성을 회복시켜 인간을 환경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것이 건축가가 사회에 할 수 있는 선”이라며 “궁극공간을 구현해 건축을 보다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며 인간환경 개선을 위한 궁극공간 창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궁극공간의 예로 한국 전통 주택의 문방을 들기도 했다. 김수근은 “문방은 서양의 서재와는 차이가 있다. 사색과 평정, 창조적인 일, 그리고 자연 속에 몰입돼 조화를 이루는 문방에는 새소리, 바람소리가 창호지를 통해 자연스럽게 들어왔고, 차 끓이는 소리, 풍경 울리는 소리 또한 즐길 수 있었다”며 “이는 인간과 자연이 친교를 가지는 것으로, 놀이(play)와 작업(work)이 동시 발생하며 조화 속에 공존하는 궁극공간”이라고 궁극공간의 특징을 짚었다.
또한 “이제 인간은 기계적, 반복적 일이 아니라 창조적인 일을 하는 것을 요구받는다. 이런 창조적 생활 내용은 필연적으로 건축공간에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수근은 전시가 열리는 아라리오뮤지엄(구 공간사옥) 지하 1층에 궁극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위한 소극장 공간사랑을 만들기도 했다. 현재 부지현 작가의 전시가 열리는 공간이다.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 만들어진 편리한 공간들이 세상에 즐비하지만 사람들은 피곤함 또한 느낀다.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타인과 접촉해야 하고. 또한 길거리에 가득한 CCTV는 사람들을 감시하는 느낌이라 오롯이 혼자 보낼 수 있는 공간을 찾기 힘들다. 이 가운데 작가는 스스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운 궁극공간을 만들었다.
주변에 분산됐던 내 자아,
부지현의 궁극공간에서 나의 감각에 집중하다

전시장에 들어서는 순간 몰아쳐 오는 어두움에 바로 옆에 있던 사람의 얼굴이 사라지는 느낌이다. 갑자기 혼자 전시장 공간에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은 느낌에 처음엔 불안함이 밀려오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익숙해지면서 안정감이 느껴진다. 타인의 시선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은 그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기도 하기에. 늘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던 사람들은 이 전시장에서 자신의 숨소리와 발걸음, 즉 자신에게 오롯이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공간은 붉은 빛과 연기, 폐 집어등 등으로 구성됐다. 약 20분 동안의 시간 동안 폐 집어등이 서서히 오르락내리락 움직이고 연기가 이따금씩 뿜어져 나오며 붉은 빛과 어우러진다. 특히 연기와 붉은 빛의 만남은 신비롭다. 처음 전시장에 들어서면 붉은 빛이 뿜어져 나오는 공간이 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든다. 빛이 만들어내는 여러 개의 층에 몽글몽글 피어오르는 연기가 끼어들면서 빛이 마치 수면 위 물결처럼 잔잔하게 흔들리기 때문.
폐 집어등은 관람자들에게 물속을 유영하는 듯한 감각을 경험하도록 돕는다. 제주 출신인 작가는 수명이 다해 버려진 폐 집어등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이 매체에 관심을 갖고 폐 집어등을 화려한 샹들리에 설치물로 탈바꿈시키는 등 다양한 시도를 이어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폐 집어등이 오르락내리락할 때 수면에 잠기는 것 같이 붉은 빛 아래로 사라지면서 정적인 공간에 생동감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본래 집어등은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 사용하는 램프다. 어두운 바다 속을 유영하는 고등어, 갈치, 오징어 등 각종 어류들이 집어등의 불빛에 몰려드는데, 이번 전시에서는 관람자들이 집어등의 불빛을 보고 모여드는 진풍경을 이룬다. 계단을 이용해 폐 집어등이 설치된 공간에 내려갈 수 있는데, 누워서도 전시를 볼 수 있도록 쿠션이 마련됐다. 계단 위 공간에 서서 불빛을 봤을 때 수면 위를 바라보는 느낌이었다면, 아래로 내려가 누워서 빛을 올려다보면 꼭 물속에 직접 들어와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작가는 “어디서 전시를 보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전시장에 몇 명 들어와 있느냐에 따라 빛이 굴절되는 방향이 바뀌면서 공간은 계속 변한다”며 “정해진 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변하는 공간을 감상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라리오뮤지엄은 건물의 1층, 2층, 3층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자신이 현재 몇 층에 있는지 바로 알아차리기 힘든 구조를 하고 있다. 이 공간에 만들어진 작가의 궁극공간 또한 현실에 분명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현실이 아닌 꿈속에 있는 것 같은 몽환적인 감각을 더해준다. 그래서 잠시나마 현실에서 흐르는 시간을 잊게 된다.
작가는 “전시를 보는 이 공간에서나마 개인의 내면에 평화롭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작가의 말처럼 이 공간에서는 머리를 애써 굴리거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 없다. 그저 고요한 침묵, 그리고 빛과 연기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파장 속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면 된다. 전시는 아라리오뮤지엄 인 스페이스에서 5월 13일까지.
- 관련태그
- CNB 씨앤비 시앤비 CNB뉴스 씨앤비뉴스










 제582호
제58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