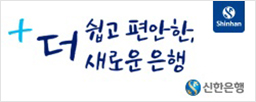(CNB저널 = 김금영 기자) 설명을 듣기 전까진 몰랐다. 만화 ‘세일러문’에서 나오는 캐릭터들의 화려한 변신 장면을 캡처해 변주시킨 화면이라니. 그보다는 오히려 추상 회화를 보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더 흥미로웠다.
윤향로 작가의 개인전 ‘서플랫픽터(Surflatpictor)’가 P21에서 6월 10일까지 열린다. 작가는 만화나 애니메이션 등에서 발췌한 이미지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해 변형 후 인쇄하거나 캔버스 위에 회화로 그리는 작업을 선보여 왔다. 그래서 ‘만화 좀 본다’ 하는 사람들은 그의 화면을 보고 친근함을 느낄 수도 있다. 2015년 작가가 선보인 ‘콤파스 – 엑스포 – 휴먼 어치브먼트(COMPASS – EXPO – HUMAN ACHIEVEMENT)’를 보곤 대번에 만화 ‘심슨’의 장면이라는 걸 알아챘다. 이번 전시에서는 마블 시리즈 중 유명 장면을 재구성한 작품이 눈길을 끌었다.

그런데 전시장을 가득 채운 대형 작품은 도통 어디서 왔는지 알아차리기 힘들었다. 그리고 이 작품이 바로 90년대 인기 애니메이션 ‘세일러문’에서 따온 이미지였다. 왜 굳이 만화 이미지를 사용했을까? 이건 본인을 ‘만화 애호가’라고 칭하는 작가가 만화를 좋아한 영향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대중문화를 대표하는 이미지를 사용해 새로운 화면을 만들어보고 싶었던 의도가 크다.
86년생인 작가는 자신의 어린 시절, 즉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까지의 한국 대중문화 이미지를 정리해보고 싶었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이 직접 보고 겪은 문화이기에 더 익숙하고 흥미로웠을 터. 그리고 그 이미지 중에는 애니메이션도 포함돼 있었다. 작가가 어린 시절 대중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애니메이션들이 있었고, 작가는 이 중 변주시켜보고 싶은 이미지를 택했다.

수많은 이미지들 중 미소녀 변신물인 ‘세일러문’을 선택한 건 에너지가 넘쳐흐르는 장면이 유독 눈에 들어왔기 때문. 특히 작가는 등장 캐릭터보다 그 뒤 배경을 흥미롭게 보는 편이다. 변신 장면 중 우주의 신비로운 에너지가 발산되는 배경을 사용해 변주시키면 또 다른 재미있는 이미지가 탄생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일례로 작가는 만화 ‘심슨’과 ‘마블’ 시리즈 이미지를 사용했을 때도 등장인물을 배제시켜버리고 배경만 남긴 형태로 작업했다. 작가는 “‘사건을 만드는 주체를 다 배제시키면 어떤 풍경이 남아있을까?’ 하는 궁금증에서 시작된 작업이었다”며 “늘 중심에 서 있는 존재보다 그 주변을 맴도는 것에 관심이 많은 것은 80년대생 세대의 삶의 방식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작가는 친구들과 학창 시절 늘 농담처럼 말하곤 했다고 한다. “우리는 중심에 도달하지 못하고 미끄러진다”고. 농담처럼 흘려버린 말이지만 경쟁에 치여 살고, 선택받는 주인공보다는 그 주변에서 선택받지 못한 채 맴도는 사람이 대부분인 젊은 세대의 심리적 박탈감과 씁쓸함이 느껴지기도 하는 말이다. 그런데 작가는 이 박탈감에 매몰되기보다는 흥미를 갖고 새로운 볼거리를 발견하기 위해 나선 느낌이다.
이런 호기심에서 시작된 작업이 현재는 유사 회화로의 탐구로 이어졌다. 관심을 반영해 만든 전시명도 눈길을 끈다. 초-납작함, 과다한 평평함으로 해석될 수 있는 ‘서플랫(surflat)’이란 단어와, 작가가 지어낸 ‘픽터(pictor)’란 합성어다. 회화는 흔히 평면 작업으로 이야기되는데, 작가는 디지털 이미지의 생산 및 편집 방식과 회화 평면의 공간적 확장이 서로 교차하는 지점, 즉 ‘유사 회화’를 넌지시 암시한다.

작업 과정은 이렇다. 캡처 이미지 파일을 이미지 변환 프로그램으로 변형을 가한다. 이때 포토샵에서 콘텐트 어웨어(content aware) 기능을 사용한다. 선택된 영역을 프로그램이 주위의 색상과 배경을 추출해서 채워주는 기능이다. 새롭게 변형된 인터페이스는 캔버스로 가져온다. 컴퓨터 알고리즘에 의해 산출된 디지털 이미지를 물리적 세계에 재현하는 과정이다. 이때 에어브러쉬를 사용해 물감을 겹겹이 분사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업과 대형 거울을 함께 설치했다. 거울은 작업을 단순 평면 작업으로 두지 않고 끝없이 이어지며 변주되는 과정을 거치게 한다. 그래서 작가의 작업을 단순 회화라거나, 또는 디지털 작업이라고 한 가지 장르로 규정할 수 없다. 회화와 디지털 이미지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 작업을 작가는 유사 회화라 부르며 탐구하고 있다.

유사 회화 또한 작가가 배경에 관심을 가졌듯 실제를 우회해서 접근하는 방식을 갖췄다. 작가는 “유사 회화는 회화 매체를 주변에서 탐구하는 방식에서 비롯됐다. 실제를 그대로 보여주기보다는 우회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흥미로운 것 같다”며 “대중문화를 소스로 삼아 추상회화 같은 화면을 만들고, 또 여기서 회화와 디지털 기술 사이를 넘나들며 이미지의 변주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쩌면 중심보다 주변에 관심을 가졌기에 이토록 예측 불가능한 화면이 나올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사람들은 대부분 앞에 나와 있는 것에, 또는 중심에 우뚝 서 있는 것에 관심을 갖기 마련이다. 그러다보면 놓치게 되는 것들이 무수히 많다. 중심을 둘러싼 수많은 주변 존재들에 관심을 갖고, 이를 재배열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요소들에 포커스를 맞춘 작가의 화면은 그래서 더욱 흥미롭다.
- 관련태그
- CNB 씨앤비 시앤비 CNB뉴스 씨앤비뉴스















![[신년사] 신학기 수협은행장 “과감한 쇄신 실행할 것…원팀으로 더 큰 도약”](/data/cache/public/photos/20260102/art_202089_1767599084_170x110.jpg)
![[신년사]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AI 전환기, 더 큰 성장 기회”](/data/cache/public/photos/20260102/art_202067_1767592452_170x11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