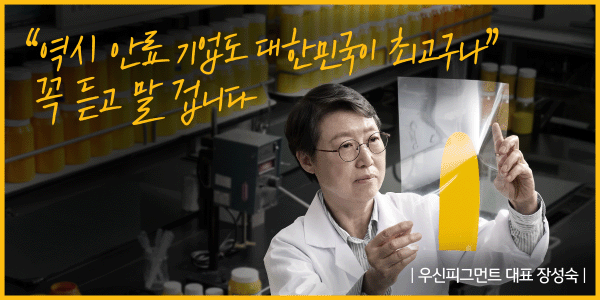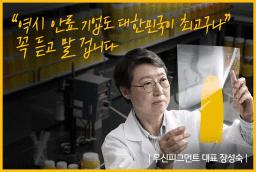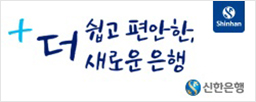[문화 현장] 흰색 실로 삶과 죽음의 기억을 연결하는 시오타 치하루
가나아트센터서 다음달 21일까지 개인전 ‘인 메모리(In Memory)’ 열어
 제728호 김금영⁄ 2022.07.19 13:28:47
제728호 김금영⁄ 2022.07.19 13:28:47

“죽지 마, 죽지 마라. 제발 부탁이야.”
시오타 치하루가 흰색 실로 공간에 그림을 그리듯 거대한 전시장을 가득 채우게 한 글귀다. 일본 출신으로 독일 베를린에서 활동하는 작가는 2020년 동료 작가에게 소설가 한강의 작품 ‘흰’을 선물 받았고, 책에 등장하는 이 문구는 작가에게 깊은 감명을 줬다. 그 기억이 개인전 ‘인 메모리(In Memory)’로 확장돼 관람객을 찾았다.

가나아트가 시오타 치하루의 개인전을 평창동에 위치한 가나아트센터에서 다음달 21일까지 연다. 이번 전시는 2020년 ‘비트윈 어스(Between Us)’ 이후 가나아트에서 2년 만에 열리는 작가의 개인전이다.
지난 전시에서 불에 탄 재와 핏빛 실을 사용한 작업을 선보였던 작가는 이번엔 순백의 실로 돌아왔다. 엉키고, 얽히고, 끊어지고, 풀리는 실들은 인간관계를 형상화한 것으로, 인간의 삶을 영위하게 하는 ‘혈관’, ‘세포’를 연상케 한다.

작가는 과거 작업에서 검은 실도 사용했는데, 색은 다를지라도 이 실들은 모두 ‘인간의 존재’ 아래 연결된다.
빨간 실은 사람의 인연(소우주), 검정 실은 칠흑의 우주(대우주)를 상징했다. 그리고 이번 흰색 실은 인간의 삶과 죽음을 잇는 기억을 이야기한다. 즉 우주라는 거대한 공간에서 삶과 죽음의 기억을 반복하며 서로 연결돼있는 인간의 존재를 살피는 것이다.
특히 이번 전시는 한강의 소설에서 영감을 얻었다. 소설에서 막 낳은 아이가 두 시간 만에 세상을 떠나자, 이 아이를 부여잡고 “죽지 말라”고 울부짖는 어머니의 모습이 나온다. 이 외침은 과거 두 번의 암 투병으로 유산의 아픔을 겪은 작가 개인의 기억을 건드렸다.

“어쩔 수 없이 아이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국적을 넘어 제게 강하게 전달됐어요. 특히 소설에서 강보(어린아이의 작은 이불), 배내옷, 달떡, 안개, 인형 등 흰색 사물 65개를 연계해 죽음과 생명을 이야기하는 방식이 인상 깊었어요. 소설 속 흰색은 죽음 자체, 즉 ‘끝’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죽음을 덮는 ‘시작’도 이중적으로 표현한다 생각했어요. 죽음이 있으면 새로운 삶의 시작도 존재하기 때문이죠.”
이번 전시의 시작을 알리는 제1 전시장엔 드레스를 그린 판화와 드로잉 작품들도 함께 설치됐다. 옷과 창문은 실과 함께 작가의 작품에 자주 쓰이는 재료로, 외부와의 경계를 상징한다. 작가는 “옷은 나와 외부를 경계 짓는 제2의 피부, 창문은 지리적 경계를 상징하는 도구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베를린 벼룩시장서 만난 물건들의 사연

드레스 작업으로 인간의 존재를 알리는 전시는 제2 전시장에서 다양한 오브제로 이야기를 이어간다. 주인 모를 오래된 책, 놀이용 카드, 의자 등 여러 오브제를 하얀색 실들이 감싸 안았다. 이 오브제는 작가가 베를린 벼룩시장에서 구한 것들로, 삶, 죽음을 관통하는 기억과 연결돼있다.
“베를린 벼룩시장엔 독특한 문화가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사용하던 물건을 없애지 않고, 청소업체가 가져가서 벼룩시장에 내다 팔죠. 종종 벼룩시장에 가서 이런 물건들을 살펴보고 모아요. 특히 가족사진을 좋아해요. 사진 속 인물들을 실제로 만난 적도 없고, 지금 이 세상엔 존재하지도 않지만 사진에 그들의 기억이 오롯이 존재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즉, 어떤 사람이 죽어서 존재가치가 없어졌던 오브제의 기억을 작가가 작품으로 되살리는 셈이다. 그렇게 죽었던 기억은 전시장에서 새 삶을 부여받아 관람객을 만나고, 관람객의 상상을 통해 새로운 기억으로 연결된다.
흰색 실의 바다를 누비는 거대한 배의 존재

오브제의 기억들로 가득 찬 제2 전시장을 지나 마지막 제3 전시장엔 이번 전시의 하이라이트인 대형 설치작 ‘인 메모리’가 기다린다. 흰색 실이 전시장 천장으로부터 아래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길게 뻗으며 공간을 채웠다. 마치 캔버스 속 그림이 현실로 튀어나온 것 같은 느낌이다.
이 공간의 중심엔 드레스 여러 벌과 흰 종이를 실은 거대한 흰색 배가 자리한다. 드레스는 인간을 상징하고, 이 옷을 싣고 흰색 실의 바다를 가르는 배는 기억을 담아 전진하는 존재다. 어디로 향하는지, 끝은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계속 살아가는 우리네 삶을 투영한 듯하다.

“배는 불투명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또는 희망찬 미래를 바라며 전진하는 우리의 모습을 상징해요. 때로는 기억의 바다를 헤매기도 하죠. 하얀 실 사이를 채운 종이들은 누군가의 일기일 수도, 메모일 수도 있어요. 죽어서도 존재하는 사람들의 기억들이죠.”
12살 때부터 화가가 되고 싶었다는 작가는 미대에 진학해 그림을 그렸지만, 항상 무언가 부족한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한정된 캔버스 공간을 넘어 공간에 그림을 그리고 싶었고, 그렇게 찾은 매체가 실이다.

작가는 실로 자신의 인생을 그린다. 설치에만 12일 걸린 ‘인 메모리’엔 즉흥성도 반영했다. 작가는 공간을 직접 방문해 손으로 스케치를 한 뒤 설치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첫 구상과 완성작이 달라지는 일도 많다. 하지만 작가는 “이 자체도 또 다른 예술”이라고 말했다.
“제게는 살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예술입니다. 과거에 전시 직전 암 선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당시 항암제 가방을 들고 전시장을 돌며 작업했죠.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우수수 빠졌을 땐 이 모습을 비디오로 찍어서 작품으로 승화시키기도 했어요. 제겐 산다는 것 자체가 예술이고, 예술이 곧 삶이에요. 제가 가장 무서운 건 죽으면 예술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술을 하지 않는 것이 제겐 죽음입니다.”
< 문화경제 김금영 기자 >
- 관련태그
- 시오타 치하루 가나아트 가나아트센터 인메모리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