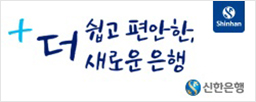최영태 편집국장 새해 벽두인 지난 2일. 미국의 경제지 <월 스트리트 저널>에 재미있는 기사가 실렸다. ‘구두쇠 경제학자’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미국 경제학회(AEA)는 3일 애틀랜타에서 정기총회를 열었다. 신년 시무식을 할 시간에 이들이 애틀랜타에 몰려들어 총회를 한 이유는 딱 한 가지, 애틀랜타의 메리어트 호텔이 최저 가격으로 입찰했기 때문이란다. 학회 날짜도 얄궂다. 일요일(3일)~화요일(5일)이다. AEA의 연례총회 일정은 이미 2015년 개최지(보스톤)까지 결정돼 있고, 개최 시기는 매년 1월 첫 번째 주다. 학회 재무이사는 “미국 전역의 도시, 호텔 등으로부터 입찰을 받아 개최지를 결정하다 보니 호텔 값이 제일 싼 1월 첫 주가 선정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월 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는 경제학자들이 얼마나 ‘경제적’인가를 몇 가지 사례로 보여줬다. 케인즈 경제학의 시조인 존 메이나드 케인즈는 친구 11명을 초대해놓고는 꿩을 단 세 마리만 내놓아, 이 식사 모임에 참석했던 작가 버지니아 울프는 “전원이 배가 고파 뼈를 핥았다”고 회고했다. 미국 노던 트러스트라는 굴지 업체에 소속된 경제학자 폴 캐스리얼은 ‘경제학의 원리’에 따라 운동화를 사도 나이키처럼 이름값이 듬뿍 덧붙여진 물건은 절대로 안 사고 ‘시장 물건’만 산다. 그는 차를 살 때도 100달러(12만 원 상당)를 아끼기 위해 문제가 없는데도 ‘엔진을 체크하시오’라고 경고 램프가 켜지는 차를 골라, 계기판의 해당 부분을 검정 테이프로 가리고 탔단다. 이들은 생활이 경제학이다. 세계 최고의 경영대학으로 꼽히는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 워튼 경영대학의 저스틴 월퍼스 교수는 친구가 이삿짐을 날라달라고 하자 “내가 몸으로 돕는 것보다 그 시간에 내가 다른 일을 하는 게 더 경제적”이라며 일꾼을 고용하라고 150달러를 줬다고 한다. 강의실 안과 밖이 따로 없다는 얘기다. 미국 경제학회의 재무이사를 맡고 있는 밴더빌트대학 존 시그프리드 교수도 “똑같은 차 모델인데 인기 있는 색깔을 피하면 100달러를 깎아준다고 해서 아내가 사 달라는 회색 대신 검정색을 골랐다”고 말했다. 물론 이렇게 몸으로 경제학을 실천하는 경제학자들이 우글대는 미국 경제학계가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역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번 학회에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컬럼비아대학의 조셉 스티글리츠 교수는 “인간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가정이 틀렸고, 보이지 않는 손은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없는 것일 수 있다”고 경제학의 대전제를 비판했다. 경제학자들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극도로 합리적·경제적으로 행동한다고 가정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비판이다. 경제학의 합리성에 대한 이런 비판이 있었기에 한국에서는 ‘전혀 경제적이지 않은 정부 정책’이 나오는 걸까? 비슷한 시기에 나온 세종시 수정안의 일부 내용은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밝힌 세종시 땅의 조성원가는 227만 원 정도이고, 이미 이 값에 세종시 택지 등을 공급받은 건설업체도 있는데, 앞으로 입주를 선택할 대기업에게는 평당 36만~40만 원에 ‘왕창 깎아’주겠단다. 깎아주는 만큼의 차액을 부담하는 주체는? 당연히 국민이다. 비싼 땅을 대기업에 싸게 넘기고 그 차액을 국민에 떠안기는 셈법은 도대체 어느 나라 경제학인가? 그리고 다른 경쟁 산업단지의 땅값보다도 40만 원 정도나 저렴하다니 다른 지역은 어쩌란 말인가? 다른 지역은 다 죽어도 세종시 문제만 해결하면 되나? ‘한국 경제학계의 거물’이란 평가를 받았던 정 총리가 주도해 이런 수정안이 나왔다니, 미국 경제학자들의 ‘지행합일(知行合一)’ 자세와 비교하면 정말 우리의 현실이 절망스럽다. 정 총리를 비롯한 학자 출신 정치인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들의 학문은 강의실 안과 밖이 그렇게 달라도 아무 상관없는가? 당신들이 한 학문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당신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한 출세용이었는가? 입(주장)과 손(실행)의 거리가 멀다고는 하지만, 한국처럼 먼 나라도 드물 것이다. 제발 지행합일 좀 하자.










 제152호
제152호 


![[인터뷰] 카카오게임즈 신작 액션 MMORPG ‘크로노 오디세이’, 글로벌 미디어 서면 Q&A](/data/cache/public/photos/20250623/art_179227_1749106703_170x11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