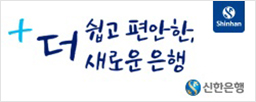▲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CNB저널 = 정혜연 스페이스 비엠 디렉터) 지난 6월 3일 필자는 ‘아트부산’에 참가하기 위해 아침 일찍 서울역에 도착했다. 다음날 있을 VIP 오프닝에 맞춰 전시 부스를 꾸미기 위해서였다. 프로젝터를 비롯해 5박 6일간의 미술 마켓에서 살아남기 위해 꽤 무거운 짐을 들고 오전 6시 30분에 올라가려는 플랫폼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에스컬레이터가 사용금지 상태였다.
할 수 없이 캐리어를 들고 꽤 높은 계단을 올라가야 했는데, 이때 허리를 삐끗하고 말았다. 부산에 도착해 부스를 꾸미기 시작하면서부터 통증이 시작됐다. 앞으로 며칠간의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정말 큰일이었다. 부랴부랴 근처 병원을 찾아 근육이완제, 진통제를 맞고 물리치료까지 받고 나서야 전시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몸이 불편하다 보니 작은 것에까지 짜증이 나기 마련이었다. 주최 측에서 알려준 호텔은 페어가 열리는 벡스코(BEXCO)에서 사뭇 멀리 떨어진 해운대 바닷가였다. 참여한 갤러리스트들이 공식 일정을 끝내고 부산을 즐기기엔 더없이 좋은 위치였지만, 몸이 불편한 나로서는 벡스코에서 멀리 떨어진 것이 한탄스러웠다.
페어 시작 전부터 몸이 불편해진 필자는 불평불만이 많은 참가자가 됐다. 흰색 부스에 설치되는 전선줄이 왜 회색인지(설치가 끝난 후 흰색으로 칠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는데, 이유는 원래 회색 전선줄로 준비되었기 때문이라고. “원하면 흰색 페인트를 구해서 각자 칠하면 된다”는 답변이었다), 각각의 부스에 달린 갤러리 사인이 왜 구부러져 있는지(부스 구조물은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부스 사인은 종이로 만들어져 구부러지거나 삐뚤어진 곳이 많았다) 등등.
필자의 끊임없던 불만은 결국 구경거리를 만들고 말았다. 페어 개장 이틀 뒤 발생한 일이다. 정오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되는 페어의 부스를 지키는 일은 많은 체력을 요구한다. 오전에 호텔 조식을 먹고 나와 하루 종일 일을 하다 보면 배고파지기 마련이다. 오후 5시경, 별 생각 없이 근처 음식점에 식사를 배달시켰다.
외형은 좋아졌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실
페어장 앞으로 배달된 피자 박스를 받아 들고 들어가려는데 입구를 지키던 경비들이 제재 하며, “외부 음식 반입 금지”라고 했다. 그러면 어디서 식사를 하냐고 물었더니, 밖에서 먹으라, 다른 갤러리스트들도 다 그렇게 했다고 한다. 반입이 안 되는 이유를 묻자, 음식 냄새가 나면 페어장을 찾은 고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경비들에게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 본데, 부스를 사서 참여한 갤러리들이 당신들에겐 고객이다. 우리가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게 운영 팀의 일이다. 외부 음식을 금지시키라고 지시 받았다면 그걸 막는 게 당신 일이겠으나, 이건 너무 어처구니없는 규칙이어서 나는 지킬 생각이 없다. 당신과 싸울 이유도 없다. 배도 고프고, 일도 해야 하니 우선 들어가겠다. 운영진과 얘기할 테니 운영진을 우리 부스로 보내 달라”는 말을 남기고 부스로 돌아왔다.

▲아트부산 전시장 전경. 사진 = 정혜연
놀랍게도 운영 팀의 과장은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하다며 바로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회를 거듭하는 동안 실무 팀은 여러 상황에 상당히 노련하게 응대하는 법을 배운 듯 했다.
이렇듯 상당히 개인적인 일들로 ‘아트부산’을 매도하기에는 미안한 구석도 많다. 인정하건대, ‘아트부산’은 그 어느 국내 아트페어보다 국제적 페어로서의 위상을 갖추어 가고 있다. VIP 오프닝 당일, 여러 명의 갤러리스트들이 아트부산의 괄목한 만한 성장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쇠락해 가는 한국국제아트페어(KIAF), 일명 키아프와 비교해 ‘저무는 키아프, 떠오르는 아트부산’을 강조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아트부산’에는 전 세계 16개국 201개의 갤러리가 참여했다.
작년 키아프에 참여한 갤러리가 총 186개였음을 감안하면, 이런 주장이 틀렸다고는 볼 수 없다. 페어의 전체 규모나 부스 디자인도 상당히 세련되게 변했다. 공식 이름도 ‘아트쇼 부산’에서 ‘아트부산’으로 바뀌는 등, ‘아트바젤’을 벤치마킹한 노력이 엿보였다. 이제 ‘아트부산’은 ‘국내 최대 미술품 장터’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럴듯해진 하드웨어에 맞는 소프트웨어는 아직 갖추지 못한 듯하다. 페어라는 하드웨어의 가장 핵심적인 운영체계는 ‘판매’다. 필자처럼 불만투성이 갤러리스트도 판매 실적이 좋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페어를 칭찬하기 시작하고, 충성 고객으로 돌아서게 돼 있다. 그래서 해외 유수의 아트페어들은 VIP 담당을 따로 두고 손님 모시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
집계도 안 했으면서 152억 원 판매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숫자?
부산에 거주하는 컬렉터들만 믿고 이 큰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누가 봐도 모험이다. ‘아트바젤 홍콩’만 봐도 그렇다. 명실공히 아시아 미술시장의 허브가 된 홍콩에는 아시아 전역에서 컬렉터들이 모여든다. 아니 그들을 모시기 위해 전력을 다한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끼고 있는 부산이 제2의 ‘마이애미 바젤’이 되지 말란 법이 없지 않은가.
페어의 마지막 날인 8일, 참여했던 국내외 많은 갤러리들이 참패를 맛보고 부산을 떠났다. 심신이 만신창이가 된 기분이었다. 서울로 돌아와 들은 소식은 더욱 놀라웠다. 메르스 공포에도 불구하고 행사기간 중 3만 6000여 명이 관람했고 152억 원어치 작품이 판매됐다는 뉴스였다.
분명 기억하건대, 주최 측에서 갤러리 부스마다 와서 판매 실적을 물어본 적도 없고 설문지를 돌린 적도 없다. 작품을 사서 바로 가지고 나가는 손님들에게 반출증을 반드시 확인한 것도 아니었다. 그럼 도대체 판매액 ‘152억 원’은 어디에 근거한 숫자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냥 만들어낸 숫자임이 분명하다.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아트페어에 지쳐가는 갤러리스트로서 ‘아트부산’에 마지막으로 투덜거려본다. 신뢰 가는 마케팅을 해달라!고, 안과 밖을 제대로 벤치마킹 해달라!고. 훌륭한 소프트웨어를 장착하지 않은 하드웨어는 폐기처분 될 가망성이 높다는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정리 = 왕진오 기자)
- 관련태그
- CNB 씨앤비 시앤비 CNB뉴스 씨앤비뉴스










 제435호
제43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