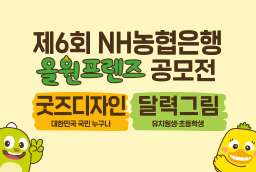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1일차 (서울 → 홍콩 → 피지 난디)
피지 가는 길
중국 동방항공 편으로 이른 아침 인천공항을 출발해 상해로 향한다. 피지가 첫 목적지인데 상해로 돌아가는 데는 이유가 있다. 단순 왕복이 아니라 주유(周遊, excursion) 여행인 여정의 특성상 항공권은 편도로 발권해야 하는데, 대한항공 피지행 편도 요금이 매우 비싸다. 대안을 찾다보니 피지 국적기 에어 퍼시픽(Air Pacific)이 일주일에 두 번 홍콩을 다니기에 그 스케줄에 맞추기 위해 먼저 홍콩으로 가는 것이다.
귀국길도 마찬가지다. 인도네시아 발리 덴파사르(Denpasar)에서 서울행 대한항공 직항이 있지만 편도 요금은 비싸다. 대신 싱가포르에 취항하는 중국동방항공을 타기 위해 발리에서 싱가포르로 가서 환승하는 고단한 일정이 여행 마지막 날 기다린다.
또 다시 중국
두 시간 후 항공기는 상해 푸동공항에 도착했다. 중국 땅을 다시 밟는다. 웬만해서는 바로 옆에 있는 나라 중국을 피할 수 없다. 인천에서 상해는 510마일, 제주도 상공 지나 조금만 더 가면 된다. 단순 환승일 뿐이지만 이민국과 보안 검색을 다시 한 번 통과하는 등 절차가 성가시다. 직항을 탔더라면 벌써 홍콩에 도착했을 시간이지만, 항공 요금을 아껴야 하는 여행자는 불편을 참는다.

▲난디와 수바 사이 해안길 퀸스 로드(Queens Road). 피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사진 = 김현주

▲피지 난디 공항에서 환영 문구 ‘불라(Bula)’가 여행객을 반긴다. 피지어로 ‘안녕하세요’라는 뜻이다. 사진 = 김현주
푸동공항 환승 대기 중에 읽은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China Daily)는 북경-광주 간 징광(京廣) 고속철도가 개통해 2300km를 8시간 만에 주파한다는 소식으로 가득하다. 2030년에는 중국 경제 규모가 미국을 초월해 G1으로 등극한다는 뉴스가 연이어 보인다. 믿기 어렵지만 믿어야 할 것 같다. 푸동공항을 떠난 항공기는 780마일을 날아 홍콩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에어 퍼시픽 탑승구 풍경
홍콩 공항 에어 퍼시픽 탑승구에는 인도계, 중국계 그리고 멜라네시아계 피지인이 모여 있다. 추위를 피해 휴가를 떠나는 러시아인을 포함해 백인도 적지 않다. 항공기 승무원들은 피지의 다양한 인종을 하나씩 대표한 듯 용모가 다양하다. 살찐 타이거 우즈를 떠올리게 하는 피지 남성 스튜어드는 체격은 우람하지만 자상하기 이를 데 없다. 그의 선한 둥근 눈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장거리 비행의 피로가 한결 줄어드는 것 같다.
다시 적도를 넘어
피지 국적기 에어 퍼시픽의 B747-400 대형 여객기는 그 많은 좌석을 대부분 채운 채 홍콩 공항을 오후 4시 50분 이륙해 곧장 동남쪽으로 향한다. 5100마일의 거리를 9시간 30분 비행할 예정이다. 항공기는 필리핀 북부와 괌 남쪽을 지나 적도 건너 태평양 상공을 가른다. 다행히 내 옆자리는 비었다. 늘 하듯이 항공기 뒤쪽 좌석을 선택하면 이런 일이 종종 생긴다. 옆 좌석이 빈다는 것은 장거리 비행, 특히 야간 비행일 때 이루 말할 수 없이 편하다.
2일차 (피지 난디 → 피지 수바)
날짜 변경선 위에 놓인 피지
피지 가는 항공 루트는 나에게는 전혀 낯선 세계다. 동경 180도 날짜 변경선에 있는 피지는 남위 18도, 즉 온전히 남반구에 속한다. 한국보다 시차가 세 시간 앞선다. 모레 맞이할 새해도 따라서 한국보다 먼저 찾아온다. 이륙 후 9시간, 항공기가 고도를 낮추니 넘실거리는 남태평양 물결 사이로 피지 제도의 크고 작은 섬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피지 시각 오전 7시 30분에 도착한 난디(Nadi) 국제공항 입국장에서는 남성 중창단이 환영 공연으로 방문객들을 반긴다.

▲수바 항구가 저 멀리 보인다. 항구에 중국 어선들이 여러 척 들어와 있다. 사진 = 김현주
입국 심사는 생각보다 시간이 걸린다. 누구에게든 이것저것 꼬치꼬치 묻지만 시원스럽게 넉 달짜리 입국 허가 스탬프를 쾅쾅 찍어준다. 산업 기반이 없는 피지에서 외국인을 따라 들어오는 관광 머니는 중요한 국가 수입원이다. 특히 최근까지 이어진 정정 불안과 세계 경제 위기, 그리고 칼레도니아, 사모아, 바누아투, 팔라우 등 남태평양 다른 국가들이 경쟁 관광지로 부상한 점 등이 피지 관광 산업에 위기의식을 불러 왔을 것이다.
공항 터미널을 나오니 습한 공기가 순간적으로 숨을 막는다. 여긴 지금 한여름이다. 연말 한파가 이어지는 한국을 떠나서 완전히 바뀐 계절을 맞으니 어지러울 지경이다. 피지에서는 사람들 걸음걸이부터 말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느리다. 느려서 좋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경상북도만한 크기에 85만 명이 사는 피지에서 바빠야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멜라네시아계와 인도계의 불안한 공존
피지 사람들은 멜라네시아계 57%, 인도계 38%, 그리고 기타로 구성된다. 생긴 모습만으로 단번에 구별되는 너무나 다른 두 인종이 아슬아슬하게 공존한다. 피지에 인도인이 이주하게 된 것은 순전히 영국 식민 통치자들의 필요 때문이었다. 영국 식민정부는 19세기 말 피지의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할 계약 노동자로 인도인을 받아들였고 이후 인도 이민이 꾸준히 이어진 것이다.
1970년 영국이 떠나고 독립을 맞이한 피지는 연이어 쿠데타를 맞는다. 이슈는 주로 어느 인종이 피지의 주도권을 잡느냐에 관한 것이었다. 결국 현재는 인종별로 의석수를 배분해 원주민 23명, 인도계 19명, 기타 4명으로 숫자를 정해 원주민의 정치적 우월권을 인정한다.

▲피지 박물관 모습. 아쉽게도 일요일에 휴관이라 들어가 보지는 못했다. 사진 = 김현주
물론 피지 원주민들이 모두 멜라네시아계는 아니다. 피지는 멜라네시아의 동쪽 끝이자 폴리네시아의 서쪽 끝에 위치하고, 미크로네시아 또한 가깝다 보니 피지 원주민들의 생김새는 혼혈로 인해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체격이 크고 매우 심한 곱슬머리에 아주 짙은 피부색을 가졌다. 피지인은 사실 순하고 선량한데 어쩐 연유인지 서구인들에게는 ‘식인종 전사’로 알려져 유럽인들이 오랫동안 피지 해안에 발붙이지 못했다고 한다.
수바 가는 길
공항 터미널 앞에서 곧장 피지 수도 수바(Suva)행 버스에 오른다. 수바까지 188km, 네 시간 걸린다. 수바까지 이어지는 남쪽 해안길 퀸스 로드(Queens Road)는 나지막한 언덕들을 여러 개 오르내리며 바다와 숨바꼭질한다. 차창을 통해 푸른 섬 피지를 즐긴다. 때묻지 않은 자연, 선량한 사람들이 사는 남태평양은 그래서 지상 낙원이라고 불렸나 보다.

▲로마가톨릭 성당. 피지 원주민은 대부분 기독교도다. 사진 = 김현주
수바 터미널에 도착해 다음 날 난디로 돌아오는 버스표를 구입해 놓고 박물관으로 향한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오늘 휴관이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박물관은 일요일에 문을 연다는 것을 믿고 정보 확인을 하지 않은 탓이다. 피지의 3700년 인간 거주 역사와 훗날 이 땅에 들어온 인도인에 관한 기록, 그리고 영국 식민지 시대의 사연들을 기대했으나 아쉽기 짝이 없다. 호텔로 이동해 일단 체크인부터 했다. 수바 항구를 내려다보는 시내 한복판 언덕 기슭에 자리 잡은 호텔 분위기가 마음에 든다. 여장을 푼 후 시내 탐방에 나선다.
태평양 한복판에서
가장 먼저 수바 항구로 가본다. 항구에는 중국 어선들이 여러 척 들어와 있다. 어딘가에 한국 어선도 있을 것이다. 인구 많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피지 바다에까지 뛰어든 현장이다. 해변 산책로에서 남태평양을 바라본다. 끝닿은 곳이 없을 것 같은 넓디넓은 바다가 일망무제로 펼쳐진다.
정말 먼 곳까지 왔다. 북동-남서 방향으로는 하와이와 뉴질랜드의 중간, 북서-남동 방향으로는 바누아투(Vanuatu)와 통가(Tonga) 사이 태평양 한복판에 있다. 한 번도 인류 역사의 무대에서 화려하게 빛을 낸 적은 없지만 아름다운 사람들이 이룩한 낙원이 수천 년 이어져온 곳이다. 더는 깊숙이 찾아 들어갈 곳이 없어 보이는 남태평양 한복판에 서 있는 감회가 크다.
언어 백화점
피지 인구의 3/4이 수도 수바에 살지만 도시는 쾌적하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한 언어와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이곳은 낯설고도 놀랍게 다가온다. 언어는 영어가 공용어이니 만큼 모두 영어를 기본적으로 잘하지만 인종에 따라 말레이폴리네시아 언어 계열인 피지어부터 인도어까지 혼용된다. 현재 피지에는 영어 연수를 위해 적지 않은 수의 한국 학생들과 일본 학생들이 와 있다고 한다. 과거 식민지가 남기고 간 영어라는 유산으로 가난한 피지 살림살이에 보탬이 된다니 피수탈의 아픔을 조금은 위안 받을 만하다.
피지 TV
콜로니얼(식민지 스타일) 건축물과 넓은 공원 녹지가 어우러진 중심 가로를 따라 법원과 정부합동청사까지 걷는다. 정부청사 건물 뒤로는 TV 채널 1번 피지 Sky 방송국과 FBC 피지방송국 건물이 있다. 저녁에 TV를 보고 확인했지만 피지방송이라고 해봤자 미국 프로그램들로 도배하다시피 편성하거나 인근 호주 TV를 중계하는 정도다. 자국 내 고유 콘텐츠를 제작해 편성을 유지하기에는 인구와 경제 규모가 빈약한 탓(1인당 국민소득 4000달러 수준)이다. 다행히 영어가 공용어이므로 더빙이나 서브타이틀 없이 미국이나 호주 방송을 재전송하기만 하면 된다.

▲피지 정부청사가 우뚝 서 있는 모습. 건물 뒤로는 방송국들이 자리잡았다. 사진 = 김현주
세련된 주택이 늘어선 거리를 걷다보니 로마가톨릭 성당(Roman Catholic Cathedral)이 나타난다. 뉴질랜드 웰링턴 대교구의 지원으로 건축된 성당 안에서 예배드리는 이들은 거의 모두 원주민 계열 피지인이다. 소박한 도시 탐방은 금세 끝났다. 저녁 식사 후 과일과 맥주, 음료 등을 구입하러 마켓에 들렀다. 웬만한 물건들은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섬나라여서 그런지 국민 소득에 비해서 물가가 결코 싸지 않다. 호텔방에서 어둠이 내린 수바 항구를 바라본다. 깜빡이는 항구의 불빛이 야릇한 솔로 여행자의 고독을 자극한다. 저녁 내내 무덥더니 밤늦은 시각 비가 무섭게 쏟아진다.
(정리 = 김금영 기자)
- 관련태그
- CNB 씨앤비 시앤비 CNB뉴스 씨앤비뉴스










 제465호
제46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