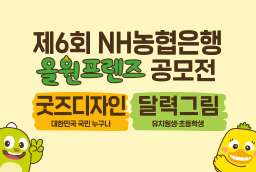[김현주의 나홀로 세계여행 - 뉴질랜드 → 호주] 신대륙 같은 뉴질랜드에서 구대륙 같은 호주로
 제469-470호(설날)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2016.02.11 11:25:24
제469-470호(설날)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2016.02.11 11:25:24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9일차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남방의 샹그릴라
호텔을 나와 먼저 찾은 곳은 해글리 공원(Hagley Park). 호텔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 미국 뉴욕 센트럴 파크(Central Park)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심 공원이다. 공기가 이렇게 맑을 수 없다.
공원을 끼고 도는 에이번(Avon)강(강이라기보다는 실개천이다)의 물 또한 그냥 마셔도 될 만큼 깨끗하다. 물가에 버드나무 가지가 늘어져 있고 오리들이 여유롭게 헤엄치는 이곳이 남방의 샹그릴라 아닌가? 하늘의 구름과 날씨는 한국의 아주 청명한 가을 어느 날이다.
대지진 이후
시내 중심을 항해 걷는다. 빅토리아 스트리트(Victoria Street)에 카지노가 있어서 구경삼아 들러본다. 일요일 아침이라서 노인들 몇 사람 말고는 사람이 없다. 뉴질랜드 10달러를 잃을 작정으로 아무 슬롯머신을 붙들고 잠시 게임을 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50달러로 불었다. 단돈 40달러를 벌고 아이처럼 좋아하는 나 자신을 질책한다.
다이아몬드 쥬빌리(Diamond Jubilee) 시계탑의 첨탑이 기울어져 보수 중이라며 사방에 그물을 쳐놓았다. 2011년 2월에 발생한 지진으로 인명 184명을 비롯해서 많은 손실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완전 복구까지는 멀어 보인다.
시내 곳곳에 지진의 흔적이 남아 있다. 시내 중심 CBD(Central Business District) 대성당 광장(Cathedral Square)을 비롯한 넓은 지역이 아직 출입 금지 구역이다. 아트갤러리 앞마당 이정표는 세계 유명 작품이 있는 곳까지의 거리를 방향을 맞춰 표시해 놓았다. 가장 먼 곳은 뉴질랜드의 대척점에 해당하는 스페인 마드리드 소피아 국립미술관 소장 피카소의 게르니카(Guernica)다. 지구 반 바퀴, 무려 1만 9550km 떨어진 곳이다.

▲호텔을 나와 해글리 공원(Hagley Park)을 방문했다. 미국 뉴욕 센트럴 파크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심 공원으로, 청명한 하늘과 맑은 공기가 마음까지 산뜻하게 한다. 사진 = 김현주
아, 지진으로 많은 소중한 것들을 잃었는데도 도시가 어쩌면 여전히 이렇게 예쁠 수 있을까? 정말 어느 방향으로 무엇을 담아도 아름다운 사진이 나오는 정원도시(garden city)임에 틀림없다. 이런 아름다움은 인간의 손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물주에게서 나오는 것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해글리 공원 초입 캔터베리(Canterbury) 박물관에 들어선다. 박물관의 주제는 마오리족이다. 뉴질랜드에 마오리족이 처음 정착한 것은 800년 전이고, 유럽 백인들이 발들인 것은 150년 전이다. 박물관에 ‘마오리에 대한 오해’가 소개돼 있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중반까지 일부 책자들이 ‘마오리는 폴리네시안이 아니고 열등하고 부도덕하며 우둔하고 피부가 검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학술적 근거가 없는 잘못된 것으로서 제국주의 프로파간다였을 뿐이라고 박물관은 해명한다.

▲다이아몬드 쥬빌리(Diamond Jubilee) 시계탑의 첨탑이 보수 공사 중이다. 2011년 2월 발생한 지진의 흔적 중 하나다. 사진 = 김현주
박물관 내 유럽인 섹션에는 초기 이민자들이 영국을 떠나며 부른 ‘이민자들(emigrants)’라는 노래가 심금을 울린다. ‘여기 (영국에) 머문다면 구할 수 없을 것 같은 빵을 찾아서… 아름다운 조국을 분노하면서 떠나는 것이 결코 아니며… 눈물로 안녕… 영원히….’ 대략 이런 내용이다. 당시로서는 한 번 떠나면 못 돌아오는 너무나 머나먼 뱃길 아니었던가? 예나 지금이나 가난한 자들의 삶이란 고달픈 것이다.
심플한 삶의 방식
크라이스트처치 거리에는 영어 학원이 종종 눈에 띈다. 이 지역의 중요한 수입원 중 하나다.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지역에서 영어를 배우러 수백 명의 학생들이 여기 와 있다고 한다. ‘기억의 다리(Bridge of Remembrance)’에는 전몰자들을 잊지 말자는 글귀와 함께 뉴질랜드 국기가 펄럭인다.
주말시장 광장을 향한다. 푸드 코트에서 구입한 양고기 필라펠과 코카콜라가 점심이다(NZD 15, 한화 약 1만 4000원). 참고로 뉴질랜드에서 빅맥 콤보는 평균 NZD 10(한화 약 9000원)이다. 시민들이 일요일 한낮을 즐기고 있다.
가족이 함께 나와 걷다가 간단한 음식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단출한 방식이다. 일상이 늘 분주한 우리들로서는 어찌 보면 부러울 수 있는 삶의 방식이다. 이렇듯 곳곳에서 한국과 뉴질랜드를 비교해 보지만 어느 것이 더 낫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삶의 방식은 저 혼자 생성된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된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크라이스트처치 시내 곳곳에 지진의 상처가 남아 있다. 건물 곳곳이 공사 중이고 출입 금지 구역도 눈에 띈다. 사진 = 김현주

▲아트갤러리 앞마당에는 세계 유명 작품이 있는 곳까지의 거리를 방향에 맞춰 표시해 놓은 이정표가 있다. 사진 = 김현주
근처 버스종합정류장(CBS, Central Bus Station)에서 동쪽 섬너(Sumner) 해안으로 가는 3번 버스에 오르니 20분 만에 도착한다. 해변에는 시민들이 많다. 나도 남태평양 바닷물에 발 적시는 세리모니를 거행한다.
바닷물이 차다. 해변에 오면 아이들이 가장 신난다. 걱정돼 아이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것은 여기서도 엄마 몫이다. 공놀이, 부메랑 던지기, 조개·가재·소라 줍기 등 물놀이 방식도 우리와 다를 게 없다. 크라이스트처치의 여름날 일요일 오후는 이렇게 지나간다. 주변 교외 주택들 중에서 어김없이 큰 집들은 바다를 모든 방향으로 조망하는 언덕 위 목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
호텔로 돌아간다. 따가운 햇살이 조금은 꺾인 늦은 오후의 도시는 쥐죽은 듯 조용하다. 마실 것을 사고 싶은데 사방 1km 반경 내에 문을 연 가게는 딱 한 군데, 그것도 주유소에 딸린 편의점뿐이다. 인구 35만, 뉴질랜드 제3의 도시라지만 분위기는 대략 이렇다. 내일 새벽 호주 시드니행 항공기 탑승을 앞둔 터라 일찍 잠을 청한다.
10일차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 호주 시드니)
하늘에서 본 남섬
국제공항이라고 해봤자 멜버른, 시드니, 브리즈번 등 호주 주요 도시로 향하는 노선이 거의 전부지만 월요일 새벽 5시의 크라이스트처치 공항은 제법 분주하다. 오전 7시 정시에 출발한 시드니행 에어 뉴질랜드(Air New Zealand) 항공기는 30분 만에 남섬을 횡단한다. 뉴질랜드 남섬의 눈 덮인 산과 계곡이 장관을 연출한 대자연이 펼쳐진다.
피오르 지형이 나타나기 시작한 굴곡진 해안선을 까마득히 아래로 보며 항공기는 태평양 태즈먼(Tasman)해를 만난다. 3시간 30분, 1323마일 비행 끝에 호주 시드니 킹스포드-스미스(Kingsford-Smith) 국제공항에 닿는다. 아시아 각 지역에서 대형 여객기들이 연이어 도착하는 국제선 터미널은 미국 LA 공항만큼 붐빈다. 게다가 공항 시설은 1953년 문을 연 이래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낡고 협소하다. 전원 같은 뉴질랜드를 떠나 호주에 들어오니 신대륙에서 구대륙으로 온 것 같다.

▲캔터베리 박물관을 찾아간 날 날씨가 유독 좋았다. 분수도 햇빛에 반사돼 반짝임을 더한다. 사진 = 김현주

▲해글리 공원 초입에 자리한 캔터베리 박물관 전경. 마오리족을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곳이다. 사진 = 김현주
시드니는 1770년 제임스 쿡(James Cook) 선장이 이끄는 탐험대가 발을 디딘 이후 1788년 최초의 영국 이민자들과 상업 선단이 오늘날 서큘러 키(Circular Quay)에 상륙해 호주 내륙 개발의 전진기지로 삼은 도시다. 초기 이민자들이 정착한 곳은 서큘러 키 바로 옆 록스(Rocks) 지역이다. 꾸준한 인구 유입에 힘입어 시드니는 1920년대에 인구 100만을 넘었고 지금은 호주 전체 인구 2300만 명의 1/5인 450만 명이 사는 메트로폴리탄으로 성장했다.
애매한 공항 교통 편
이제 공항에서 시내까지 교통편을 수배하면 된다. 물론 가장 빠르고 편안한 방법은 뉴사우스웨일즈(NSW) 에어포트 링크(Airport Link)를 이용하는 것이지만, 공연히 게이트 패스(Gate Pass)라는 명목으로 공항철도 이용세 12 호주달러(AUD)를 걷는다. 거기에 철도 요금을 따로 내면 16 호주달러(한화 1만 7600원)가 든다. 공항세가 부담된다면 버스를 타는 방법이 있으나, 낯선 도시에서 권할 일이 아니다.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타야 하고 게다가 버스표는 미리 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섬너 해변의 휴일 오후 풍경이 한가롭다. 신나서 노는 아이들의 모습이 바다와 함께 빛난다. 사진 = 김현주

▲‘기억의 다리’가 보인다.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뉴질랜드 전몰자들을 잊지 말자는 글귀와 뉴질랜드 국기가 펄럭인다. 사진 = 김현주
(정리 = 김금영 기자)
- 관련태그
- CNB 씨앤비 시앤비 CNB뉴스 씨앤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