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하나, '무제'. 130.3 ×162.2cm, 캔버스에 유채. 2016. (사진 = 김하나 작가)
우리는 빙하의 색을 어떻게 기억할까? 누구는 파랗다고, 또 누구는 하얗거나 투명하다고 기억할 것이다. 상식적으로 빙하는 투명한 물에서 기화한 흰 눈이 쌓여 파란빛을 띠게 된다. 하지만 실제 빙하의 색은 빛이 표면에 부딪혀 얼마나 깊이 침투한 뒤 반사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에스키모가 알고 있는 눈의 색 종류만큼, 빙하를 오래 바라보고 다채로운 빛의 스펙트럼을 발견하는 작가의 전시가 최근 열렸다.
신한갤러리 광화문에서 빙하를 탐구하며 추상 회화를 실험하는 신진작가 김하나의 개인전 '빙하풍경'이 5월 2일~6월 8일 열린다. 이번 전시는 김하나의 첫번째 개인전으로, 신한갤러리가 후원하는 신진작가 지원 공모기획전의 일환이다.

▲김하나, '무제'. 130.3 x 162.2cm, 캔버스에 유채. 2015. (사진 = 김하나 작가)
작가 김하나는 빙하 이미지를 수집하고 골라내며 오랫동안 바라본다. 작가가 주목한 빙하는 실존하는 어느 곳의 빙하가 아니라, 빙하라는 관념 내부에서 활성화되는 변화다. 단단해보이는 외벽과 달리 빙하의 내부는 끊임없이 대류하고 녹고 얼기를 반복한다. 그 변화 속에서 빛과 색도 무수히 변하고 작가는 그 변화를 캔버스 위에 포착한다.
전시장을 방문해 받은 첫인상은 전시된 작품들이 마치 거대한 배 안에서 크고 작은 창을 통해 바라본 각양각색의 빙하들 같았다는 것이다. 층고가 조금 낮은 전시장에 다양한 크기의 작품들이 나란히 서서 저마다 다른 풍경을 보여준다. 하지만 빙하의 원형적 이미지에서 출발한 이 작품들이 보여주는 것은 사실 '빙하가 있는 풍경'이 아니다.

▲김하나, '무제'. 193.9 x 260.6cm, 캔버스에 유채. 2015. (사진 = 신한갤러리 광화문)
작가노트를 통해 작가는 "빙하는 붕괴하고 변화한다는 그 존재방식 자체로 인간의 메타포가 된다"며, "작업이 이어질수록 나의 관심은 회화 자체로 옮겨갔다. 이 과정 속에서 빙하라는 매체는 조금씩 사라지고, 다시 우연적인 붕괴와 변화라는 본질로 회귀한다"고 밝혔다.
작가가 수집한 단편적인 이미지는 그 이미지의 어떤 부분도 작품 내에서 그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작가는 재현이 아니라 자신이 회화를 실험하는 과정에서 빙하를 소화시키고 흡수해 작업적 결과물로 이끈다. 마치 빙하가 계속 녹고 이동하며 부서지고 또 다시 결빙되는 것처럼, 극적인 변화의 과정을 끊임없이 캔버스 위에 발생시켜 자신만의 추상회화를 실험하는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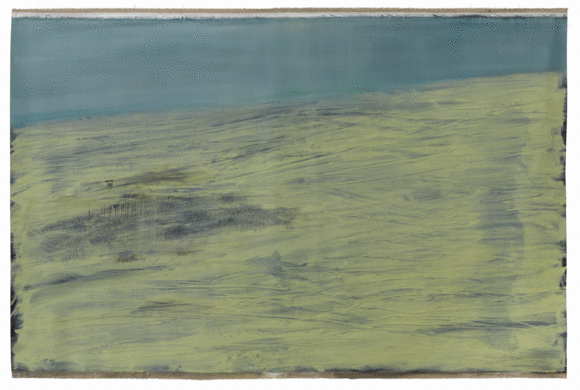
▲김하나, '무제'. 160 x 250cm, 캔버스에 유채. 2015. (사진 = 김하나 작가)
독특한 점은 역동적인 붓터치를 이용한 김하나의 풍경화가 전통적인 추상화의 분류대로라면 '따뜻한 추상(비정형적 형태와 열정적인 표현 방식이 특징)'에 가깝지만 내부에 도사린 색감들이 시리도록 차갑다는 것이다. 작가는 어떤 형식의 추상을 따르기보다 빙하라는 상징을 통해 변화하는 자신만의 풍경을 발견한다.
이선영 평론가는 김하나의 작업에 대해 "무엇으로부터든 변화할 수 있고 무엇으로부터도 침해받을 수 있는 빙하 풍경은 현실성이라기보다 잠재성의 색과 빛에 잠겨있다"고 설명하며, "(작업 속) 빙하는 차갑지만 빙하를 녹이고 무너뜨리는 열기와 꽉 조여져 있던 것이 풀어지며 발생되는 미열도 있다"고 평했다. 그 미묘한 열기가 작업을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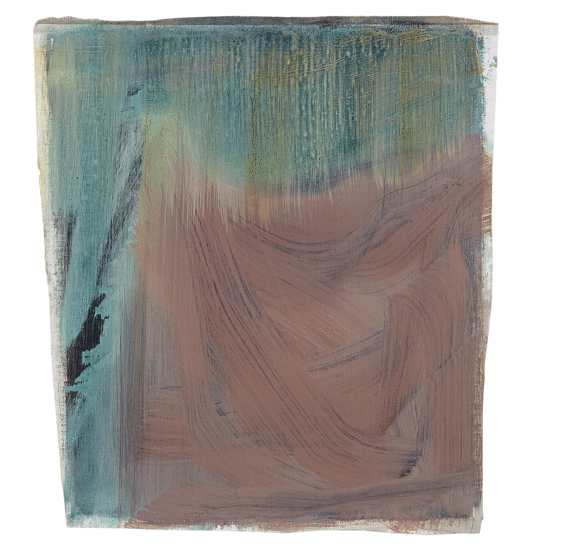
▲김하나, '무제'. 39 x 35cm, 캔버스에 유채. 2015. (사진 = 김하나 작가)
- 관련태그
- CNB 씨앤비 시앤비 CNB뉴스 씨앤비뉴스










 제483호
제48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