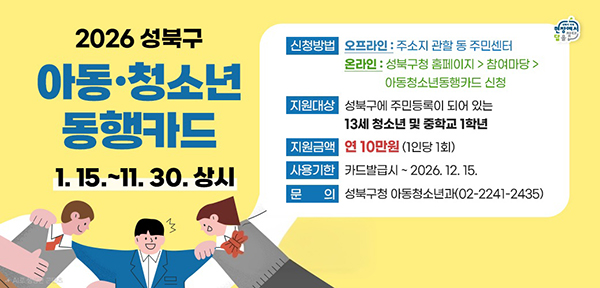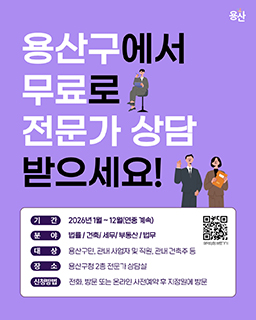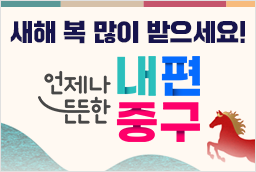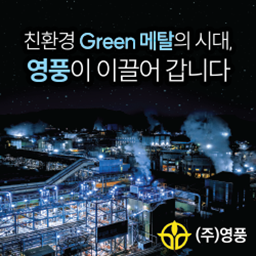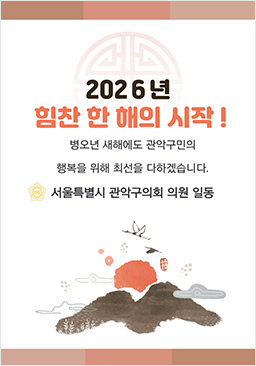(문화경제 = 이한성 옛길 답사가)
매월당은 이제 도미협(渡迷峽: 팔당나루)을 출발하여 강릉, 양양을 향하여 길머리를 동쪽으로 잡는다. 왼쪽으로는 예봉산, 오른쪽으로는 검단산이 우뚝하고 두 산 사이 좁은 골짜기로 한강 물은 세차게 흘러내렸다. 이 예봉산 기슭 가파른 강가 길을 도미천(渡迷遷: 도미 벼랑길)이라 불렀다. 지금은 예봉산으로 불리고 그 끝 조그만 봉우리를 예빈산(禮賓山)이라 부르지만, 조선 시대에는 예봉산이라는 이름은 없었고 이곳 산을 모두 예빈산이라 불렀다. 이 산이 바로 궁중에서 빈객 접대를 담당했던 부서인 예빈시(禮賓寺)에 땔나무를 공급하는 산이었기에 그런 이름을 얻었다. 이 산과 검단산 사이 협곡을 막아 팔당댐을 완공하였다. 물살이 빨랐던 상류는 수량이 풍부하고 잔잔한 호수가 되었다.
매월당은 동쪽으로 나아간다. 양평(양근, 지평) 지나고 원주, 진부, 대관령 넘어 강릉, 평해로 가는 평해로(平海路, 관동대로) 길이다. 우리 시대에는 6번 국도인 경강국도(京江國道)가 이 길 위에 개설되고, 곁으로는 중앙선 철로가 개설되었다가 지평까지 전철화되면서 중앙선 옛 철길은 국도 순환 자전거 길이 되었다.

팔당댐을 지나 예빈산 등산로 입구에 닿으면서 천주교 묘지를 만난다. 그 곁으로는 능내리 봉안(奉安)마을이다. 가나안 농군학교를 일으켰던 김용기 선생이 1930년대 일제강점기에 협동 마을인 봉안이상촌을 세우고 농민의 자립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던 곳이다. 조선 시대에는 말도 먹이고 숙식도 제공 받던 봉안역(奉安驛)이 있었다. 덕소 평구역에서 길을 떠나 비로소 쉬어 갈 수 있었던 반가운 역이 있던 마을이었다. 지금은 강에서 거리가 좀 있는 곳에 마을이 형성되었지만 팔당댐이 생기기 전까지 조선시대 내내 봉안마을은 강가에 있던 마을이었다. 봉안역은 세종실록지리지에도 기록되어 있으니 매월당이 이 길을 지날 때에도 있었다. 아쉽게도 매월당의 기록은 전해지는 것이 없다.
능 없는데 왜 능내리?
동국여지승람에는 양촌 권근이 읊은 시가 실려 있고 택당 이식이 봉안역에 머물면서 읊은 시도 전한다. 그는 젊었을 때 지나갔던 봉안역에 다시 들러 앞 강에 배를 대고 옛날을 회상한다. “희망을 읊었던 자리에 돌아와(向來吟望地) 희끗한 백발로 외로운 배 대는구나(衰白艤孤舟)”라 했다. 이제는 택당이 들렸던 강가 봉안마을도, 봉안역도 모두 기억 속에만 남았다. 봉안마을을 지나면 폐역이 된 옛 중앙선의 작은 역 능내역을 만난다.

그 앞으로는 옛 철길을 이용한 자전거 길이 직선으로 뻗어 있다. 그런데 여기가 조안면 능내리(陵內里)인데 누구의 능(陵)이 있기에 능내리가 되었을까? 답은 능내리 길가에서 바라보이는 큰 무덤에 있다. 옛사람들은 왕가의 무덤이 아니더라도 큰 무덤은 능(陵)이라 불렀던 듯하다. 능안마을, 능골, 능내…. 이런 마을 이름이 있는 곳에는 큰 무덤이 있다.
능내리의 큰 무덤은 연산군의 할머니 인수대비의 아버지인 한확(韓確)의 것이다. 그는 이미 명나라 영락제의 후궁이 된 누이를 둔 데다가 막내딸을 세조의 큰아들 의경세자에게 시집보냄으로써 강력한 외척이 되어 있었다. 1456년에 생을 마감해 이곳에 묻혔으니 매월당이 이곳을 지나간 1460년 봄에는 매월당도 그의 묘를 보며 지나갔을 것이다. 세조가 싫어 떠다니는 매월당이 세조의 사돈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으로서 마주친 곳이 능내리인 셈이다. 물론 그때에는 아직 능내리라는 지명은 없었겠지만….
능내리 지나 길을 재촉하면 후세에 실학자로 이름을 날린 다산 정약용의 마을 마재마을이 있다. 1925년 을축년 대홍수로 떠내려간 집을 다시 지은 다산의 집 여유당도 있다. 매월당이 이 길을 지날 때는 고개 넘어 강가 마을만 있었을 것이다. 이윽고 매월당은 두 개의 강이 만나는 강가에 선다. 이수두(二水頭: 두물머리)가 바라보이는 강가다. 우리 시대에는 이곳에 네 개의 다리가 놓여 있다. 상류부터 보자면,
첫 번째 다리는 중앙선 다리로 전철이 개통하면서 새로 놓은 다리다. 전철만 다니고 사람과 차량은 건널 수 없다.
두 번째 다리는 예전 중앙선 철로 길이다. 이제는 전국을 잇는 자전거 다리로 변신하였다. 이른바 남한강 자전거 길이다. 물론 걷는 이들도 쾌적하게 걸을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자동차는 통행금지다.
세 번째 다리가 예부터 차량과 사람이 건널 수 있게 한 양수교인데 예전과 변함없이 노선버스도 다니고 일반 차량도 다니고 인도로는 사람도 다닌다.
네 번째 다리는 신양수대교다. 막히고 막히던 6번 경강국도를 개선해 양수리를 거치지 않고 양평에서 서울로 가는 두물머리 위로 놓은 자동차 전용 다리다. 사람은 건널 수 없다.
양근(양평이란 지명은 양근과 지평을 합친 지명)으로 가려면 강을 건너야 했는데 나루는 두 곳이 있었다. 오던 길에서 바로 나루를 건너면 두물머리(양수리 마을)로 가게 되고, 북한강변을 따라 1킬로쯤 올라가 조안면 진중리(鎭中里), 송촌리 용진(龍津)나루를 건너 양서면 골용진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었다. 이 길이 관동대로의 주 통로였다.

세조와 수종사
전철 운길산역을 나와 길을 건너 좌측으로 향하면 강가 습지와 풀 우거진 넓은 공한지를 가꾸어 ‘물의 정원’이라는 보기 드물게 아름다운 수변공원이 조성돼 있다. 북한강변에 자리 잡은 넓고 넓은 공원이다. 강 이 편은 남양주 조안면 진중리, 송촌리이고 저 편은 양평 양서면 양수리 골용진이다.
송촌리 진중리 뒷산은 운길산이다. 세조가 하룻밤 머물다가 떨어지는 석간수 소리를 종소리로 듣고 이름이 바뀌었다는 수종사(水鐘寺)가 있다. 이 길을 지나는 많은 이들이 들르고 시 한 수 읊었는데 매월당의 기록은 없다. 세조가 못마땅해서였을까?

운길산을 내려오면 송촌리 사제(莎堤)마을이다. 후세에 한음 이덕형이 은퇴 후 낙향하여 살던 곳이다. 한음은 연로하신 부친과 자신의 은퇴 후 한거(閑居)할 곳으로 이곳에 별서(시골 집)를 지어 대아당(大雅堂)이라 명명했다. 서실은 하루하루를 아낀다는 뜻으로 애일(愛日), 마루는 진일(眞佚: 진정 편안하다), 두 정자는 이로당(怡老亭: 기쁘게 맞는 노년), 읍수정(挹秀亭: 좋은 경치를 끌어당기다)이라 이름 붙였다. 이때 심었을 은행나무 두 그루는 별서 터 마당을 채우고 있다. 여러 벗들이 다녀갔으며 그 가운데 노계(蘆溪) 박인로(朴仁老)는 이곳을 읊은 가사 사제곡(莎堤曲)을 남겼다. 정승과 6품 무관의 사귐도 새롭게 다가온다.
“漢水東흐로訪水尋山야龍津江디내올나莎堤안도라드니第一江山이임업시려다(한강물 동쪽 땅으로 물과 산을 찾았는데 용진강 지나 올라 사제 안 돌아드니 제일 강산이 임자 없이 버려졌네).” 아마도 용진나루 강둑에는 사초(莎草)가 가득했던 모양이다.

그 옛날 매월당은 이 나루를 건너 양평 땅으로 향했다.
용진 나루를 건너며
맑은 강 아득히 푸른 못 같이 흐르고
그 가운데 흰 갈매기 나처럼 한가하네
푸른 물결에 들며 나며 마음 둠 없는데
나루에서 그냥 듣는, 물 가운데 배 키 소리
새소리 목이 메어 짝짝이 지저귀고
어슴푸레 나를 좇아 돛단배를 넘나드네
사공도 역시나 벽류풍을 싫어해
귀 가리는 털모자에 끈 늘어뜨렸네
호연하게 물 가운데 뱃노래 한 곡 뽑는데
강가의 봄꽃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세상 버리고 동으로 서로 떠돌 때부터
가슴 속 기개는 많이 우뚝했지
결국 세상일은 틀에 매어 있는 것인데
강 멀리 푸른 봉에는 천만 송이 꽃이라
渡龍津
澄江淼淼碧潭沱. 中有白鷗閑似我. 出沒淸波無个心. 慣聽渡口中流柁. 咬咬嘎嘎兩兩鳴. 恍然逐我凌風舸. 篙工亦憎擘柳風. 耳掩毛冠纓下嚲. 浩然中流發棹歌. 江上春花何婀娜. 自從遺世西復東. 胸中氣槩多磊砢. 畢竟底物爲保伍. 江外碧峯千萬朶.
교교 咬咬: 새소리
애애 嘎嘎: 목이 메다, 울어 목이 쉬다
벽류풍 擘柳風: 버드나무 가지를 꺾을 듯 봄에 부는 센 바람
아나 婀娜: 예쁘고 단아함
뇌라 磊砢: 장대한 모양, 돌이 쌓인 형상
보오 保伍: 조선 시대 5가구를 묶어 협력하고 공동 책임을 지도록 한 조직 관리 방법

매월당이 강을 건너던 용진나루에는 앞산 부용산에도, 지나온 운길산에도, 강가에도 봄꽃이 가득했다. 그는 그 모양을 천만 떨기(千萬朶)라고 했으니 얼마나 봄꽃이 가득했겠는가.
그런데 궁금한 점은 매월당은 왜 직선 길인 두물머리를 건너지 않고 위로 올라와 용진으로 건넜을까? 우리 시대에는 팔당댐이 물을 막아 두 강이 모두 넓고 넓은 호수가 되었지만 댐이 없던 그 옛날에는 강폭이나 강물의 깊이가 달랐다. 두물머리는 북한강(산수: 汕水, 또는 용진강)과 남한강(습수: 濕水, 월계강)이 합수하여 강폭이 넓고 깊었으며 또한 퇴적층 삼각주이다 보니 물길을 두 번 건너야 하는 지형이다. 반면 용진은 강폭이 좁았고 갈수기에는 배를 타지 않고도 건널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러다 보니 임진란 때에는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가 이끄는 왜군이 충주, 여주, 양근을 거쳐 용진나루를 건너 동대문으로 진격했다. 관동대로를 더럽힌 것이다. 이후 용진나루에는 군영이 설치되었고 지금의 ‘물의 정원’ 넓은 땅은 군사들이 자급할 수 있는 둔전(屯田)이 운영되었다.
다시 매월당의 발길을 따라가보자. 강 건너 양근 땅 골용진으로 넘어 온 매월당은 강을 따라 지금의 양수역 앞 동네 용담리 기두원 마을로 내려왔을 것이다. 이곳이 우리 시대에 6번 국도를 따라 양평 시내로 가는 길이다. 연꽃 마을 세미원이 있다. 돌아보면 양수리에서 신원리까지 가는 남한강변 길인데, 가파른 산길에 간신히 비비고 만든 신작로길 6번 경강국도가 보인다. 예전에 눈이라고 조금 오거나 안개라도 끼면 차들은 벌벌 기고 때로는 신문 기사에 ‘시외버스, 남한강 추락’ 같은 기사가 나면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길이다. 설악산에라도 가려면 전날 밤 마장동 여인숙에서 쪽잠 자다가 새벽 4시에 뛰어 나와 먼지 풀풀 날리던 시외버스로 지나가던 길이었다. 이제는 신양수대교가 강 위를 고가다리로 달리고, 기차는 전철이 되어 터널 속을 쌩쌩 달린다. 우리가 젊었을 때 그랬는데 매월당 시절에는 어땠을까? 1460년으로 시간여행을 떠나 보자.
월계협에서
동풍에 산골짜기 길은 험하고
이슬비는 배꽃에 내리네
강가 산은 창처럼 뾰죽하고
바윗가 나무들 이빨처럼 자리했네
인가는 맑은 물 곁에 있고
맑은 모래에는 말 발자국
잔도 길은 언제 끝날까?
푸른 봉우리 해는 곧 지고 말 것인데
月溪峽
東風峽路惡. 小雨落梨花. 江上山如戟. 巖邊樹似牙. 人家依淥水. 馬跡印晴沙. 棧道何時盡. 蒼峯日政斜.
길은 험악하고, 마치 창끝 같고 이빨 같다 하였으니 매월당 시절에는 더 힘든 길이었던 것 같다. 해는 지는데 잔도 길이 얼마나 멀게 느껴졌으면 ‘이 잔도는 언제 끝나느냐(棧道何時盡)’ 했을까? 매월당은 잔도(棧道)라고 표현했지만 가파른 산기슭을 가로지르는 길을 신라(新羅)의 표현으로는 천(遷: 벼리 길. 표준어로 벼랑 길)이라 했고 이 지역 산을 낀 벼리 길은 주로 천(遷)으로 표현된다. 겸재 정선의 그림 중에는 빙천부신(氷遷負薪)이라는 그림이 있다. 언 벼리 길에 한 남자가 나무를 지게에 지고 가는 그림이다. 매월당이 지난 벼리 길은 높이 366m의 나지막한 흙산 부용산(芙蓉山)에 만들어졌다. 임진란 때 용진으로 몰려 오는 고니시 유키나가 왜군을 막고자 했던 성터 흔적이 남아 있다. 트레킹 나서기도 편한 산인데 이 산의 동쪽과 남쪽 경사면은 절벽에 가깝고 바위도 많아 옛부터 양근으로 가는 어려운 길목이었다.
이 부용산 벼리 길을 돌아 나서면 언제나 봄볕처럼 따스한 햇볕 속에 자리 잡은 신원1리에 닿는다. 여기부터 길은 넓어지고 평탄하다. 앞쪽으로는 기차역 신원역이 있다. 앞쪽 강은 조선시대 큰 나루 월계나루(月溪津)였다. 정선 아루라지에서 내려오는 뗏목이 머물러 가는 곳이었고, 남한강을 오르내리는 배들이 쉬어가는 곳이기도 했다. 자연히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하니 월계원(月溪院)도 설치되고 개인이 장사하는 점(店: 가게)도 열렸다. 매월당도 다 저녁에 월계나루에 도착했으니 어느 점(店)에선가 한 끼 밥에 술 한 잔 하지 않았을까? 아쉽게도 기록은 없다. 더구나 번성했었을 월계나루의 흔적은 이제는 정말로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 팔당댐으로 인해 나루는 잠겼고 6번 국도와 철길이 길을 막아 신원리와 강은 분리되었다.
다행히 이곳에서 살던 이들의 이야기가 남아 있다. 대대로 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살던 함양 여씨(呂氏)에 관한 것이다. 그 중 한 사람은 신원역 뒷마을에서 나서 여러 활동을 한 몽양 여운형이다. 생각을 달리 하는 세력에게 암살당했는데 그의 생가에는 기념관이 세워져 있다.
편안한 신원리의 편안한 ‘노비 시인’
또 한 꼭지. 조선 후기 이곳에 살았던 여씨와 그의 노비. 졸고 ‘겸재 그림 길’에서 인용한다.
“그는 헌적(軒適) 여춘영(呂春永)이다. 생소한 이름이다. 그러나 나무꾼 시인 정초부를 떠올리면 그가 누구인지 짐작이 간다. 여춘영은 월계나루에 사는, 시 잘 쓰고 새로운 생각에 깨우쳐 있던 젊은 선비였다. 어느 날 자신이 지은 시를 되뇌이고 있는 늙은 노비를 보게 된다. 그는 정 씨 성 가진 노비였다. 여춘영은 그 노비가 한시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시재(詩才)가 출중한 노비는 이윽고 제 구실을 하는 시인으로 성장했고 주위에 이름이 알려진다. 여춘영은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그를 자유인으로 살게 한다. 노비는 나무꾼이 되었다. 부용산 기슭에서 나무를 해서 동대문 밖에 내다 팔아 생계를 이었다. 이 사람이 나무꾼 시인 정초부(鄭樵夫)다. 그의 시 한 수 읽자.

江上樵夫屋
강가 나무꾼 집이라오
元非逆旅家
본시는 길손 맞는 집이 아닙지요
欲知我名姓
내 이름을 알고저 하면
歸問廣陵花
광릉 꽃에게 물으시지요
그의 시재가 알려지자 여러 사람이 찾아왔던 것 같다. 양반들이야 호기심 반 궁금증 반으로 찾아왔겠지만 한 끼 밥거리가 없는 그에게는 다 호사스러운 이야기였을 것이다. 가난에 찌들게 살던 그는 76세 되던 해 1798년 세상을 하직했다. 여춘영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조문하였다.
黃庐亦樵否
저승에서도 나무 하시오?
霜葉雨空汀
단풍은 비 되어 텅 빈 물가 내린다오
三韓多氏族
삼한(三韓) 땅에 좋은 가문 많으니
來世托寧馨
내세(來世)에는 이런 곳에 태어나시게
이제 신원리에는 정초부 지겟길도 만들고 그의 초당도 재현해 놓았다. 대표적인 시들도 판에 세워 잊지 않게 했으니 그의 내세(來世)는 우리 시대가 된 셈이다. 시대를 넘어 매월당과 정초부가 이곳 월계에서 만나 한 잔 기울이며 시 한 수를 나누는 봄 꿈을 꾸어 보아야겠다.










 제791호
제79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