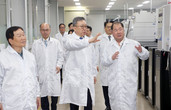“다양한 몸을 환대하는 방법” 국립현대미술관 '기울인 몸들: 서로의 취약함이 만날 때'
서로 다른 모습의 너와 내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방법에 관한 예술적 실험.... 접근성 확대 위한 미술관의 새로운 실천
 안용호⁄ 2025.05.16 17:03:14
안용호⁄ 2025.05.16 17:03:14

국제박물관협회(ICOM)는 2022년 개정된 박물관의 정의에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 이용하기 쉽고 포용적이어서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을 촉진한다”는 과제를 포함한 바 있다. 이는 박물관•미술관이 건강한 몸뿐만 아니라 장애가 있는 몸, 나이 든 몸, 아픈 몸 등 다양한 몸을 맞이하는 공공의 장소로서 변화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이와 같은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고자 서로 다른 몸을 환대하고 그 만남의 방식을 실험하는 전시를 마련했다.

5월 16일부터 7월 20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리는 《기울인 몸들: 서로의 취약함이 만날 때》는 장애, 노년, 질병 등 신체의 다양성을 살펴보고 표옹하는 작가들의 질문과 실천이다. 전시는 ‘기울인 몸들’, ‘살피는 우리’, ‘다른 몸과 마주보기’라는 3개 주제로 취약한 몸에 대한 통념에 저항하는 작품과 함께 서로 다른 몸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제안한다. 국내외 작가 15인(팀)의 회화, 조각, 사진, 건축, 퍼포먼스 등 40여 점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는 몸의 다양함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서로 다른 몸을 살피는 일이 결국 공공의 이익으로 돌아옴을 보여준다.
전시실 초입에 들어서면 먼저 대화형 음성 해설 장비가 눈에 띈다. 사전에 이 전시실을 방문한 시각 장애인 과 비시각 장애인 함께 만나 함께 작품을 경험한 과정을 담고 있다. 이주연 학예연구사는 “그림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렇게 팔을 벌릴 정도의 크기입니다 라고 설명해 줍니다. 여러 가지 손이 그려져 있는데 손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나요 라고 물으면 손의 모양을 설명해줍니다. 결국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그림의 의미를 함께 찾아가는 과정을 담고 있어요”라고 설명했다.

대화형 음성 해설을 제공하고 있는 김 크리스틴 선의 회화 ‘일상의 수어’는 수어 사용자로서 작가 본인의 경험을 직접 담은 작품이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수어를 그린 아주 소박한 드로잉인데, 두 가지 그림을 통해 한쪽에서는 수어를 말하는 사람의 시선이 보이고 다른 쪽에서는 수어를 듣는 사람의 시선이 그려져 어떤 주체적인 관점을 드러낸다. 또한 작가는 소통을 어떻게 시각화할 것인지를 고민한다.

아픈 몸과 장애가 있는 몸에 주목하는 판테하 아바레시의 작품 ‘닫힌 시스템’은 몸이 서로 다른 약물에 기대게 되는 상태를 표현한 모형 작품이다. 집들을 연결한 관을 통해 빨간색과 파란 물이 움직인다. 각 기둥에는 약물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고통의 경험을 시각화한 조각이다. 옆의 ‘사물 욕망’과 ‘(약해짐이) 쓸모 있도록’은 두 다리가 묶인 채 성적 자세을 하는 다리 보조기의 모습으로 몸이 묶인 것 같은 장애인의 상황을 표현한다.


장애의 손으로 특별한 기구를 사용해 아이라인을 그리는 여성과 조금씩 변형된 물건들도 전시되어 있다. 사라 헨드렌은 디자인을 연구하고, 케이트린 린치는 인간의 연사를 연구한다. 두 사람은 심장마비로 다리와 손가락을 잃은 신디 와카 가르니의 이야기를 전한다. 신디는 로봇 손을 쓰는 대신, 쉬운 기술로 혼자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건을 만든다. 자신을 위해 만든 물건을 보여주는 작품을 통해 누구든 필요한 물건을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어야 하며 사소한 변화로도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조영주 작가는 여성의 삶을 연구하는 작가로 이번에는 특별히 여성적인 기관 두 가지 기관 자궁과 유방이라는 두 가지 기관을 바탕으로 이제 작업을 진행했다. 그녀의 영상은 총 7가지의 장면으로 되어 있는데 아이들과 이 기관의 건강과 돌봄의 중요성에 관해 이야기하는 장면을 담고 있다.

천경우 작가는 9명 9쌍의 노년기 여성들, 총 18명과 함께 협업해 작품을 만들었다. 서로를 초대해 만든 사진 작품 ‘의지하거나 의지되거나’는 나이 든 사람이라는 것이 항상 돌봄의 대상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도 누군가를 돌봐주고 서로 기대고 지탱해서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함께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리처드 도허티는 손과 표정, 몸짓으로 말하는 수어를 사용하는 건축가다. 이번 전시가 열리는 국립현대미술관 밖 입구에는 ‘농인공간: 입을 맞추는 의자’가 설치되어 있다. 서로 마주 보고 앉아 수어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다. 의자로 인해 비장애인들은 옆으로 나 있는 경사로를 따라 미술관으로 들어간다. ‘농인공간’이 비장애인들에게 장애의 체험을 하도록 도와주는 셈이다.

데이비드 기슨, 브랫 스나이더, 아이린 챙 ‘블록 파티: 자립생활에서 장애 공동체에 이르기까지’는 장애 공동체라는 생소한 개념을 모형으로 보여준다. 3개의 집을 연결하고 두 집이 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등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김은설 작가의 ‘흐려지는 소리, 남겨진 소리’는 어울려 살아가기 위한 사람들의 몸짓과 언어를 상상한다. 뿌연 유리 박스 안의 사람 얼굴은 뭔가 이야기하는 듯하지만 우리에겐 들리지 않는다. 농인은 아니지만 청각 장애가 있는 김 작가는 “소리가 인식은 되지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청각장애인용 앱을 사용하면 자막으로 나오는데 오탈자도 있고 딜레이가 되기도 하죠. 간격이 생기면서 마치 언어가 점점 흐려지는 느낌을 받죠. 이번 작품은 관람객들이 청각장애인 몸 안에 남겨진 감각이 어떤 것인지 느낄 수 있도록 기획했어요”라고 설명했다.

싱가포르 작가 알레시아 네오의 ‘땅과 하늘 사이’는 영상으로 정신 질환이 있는 사람을 돌보는 이들의 경험을 담았다. 이 작업은 정신 질환이 있는 가족을 돌봤던 작가의 개인사와도 연결되어 있다. 알레시아 네오는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는 이들의 정신적, 육체적 무게를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랫동안 알아 왔던 사람이 뿌리째 변화한 모습을 보는 고통을 보며 돌봄을 제공하는 이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라고 말했다.
3, 4전시실을 둘러보고 밖으로 나오면 말 그대로 잠시 멈춰 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푹신한 소파에 몸을 ‘기대어’ 잠시 쉬어가도 좋다.

로비에는 윤상은 작가의 퍼포먼스 ‘메타발레’를 볼 수 있는 특별한 무대가 마련되어 있다. 윤상은 작가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자유로운 발레를 시도한다. 그녀는 훈련과 경쟁이 아닌 서로 돌보는 발레를 꿈꾼다. 윤 작가는 “시각장애인 분들을 만나 그분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발레는 뭘까 질문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책자로 만들어봤어요. 발레의 동작과 아름다움을 어휘로 표현한 거죠”라고 말했다. 윤상은 작가의 워크숍 ‘어딘가의 발레’는 격주 수, 일요일에 열린다. 작가는 바닥에서 10cm 높여 만든 무대에서 쉬어 가도 좋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에는 다양한 접근성 장치도 시도된다. 휠체어 사용자의 동선을 고려한 공간 조성을 비롯, 시각장애인의 자율적인 관람을 돕는 점자블록, 발달장애인을 포함 모두를 위한 ‘쉬운 글’전시설명 벽글,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관객들을 위한 대화형 음성해설 등이다. 전시 도록은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웹(web) 형식으로 만들어 사용자에 따라 큰 글자, 음성지원, 어두운 화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열람할 수 있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
- 관련태그
- 국립현대미술관 기울인 몸들: 서로의 취약함이 만날 때 김성희 리처드 도허티 김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