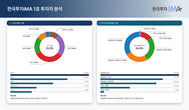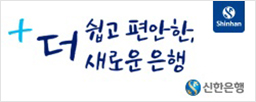‘훈맹정음(訓盲正音)’이라고 알까 모르겠다. ‘훈민정음’의 오기(誤記)가 아니다.
박두성(朴斗星) 선생. 1888년 인천 강화군에서 태어났다. 그곳 보창학교에서 신교육을 받고 서울 한성사범학교에서 수학한 후, 어의동보통학교(지금의 서울효제초등학교)에서 교직자로 첫발을 내디뎠다. 1911년 보창학교의 설립자이자 독립운동가 이동휘(李東揮)로부터 ‘암자의 소나무처럼 절개를 굽히지 말라’는 의미의 ‘송암(松庵)’이라는 아호를 받았다. 그리곤 남이 하지 않는 일에 평생을 바치기로 맘먹는다.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총독부 내 장애인 교육기관 제생원(濟生院)의 맹아부에 교사로 발령받았다. 그렇게 맹(盲)교육의 첫발을 들였다. 하지만 점자(點字) 교과서 하나 없는 암담한 현실. 우여곡절 끝 일본에서 점자 인쇄기를 들여왔다. 1913년, 비록 일본어이긴 해도 우리나라 최초의 점자 교과서를 냈다. 192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한글 점자 연구에 몰두했다. 마침내 1926년 11월 4일, 한글 점자를 만들어냈다. 이른바 ‘훈맹정음’이다.

박두성 선생은 점자책들을 전국의 시각장애인에게 보냈다. 교육용 점자책으론 무지(無知)에서 벗어나도록 했고, 소설 점자책으론 세상에 눈뜨게 했다. 그러면서 “비록 눈은 못 봐도 배우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자”고 외쳤다.
“너희들이 눈은 비록 어두우나 마음까지 우울해선 안 된다. 몸은 비록 모자라도 명랑(明朗)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배워야 한다. 안 배우면 마음조차 암흑이 될 테니 배워야 한다.”
그가 살았던 인천 율목동 집에는 선생을 만나기 위해 혹은 점자책을 읽기 위해 찾아오는 시각장애인이 많았다. 그의 집 대문에는 커다란 태극무늬가 그려져 있었다. 선생의 집을 찾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태극무늬 집을 물어 쉽게 찾도록 한 것이다.
박두성 선생은 1963년 8월 25일 76세를 일기로 숨을 거뒀다. 그 순간에도 “점자책을 쌓아놓지 말고 책꽂이에 꽂아두라”는 말을 잊지 않았던 그다.
11월 4일은 ‘점자의 날’이다. 시각장애인의 세종대왕으로 불리는 박두성 선생이 한글 점자를 만들어 반포했던 바로 그 날이다.
동화를 낭독해 오디오북으로 만들다
읽는다는 건 행복한 일이다. 늘 읽을 수 있으니 행복한 줄 모를 뿐이다.
시각장애인은 보지 못한다. 해서 손끝으로 읽는다. 방식의 차이다. 눈으로 읽고 생각하거나 손끝으로 읽고 생각하거나. 어쩜 그들이 접하는 책 속 세상이 더 크고 더 넓고 더 멀지도 모르겠다.

코웨이의 ESG 경영 중 하나가 유독 빛난다. 독서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이다. 방법이 독특하다. 참여를 자처한 임직원들이 목소리를 기부한다. 책이나 활자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책 내용을 음성으로 전달해, 독서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자는 것이다.
임직원들은 주로 동화(童話)를 낭독한다. 이를 위해 전문 성우로부터 발성이라든지 목소리 훈련을 받는다. 그러곤 각 배역에 따라 스튜디오에서 녹음한다. 시대에 맞게 집에서 스스로 녹음한 후 음성 파일만 제출하는 온라인 참여 방식도 병행하는 중인데, 이 경우 더 많은 임직원이 동참할 수 있다.
그렇게 녹음하고 취합한 음성은 전문가의 편집 작업을 거쳐 시각장애인이나 다문화 가정의 아동에게 오디오북과 음성 자료로 전달한다. 코웨이는 2023년부터 이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올해로 3회째다.
코웨이는 관계자는 “임직원들의 따뜻한 목소리가 독서 취약계층에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와 소통하며 교육·문화 격차 해소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책 읽기는 혼자서도 언제든 어디서든 할 수 있다. 그래서 좋다. 쾌청한 날 길거리 벤치에서, 커피콩 볶은 냄새에 이끌려 들어간 카페에서, 덜컹덜컹 흔들리는 버스에서, 그냥 읽기만 하면 그뿐이다. 내가 있는 세상과 책 속 세상이 묘하게 맞물리며 나는 또 한 뼘만큼 생각의 키가 커진다.
하긴, 이 늦은 가을, 어디 책만 읽기 좋을까. 무얼 해도 행복한 때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
- 관련태그
- 코웨이 시각장애인 동화 낭독 박두성 훈맹정음










 제807호
제8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