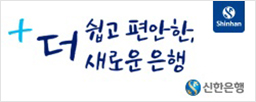“ ▲임지민, '닫아진 손 연작'. 종이에 목탄, 24 x 32cm. 2016.
아기의 애도: 아기는 생후 8개월이 되면 엄마가 자신을 떠날 때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해 불안감을 가지게 된다. ‘아기의 애도’는 자기가 독립되어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생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내’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과 다르다는 사실은 참을 수 없는 슬픔이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 - 아기의 애도’ 중
이 글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아기는 18개월 이후가 지나서야 엄마와의 일시적인 이별을 범상한 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고 한다. 과연 일시적인 이별을 범상한 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은 이전 시기의 불안감으로부터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일까?
‘애도’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지만, 심리학적으로는 모든 의미 있는 상실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을 일컫는다고 한다. 아기의 애도는 엄마가 전부이던 세상의 상실로부터 비롯되는 한편, 엄마보다 더 넓어진 범위의 세상은 18개월이 지난 후에도 반복적으로 상실되고 있는 듯하다.

▲임지민, '두 개의 다른 생각(Two different thought)'. 캔버스에 오일, 80.3 x 116.8cm. 2015.
감정이 왜곡한 형상
액자 없이 벽에 붙은 캔버스 천 위에는 인물의 부분 모습이 클로즈-업 되며 스쳐가는 카메라 앵글을 포착한 듯 펼쳐져 있다. 앙 다문 입술, 경직된 턱, 갈 곳 잃은 손들은 부드럽지만 의뭉스럽게 흑백의 오일 파스텔로 표현된 것들이다.
작업의 시작은 갑작스럽게 닥친 아버지의 부재와 함께 한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이전에도 그림은 그리고 있었지만, 이런 인물화는 아니었다. 아버지가 그리워 들춘 가족 앨범에는 아버지의 시점에서 바라본 세상이 남아 있었다. 그래서 그냥 그 사진들을 그리기 시작했다. 아버지 역시 그림을 그리셨단다. 작가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는 것 밖에 없었다”며, “슬픔에 잠겨 있기보다는 슬픔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사진을 보면서 그에겐 묘한 감정이 들곤 했다. 사진 속의 세상에 있던 사람들은 현재 존재하지 않고, 그 사람들 역시 현재의 상황을 몰랐을 것이다. 아무런 의도 없이 그리던 사진 속의 인물들이 언젠가부터 조금씩 비율이 왜곡돼 낯설어 보이기 시작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은 분명 실력의 서투름이 아니라 감정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임지민, '오래된 드레스(The old dress)'. 캔버스에 오일, 25 x 32.5cm. 2015.
다시 돌아온 아기=나
시간이 지나면 감정이란 사그라지기 마련이다. 슬픔이 조금씩 무뎌지자 머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왜 이것(사진)을 그리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가?’ ‘왜 이 사진을 그리고 싶었나?’ 작가는 그림과 사진을 보며, 자신이 주목하는 게 무엇인지 찾았다. 깨달은 것은, 세상을 보는 자신의 어린 시절 시선이었다. 어린 시절의 임지민은 엄마의 턱 밑, 엄마를 찾을 때마다 먼저 찾게 되던 손, 그리고 어깨의 긴장 상태에 따라 미묘하게 달라지는 목 근처 옷깃의 형태를 보곤 했다. 그리고 낯설고 불편한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정면을 바라볼 수 없었다.
어른이 되어 다시 돌아온 아이의 시선은 일종의 퇴행처럼 보이는 동시에, 태어나면서부터 있었던 것 같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을 상기시킨다. 작가는 “왜곡된 형태들이 맘에 들었고, 딱히 편안해 보이는 작품들을 좋아하진 않는 것 같다”며, “치유라기보다는 불안함을 찾아가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자신 작업 행위에 대한 정의를 언뜻 내려 본다.

▲임지민, '연하고 굳어진 것들 02'. 캔버스에 오일파스텔, 63.5 x 155cm. 2016.
나의 애도에서 당신의 애도로
조금씩 사그라지는 강렬했던 감정과 함께 임지민의 그림은 인물의 전제 모습에서 부분으로, 강렬한 색채에서 흑백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행동을 즉각 반영할 수 있는 오일 파스텔로 재료를 바꿔 즉흥적으로 생기는 감정이 빨리 집중적으로 표현될 수 있게 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유화를 그리면 잘하고 싶은 욕심에 긴장되고 몸이 경직되곤 했기 때문이다.
또한, 가족 앨범에서 수집한 과거 사진뿐 아니라 타인의 과거 사진도 그리기 시작했다. 재미있는 사실은 사진 안에서 어른의 모습일수록 더욱 손 모양과 턱 주변, 어깨 등이 경직되어 보인다는 것. 아이들의 단체 사진을 그린 것과 어른들의 단체 사진을 그린 것을 나란히 놓고 보면 그 차이가 확연히 보인다. 작가는 무성 흑백 영화에서 스토리 전달에 큰 역할을 하는 배우의 몸짓처럼, 그림 속 인물들의 손 모양을 통해 사진 속 세상, 그리고 현실의 세상과 공감을 찾고 있다.
임지민은 “작품을 모으면 모을수록 슬픔이 커진다는 생각이 든다”고 이야기했다. 그 말은 각 인물의 감정이 담긴 몸짓들을 모아 한꺼번에 보일 때, 전달되는 감정의 힘이 더 강해진다는 의미일 터. 그는 작품의 제목에, 경직된 표정의 어른들에게도 조금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 아이들에게도 ‘연한’이라는 형용사를 붙였다. 모든 사람은 약한 존재라는 생각 때문이다.

▲임지민, '연하고 무른 것들 02'. 캔버스에 오일파스텔, 42 x 179cm. 2015.

▲임지민, '연하고 굳어진 것들 01'. 캔버스에 오일파스텔, 109 x 176cm. 2015.
잊혔을 손모양은 지나쳐버린 감정
작가 임지민의 작품은 애도의 감정에서 비롯됐다. 애도는 고통스러운 것이 지배적인 감정이란다. 그가 그림을 그린 것이 고통에서 빠져나오기 위했던 것인지, 아니면 더욱 침잠하기 위해서인지는 어느 누구도 정의할 수도, 정의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작가가 개인적 감정으로부터 외부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작업은 아버지의 부재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나가고 흘러가버린 것들에 대한 애도의 행위가 됐다.
그는 애도에 대해 “생각하지 싶지 않아도 계속 떠오르는 것, 옆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고, 없어졌지만 인정은 잘 안 되는 상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일생을 거쳐 상실을 경험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어느 순간 뼈에 사무치게 그리운 순간 혹은 사람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순간이 되어서야 감정에 젖어들곤 한다. 임지민의 작품은 어느 시간대에 존재했던 사람의 잊혔을 손 모양을 통해 ‘사실은 우리의 삶 전체가 애도의 시간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만든다.

▲임지민, '굳게 다문 입과 무겁게 닫은 눈 그리고 닫아진 손‘. 종이에 목탄, 24 x 32cm(각각). 2015-2016.

▲임지민 작가.(사진=임지민 작가)
- 관련태그
- CNB 씨앤비 시앤비 CNB뉴스 씨앤비뉴스










 제488호
제48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