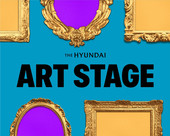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다. 공천·불공천, 1번·2번, 공천룰 논란은 차치하고 가장 심각한 게 재정문제다. 전국 244개 지자체 빚은 27조원, 지방 공기업 부채까지 합치면 100조원에 달한다. 재정자립도 50% 미만 지자체가 216곳에 이른다. 중앙정부가 부족한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상당수가 부도날 판이다. 그럼에도 6월 4일 지방선거는 치러진다.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다. 공천·불공천, 1번·2번, 공천룰 논란은 차치하고 가장 심각한 게 재정문제다. 전국 244개 지자체 빚은 27조원, 지방 공기업 부채까지 합치면 100조원에 달한다. 재정자립도 50% 미만 지자체가 216곳에 이른다. 중앙정부가 부족한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상당수가 부도날 판이다. 그럼에도 6월 4일 지방선거는 치러진다.
지자체가 흥청망청 이벤트를 벌이고 지방채 발행을 늘리면 중앙정부는 지불을 보장해준다. 그래서 항상 감당 못할 선거공약이 남발한다. 세금을 허투루 쓰면서도 주민에게 큰 짐을 지우게 되는 걸 모른다. 세금은 주민의 혈세다.
용인도시공사 부도위기, 지방 공기업 첫 사례
경전철 건설에 1조원을 쏟아 부어 논란을 빚은 경기도 용인시의 용인도시공사가 부도위기에 몰렸다. 4월 24일까지 갚아야 할 공사채가 200억원이다. 채권을 갚지 못하면 지방 공기업 중 부도나는 첫 사례가 된다. 상환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20번째로 가진 택지 공개입찰이 무산됐다. 경전철 채무부담으로 용인시도 지급 여력이 없다.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선 ‘지자체 파산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 재정이 파산 난 지자체에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우는 거다. 국회가 적극 나설 때다.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권한을 축소하고 구조조정을 실시해 재정을 건전하게 회생시켜야 한다. 방만 인력과 사업을 축소해 비정상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기업의 구조조정 사례에서 배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미국은 1930년부터 지자체 파산제를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500곳이 파산선고를 받았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홋카이도 유바라시는 2006년 관광산업에 투자했다가 파산한 대표적인 경우다. 공무원과 지방의원을 절반 이상 줄였다. 복지정책도 대부분 수정했지만 아직도 파산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순기능도 있지만 민선 지방자치의 역기능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대부분 지역봉사에 눈멀고 사심(邪心)이 앞섰기 때문이다. 지자체장과 기초광역의원은 주민의 행복을 위해 봉사하는 게 최우선이다. 지방선거는 입신영달을 위한 비즈니스가 아니다. 그들은 기업에서 경영마인드를 배워야 한다. 기업이 들어가 지역이 사는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
“지방선거 출마, 비즈니스 차원으로 봐선 곤란”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지원은 기업과 지역의 대표적 상생 모델이다. SK하이닉스는 충북 음성의 충북반도체고를 지원한다. 세계유일의 반도체 마이스터 학교다. 맞춤형 교육을 받고 기업에 취업하고 자녀가 다시 그 학교를 지원하는 선순환이 이뤄진다. 현대제철이 지원하는 충남 당진 합덕제철고와 두산인프라코어가 지원하는 전북 군산기계공고도 마찬가지다.
기업이 오면 일자리가 늘고 소득이 향상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기업으로 지역경제가 살아나면 교육과 문화로 혜택이 확산돼 지역 전체가 한 단계 도약한다. 삼성전자 반도체라인이 들어선 경기도 화성의 지역내총생산 증가율은 12%로 국내 최고다. 이 지역 삼성전자 협력사 고용인원은 1만명, 매출은 1조원에 달한다.
전남 광주의 경제엔진은 기아자동차다. 지역 제조업 매출에서 자동차관련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40%에 육박한다. 지역 전체 매출 29조원 중 자동차 관련 127개사가 차지하는 매출이 11조로 39.3%다. 경북 포항지역 제조업 40%가 포스코와 직간접으로 연결돼 있다. 포항인구 15%가 포스코와 관련이 있다. 6만명 어촌이 52만의 산업도시로 탈바꿈했다.
장재홍 한국지역정책학회장(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기업과 도시의 상생관계가 사회를 발전시킨다”고 말했다. 지자체는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타기에 혈안이 될 게 아니라, 지역을 먹여 살릴 콘텐츠를 계발해야 한다. 그런 사람이 지방선거에 나설 자격이 있다. 공직출마를 쉽게 여기는 사람들(이진지인 易進之人)이 명심할 일이다.
- 김경훈 편집인 겸 편집국장
- 관련태그
- CNB 씨앤비 시앤비 CNB뉴스 씨앤비뉴스










 제374호
제37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