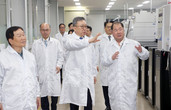제92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이 다가오면서 한국 영화 ‘기생충’(봉준호 감독/영어 제목 ‘Parasite’)의 수상 여부로 로스앤젤레스 현지와 국내에서도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시상식은 2월 9일(일) 저녁(한국시간 10일 오전)에 이루어지며, TV조선에 의해 생방송된다고 한다.

오스카상 6개 부문 오른 ‘기생충’
‘기생충’은 한국 영화사 최초로 최종 심사에 진출했을 뿐만 아니라, 비영어권 작품에게 수여하는 ‘국제극영화상’ 부문뿐만 아니라, 주요 영역인 작품상/감독상/각본상/편집상/미술상 등을 포괄하여 총 6개 부문에서 다른 작품들과 오스카 상을 놓고 경쟁을 펼치고 있다.
최고 영예라고 할 작품상 부문의 다른 경쟁작들로는 ‘1917', ‘아이리시맨', ‘작은 아씨들', ‘조커', ‘결혼 이야기', ‘조조 래빗', ‘포드 대 페라리',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가 있다. 최종 심사는 미국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 회원 8400명의 투표에 의해 결정되며, 이들 중에는 한국 영화인도 40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기생충’이 북미 최고이자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는 오스카상의 주요 부문에서도 저명한 감독의 영화들과 당당히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국내 영화계를 적잖이 흥분시키고 있고, 문화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사실, 오스카 상은 이때까지 대부분 미국 영화들을 대상으로 주어지는 것이었고, 특히 비영어권 영화들은 ‘외국어 영화상’(‘국제 극영화 상’으로 개명됨)에 참여-수상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기생충’이 아카데미의 메인 영역 5개 부문에 뛰어들어 대등하게 경쟁하고 있다는 것부터 이미 대단한 일이다. 그러면, ‘기생충’은 과연 오스카 상을 받을 수 있을까? 받는다면 어떤 부문에서 받을까?

높은 작품상 장벽 … 외국 작품은 전례 없어
‘기생충’은 작년 5월 칸느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 처음으로 최고상(그랑 프리)을 수상한 이후 현 시점까지 유럽과 북중미-호주의 여러 영화제에서도 수상하며 화려한 행진을 해오고 있다. 미국에선 지난 가을 LA 지역을 포함한 여러 극장에서 개봉된 이후 많은 관객들이 오고 있고, 현재 1000여 개 극장에서 상영되며 대박 중의 대박이 되고 있다(오스카 상 후보에 오르려면 미국 내 극장 상영은 필수다).
영화가 칸느에서 수상했어도, 유럽식 작가 영화가 아니라 미국식 장르 영화(가족 드라마와 미스터리 스릴러) 형태를 취해 흥미 요소도 다분하므로, 미국 등지에서 대중적인 성공도 충분히 예견될 수 있었다.
더욱이 ‘기생충’은 금년 1월 초 LA에서 오스카상의 시금석으로 간주되는 골든글로브(Golden Globe) 상에서 한국 영화 최초로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다. 이어서 2월 초에는 미국에서 분야별 영화인 단체인 작가조합과 미술감독조합에서 수여하는 ‘각본상’과 현대극 부문 ‘미술상’을 수상하여 기세를 올리며 오스카 상에 대한 기대를 한껏 부풀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오스카라고 말해진다.
미국에서 큰 인기 얻은 이유
최근 LA 현지 언론(‘LA Times' 등)의 비평가들도 ‘기생충’이 국제 극영화 상에 가장 근접해있다고 하며, 가장 강력한 다크호스로서 최고 영예인 작품상 부문에서도 ‘1917'과 경쟁하고, 각본상은 ‘결혼 이야기' 등과 경쟁하고 있다고 했다.
필자도 국제영화제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적 있는 영화 비평가로서 추측해본다면, ‘기생충’은 국제극영화상과 더불어 각본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한다. ‘기생충’의 잘 짜인 대본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문제는 작품상과 감독상인데, 필자는 ‘기생충’ 외에 작품상 부문의 여덟 작품들을 아직 볼 수 없었기에 말할 수 없을 뿐이다. 또한, ‘기생충’이 높은 장벽을 넘어 선전하고 있지만 좀 냉정하게 볼 때, 그동안 91년 오스카상 역사에서 비영어권 영화가 작품상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점을 상기해보자. 그만큼 오스카상은 미국 영화를 위한 것이었다. 또, 감독상 후보들로는 샘 멘데스, 마틴 스코르세지, 토드 필립스 등이 버티고 있는 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무래도 좋을 것 같다. ‘기생충’이 단 하나의 오스카를 들고 온다 해도, 그것은 이미 대략 115년 한국 영화사에 획기적인 기록을 남기는 것이고, 가까운 시일 내에 이를 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 때문에 최근 국내 언론 매체 문화면에서 ‘기생충’과 오스카에 대해 자주 언급하는 것도 당연하며, 더구나 칸느에 이어 미국에서의 이런 상은 ‘한국 문화의 국제적 인정’이라고 여겨질 수 있기에, 폭넓은 문화계의 관심도 당연하다.

작품 이야기
하지만 아울러 비평적인 견해도 있었으면 한다. 분명 ‘기생충’은 좋은 드라마(well-made play)처럼 촘촘히 구성된 대본에 근거하여 매순간 적절한 촬영(camera work)과 유머가 있으면서도 긴장감 넘치는(특히 후반부) 극 진행을 보여준다. 영화는 한국 사회의 빈부 격차 문제를 다루는 듯한 가족 드라마에서 시작하여 봉준호 감독이 좋아하고 잘 하는 미스터리 스릴러(‘살인의 추억', ‘괴물'처럼)로 빠져들고, 후반부에서는 고급 주택의 깊은 지하실 속에 갇힌 남자가 돌발변수로 작용하며 빈부 갈등은 복수가 내포된 액션 영화로 반전시킨다.
그러나 이런 내용의 빈부 갈등과 복수극은 단순하다. 물론, 감독은 비유적으로 묘사하며 한국 사회의 모습을 희화하고 조롱하면서 영화는 다수 관객에게 공감과 쾌감마저 일으킬 수 있다. 실례로, 지나친 학벌 위주 풍조를 풍자하는 학력 위조 장면(극 중 송강호 가족의 자녀들)은 작년 8월 이후 터진 조국 사태를 미리 말해준 듯도 하다. 이런 측면이 외국 관객들에게도 전달될지는 모르겠지만, 감독은 한국 사회의 일면을 예리하게 풍자하고 있다.
그럼에도, 단합된 빈자들이 감행하는 경박하고 역겨운 부자들에 대한 처참한 복수 활극에는 다양한 삶의 모습과 인생철학이 들어있지는 않아 보인다. 감독의 다른 영화 ‘설국열차'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부자-빈자의 갈등과 대립은 영화 초기 ‘편협함'(1916), ‘메트로폴리스'(1927) 이래 종종 영화화되었으니, 이젠 다른 형태와 깊이의 작품이 필요하다고 필자는 본다. 이 점은 봉준호 감독의 미래 영화들에서 기대해보고 싶다.

- 관련태그
- CNB 씨앤비 시앤비 CNB뉴스 씨앤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