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 기록을 전달받아 읽으면서 “오잉?” 하고 눈동자가 크게 떠지는 문구가 있었다. 바로 “이제 한 달이 지나면 각국의 1년 성적표가 나올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2020년’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남은 한 달,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에 총력을 다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도전에 더욱 힘을 실어야겠습니다”라는 부분이었다.
이제 한 달만 지나면, 글자 모양이 아름다운 2020년이 저문다. 그런데, 마스크를 쓰고, 옆 사람과 거리를 떼려고 최대한 몸을 움츠리며, 500명을 넘나드는 확진자 보도를 보고 있으려면, “정말 지긋지긋한 2020년”이란 생각이 수시로 드는데, 대통령은 ‘위대한 2020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니 다른 세상의 언어를 듣는 듯한 착각도 잠시 들었다.
그러나 되돌려보면, “대통령처럼 생각하는 것도 가능하겠구나”라는 짐작도 든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2020년만큼 그야말로 국위를 선양한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아니, ‘국위 선양’이라는 말 자체는 너무 촌스럽고 옛날스럽다. 국위선양이라는 개념이 국위(國威: 나라의 위신 또는 위세)를 널리 떨친다는 뜻으로, 그 안에는 ‘국위가 낮은 나라가 어쩌다 한 번 타국 사람들이 주목하도록 위세를 떨친다’는 속뜻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은 나라 출신’이라는 한국인의 자의식은, 그간 일부 보수언론들이 끊임없이 세뇌시킨 결과였다. 그러한 열등감은 특히 미국과 일본에 대해 강했었다. 그러나 작년 7월부터 올해까지 이어진 일본의 반도체 원자재 수출금지에 대한 저항과 극복을 통해, 그리고 올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펼쳐진 일본과 미국의 한심한 대응을 목격하면서 일본에 대한 열등감은 거의 완전히 해소된 것 같고, 미국에 대해서도 “미국도 그냥 하나의 나라일 뿐이군”으로 보는 시각으로까지 발전했다.

“작은 나라 출신”이었던 한국인들
스스로를 ‘작은 나라의 사람’이라고 여기는 한국인들은 그간 “외국에 나가면 자기도 모르게 애국자가 된다”는 식으로, 거의 항상 나라 체면을 먼저 생각하는 행동 태도를 보여왔다. 나라 체면 또는 국위를 먼저 생각하다 보니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에 가면 주눅이 들면서 행동거지를 조심하되, 우리보다 국위가 낮다고 생각되는 동남아 같은 나라들에 가서는 조그만 부끄러움도 없이 마구 행동하는 경향도 없지 않았던 게 한국인들이었다.
2000년대 초반 미국 대학에서 필자가 겪은 일이다. ‘외국인을 위한 영어(ESL)’ 수업 시간에는 전세계에서 몰려온 다국적자들이 모여든다. 담당 여강사는 수업 초반에 주제를 준 뒤 수강생들끼리 짝을 지어 영어 대화를 하도록 했다. “원어민도 아닌 외국인끼리 영어 회화를 하면 대체 뭔 도움?”이라는 생각에 불만도 많았으나 어쨌든 낯선 외국인 수강생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꽤 나누었다. 헌데, 학기말쯤에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꽤 사회주의적이었던 남학생이 필자를 지목하며 공격했다. “너는 왜 너 자신에 대한 얘기는 못하고 항상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만 말하냐? 너는 질문도 ‘당신 나라는 어떠냐?’는 것밖에 못 하더라”고. 순간, 정신이 띵했다. 그러고보면 선진국 출신이든 후진국 출신이든 다른 학생들은 대개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하고 있었는데, 필자만 “너는 어느 나라에서 왔냐?” “너희 나라는 어떠냐?”면서 국가주의적 질문에 몰두했음을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만큼 그간 한국인들은 ‘나’에 대해서는 묻지 못하고 ‘우리’에 대해서만 묻고 생각해왔던 전체주의적 국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간 일부 한국인들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라면서 말문을 뗐지만, 다른 나라 사람의 경우 이런 말(영어로 하자면 “as a member of the people of 나라 이름”)을 하는 경우를 거의 듣지 못했다. 물론 한국에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나이 든 사람이나 쓰는 사어(死語)가 돼가고 있다.
‘민족중흥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필자 같은 나이든 전체주의적-국가주의적 사람들이, 요즘에는 점점 더 개인주의화돼 가고 있지만, 문 대통령의 말을 듣고 2020년을 되돌아보자면, “2020년은 개인에게는 지옥 같았지만 대한민국에는 영광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비로소 든다.

고통에 찬 2020년은 대한민국엔 달콤했던 한 해로 기억될 까
성공적인 K-방역 덕에 세계인이 더욱 한국을 바로보게 되었고,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다’라는 말이 과거에는 약간 억지 섞인 ‘국뽕식’(국가와 히로뽕의 합성어. 국가에 대한 자긍심에 지나치게 도취하는 행태를 비꼬는 말) 주장이었으나, 코로나19 이후 세계에서는 한국을 우선적으로 바라보는 세계인의 시선을 한국인들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현실이 되었다.
대통령 말대로 2020년이 (개개인은 대개 괴로웠으나) 나라는 영광스러운 한 해가 될지는 물론 시간이 더 지나봐야 안다. 역사라는 것은 그 ‘안’에서 시간과 함께 흘러가는 인간으로서는 거의 절대로 알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IMF 외환위기 이전의 1995~96년의 ‘흥청망청 돈이 넘쳐나는 경제’를 산 한국인은 곧 나라가 부도나리라는 예상을 전혀 할 수 없었고, 2006~2007년 역시 흥청망청 돈이 넘쳐나는 미국을 산 미국인도 2008년 금융위기가 닥칠 줄은 거의 절대로 몰랐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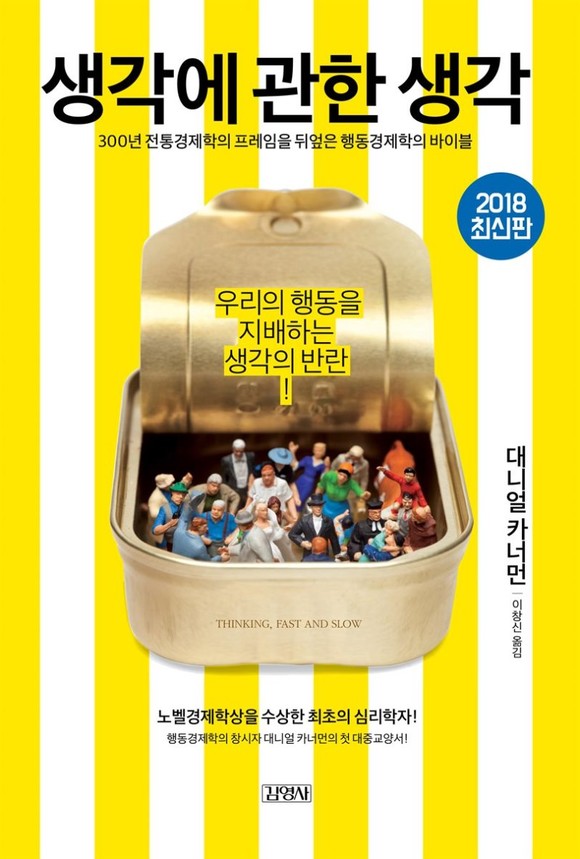
많은 역사서에서 보면, 실제상황에서 그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험과, 역사적으로 의미가 부여된 그때를 되돌아보는 시각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드러난다.
심리학적에서도 ‘경험하는 자아’와 ‘기억하는 자아’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음은 실험을 통해 증명된다(대니얼 카너먼 저 ‘생각에 대한 생각’ 593~595쪽 참조).
2020년을 그 속에서 흘러가면서 그 결을 처절히 경험한 현시대인들과, 그러한 2020년을 미래의 시점에서 자료-기억-역사로서 되돌아볼 우리 후손들의 인식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상황을 새롭게 돌아보도록 해주기도 하는 대통령의 긍정적이면서도, “위기를 대하는 공직자들의 마음가짐부터 더욱 가다듬어야 할 때입니다. (중략)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는 개척 촉구적인 발언이 더욱 든든하게 다가온다.
- 관련태그
- CNB 씨앤비 시앤비 CNB뉴스 씨앤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