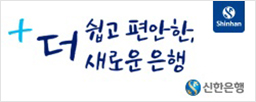[기업 문화향유 공간③] 3家5色서 내 취향을 찾았다, 그렇게 내 공간을 만들겠다
디뮤지엄 10주년 전시 ‘취향가옥: Art in Life, Life in Art’
 제785호 김응구⁄ 2024.12.04 08:15:35
제785호 김응구⁄ 2024.12.04 08:15:35

스위스 태생의 프랑스 건축가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1887~1965)가 이런 말을 했다. “The home should be the treasure chest of living(집은 삶의 보물창고여야 한다).”
전시 이름이 ‘취향가옥’이다. 뒤에는 쌍점(:)이 따라붙었다. ‘Art in Life, Life in Art’, 예술은 인생이고 삶은 예술이다. 뭘 말하고 싶은 걸까.
이 전시를 기획한 디뮤지엄은 집을 두고 “사는 사람의 정체성이자 취향의 집약체”라고 했다. 어려울 것 없다. 취향(趣向)은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방향이다. 그에 맞도록 거주자의 취향대로 집을 꾸미면 그뿐이다.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집은 이제 더이상 사적인 생활 영역이 아니게 됐다. 거주자의 감각과 안목, 더 나아가 디자인을 표현하는 공간으로 확장하고 있다. 집이 곧 예술작품이 되는 시대를 우린 살고 있다.
전시는 디뮤지엄 2층부터 4층까지를 세 개의 집으로 구성했다. 이는 다시 다섯 개 공간으로 구분된다. 재밌는 건, 이 다섯 공간의 주인에겐 ‘페르소나’라는 이름을 붙여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그렇듯 다섯 페르소나의 취향이 응축된 공간들에는 파블로 피카소, 알렉산더 칼더, 김환기, 박서보 같은 거장들의 예술작품부터 장 푸르베, 핀 율 등의 디자인 가구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아티스트 70여 명의 작품 300여 점을 채워 넣었다.
영상감독 아들과 티소믈리에 엄마의 공간

첫 번째 집은 ‘스플릿(split) 하우스’로 이름 지었다. 한마디로 엄마와 아들의 취향이 녹아든 공간이다. 아들은 대중문화에 관심 많은 20대 영상 감독이고, 엄마는 50대의 티소믈리에다.
집 안쪽으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드로잉 작품과 만난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사람들의 인상이나 공간의 분위기를 간결한 흑백 선으로 담아내는 유 나가바(Yu Nagaba·일본)의 작품이다. 순수예술과 디자인의 영역을 넘나들며 인물이나 사물의 특징을 따뜻한 시선으로 포착하는 그는 흑백의 절제되고 단순한 선으로 작품을 표현해낸다.
거실에는 일본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을 그린 듯한 그림 두 개가 한쪽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다. 아오카비 사야(Aokabi Saya·일본)의 작품이다. 그의 소재는 주로 1990년대 일본 애니메이션에 등장할 법한 캐릭터다. 다가가 자세히 보니 그림 하나는 그리다 만 듯하다. 가운데 부분은 스케치만 돼 있고 채색은 하지 않았다. 사야는 초기 아이디어 스케치를 보여주는 연필 단계, 구체적인 모양과 형태를 윤곽선으로 표현하는 검은 페인트 단계, 작품에 색을 입혀 완성하는 단계까지 그림이 완성되는 과정을 총 세 단계로 나눠 보여주고 있다.
시선을 그림 밑으로 떨구니 부드러워 보이는 사각형 소파가 눈에 쏙 들어온다. 이탈리아 디자이너 마리오 벨리니(Mario Bellini)의 작품 ‘카멜레온다 소파(Camaleonda Sofa)’다. 환경에 맞게 색을 바꾸는 동물 카멜레온, 바다나 사막의 파도 모양을 뜻하는 이탈리아어 ‘온다’를 합친 작품명이다. 공간의 환경과 디자인에 맞춰 팔걸이나 등받이를 분리하고 재결합할 수 있는 소파다운 이름이다.

영상 감독 아들의 엄마가 거주하는 공간도 흥미롭다. 티소믈리에답게 티룸과 다이닝룸으로 구분했다. 다이닝룸에는 전통 도자 기업 광주요의 작품들이 가지런히 진열돼 있다. 이곳에선 지나치지 말아야 할 그림이 있다. 박서보. 대표작 ‘묘법(描法)’ 시리즈로 단색화 고유의 특성과 개성을 국내외에 소개하며 한국 현대미술사를 이끈 작가. 그의 묘법은 캔버스에 물감을 바른 후 표면이 마르기 전에 막대기 같은 도구로 선을 긋고, 그 선 위에 다시 색을 칠하는 방식이다. 박서보는 이렇듯 목적 없이 긋고 지우는 방식을 무한 반복하는 행위를 ‘수행(修行)’이라고 불렀다. 그리곤 그 과정에서 자신을 비워야 한다고 믿었다.
30대 부부의 취향 녹아든 테라스엔 햇살 한가득
이제 3층이다. ‘테라스(Terrace) 하우스’라는 이름을 붙였다. 자연과 건강에 관심 많은 30대 부부의 취향이 녹아든 공간이다. 입구인 현관에서 가장 먼저 마주친 건 클로드 비알라(Claude Viallat·프랑스)다. 이 작가의 특징은 작품 캔버스에 나무 틀이 없다. 천이나 커튼, 텐트, 산업용 방수포 같은 다양한 텍스타일 표면 위에 콩이나 구름 모양의 형태를 반복적으로 찍어내 그림을 완성한다. “중요한 건 회화의 주제가 아니라, 색과 재료가 만나서 자연스럽게 새로움을 만드는 창작의 순간이다.” 비알라가 남긴 말이다.
마침 테라스에 햇살이 가득하다. 창밖엔 늦가을 색이 한창이고. 야외용 소파와 의자가 그 빛과 색을 잔뜩 받고 있다. 파트리시아 우르퀴올라(Patricia Urquiola·이탈리아)의 작품이다. 가구 디자인은 물론 건축 디자인까지 다방면으로 활동하며 여러 명품 패션·가구 브랜드와 협업을 이어오고 있다. 여성스럽지만 과감한 디자인이 우르퀴올라의 매력이다.
그 옆엔 ‘닥터 로마넬리’로 불리는 대런 로마넬리(Darren Romanelli·미국)의 소파도 보인다. 이 작가는 수많은 빈티지 의류를 조각조각 잘라내 새로운 형태의 가구들로 재탄생시킨다. 과거에 존재했던 것들을 가져와 새 생명을 불어넣기에 작가는 이 과정을 ‘수술’이라고 부른다. 왜 ‘닥터’로 부르는지 알겠다. 그는 나이키·디즈니, 지드래곤 등 여러 브랜드·아트스트와 협업을 즐기는 아트디렉터이기도 하다. 지드래곤의 애장품 중 하나가 바로 로마넬리의 작품이다.
그런 대런 로마넬리와 서로 영감을 주고받으며 협업하는 작가도 바로 옆에 함께하고 있다. 세라믹 작가인 캔디스 로마넬리다. 맞다. 둘은 부부다. 캔디스는 손으로 도자를 만드는 핸드 빌딩 기법으로 틀에 박히지 않은 자연스러운 형상을 추구한다. 핸드 빌딩은 틀이나 물레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빚는 도자 성형방법이다. ‘손 성형’이라고도 한다. 눈에 띄는 몇몇 꽃무늬 화분은 이번 전시를 위해 만든 작품이다.

차분한 분위기의 다이닝룸에선 서세옥 작가의 그림 두 점이 한눈에 확 감긴다. 수많은 사람이 손에 손을 잡은 듯 연결된 모습이 재밌다. 그의 대표작 ‘사람들’이다. 단순한 선을 통해 간결하고도 함축적인 군중의 형체와 움직임을 표현하고 있다. 다양한 굵기와 농담(濃淡)의 붓 터치가 꽤 인상적이다. 서세옥은 동양화 1세대 작가다. 동양의 전통 미학과 문인화 (文人畵)의 개념에 기초한 독자적인 수묵추상화법을 개척했다. 가장 귀한 존재는 ‘사람’이라는 작가의 철학을 평생에 걸쳐 풀어냈다.
안방에 들어가니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스페인)가 기다리고 있다. 더 무슨 말이 필요할까. 평생의 작품 수가 3만여 점에 이른다. 말년엔 재밌는 실험을 많이 했다. 종이 포장지, 골판지 상자 같은 것들을 이용해 작품화했다. 전시 작품인 ‘포트레 이마지네르’는 작품 활동 말년인 1969년 제작한 판화다. 종이에 유화와 수채물감인 과슈로 수십 점의 초상화를 그렸고, 이를 판화로 제작했다. 잘 보면 골판지의 세로 줄무늬가 눈에 띈다.
침대 머리맡엔 커다란 작품이 걸렸다. 프랭크 스텔라(Frank Stella·미국)다. 미국 추상화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화가이자 조각가 그리고 판화가다. 일생을 회화의 특성에 대해 고민했다. 바다가 출렁이고 파도는 부서진다. 가운데엔 고래도 보이는 듯하다. 허먼 멜빌의 유명한 소설 ‘모비딕(Moby-Dick)’의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작품이다.

남성 갤러리스트 공간엔 칼더·백남준·카예하가 한가득
이제 4층이다. 복층으로 구성된, 말 그대로 ‘듀플렉스(Duplex) 하우스’다. 이 공간은 40대 남성 갤러리스트의 집이다.
움직이는 미술인 ‘키네틱 아트(Kinetic Art)’의 선구자. 움직이는 조각인 ‘모빌(mobile)’의 창시자. 조각가 알렉산더 칼더(Alexander Calder·미국) 얘기다. 이번 전시작은 그가 생전에 큰 애정을 보였던 드로잉과 판화 작업 중 하나다. 작품에 그려진 추상적인 형태는 입체작업을 구현하는 바탕이 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칼더는 화가 피에트 몬드리안(Piet Mondrian·네덜란드)에게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 그의 작업실을 찾아간 칼더는 하얀색 벽과 원색의 도형들이 빛에 교차하는 모습을 보며 “저 도형들이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기하학적인 도형들을 움직이도록 만든 조각이 바로 모빌이 됐다.
거실로 향하기 전, 동굴 같은 길쭉한 공간 하나를 발견했다. 한쪽 벽면에 크고 작은 조각품들이 늘어서 있다. 사람 같기도, 동물 같기도 한 모양. 이 작품들은 스케이트보드 데크를 재활용해 만들었다. 겹겹이 쌓인 나무 층과 조화로운 색상들이 고스란히 보이는 게 특징이다. 일본 작가 하로시(Haroshi)의 작품들이다. 보드를 쌓고 자르고 깎아서 형태를 만들고, 여기에 색을 칠하고 광택을 낸다. 스트리트 문화로 대표되는 스케이트보딩과 일본의 장인정신이 혼합된 그런 작품이다.
바로 옆, 사람 얼굴처럼 보이는 텔레비전 하나에 눈길이 쏠린다. 눈치 빠른 관람객이라면 바로 백남준과 연결 짓는다. 작품명은 ‘본 어게인’. 작가는 생전 텔레비전과 생방송을 매개로 사람들과 소통하고자 여러 시도를 했다. 이 작품 역시 마찬가지. 원래는 안테나가 있었다. 이 작품이 놓이는 장소와 시간에 따라 근방의 전파를 잡아 공중파 방송을 송출했다. 허나, 이 같은 방식의 아날로그 방송은 2012년 전 세계적으로 종료됐다. 이에 지금은 화면 조정 이미지만 볼 수 있다.
개인적으론 이번 전시의 하이라이트라고 표현하고픈 게 이 공간 거실이다. 커다란 눈망울에 더벅머리 모습의 아이 얼굴 다섯 개가 크기 순으로 바닥에 쌓여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고 나이대도 가늠되지 않는다. 순수하고 호기심 넘쳐 보인다는 정도. 하비에르 카예하(Javier Calleja·스페인)의 시그니처 캐릭터다. 작가는 관객이 작품을 바라보며 자신만의 감정과 해석을 통해 이야기를 완성하는 과정까지가 자신의 의도라고 밝히고 있다. 거실 안쪽엔 카예하의 회화 작품부터 캐릭터가 그려지는 과정을 담은 드로잉도 볼 수 있다. 작가에게 상상력과 영감을 주는 동물인 고양이를 표현한 ‘미스터 귄터’ 시리즈도 마련돼 있다. 사실 카예하는 고양이 네 마리와 함께 살 정도로 이 동물을 굉장히 사랑한다.

2층으로 올라가니 팝아트의 선구자 케이이치 타나아미(Keiichi Tanaami·일본)의 그림이 거의 벽 한 면을 채우고 있다. 화려한 그림만 보고 젊은 작가가 아닐까 생각하지만, 사실 타나아미는 2차 세계대전을 직접 겪은 당사자다. 도쿄 대공습 당시 아홉 살이었던 작가는 가족과 함께 산으로 도망쳤던 기억,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었던 경험을 작품 속에 풀어낸다. 특히, 투병 시절 경험했던 환각은 작품 속 기이한 표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대림미술관은 케이이치 타나아미의 대규모 특별전 ‘Keiichi Tanaami: I’M THE ORIGIN’을 12월 14일부터 열고 있다. 작가 생애 전반에 걸쳐 제작한 작품 700여 점을 만날 수 있다. 내년 6월 29일까지.
디뮤지엄서 내년 5월 18일까지 전시
‘취향가옥: Art in Life, Life in Art’는 세계적인 아티스트 70여 명의 마스터피스와 디자인 가구 컬렉션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아트·디자인 전시다. 대림문화재단이 2006년부터 전개해온 컬렉션 시리즈의 계보를 잇는 기획 전시이기도 하다. 특히나 디뮤지엄 개관 1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여서 더 특별하게 다가온다. 내년 5월 18일까지 문을 열어놓는다.
난 내 취향을 알고 있긴 할까? 안다면, 내 공간은 어떻게 꾸밀까. 어떤 그림을 벽에 걸고 어떤 가구를 내 눈 가까이 둘까. 어쩜 내가 그린 그림을 걸 수 있고, 내가 만든 의자를 곁에 둘 수도 있겠다. 생각만으로도 즐겁다. 흥겹다. 웃음이 생긴다. 그 상상이 현실이 되는 순간, 적어도 그 방은 나만의 ‘취향가옥’이고, 난 누구 못잖은 아티스트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
- 관련태그
- 디뮤지엄 취향가옥 박서보 백남준 케이이치 타나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