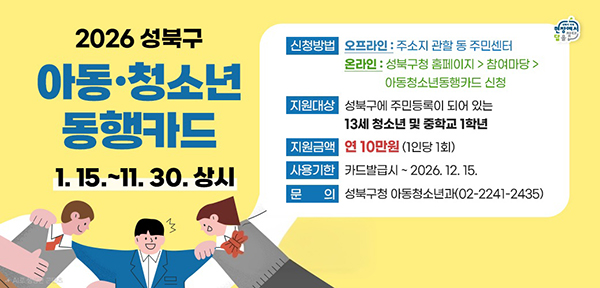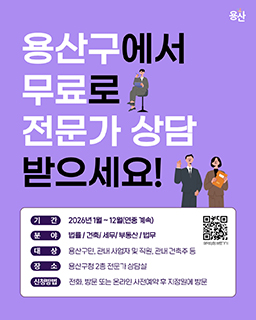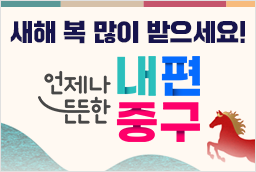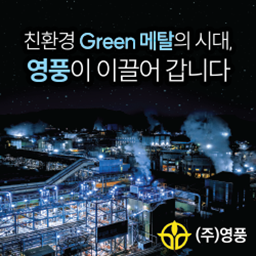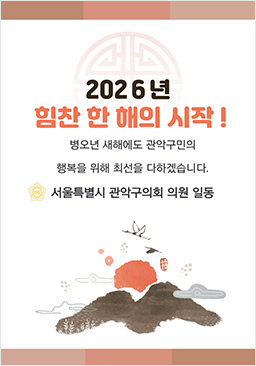(문화경제 = 이한성 옛길 답사가)
봄은 언제나 그렇듯이, 떠돌아다니는 26세 매월당에게도 1460년(세조 6년) 봄은 흐드러지게 찾아왔다. 월계역(양평 신원리)을 떠나 매월당은 현재 6번 국도가 된 관동대로를 따라 동쪽으로 나아갔다. 남한강은 봄기운을 가득 담고 있었을 것인데 작은 개울 복포천을 건너면 요즈음의 지명으로 국수리가 되고, 이어 한티고개가 길을 막는다. 이 고개를 넘으면 이르는 곳이 전철 기준 아신역이고 이윽고 중미산에서 발원한 신복천을 따라 오르면 옥천냉면으로 이름을 얻은 옥천면 소재지에 이른다. 바로 양근(楊根: 양평은 양근과 지평이 합친 지명)의 읍치(邑治)가 있었던 구읍(舊邑)이다. 매월당은 이곳에 들러 지친 발걸음을 쉬었을 텐데 아쉽게도 시(詩) 한 수 전해지지 않는다.
다시 길을 잡아 나아가면 오빈리(娛賓里)에 닿는다. 옛 관동대로에는 오빈역(娛賓驛, 梧濱驛)이 있었다. 이제는 6번 국도와 경의중앙선 오빈역과는 거리를 두고 있는데 매월당은 6번 국도 옆 덕구실 마을을 지나갔을 것이다. 이윽고 도착한 곳은 양평읍 시내가 된 양근리일 것이다. 그는 여기에서 용문산(龍門山)으로 향했다. 용문산은 산줄기가 갈라놓는 계곡을 중심으로 세 구역으로 나뉜다. 제일 서쪽은 장군봉, 백운봉의 서쪽인 옥천면 용천리 지역으로 사나사(舍那寺)가 자리잡고 있다. 가운데는 장군봉, 백운봉 동쪽인 용문면 연수리에 상원사(上院寺)가 자리 잡았고, 동쪽으로는 용문면 신점리에 자리잡은 용문사(龍門寺)가 있다.
지금 남아 있는 매월당의 시(詩)를 보면 서쪽 사나사의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오래지 않은 시기에 입적한 태고 보우(太古 普愚)의 승탑과 탑비가 있고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던 사나사를 들렀다는 기록은 없다. 후세에 다승(茶僧) 초의(草衣)는 용문산의 위 세 곳을 들러 주옥같은 시편들을 남겼다.

큰 사찰이었던 보리갑사
이제 매월당의 시편들을 따라간다. 그는 양근에서 용문으로 와서 연수리에서 흘러내리는 연수천을 따라 용문산으로 들어갔다. 그때는 이 지역이 지평현(砥平縣)에 속했다. 용문산으로 발길을 옮겨 기슭에 닿으면 제일 먼저 만나는 절이 대찰(大刹) 보리(갑)사였다. 지금은 흔적 없이 사라졌다. 보리(갑)사는 어떤 절이었을까? 보리사지(菩提寺址)를 찾아간다. 그곳은 연수리 계곡 입구로 광활한 빈터에 선운사라는 근래의 절이 자리 잡고 있다.
광활한 절 터가 보여주듯 보리사는 나말 여초(羅末 麗初) 이 지역 대찰이었다. 태종실록에 의하면 전국에 자복사(資福寺)라 하여 기도 드리는 절을 정했었는데 이를 명찰(名刹)로 대신하도록 하였다. 지평현(砥平縣)의 명찰은 보리(갑)사(菩提(岬)寺)였다. 용문사가 아니라 보리사가 선정된 것은 이 시대까지만 해도 보리사가 용문사만큼 큰 절이었기 때문인 모양이다.
보리사 터에서 만난 선운사 스님은 보리사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신다. 1910년대 일제(日帝)에 의한 토지조사사업(土地調査事業) 때 방치되어 있던 보리사지는 대부분 이 지역 어떤 사람이 자신의 토지로 점유하여 절터를 찾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절 터에 서 있던 승탑(부도)(僧塔: 대경대사 승탑으로 추정)과 대경대사탑비(大鏡大師塔碑)도 관리하는 이가 없자 서울로 반출되었다는 것이다.

승탑(부도)은 1913년 반출되어 남산 일본인 집 마당 조경물로 쓰이다가 이화여대 총장 사택으로 옮겨졌다는 것이다.(보물 351호)
또한 문화재청 자료에 의하면 대경대사탑비(보물 361호)는 1914년 경복궁으로 옮겨졌다고 한다. 지금은 국립박물관 뜰에 세워져 있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고려국 미지산 보리사 고교시대경국사 현기지탑 비명병서(高麗國 彌智山 菩提寺 故敎諡大鏡國師 玄機之塔 碑銘幷書). 대경국사의 일대기가 기록되어 있다. 매월당집에는 이곳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지만 어느 절에선가 용문산을 바라보며 읊은 시가 있다. 다음 행선지가 상원사인 것을 보면 아마도 보리(갑)사였을 것 같다.
용문산
용문산 산색은 능선마다 푸르르고
찬 이내 속 절집은 몇 층이나 되는고
나이 든 학 제홀로 달 뜬 솔 고개에 깃들고
맑은 샘 차게 맴도는 곳 범은 골짜기 등나무에
종소리에 노승은 일찍이 깊이 돌아보고
신어(神魚)*는 벌써 튀어 올라 물결 그림자 지네
나는 바람 타고 산 넘고 싶은데
흰 구름 쌓인 속에 푸른 행전만 허비했네
*神魚: 漢書 宣帝紀(한서 선제기)의 상서로운 물고기
龍門山
龍門山色碧稜稜. 寺在寒煙第幾層. 老鶴獨棲松嶺月. 淸泉閑澆虎溪藤. 鍾聲老杜曾深省. 波影神魚已上騰. 我欲駕風凌絶頂. 白雲堆裏費靑縢*.
*縢(등): 묶다, 봉하다/ 노끈, 띠/ 가장자리/ 주머니, 행전
용문산 능선에 시시각각 찾아오는 푸르름을 보면서 매월당은 바람 타고 정상를 넘어가고 싶어 한다(我欲駕風凌絶頂). 그는 과연 용문산 정상에 올랐을까?
푸른 행전만 허비했다(費靑縢) 한 것을 보면 아마도 오르다 그만둔 것 같다. 용문산은 어떤 산이길래 그랬을까? 용문산은 고도가 1157m나 되는 경기도의 준봉으로 백두대간 오대산에서 힘찬 산줄기가 서쪽으로 가지를 펼쳐 내려오면서 계방산과 운무산, 대학산, 오음산, 갈기산을 지나 용문산에 도착한다. 이윽고 청계산 지나 두물머리로 산 기운을 전하는 한강기맥(漢江岐脈)의 주요 거점 산이다. 용문산에 대한 옛 기록은 남인의 영수 미수 허목(眉叟 許穆)의 미지산기(彌智山記)에 잘 기록되어 있다.
“미지산은 서울에서 동쪽으로 150리 지점에 있다. 미지산 정상은 가섭봉(伽葉峰)이며 가섭봉 북쪽이 미원(迷源)과 소설(小雪)이다(현 가평 설악면). 그 북쪽은 옛 맥(貊) 땅으로 지금의 수춘(壽春)과 화산(花山) 지역인데, 산수가 가장 깊다. 가섭봉 아래에는 묘덕암(妙德庵)과 윤필암(潤筆庵)이 있고, 윤필암 아래에는 죽장암(竹杖庵)이 있다. 죽장암 남쪽에는 상원사(上元寺)가 있는데, 옛날에 혜장대왕(惠莊大王, 세조)이 이 절에 거둥하여 도량(道場)을 중건하고 이 일을 그림으로 그리게 했는데 태학사 최항(崔恒)으로 하여금 이를 시행케 했다.

상원사 아래에 묘적암(妙寂庵)이 있는데, 묘적암 아래에는 고려 때 보리사의 탑비(菩提塔碑)가 있다. 용문사는 미지산에서 가장 큰 가람(伽藍)이다. 혜장대왕 때 용문사에서 범종을 대대적으로 주조하였는데 불사(佛事)가 매우 엄숙하였으며, 왕이 백팔불주(百八佛珠)를 하사하여 삼보(三寶)로 보관하고 있다. 용문사 아래에는 용문은자(龍門隱者: 명종 때 이곳에 은거한 조욱/趙昱)의 사당(祠堂)이 있다.
彌智山京城東百五十里. 彌智絶頂伽葉. 伽葉北迷源,小雪. 又其北古貊地. 今壽春花山. 山水最深. 迦葉下妙德,潤筆. 潤筆下竹杖. 竹杖南上元. 古時惠莊大王幸上元作逆釐道場. 仍圖畫其事. 令大學士恒識之. 其下妙寂. 妙寂下有高麗普提塔碑. 龍門最大伽藍. 惠莊時. 大鑄佛鐘於龍門. 佛事甚嚴. 賜佛珠百八. 藏三寶. 龍門下有龍門隱者祠
미지산이라는 이름은 용문산의 다른 이름인데 지금은 사라진 절들도 많았다.
다음으로 매월당의 발길이 닿은 곳은 상원사(上院寺)였다. 보리사 터에서 3km 상류에 있다. 지금도 이곳에 가면 그윽함과 아늑함이 느껴진다. 600년 전 매월당은 어떤 느낌이었을까?
상원사
옛 전각 향 연기에 어우러졌는데
삼문에는 빗장이 열려 있구나
빈 뜰에 참새는 짹짹거리고
바위는 오래되니 이끼 가득하네
아름다운 나무는 햇빛 받아 컸고
반도(蟠桃: 납작 복숭아)는 봄날 절로 피었네
담담히 바깥세상과 엮인 것 없으니
고운 경치는 天台(천태)*를 닮았구나
*天台; 절강성 천태현에 있는 대(臺). 한나라 유신과 완조가 이 산에서 두 여인을 만나 놀다 오니 벌써 10대가 지났다 함
上院寺
古殿香煙合. 三門獸鑰開. 庭空喧鳥雀. 巖老櫬莓苔. 琪樹日應長. 蟠桃春自開. 淡然無外累. 雅境似天台.
매월당의 시처럼 필자가 간 날에도 복사꽃이 흐드러지게 절로 피어 있었다(春自開). 봉은본말사지에 따르면 상원사도 보리갑사, 용문사와 같이 신라 말 창건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웅전 축대 아래에는 절의 내력을 적은 안내판 옆에 목판인쇄 그림을 옮겨 놓은 작은 그림 판이 서 있다. 그림을 곰곰이 살펴보니 첩첩산중에 절이 자리하고 절 위 하늘에는 관세음보살이 화현(化現)해 계신다. 이것이 무슨 그림일까? 조선 초 문신 최항(崔恒)의 글에 관음현상기(觀音現相記)라는 목판본 책이 있다. 그 책 속에 새겨 있는 그림이다. 내력은 이렇다.
“임금(세조)께서 상원사에 거둥할 때에 관음보살이 현상(現相)하는 이상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백관들이 전(箋)을 올려 경하 드리니, 교서를 내려 극악무도한 죄를 범한 외에는 모두 용서하도록 하였다.(上幸上元寺, 時有觀音現相之異, 百官進箋陳賀, 下敎赦謀反大逆、謀反、子孫謀殺歐罵祖父母·父母、妻妾謀殺夫、奴婢謀殺主、謀故殺人、但犯軍令·盜强外罪)”
아이러니하게도 운수납자 매월당이 다녀간 얼마 뒤 세조는 상원사에 들렀고 이때 신비스럽게도 하늘에 흰 구름이 관세음보살처럼 나타났다는 것이다.

세조는 이때의 일을 최항으로 하여금 글과 그림으로 기록하게 했던 것이다. 세종대(代)에는 임금이 편찮으셔서 용문산 신께 기도를 올렸는데 그즈음 형님 효령대군이 종을 주조하여 상원사에 시납(施納)했다. 그 종은 지금 어찌 되었을까? 이처럼 비록 규모는 작았으나 상원사는 왕실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절이었다.
절 뒤 골짜기로 오르면 약 500m 지점, 즉 골짜기가 Y자 형태로 갈라지는 지점에 옛 절 터가 있다. 주위에는 산죽(山竹)이 가득하다. 옛 기록 여러 곳에 남아 있는 죽장암(竹杖菴) 터로 여겨지는 곳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 골짜기 물이 상원사 식수로 사용되다 보니 아쉽게도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
동국여지승람에는 이색이 쓴 죽장암중수기(竹杖菴重修記)가 전해진다. 옛날 이 절에 도를 깨달은 사람이 있어 “군왕에게서 대(大)지팡이를 하사받았기 때문에, 죽장(竹杖)으로 편액(扁額)하였다”는 절의 연원이 기록되어 있다.
깨달은 이가 누구인지, 군왕은 누구인지는 전해지지 않는다. 죽장암이 산속 깊이 있어 매월당도 저녁 무렵 숲길로 올라왔다. 그는 이곳에서 얼마나 쉬어 갔을까? “다니는 곳 다 내 집이려니(逍遙卽我家)” 하면서.
죽장암
높고 낮은 돌길 빗겨 있는데
산마루 깊은 곳 절 하나 있네
저녁 햇살 높은 나무 비추고
샛바람은 들꽃에 불어오는군
계곡 물은 명주처럼 환하고
등 넝쿨은 뱀처럼 구불구불하네
예(禮) 올리려 명산 두루 다니니
다니는 길이 곧 내 집이려니
竹長菴
高低石徑斜. 岑寂有僧家. 晚日照高樹. 東風吹野花. 溪流明似練. 藤蔓曲如蛇. 參禮名山遍. 逍遙卽我家.
이 골짜기에는 또 하나 유서 깊은 절이 있었다. Y자로 갈라지는 좌측 계곡을 따라 1.5km 오르면 용문산 정상과 장군봉을 잇는 능선 아래 계곡 옆으로 윤필암(潤筆庵) 터가 있다. 동문선에는 이색이 지은 윤필암기가 전해진다.
(내용은 생략함. 졸고 ‘옛절터 가는 길’ 용문산 편 참조. CNB 문화경제)
매월당은 이제 용문산의 터주대감 격인 대찰 용문사로 향한다. 필자는 상원사 입구에서 산허리를 끼고 이어지는 최고의 숨은 트레킹 길로 용문사를 향해 가지만, 매월당 시절에도 이 길이 있었을까? 아니면 아랫마을 연수리로 내려가 고개를 넘어 용문사로 갔을 것이다. 매월당이 도착한 용문사는 역시나 봄날 복사꽃이 흐드러져 있었다(桃花浪躍時).
용문사
노승은 절집에 계시고
복사꽃은 흐드러지게 피었구나
대웅전은 향 사위 가득하고
산방(山房)에는 느지막 풍경 소리
돌길은 이끼 덮여 발 미끄럽고
바위틈 샘물에는 덩굴 드리웠네
우리 임금 잠저(潛邸)에 계시던 때
그 행차 이곳에 이르렀었지
*潛邸(잠저): 임금이 왕위에 오르기 전 살던 집, 또는 그 시기
龍門寺
杜老招提*境. 桃花浪躍時. 寶房香霧鎖. 山室磬聲遲. 石逕苔蹤滑. 巖泉蘿蔓垂. 我王潛邸日. 翠蓋**屆于玆.
*招提(초제): 절, 특히 관(官)에서 사액한 절
**翠蓋(취개): 높은 이가 출타할 때 씌우는 큰 양산(햇빛 가리개: 日傘)이 화개(華蓋)인데, 푸른색 화개라 해서 翠蓋(취개)로 썼음. 즉 행차(行次, 幸次)
용문사는 봄 복사꽃 속에 법당에는 안개처럼 향불 그윽하고, 풍경 소리는 은은하게 울리고 있었다. 어느덧 한순간 그의 마음도 무장해제 된다.
우리 임금(수양대군) 사가(私家)에 계실 때 이곳에 들렀었지…. 문득 그런 생각이 떠오른다. 수양대군의 반란을 용인할 수 없어 떠돌이로 나선 매월당이 우리 임금(我王)이라고 인정하다니! 그는 부처님 앞마당에서 단종은 가슴에 묻고 세조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일까?
용문사 은행나무는 올해도 잎을 틔울 준비에 바쁘다. 마의태자의 지팡이에서 싹을 틔웠다는 1100살을 더 살았다는 은행나무는 매월당도 내려다보고, 세조도 내려다보고, 많고 많은 이들을 내려다보았을 것이다. 이미 세종대왕 시절 정3품 품계를 받았으니 공덕이 참 큰 나무다. 관음전에 모셔져 있는 보물 금동보살상을 뵙고, 부도전을 지나 언덕길을 오르면 여말(麗末) 불법에만 몰두하다가 입적한 정지국사(正智國師: 1324~1395년)의 단아한 승탑과 탑비가 숲속에 숨어 있다. 1971년 보물로 지정된 문화유산이다.


이제 매월당을 만나러 간 용문산도 마무리해야겠다. 일주문 앞에는 1907년 대한의 독립을 외치고 무장투쟁 했던 정미의병을 비롯한 여러 의사, 지사들을 기리는 기념물이 있다. 나라가 어지러운 때일수록 기억해야 할 이들이다. 문득 김태리, 이병헌의 명연기가 기억난다. 그때 재현했던 정미의병 사진, 기억이 새롭다.
또 하나 공원화된 너른 마당에는 용문산을 찾아와 읊은 시인묵객들의 시(詩)를 시비로 만들어 세워 놓았다. 알 만한 옛사람들의 이름이 살갑구나.










 제793호
제79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