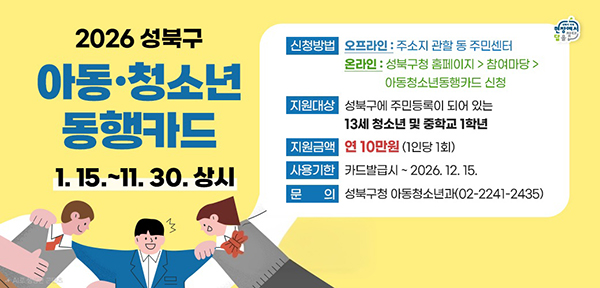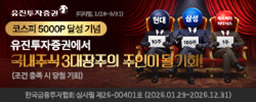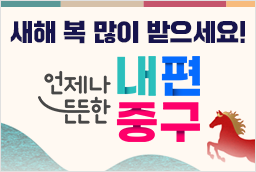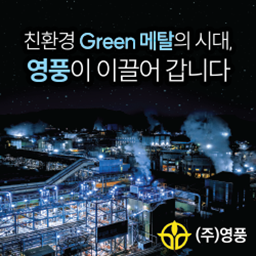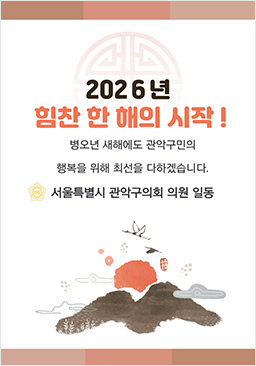국립현대미술관, MMCA 과천 상설전《한국근현대미술 I》개최
한국 근현대미술 100년사를 조명하는 과천관 대규모 소장품 상설전... 채용신, 구본웅, 임군홍, 오지호, 박래현, 김기창, 이응노, 장욱진, 이중섭 등 한국 근현대미술 대표 작가 70명의 작품 145점
 안용호⁄ 2025.04.30 14:23:23
안용호⁄ 2025.04.30 14:23:23

국립현대미술관(MMCA, 관장 김성희)은 한국 근현대미술의 역사와 정체성을 조명하는 MMCA 과천 상설전 《한국근현대미술 Ⅰ》을 5월 1일(목)부터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에서 개최한다.
1972년 국립현대미술관의 첫 기획전 《한국근대미술 60년전》 이후 53년 만에 한국 근현대미술 100년사를 집중 조망하는 이번 상설전시는 《한국근현대미술 Ⅰ》, 《한국근현대미술 Ⅱ》 2부로 나뉘어 개최된다. (2부는 6월 26일 개막)
《한국근현대미술 Ⅰ》은 대한제국과 개화기를 거쳐 한국전쟁까지 격동하는 역사의 흐름 속 태동한 한국 근현대미술을 채용신, 구본웅, 임군홍, 오지호, 박래현, 김기창, 이응노, 이중섭 등 작가 70명의 작품 145점을 통해 짚어본다. 이건희컬렉션도 42점이 대거 포함돼, 코로나19 기간 관람인원 제한과 지역 순회전시로 미처 관람하지 못했던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는 3개의 ‘작가의 방’을 포함하여 대한제국부터 한국전쟁까지의 시기를 <새로운 시선의 등장>, <근대 서화의 모색>, <미술/미술가 개념의 등장>, <조선의 삶을 그리다>, <한국전쟁과 조형실험>, <가족을 그리며> 라는 9개의 소주제로 구성했다. 작가의 방은 1년 단위로 교체되는 특정 작가 집중 조명 공간으로 오지호, 박래현과 김기창, 이중섭 4인을 소개한다.
1부 ‘새로운 시선의 등장: 광학과 카메라, 근대적 지식체계와 미술’에서는 조선 후기 영선사(領選使), 관비 유학 등의 제도로 유입된 현미경, 망원경, 카메라와 같은 신문물을 통해 과거와는 다른 시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관찰하며 제작한 작품을 소개한다. 이영일(李英一, 1904–1984)의 <응추백로>(1929), 정찬영(鄭燦英, 1906–1988)의 <공작>(1937)은 세밀한 관찰에 입각한 사실적인 묘사가 두드러진다. 실제 사진을 토대로 그려진 김은호(金殷鎬, 1892–1979)의 <순종황제 인물상>(1923)과 채용신(蔡龍臣, 1850–1941)의 <허유, 유인명 초상>(1924-1925)에서도 조선 중기 인물화와 다른 세밀하고 사실적인 얼굴 표현을 발견할 수 있다.
2부 ‘근대 서화의 모색’에서는 전통 서화의 변모를 살펴본다. 중국으로 파견된 영선사(領選使)의 일행이었던 안중식(安中植, 1861–1919)과 조석진(趙錫晉, 1853–1920)은 시대의 변화와 신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근대 서화의 환경을 변화시켰다. 안중식의 <산수>(1912), 조석진의 <사계산수>(1919), 이도영(李道榮, 1884-1934)의 <기명절지>(연도미상) 등과 함께 김규진(金圭鎭, 1868–1933)의 <해금강총석>(1920), 변월룡(邊月龍, 1916–1990)의 <북조선 금강산(만물상)>(1959) 등 금강산과 우리의 산수를 그린 근대서화가의 작품이 전시된다.

3부 ‘미술/미술가 개념의 등장’에서는 20세기 초 서양화가들을 살펴본다. 일본 유학을 통해 유화와 서양 미술사조를 접한 나혜석(羅蕙錫, 1896-1948), 도상봉(都相鳳, 1902–1977), 이종우(李種禹, 1899–1981) 등 1세대 서양화가들의 유화 작품을 소개한다. 또한 해부학에 기초한 인체 표현을 접하게 되면서 이해선(李海善, 1905–1983)의 <누드>(1928), 나상윤(羅祥允, 1904–2011)의 <누드>(1927)와 같이 나체의 인물을 그린 회화도 제작되었다.
4부 첫 번째 작가의 방에서는 신미술가의 탄생을 대표하는 ‘오지호’의 작품을 살펴본다. 한국 근대 서양화단의 인상주의 선구자 오지호(吳之湖, 1905–1982)를 집중 조명하는 공간이다. 오지호는 일본 동경미술학교에서 공부하며 서양의 인상주의 화풍에 빠져들었다. 귀국 후 서양의 인상주의 이론을 접목하여 한국의 풍취를 우리만의 빛과 색채로 담아내고자 한 오지호의 작품세계를 <남향집>(1939), <처의 상>(1936) 등 1930년대 초기작부터 미완성으로 남은 유작 <세네갈의 소년들>(1982)까지 대표작 15점을 통해 소개한다.
5부 ‘조선의 삶을 그리다’에서는 1930-1940년대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자주 다루어졌던 소재인 초가집, 장독대, 아이를 업은 여자, 기생 등의 모습을 담은 작품들이 소개된다. 김중현(金重鉉, 1901-1953)의 <무녀도>(1941), <농악>(1941), <춘양(春陽)>(1936) 에서는 농악대, 무녀, 부녀자의 모습 등 전통풍습을 살펴볼 수 있다. 장우성(張遇聖, 1912-2005)의 <귀목>(1935)은 농촌의 목가적 분위기를 담았다. 한편, 새로운 생활상에 관한 관심과 동경을 담은 작품도 출현하기 시작했다. 이유태(李惟台, 1916-1999)의 <인물일대(人物一對)-탐구>(1944)와 <인물일대(人物一對)-화운>(1944), 김기창(金基昶, 1913-2001)의 <정청>(1934)은 ‘신여성’과 ‘여가’라는 근대적 개념을 포착하고 있다.
6부 두 번째 작가의 방 ‘동행: 우향 박래현과 운보 김기창’에서는 예술가로서 서로의 활동을 존중하며 《부부전》을 개최하는 등 예술적 여정을 함께 걸었던 박래현과 김기창의 작품을 소개한다. 우향(雨鄕) 박래현(朴崍賢, 1920–1976)은 자녀 양육과 가사를 담당하며 김기창의 대외적 업무를 지원했고, 운보(雲甫) 김기창(金基昶, 1913–2001)은 청각장애라는 어려움 속에서 예술가의 길을 걸으며 박래현의 작품 활동을 위해 가사를 분담하며 화실 준비와 미국 유학을 지원했다. 이 방에서는 두 작가가 어떻게 조형적 시도를 해나갔는지 초기 채색인물화 <여인>(1942, 박래현 작), <모임>(1943, 김기창 작), 한국의 전통적 소재를 추상화된 형상으로 표현한 <탈>(1958, 박래현 작)과 <흥락도(興樂圖)>(1957, 김기창 작) 등을 한 자리에서 비교하면서 볼 수 있다.
7부 ‘폐허 위에서: 한국전쟁과 조형실험’에서는 한국전쟁(1950~1953)과 그 직후의 작품을 소개한다. 김두환(金斗煥, 1913–1994)의 <야전병원>(1953), 이응노(李應魯, 1904-1989)의 <재건현장>(1954), 임응식(林應植, 1912–2001)의 사진은 한국전쟁의 참상을 사실적으로 담았다. 이철이(李哲伊, 1909-1969)의 <학살>(1951)은 작가가 직접 목격한 전쟁의 참상을 단순화한 형상과 강렬한 색채로 표현했다. 오종욱(吳宗旭, 1934–1996)의 <미망인 No.2>(1960)도 뼈만 남은 듯 추상화된 형태가 전쟁 이후의 허무를 연상시킨다. 한편, 구체적인 형태를 생략하거나 소거한 추상 형상으로 표현하는 조형실험도 이어졌다. 한묵(韓默, 1914–2016)의 <엉겅퀴>(1958), 김경(金耕, 1922–1965)의 <작품>(1958), 이응노(李應魯, 1904-1989)의 <숲>(1950년대 후반) 등으로 구체적인 형상에서 추상 형태로 나아간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8부 ‘폐허 위에서: 가족을 그리며’에서는 식민 지배와 전쟁, 분단 등의 역사적 아픔 속에서 치유의 원동력으로 작동한 ‘가족’을 주제로 한다. 수유 중인 어머니와 아기를 표현한 변영원(邊永園, 1921–1988)의 <모자>(1945), 어린 손주를 등 뒤에서 감싸 안은 박수근(朴壽根, 1914–1965)의 <할아버지와 손자>(1960)는 든든하고 따뜻한 가족의 모습을 담고 있다. 최영림(崔榮林, 1916–1985)의 <가족>(1972)에서는 빈틈없이 얽혀진 가족의 모습을 통해 이상향으로서의 가족을 확인할 수 있다. 장욱진(張旭鎭, 1917–1990) 또한 단순하고 소박한 배경 속에 쉬거나 놀고 있는 가족을 통해 따뜻하고 편안한 회귀처로서의 ‘집’을 표현한다.
9부 세 번째 작가의 방 ‘이중섭’에서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이자 비운의 삶을 살았던 천재 화가 이중섭을 소개한다. 이중섭(李仲燮, 1916–1956)은 전쟁과 분단으로 광복 직후 일본에 아내와 두 아들을 보낸 상태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며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작품으로 승화시켰다. <황소>(1950년대), <흰 소>(1950년대)를 비롯하여 고단한 현실을 벗어나 가족을 다시 만나고 싶은 염원을 담은 소묘, 펜화, 유화 등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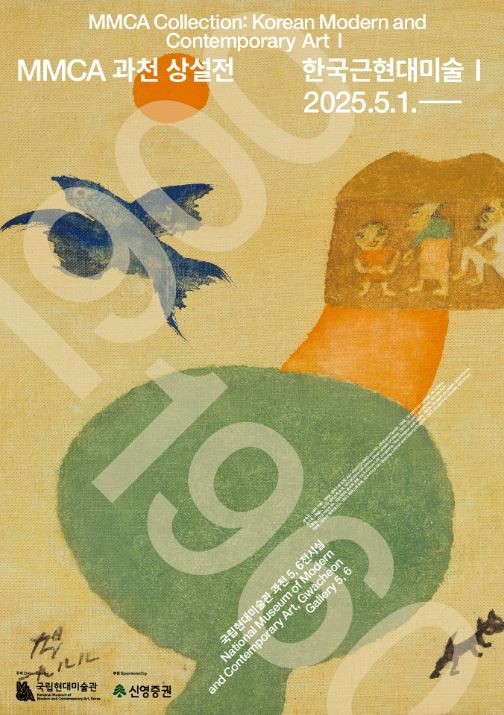
전시와 함께 다양한 연계프로그램과 교육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청소년을 위한 , 장애통합학급을 위한 <함께 보는 미술관 한 작품>이 진행되며, 매월 전시 연계 강연도 개최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과 참가 신청은 향후 국립현대미술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희 국립현대미술관장은 “이번 상설전은 국립현대미술관의 지속적인 소장품 확보 노력과 한국 미술의 보존과 감상을 위해 작품을 기증해주신 분들의 노력이 더해져 이루어진 전시”라며, “이후 개최될 2부와 함께 한국근현대미술 100년사를 조망하는 상설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한국 미술의 정체성과 가치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
- 관련태그
-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한국근현대미술 I 김성희 채용신 구본웅















![[동계 올림픽] 쇼트트랙 황대헌 은메달 추가…1500m 2위](/data/cache/public/photos/20260207/art_206169_1771123206_170x11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