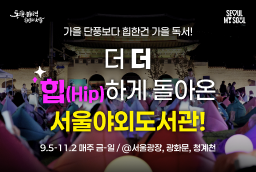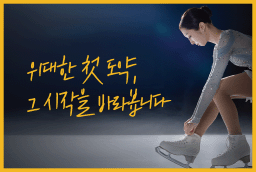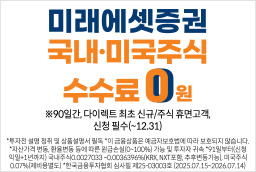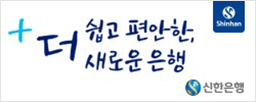▲제여란, 'usquam nusquam'. 112.2 x 145.5cm, 캔버스에 유화. 2016. (사진 =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제가) 자그마해서 본능적으로 도구로 크게 확장하려 했는지도 몰라요.”
“작품이 굉장히 크고 기백이 넘치는데 자그마한 체구로 어떻게 작업하세요?” 기자의 뜬금없는 첫 질문에 제여란 작가가 차분하게 답했다. 실제로 200호 가까운 작품 5점이 나란히 걸린 전시장 1층에서 만난 작가는 자그마한 체구에 정돈된 말투가 인상적이었다. “크기를 받아들이는 방식은 작가마다 달라요. 제 경우는 큰 캔버스 앞에 섰을 때 적절한 도전의식과 저항감, 크기에 맞서는 오기 같은 게 있죠. 그게 전제로 돼야 ‘어디 한번 해볼까’ 하는 충동이 자연스레 생기죠.”

▲2층 전시장 모습. (사진 =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성공적인 추상 작업은 완성품이 낯설 때
제여란은 붓 대신 스퀴지*를 사용한 추상회화를 지난 30여 년간 그려왔다. 한꺼번에 150~200호 크기의 커다란 캔버스를 대여섯 점 바닥에 깔고, 그 위에 길게 자른 스퀴지로 물감을 얹고 온몸의 힘으로 밀고 돌리고 멈추기를 반복한다. 그런데, 이렇게 담대한 추상 작업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그의 열정과 추상의 의미는 대체 무엇일까. 추상회화의 경우 어떤 과정을 거쳐 작품을 완성하는지, 작가는 어떤 기준으로 좋은 작품이라 부르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작가는 아기 달래듯 어르며 설명했다. .
*스퀴지: 이미지를 종이 위에 인쇄하기 위해 물감을 밀어내는 도구. 수직과 수평으로 내리긋기에 편리하다.
“형상이라고 얘기하는 건 자기 안에서 기억되고 연상되는 그 무엇을 읽는 과정일지 몰라요. 구상회화의 얼굴을 예로 들죠. 일정 거리에서 보면 누구나 얼굴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런데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보거나, 오른쪽 눈만 살짝 가리고 봐도 (실제 얼굴은 물론이고 그림을 볼 때) 초점을 잃고 희미해지잖아요. 그렇게 볼 때도 우리가 그걸 얼굴이라고 부르는 건 오류일 가능성이 커요.” 그는 이런 상황을 “불완전하게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이 결탁한 상황”이라고 표현하며, 구상의 시각언어에는 일찍이 흥미를 못 느꼈다고 고백했다.
추상회화에는 (적어도 작가의 작업에는) 전제조건이 하나도 없다. 형상을 쫓지 않는 대신 시간, 색, 형, 면 등의 조형요소가 작가의 지배적인 정서에 영향받는다. 그렇게 완성된 그림의 성공적 작업 기준에 대해서는 “완성된 결과물이 내 내부와도, 외부와도 닮지 않아 아주 낯설었으면 좋겠다”며 그렸기 때문에 30여 년간 설레며 추상 작업을 이어올 수 있었다고 그는 유쾌하게 말을 이었다.

▲제여란, 'usquam nusquam'. 182 x 227cm, 캔버스에 유화. 2015. (사진 =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빛 지나간 흔적만 담았던 블랙 회화에서
수다스러운 색의 세계로
문학과 음악에 조예가 깊은 작가의 능변에 취해갈 때쯤, 간신히 정신을 붙잡고 전시장을 함께 둘러보자고 제안했다. 파주에 위치한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1, 2층에서 제여란의 ‘그리기에 관하여’전이 8월 20일부터 진행 중이다.
2층 메인 전시장에 들어서니 거대한 작품들이 조용하지만 엄청난 진동을 동반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인공조명이 없는 전시장의 특성상 작품 색의 깊이가 반사되지 않고 자연스레 우러나왔다. 색을 완전히 배제한 블랙 회화만을 고집해온 작가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깊고 탁한 색부터 온색에 이르기까지 작가의 팔레트는 무한대에 가까웠다. 제여란은 지난 10년간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였던 블랙 회화를 벗어던지고 화려한 색의 새 옷을 갈아입었다. 작가의 몸이 지나간 흔적이 이제는 매번 다른 색감으로 남아 그림이 되는 것이다.
“추상회화와 구상회화라는 구분은 그 의미를 잃었고, 완전한 추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쓴 제여란에게 다시 물었다. 추상과 구상의 구분, 그리고 완전한 추상이 왜 존재하지 않는지를. 작가는 구상화가가 머릿속 이미지를 개념화해 캔버스에 담는 행위 자체가 추상의 영역에 있다고 여긴다. 마찬가지로 작품이 완성되고 관객이 바라볼 때, 그들은 자기 심상 안에 있는 이미지를 떠올린다. 그림의 완성은 형상을 기술적으로 표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림 앞에서 관객들이 떠올리는 각기 다른 이미지에 있다. 마찬가지로 작업이 시작되기 전, 그리고 작업이 끝난 후 작가 또한 구상에서 완벽히 멀어질 수 없다는 설명이었다.

▲제여란, 'usquam nusquam'. 182 x 182cm, 캔버스에 유화. 2015. (사진 =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같은 스퀴지, 다른 작업 - 리히터와의 차별성
스퀴지 작업을 보면 으레 대표적인 화가 게르하르트 리히터가 떠오르게 된다. 사진 회화(photo-painting, 사진처럼 똑같이 그린 기법)의 대가 리히터도 스퀴지를 이용해 추상화를 작업한 바 있다. 그런데 리히터와 제여란의 스퀴지 작업은 작업의 의미가 굉장히 다르다. 리히터가 스퀴지를 사용해 추상화하는 것은 그가 미리 작업해놓은 사진 회화를 삭제하기 위해서다. 다시 말해 사진과도 같이 정교한, 마르지 않은 그림 위에 스퀴지로 물감을 밀며 해당 사진 회화의 구상을 지우는 작업이다.
반면, 제여란은 몸의 곡선을 따라 유기적인 화면을 만들어낸다. 빈 캔버스 위에 처음부터 끝까지 신체 동작의 시작과 끝을 담아내며 생과 멸을 표현하는 작업이다. 작가는 이 과정을 춤에 비유하며 “마치 무용수가 ‘몸 안의 새’라고 표현하는 도약과 착지처럼, 제 그림 안에서도 시간이 존재하는 방식이 몸의 감각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 도약과 착지는 순간의 시간을 내포한다. 마치 순식간에 일어나는 바람이나 천둥 번개처럼, 그림 속의 시간은 순간이 명멸하는 것을 보는 느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순간의 현상 이후 찾아오는 고요함과 평온함을 “추상으로밖에 보충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추상을 믿는 작가 제여란의 이야기가 명상처럼 다가왔다.

▲전시장에서 만난 제여란 작가. (사진 = 윤하나 기자)

▲제여란 작가가 스퀴지를 이용해 작업 중이다. (사진 =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 관련태그
- CNB 씨앤비 시앤비 CNB뉴스 씨앤비뉴스










 제498호
제49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