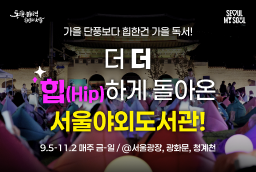가나문화재단과 가나아트가 추석 연휴를 맞아 특별 기획전 ‘호랑이’를 서울 평창동 가나아트센터 ‘SPACE 97’에서 연다.
이번 전시는 가나문화재단 소장품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까치호랑이’ 계열 호랑이 그림 12점과 호피도 8폭병풍을 비롯해 호랑이를 소재로 한 작품 총 16점을 공개한다.
이번 전시는 한국 전통문화에서 수호와 벽사의 상징으로 여겨진 호랑이를 주제로, 조선 후기 회화에 나타난 호랑이 이미지의 다채로운 변용과 그 미학적 의미를 조명한다.
18세기 화원회화 양식의 ‘호도’부터 시작해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의 캐릭터 ‘더피’와 ‘수지’의 원형이 되는 까치호랑이 그림 ‘호작도’의 다양한 작례와 화면 가득 호랑이 가죽을 세필로 그려 넣은 ‘호피도’ 등을 통해, 호랑이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일상의 보호자이자 문화적 상징으로 자리해온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한국의 호랑이 미술은 그 기원을 찾자면 선사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실제 호랑이를 보고 그린 듯한 사실적 표현의 호랑이 미술은 조선시대에 이르러 성행했다. 이 시기 산신신앙(山神信仰)이 불교에 편입되면서 호랑이는 산신의 화신으로 신격화됐고, 한반도에 호랑이가 많았던 현실적 배경은 호랑이를 공포의 대상이자 신앙의 대상으로 자리 잡게 했다. 결국 포악한 맹수의 본성은 용맹스러움으로 치환됐고, 호랑이는 수호와 벽사, 나아가 길상의 의미까지 동시에 상징하는 존재로 삶 속에 깊이 스며들게 됐다.
초반에는 까치가 생략되거나 단순한 배경 요소로 여겨졌으나, 후대로 갈수록 까치를 백성으로, 호랑이를 양반, 관리로 빗대어 풍자하는 해석이 더해지거나 ‘영리한 까치에게 골탕 먹는 호랑이’라는 민담이 반영되면서 까치가 여러 마리로 늘어나거나 호랑이의 얼굴이 어수룩하게 해학적으로 표현된 까치호랑이 그림이 등장하게 됐다.
한국 전통의 모티프 ‘호작도’

전시 출품작 중 가장 연대가 오래된 것은 18세기 초반 작품으로 추정되는 호도다. 북송에서 명대로 이어지는 ‘출산호도’ 계열의 작품으로, 최근 공개된 리움미술관 소장의 1592년 작 호작도와 화면 구성이 유사하다. 호랑이의 동세나 오른쪽으로 치켜 뜬 눈에서도 비슷한 특징을 보이지만, 전시 출품작에서는 까치가 등장하지 않는다. 중국에서 조선으로 전래되는 과정에서 화원회화 계열의 작품들은 의도적으로 까치를 그리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 가장 주목할 까치호랑이 그림은 두 폭 가리개 형식으로 장황된 ‘용호도(龍虎圖)’ 속 까치호랑이다. 이 작품은 한국 민화의 시조 조자용(1926~2000)의 구장품으로 반세기에 걸쳐 그 명성을 지닌 작품이다.
1971년 조자용 관장이 펴낸 ‘한얼의 미술’, 1974년 ‘한호(韓虎)의 미술’이라는 책에서 공개된 것을 시작으로 88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1984년 서울 올림픽 주경기장 특별전시장에서 열린 ‘한국 호랑이 민화대전’에도 나왔던 작품이다. 조자용 관장은 이 작품에 대해 “이조민화의 ‘까치호랑이 그림’을 대표한다고 하여도 좋을 만한 걸작품”이라고 했으며, 또 그림 속 호랑이 얼굴을 두고는 “마치 시골의 텁수룩이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모습처럼 소박한 인격을 가진 듯이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근 리움미술관 전시에 나온 88 올림픽 마스코트 호돌이의 모티브로 알려진 ‘피카소 호랑이’와 화면 구도와 얼굴 표현이 몹시 닮은 가나문화재단 소장 호작도도 전시된다. 두 작품은 서로 데칼코마니 같이 대칭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발과 수염의 표현과 자세가 매우 유사해 같은 작가가 그렸거나 같은 모본에서 파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작품도 유수의 민화관련 도록에 수록돼 있고, 2021년에는 국립현대미술관 ‘DNA: 한국미술 어제와 오늘’ 전시에 소개된 바 있다. 직각으로 떨어지는 턱 선이 인상적인 점 또한 그 특징이다.
본 전시는 시대에 따른 그림 속 호랑이의 자세 변화를 한 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가장 이른 것은 걸어 내려오는 듯한 출산호도 계열이며, 17세기 중반에 등장해 20세기 초까지 가장 보편적으로 쓰인 형식은 출품작 ‘백호도’(개인소장)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앉은 자세 ‘좌호(座虎)’다. 18세기 중반 경에 나타나는 것이 사선형 자세인데, 화면 하단에 앞발과 머리를 두고 몸통을 사선으로 뻗어 상단에 뒷발과 꼬리를 배치하는 구도다.
더불어 호랑이 가죽을 그림으로 그린 ‘호피도’도 출품된다. 호랑이 여덟 마리가 금방이라도 몸을 틀어 병풍을 부수고 뛰어내릴 것만 같은 ‘호피도 8폭 병풍’의 위용은 대단하다. 굵은 먹선으로 단순화한 호작도와 달리, 세필로 가죽의 털을 한 올 한 올 세밀하게 묘사한 이 작품은 상당한 수공을 필요로 했으며, 벽사와 용맹의 상징을 담아 권력층의 공간을 장식하는 용도로 사용됐다.

호랑이는 12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범띠 해마다 세상에 소환되고, 88서울 올림픽 ‘호돌이’와 2018평창 동계올림픽 ‘수호랑’처럼 국가 행사의 마스코트로 반복 등장하며 국민적 상징으로 자리해왔다. 코로나와 같은 역병의 시기에도 벽사와 수호의 의미로 다시금 불려왔듯, 호랑이는 한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순간마다 모습을 드러내 왔다. 이전엔 당연하게 여겨졌던 이러한 호랑이의 소환이 최근에는 문화 콘텐츠의 영역으로 확장되며, 특별한 계기 없이도 ‘호랑이 열풍’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가나문화재단과 가나아트는 “특별기획전을 통해 한국인의 삶 속에서 호랑이가 지닌 다채로운 상징과 미술적 의미를 총체적으로 조망하고자 한다. 동시에 호랑이 상징의 원류를 되짚으며 수호와 벽사의 영물로서, 또 민중의 해학과 웃음을 담은 친근한 존재로서 호랑이를 재발견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케데헌의 더피와 수지처럼, 한국 전통의 모티프는 오늘날에도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재탄생하며 큰 울림을 주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번 전시가 호랑이라는 한국적 상징이 지닌 보편성과 동시대적 매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시는 19일까지 열린다.
< 문화경제 김금영 기자 >
- 관련태그
- 가나문화재단 가나아트 호작도 케데헌 리움미술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