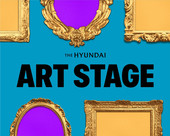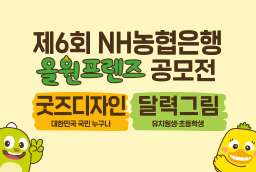원숭이를 잡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하고 쉽다. 무거운 통에 원숭이 손만 들어갈 구멍을 만든 다음 그 안에 바나나를 넣어두기만 하면 된다. 십중팔구 원숭이는 통 안으로 손을 넣고 바나나를 집는다. 그리고는 끝까지 그걸 놓지 않는다. 결국 먹지도 못할 바나나를 손에서 놓기만 하면 자유로울 수 있건만 그러질 못해 결국 잡히고 만다. 인간과 DNA가 가장 유사하다는 원숭이도 집착과 욕심을 떨치는데 익숙하지 않다. 낙엽이 지는 초겨울, 생뚱맞게 원숭이 얘기를 꺼낸 건 다름 아닌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엇갈린 언행 때문이다. 아울러 과거 DJP연합과 10년 전 이맘때 단일화를 성사시킨 노무현 정권에서 시대적 교훈을 얻고자 함이다. 문·안 두 후보가 과거경험을 벤치마킹 했는지 아니면 반면교사로 삼았는지 알 수 없다. 다만 이번 단일화 성패는 진정성과 국민적 공감대에서 갈릴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공감을 못 얻으면 둘 다 피해본다. 두 차례 학습효과 때문이다. DJP연합,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빛과 그림자 지난 11월6일 문·안 두 후보는 단독회동을 갖고 11월25일∼26일 후보등록 이전에 단일화 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후보등록까지 20일, 후보등록 후 20일간 대선정국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12월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야권 단일후보와의 양자대결로 결판날 것으로 보인다. 문·안 두 후보가 대선출마 선언 후 그동안 보인 언행을 보면 과연 진정성이 있는지 궁금하다. 민심에 정치적 투서하듯 대권도전에 나선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비근한 예를 하나만 들면, 문 후보는 영남과 호남에 가면 각각 말이 다르다. 한입 두고 두말 하는 셈이다.(一口二言) 호남 가서는 LH공사를 전주, 영남에선 진주로 이전하겠단다. 과거 포퓰리즘 악령이 되살아난 것 같아 소름끼친다. 안 후보는 어떤가? 해군기지 건설 중인 제주 강정마을을 방문해 느닷없이 이명박 대통령 사과를 요구했다. 주민들 손에 이끌려 예정에도 없는 간담회에 참석해서 뱉은 말이다. 이 자리에서 그는 제주 해군기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제주 해군기지는 김영삼 정부 때 구상하고, 노무현 정부 때 확정한 국책사업 아닌가. 더욱이 온갖 종북좌파 세력 반대를 물리치고 이명박 정부 들어 공사를 시작한 게 아닌가. 안 후보는 ‘안철수의 생각’ 책을 통해 “대외정책에서 각자 다른 색깔을 취해온 정부들이 모두 해군기지가 필요하다는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면서도 “소통부재와 개발 만능주의가 빚은 참극” 이라 했다. 무슨 말인가. 여기선 이말, 저기선 저말 해도 되는 것인가?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의 어중간한 입장은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다. 문재인-안철수 후보 엇갈린 언행 시작과 끝 안·문 두 후보의 단일화가 그들이 합의대로 가치와 철학을 나누고 국민연대까지 이뤄낼 지는 미지수지만, 과거 단일화에 대한 평가는 엄격해야 한다. 그게 그들이 알아야 할 최소한의 책무다. 먼저 김대중-김종필 연합은 어땠나. 나눠먹기식 공동정부, 지키지도 못할 내각제 합의가 결국 파국을 부르지 않았나? 노무현-정몽준 단일화는 어떤가. 임기 내내 국민은 불안한 동거의 끝없는 파열음을 줄곧 지켜보지 않았나. ‘단일화 피로증’은 고스란히 국민 몫이었다. 문·안 두 후보가 대권에 목말라 민심을 겉돈다면, 사슴만 쫓다 명산을 놓치고 황금만 좇다 사람을 잃는 것(逐鹿者 不見山, 攫金者 不見人)과 같다. 단일화 프레임에 갇혀 집착과 욕망을 떨치지 못한 건 아닌지 되묻고 싶다. 이번 대선은 과거에 비해 가뜩이나 판세를 예상하기 힘든 ‘3무(無) 대선’ 이다. 토론과 검증, 정책이 실종됐다. 일개 장관 뽑는 시스템보다 못하다. 국민에겐 ‘정치 피로증’ 이 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잊지 말자. 2010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페루의 마리오 바르가스의 말이다. “정치가 아무리 혐오스럽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정치를 배제할 순 없다” - 김경훈 편집인 겸 편집국장










 제300호
제30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