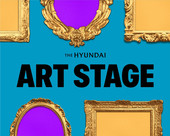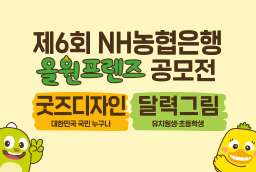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12일차 (호주 멜버른)
페더레이션 광장 부근
페더레이션 광장(Federation Square)에 닿는다. 광장에서는 공연이 열린다. 별로 웃길 것 없는 MC의 싱거운 진행이지만 시민들은 열렬히 호응하면서 분위기를 북돋아준다. 시드니도 그렇겠지만 이 도시의 거리 이름도 항해사와 서북부 지역 개척자, 탐험가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경우가 많다. 곳곳에는 그들의 동상도 서 있다.
광장에는 호주 상업방송인 SBS(Sydney Broadcasting System) 멜버른 지국이 야릇한 모습으로 서 있다. 아시아 학생들이 한 무리 지나간다. 겨울방학을 맞아 호주에 영어 연수하러 온 학생들이다. 페더레이션 광장 옆은 플린더스 스트리트(Flinders Street) 열차역이다. 멜버른의 명소 중 하나인 이곳은 열차역이라고는 볼 수 없는 아름다운 건축물이다. 퇴근 시간 무렵이어서 수많은 시민들이 이곳을 통해 교외로 나가는 열차를 타느라 걸음이 바쁘다.
ACMI와 AFTRS
광장에는 또 하나 중요한 시설이 있다. ACMI(Australian Center for Moving Images)다. 예술, 영화, TV, 그리고 비디오 게임까지 망라하는 시설이다. ACMI 내 동영상 역사 소개관인 스크린 월드(Screen World)로 들어가 본다. 1895년 프랑스 뤼미에르 형제에서 시작된 영화가 토키 유성영화, 칼라로 진화하는 과정과 TV 등장 등의 역사를 잘 요약해 보여준다. 호주에서 TV의 도입은 의외로 늦어졌다는 점이 흥미롭다. 1956년 멜버른 올림픽에 맞춰 TV가 첫 전파를 냈으니 세계 선진국보다 10~20년 늦은 셈이다. 공영이냐 상업이냐의 논쟁, TV가 어린이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논쟁 때문이었다고 한다. 충분히 의미 있는 논쟁이었다.
ACMI엔 호주 출신 감독과 배우, 영상 예술가, 비주얼 효과-의상-촬영 전문가, 애니메이터 등 동영상 분야 인재들이 소개돼 있다. 사실 호주엔 영화에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다. 영화 ‘매드 맥스’ 감독 조지 밀러를 비롯해 할리우드 대스타가 된 배우 멜 깁슨, 니콜 키드먼 등이다. AFTRS(Australian Film TV Radio School)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상 교육기관 아닌가?

▲페더레이션 광장(Federation Square)에서 즉흥 공연이 열렸다. 시민들이 열렬히 호응하며 분위기를 북돋는다. 사진 = 김현주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크라운 카지노(Crown Casino)에 가본다. 시내 중심 야라(Yarra) 강변 최고 요지에 자리 잡았는데도 한없이 넓다. 이 도시에 카지노가 들어설 때 시민들의 반대가 높았다고 한다. 지나는 거리마다 화려한 가게가 즐비하다. 요즘 세계 경기 침체에도 별 영향을 받지 않는 호주는 이처럼 부와 활력이 넘친다. 호텔로 걸음을 재촉하는 시각은 저녁 7시 20분. 아직 초저녁이지만 벌써 행인들은 드문드문하다. 다른 성당과 마찬가지로 성 미카엘(St. Michael) 성당도 매우 뾰족한 첨탑을 가지고 있다. 비나 눈이 많지 않은 곳에서 왜 이렇게 날카로운 고딕 양식을 구사했는지 궁금해진다.
13일차 (호주 멜버른)
변덕스런 호주 날씨
호주 남동 해안 여름 날씨는 변덕이 심해서 옷을 맞춰 입기 어렵다. 하루에 4계절이 모두 나타난다는 말을 입증하듯, 오늘 일기예보는 최저 12도, 최고 26도란다. 열대야 같은 것은 없다. 내일은 최고 37도를 예상한다니 하루 사이에 크게 변덕을 부리는 날씨를 기상학적으로 뭐라 부르는지 알고 싶다. 하기야 호주는 대륙 아닌가? 안정적인 여름 날씨가 나타나는 동부 해안, 열대 기후가 나타나는 북부 해안, 그리고 건조 기후와 사막 기후가 나타나는 중부 내륙까지 호주에는 여러 기후대가 존재한다.

▲성 미카엘(St. Machael Cathedral) 성당. 매우 뾰족한 첨탑이 눈길을 끈다.

▲시내 중심에 자리한 야라(Yarra) 강 뒤로 도심 풍경이 보인다. 거리에 화려한 가게가 즐비하다.
오늘 아침엔 하늘이 정말 높고 파랗다. 드물게 보는 아름다운 아침이다. 중국박물관(Chinese Museum)을 관람하기 위해 차이나타운을 다시 찾아간다. 리틀 콜린스(Little Collins) 거리의 서양식 클래식 건축물에 중국 음식점들이 가득한 모습이 영 어울리지 않는다. 중국박물관 입구 작은 골목 안에는 국부 손문(孫文), 즉 손중산의 동상이 소담하게 서 있다. 중국인들의 호주 이주 역사는 1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852년 이민자와 계약노동자들이 멜버른에 발을 디딘 것이 처음이었으나 빅토리아(Victoria) 주에 금광이 발견되면서 가속된다. 1850년대 중국인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1858년 호주에는 4만 명의 중국인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인 차별 정책
그러자 호주는 중국인 유입을 막기 위해 입국세, 면허세 등 각종 불평등 세금을 부과했다. 중국인 급증은 곧이어 1901년 이민제한법(Immigration Restriction Act) 제정으로 이어진다. 여기엔 호주 시민이 되기 위해 유럽 언어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받아쓰기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규정도 포함됐다. 호주 거주 자격이 주어지더라도 투표권과 귀화에 제한이 있었음은 당연하다. 결국 백호주의는 늘어나는 중국인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940년에는 호주 내 중국인이 9000명으로 감소했다가, 1960년대 이후 이민차별 정책 완화로 중국인들이 다시 유입되기 시작했다.

▲호주 상업방송 SBS 멜버른 지국. 겨울방학을 맞아 호주에 영어 연수하러 온 학생들이 한 무리 지나가는 모습도 보인다.
중국인 이민자들은 중국 본토 이외에도 동남아시아 등 각국으로부터 갖은 사연을 안고 호주에 들어왔다. 현재 중국계 호주인은 50만 정도로, 호주 전체 인구의 2%를 차지한다. 중국 박물관에는 중국어 체험장도 있다. 1976년 다윈(Darwin)에 첫 보트피플이 상륙하면서 호주는 2만 3000명의 인도차이나 난민을 받아들이는데, 사실 이들의 60%가 중국계였다.
말레이시아로부터 말레이인 우대 정책에 차별받아 호주로 이민 온 중국계 말레이시아인 9만 명, 그 외에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서도 중국인 배척에 따라 많은 수가 호주 이민 길에 올랐다. 심지어 동티모르에서도 1975년 인도네시아의 강점, 1999년 독립 전쟁 시 혼란 등으로 6000여 명의 중국계 동티모르인이 호주로 이민 왔다.
지하 전시실에는 골드러시 시절 빅토리아 주의 금광과 중국인 마을을 재현해 놓았다. 박물관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는 중국계 말레이시아 출신 이민자인 따이진중 씨와 많은 얘기를 나눴다. 북방 출신이어서 그런지, 그는 거의 한국인 얼굴과 흡사하다. 엔지니어로 활동하다가 정년 후 정부에서 받는 연금이 풍족하다면서 호주에 이민 온 것에 만족해한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매우 존경한다고도 했다.
멜버른 대학
빅토리아 주 도서관을 지난다. 도서관 앞 잔디광장에 많은 시민들이 볕을 즐긴다. 멜버른 시내에는 이처럼 널찍한 잔디 광장이 곳곳에 있어 누구든 피곤한 발을 쉴 수 있어 좋다. 도서관에서 가까운 멜버른 대학(University of Melbourne)에 가본다. 곳곳에 건물을 신축 중이다. 서구의 대학이 다 그렇듯 학과별로 최소한 하나 이상의 단독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럽다.
쾌적한 대학 캠퍼스를 보며 지금 캐나다나 미국 어디쯤 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한다. 대학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퀸 빅토리아 마켓(Queen Victoria Market)은 육류와 해산물, 과일과 채소, 의류와 잡화, 심지어 전기전자까지 없는 게 없는 종합시장이다. 상인과 손님 모두 전 세계 모든 인종을 다 모아놓은 것 같은 시장에서 멜버른 시민들의 체취를 한껏 느낀다. 더 좋은 물건을 더 싸게 사고 싶은 마음은 동서고금 남녀노소가 모두 같다.

▲빅토리아 주 도서관 모습. 도서관 앞 잔디광장에서 많은 시민들이 볕을 즐긴다. 사진 = 김현주
웬만한 곳은 모두 걸어서 이동이 가능한 멜버른의 거리는 활기차다. 트램을 타고 이동한 곳은 이민 박물관이다. ‘리빙 더블린(Leaving Dublin)’ 특별 전시는 19세기 중반 아일랜드 대기근의 21세기 버전에 해당하는 아일랜드의 아픈 모습을 담았다. 글로벌 경제 위기로 아일랜드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의 사연을 사진과 함께 소개한다.
2012년 한 해, 7000명의 아일랜드인이 호주 취업 비자를 얻었다고 설명한다. 호주에서 아일랜드계는 10%로 적지 않지만, 다른 나라에 정착하는 데 겪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차별과 편견에 시달렸다고 기록한다. 정체성 섹션엔 다양한 이민 집단의 음식, 의복, 언어, 용모 등을 소개하면서 차이를 받아들임으로써 편견을 극복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인종 문제에 관한 박물관의 접근법이 참으로 솔직하다. 인종 차별을 당했을 때 대처법도 소개한다.

▲대학 캠퍼스 근처에서 퀸 빅토리아 마켓(Queen Victoria Market)을 만났다. 상인과 손님 모두 전 세계의 인종을 모아놓은 것 같다. 사진 = 김현주
2차 대전 중 미국 정부가 일본계 미국인들을 소개해 캠프에 수용했듯이 호주에서도 독일계, 이태리계, 일본계 등 30개국 출신 7000명을 캠프(internment camp)에 소개했다는 기록도 새롭다. 중국 이민 정책의 변천사도 보여준다. 1970년대 이전까지 호주는 스스로 ‘사람이 부족한 영국 땅(a British land short of people)’이라고 생각했다. 백호주의에 대한 집착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나왔음을 박물관 자료는 솔직히 보여 준다. 넓디넓은 대륙을 가급적 영국인, 최소한 백인으로 채우기 위해 몸부림쳤음을 알게 한다.
이민 문제와 관련해 늘 호주가 가지는 정체성 고민도 소개한다. 호주는 영국 문화의 남방 기지인가 아니면 아시아 태평양에 귀속되는가의 문제다. 출향 섹션은 고국을 떠나 이민 길에 오르게 된 사연을 개인별로 영상 자료와 함께 소개한다.
일본의 황당한 주장
2차 대전 중 일본의 호주 침공 얘기도 슬쩍 내비친다. 일본은 호주 대륙을 백인들로 완전히 채우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구실도 내세웠다. 한때 탈아입구(脫亞入歐), 즉 아시아를 벗어나 유럽에 들어간다고 주장하며 스스로 백인 흉내를 내고 황인종을 멸시했던 일본이 황당하고 모순적인 소리를 한 것이다. 당시 호주는 야비한 백호주의로 철통같이 폐쇄적인 이민 정책을 펴오던 때 아닌가? 이민의 나라답게 적극적이고 솔직한 주제 의식으로 꾸며진 훌륭한 박물관이다.
기억의 사당(Shrine of Remembrance)을 찾는다. 1962년 전쟁 기념관으로 건립했다.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고 있고 사당 안에서는 시민들도 함께 참가하는 추념 세리모니가 30분 간격으로 열린다. 사당 지붕 발코니에 오르니 멀리 멜버른의 도시 전경이 들어온다. 정원의 도시가 찬란한 그린을 뿜어낸다. 저마다 개성 있게 지은 고층 빌딩들이 도시의 자유로운 스카이라인을 그려낸다. 파란 하늘과 어우러진 도시 파노라마가 멋지다.

▲기억의 사당(Shrine of Remembrance)은 1962년 전쟁 기념관으로 건립됐다. 시민들이 함께 참가하는 추념 세리모니가 30분 간격으로 열린다. 사진 = 김현주
오늘은 자정 훨씬 넘어 다윈(Darwin) 행 항공기를 탈 때까지 시간이 무척 많이 남는다. 여기 저기 다니면서 시간을 많이 때워야 공항에서의 기다림이 덜 지루하다. 트램을 타고 도클랜드 뉴 키(Dockland New Quay) 지역으로 향한다.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최근 멜버른 시가 항만 위락지구로 개발한 곳이다. 항만을 조망하는 좋은 자리에는 여기서도 어김없이 고급 아파트 건설이 한창이다. 과잉 공급으로 분양에 실패하지 않기만을 바란다.
바다로 이어지는 항만 어구까지 걸어가 본다. 지금 만난 바다는 태평양이라기보다는 인도양이다. 호텔로 돌아와 맡긴 가방을 찾아 공항에 나왔지만 시간은 더디 간다. 국제선 터미널에는 내가 탈 다윈 행 버진 오스트레일리아(Virgin Australia) 여객기 한 편만을 남겨놓고 있다. 여행 일지를 정리하자니 지난 이틀 동안 익숙해진 멜버른의 거리가 눈앞에 아른거린다.
(정리 = 김금영 기자)
- 관련태그
- CNB 씨앤비 시앤비 CNB뉴스 씨앤비뉴스










 제473호
제47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