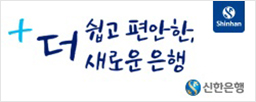한국이 이미 선진국이 됐다는 소리가 많지만,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로?”라는 의문이 든다. 한국이 선진국이 되기 힘든 이유 한 가지만 들어 보자. 한국인의 대정부 신뢰도는 세계 최저 수준이다. 얼마 전 여론조사에서는 ‘처음 만난 사람’에 대한 신뢰도보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더 낮았다. 한국인에게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숙제를 남겨준 책이 있다. 일본계 미국인 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존스홉킨스대학 교수)가 1995년에 내놓은 <신뢰(Trust)>다. 이 책의 주요 내용은 ‘미국·일본·독일은 사람들이 서로 신뢰하기 때문에 뭘 해도 다 잘 되고, 한국·중국·인도는 불신 때문에 뭘 해도 안 되는 나라’라는 것이었다. 이를 그는 여러 자료로 증명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그 뒤 반론도 나왔다. ‘미·일·독은 신뢰가 있어서 잘 된 게 아니라 잘 되니 신뢰가 생겼고, 한국·중국·인도는 신뢰가 없어 안 되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뒤처졌기 때문에 사회적 신뢰가 낮은 것’이란 반론이었다. 즉, 원인과 결과를 후쿠야마가 바꿔치기 했다는 반론이었다. 한국 경제가 날고 긴다는 지금 다시 생각해본다. 한국 경제가 잘 되니 우리에게 상호 신뢰는 생겼는가? 한국인이 얼마나 ‘서로 불신’ 속에 사는지를 피부로 느낀 경험을 하나만 얘기해보겠다. 미국에서 메릴랜드주립대학(University of Maryland)을 2학년까지 다니고 한국에 온 학생이 있었다. 한국 대학 3학년에 편입하길 원한 그는 미국 학교의 재학증명서·성적증명서 등을 미리 떼어 왔다. ‘증명서의 증명서’를 요구하는 한국 시스템은 누구 위한 것? 원서를 내려는데, 듣도 보도 못한 ‘아포스티유(Apostille)’라는 증명서를 내라고 한국 대학들이 요구했다. 그가 다닌 메릴랜드주립대학이 미국에 존재한다는 증명을 현지의 한국 대사관·영사관 또는 미국 정부로부터 받아오라는 것이었다. 그는 2주 동안 워싱턴 주미 대사관, 총영사관, LA 총영사관, 미국 교육부 등에 전화를 걸고 또 걸었다. 비싼 국제 전화료를 내면서. 현지 한국 대사관·영사관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우리는 아포스티유 발급을 안 한다”는 것이었다. “대학이 요구한다”고 해도 막무가내였다. 미국 교육부에 전화하니 “이 뭔 황당한 소리?”냐는 반응이었다. 주 정부가 운영하는 주립대학이 존재한다는 증명을 왜 연방 정부가 해야 하느냐는 반문이었다. 처음 들어보는 주문이란다. 메릴랜드대학 측도 기막혀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우리가 최고로 해줄 수 있는 것은 성적표·재학증명서를 봉인해 한국 대학에 직접 보내주는 것”이라고 했다. 왜 자기 학교가 존재한다는 정부의 증명서를 따로 받아야 하느냐며 불쾌해했다. 입만 열면 글로벌 스탠더드를 말하는 한국 대학은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시키고 있는 것이었다. 아포스티유를 못 받아낸 이 학생은 대학들에게 “주립대학의 존재를 왜 정부가 증명해야 하느냐”고 항의했지만, 대학들의 대답은 거의 한결같았다. “아포스티유를 떼어 와!” 다행히 연세대와 성균관대는 ‘예외’를 인정해줬다. 유명한 주립대학이니 아포스티유 없이 원서를 받아주겠다는 것이었다. 이 두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 끝내 원서 접수 자체를 거부했다. ‘정부의 관인’만을 신뢰하는 한국의 대학들에게 묻고 싶다. 정부 관인은 그렇게 믿어지나? 하루가 멀다고 터져 나오는 공무원들의 독직·비리를 들어는 봤나? ‘증명서가 맞다는 증명서의 증명서’는 왜 추가로 요구하지 않나? <다음 호에 계속>










 제155호
제155호 


![[인터뷰] 카카오게임즈 신작 액션 MMORPG ‘크로노 오디세이’, 글로벌 미디어 서면 Q&A](/data/cache/public/photos/20250623/art_179227_1749106703_170x11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