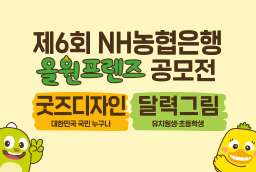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7일차 (뉴질랜드 오클랜드 → 웰링턴)
웰링턴행 버스 여행
오전 9시 15분, 인터씨티(Intercity) 버스를 타고 웰링턴으로 향한다. 총 643km, 11시간이 예상되는 아주 먼 길이다. 버스는 만석이다. 오늘 금요일에다 하루에 한두 번 다니는 버스에 비해 승객이 많기 때문이다. 승객 중에는 마오리족을 비롯해 이 사회의 가난한 이민자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미국에서도 가장 저렴한 장거리 교통수단인 그레이하운드 승객은 대부분 흑인이나 히스패닉인 것과 같은 이치다.
인구는 430만 명, 양은 6000만 마리
오클랜드 출발 후 1시간 지나니 도시와 마을이 뜸해지고 도로도 왕복 2차선으로 좁아진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구릉을 따라 오로지 초원과 목장만이 끝없이 펼쳐진다. 그렇다. 뉴질랜드는 농업축산 국가다. 농가는 아주 드문드문 있을 뿐이다. 미국 서부보다 훨씬 푸르고 미국 중서부 곡창보다 훨씬 굴곡이 있어서 풍광이 아름답다. 대자연의 광활한 대지, 화산토로 이뤄진 비옥한 땅, 게다가 축복받은 기후까지…. 북반부 문명권에서 먼 것을 제외하고는 아쉬울 것이 없는 땅이다. 영국 이민자들이 거칠고 척박한 고향을 떠나 줄지어 이곳 신대륙으로 향한 이유를 쉽게 짐작하고도 남는다.

▲퀸스 워프 부둣가 풍경. 도시의 아침이 바다에 잔잔하게 이는 물결에 반사된다. 평화로운 풍경이다. 사진 = 김현주
버스에서 내려 잠시 쉬었다가 가고 싶은 예쁜 작은 시골마을들을 수없이 지난다. 소담한 식당과 카페, 예쁜 상점…. 옆 자리에 앉은 청년은 알고 보니 스코틀랜드 사람이다. 고향 떠난 지 1년도 넘었다고 한다. 이곳에서 워킹 홀리데이 중인데 목장에서 가축을 돌본다고 한다. 고향에서도 해왔던 익숙한 일이라서 쉽다고 한다.
우유 생산 젖소는 집 가까운 평지, 육우와 양은 경사진 곳에서 키우는데 한 사람이 양 6000마리를 관리할 정도로 효율적인 일이라고 한다. 스코틀랜드 청년 알란(Alan)은 이곳 생활을 무척 즐기는 눈치다. 게다가 1950년대 이후 고향을 떠나 뉴질랜드로 이민 온 친척들도 곳곳에 많다고 한다. 자기도 뉴질랜드에 적절한 일자리가 있으면 이민할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웰링턴 가는 길엔 오르락내리락 구릉을 따라 초원과 목장이 끝없이 펼쳐진다. 사진 = 김현주
중간쯤 왔을까? 타우포(Taupo)에서 버스 기사를 교대하고 또 떠난다. 오클랜드에서 여기까지 몰고 온 기사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노인 기사지만, 베테랑 운전 솜씨가 승객들을 마음 든든하게 해준다. 아무리 가도 끝이 없는 초원과 구릉이다. 멀리 산맥이 펼쳐지고 그중 최고봉은 만년설을 이고 있다. 넓은 호수 너머 산들이 걸린 풍경이 그림 같다. 거대한 자연에 금을 긋듯 이어지는 도로를 제외하면 원래 이 땅이 생겨났던 원시 모습 그대로다. 뉴질랜드가 개발을 원치 않는 것인지 아니면 개발의 손길이 부족해서인지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무한한 기회의 땅이고 미래의 땅이라는 사실이다. 인구는 430만 명인데 양 6000만 마리, 젖소 620만 마리, 육우 390만 마리가 풀을 뜯어 먹으며 자라는 나라. 그것이 뉴질랜드다.
재미없는 천국?
버스가 들르는 시골 중소 도시의 작은 상점주인 중 아시아인이 많아서 깜짝 놀랐다. 근래 이민 온 아시아인은 후발자로서 대도시 진입이 어려워 이렇게 먼 곳까지 내려와서 정착한다. 한편으로는 지방 소도시 분위기가 배타적이지 않아서 아시아인도 쉽게 정착이 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다.
스치며 지나는 수많은 시골 풍경은 영락없이 미국 소도시를 닮았다. 패스트푸드점, 모텔, 주유소, 편의점…. 지금 시각 오후 6시 30분이지만 남반구의 여름 해는 기울 줄 모른다. 초원과 구릉과 가축들을 하루 종일 보고 있자니 늘 이런 환경을 접하며 사는 이들에게는 일상이 지루하겠다는 생각도 든다. 뉴질랜드에 온 한국인 이민자들 사이에 ‘재미없는 천국’이라는 말도 있지만 따지고 보면 이 나라 사람들의 고상하고 여유로운 삶에 대한 질투에 찬 부러움의 표현 아닐까?

▲테 파파 뉴질랜드 박물관. 1995년 11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곳을 방문했을 때 세워진 기념 판이 있다. 사진 = 김현주
웰링턴을 얼마 안 남기고 바다를 만난다. 아주 파란 바다다. 산언덕을 따라 집들이 올라간 모습은 크로아티아 아드리아해 어딘가를 닮은 것 같다. 산맥이 바다로 급히 빠지느라 평지가 귀한 곳에 웰링턴이 자리 잡은 것이다. 드디어 웰링턴이다. 1865년 이후 뉴질랜드의 수도이고 인구 33만 명, 뉴질랜드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다. 윈디 시티(Windy City)라고 하는데 바람이 심할 때는 인도를 걷던 보행자가 차도로 밀려 내려올 정도란다. 다행히 오늘은 바람이 잔잔해 다니기 좋을 것 같다.
8일차 (뉴질랜드 웰링턴 → 크라이스트처치)
햇빛 찬란한 남국의 아침
퀸스 워프(Queens Wharf) 부둣가를 따라 걷는다. 도시의 아침이 바다에 잔잔하게 이는 물결에 반사되고 시민들은 산책에 나서는 평화로운 아침이다. 워털루 퀴(Waterloo Quay)를 지나 테 파파(Te Papa) 뉴질랜드 박물관에 닿는다. 1995년 11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곳을 방문한 기념 판이 세워져 있다.
인근 섬들로 향하는 페리도 여기서 들어오고 나간다. 바닷물을 공원 깊숙이까지 끌어들여 시민들이 물과 가까워지도록 꾸며놓은 것이 인상적이다. 거친 남태평양이 고요한 풀장처럼 얌전해진 곳에서 시민들은 발로 움직이는 보트를 타거나 카누를 젓고 있다. 무엇보다도 한적해서 좋다. 박물관 앞 광장 건너 써카(Circa) 극장에서는 각종 공연이 활기차게 열린다. 박물관 개장 시간이 30분 남아서 퀸스 워프에서 하염없이 오리엔탈 베이(Oriental Bay)와 그 너머 대양을 바라본다.
테 파파 뉴질랜드 박물관
드디어 박물관 개장 시각이다. 태평양, 자연사, 예술, 마오리, 이민사 등 각 테마별로 방대한 컬렉션을 갖고 있는 뉴질랜드 최대의 국립 박물관이다. 6층 아트 갤러리(Art Gallery)부터 관람을 시작한다. 마오리 미술이 서양 미술을 만나 펼쳐놓은 열대 색감이 독특하게 화려하다.
5층 뉴질랜드 이민 역사관이 크게 관심을 끈다. 뉴질랜드는 지구상 인류가 마지막으로 개척한 신대륙이어서 더욱 의미가 있다. 1840년 첫 이민을 시작으로, 1858년에는 유럽인 숫자와 마오리 숫자가 같아진다. 1960년대 이후에는 태평양 도서 지역 간 왕래가 편리해지면서 태평양 지역 유입 이민자들이 부쩍 늘어난 것이 흥미롭다. 태평양 지역에서는 뉴질랜드가 단연 빅브라더 아닌가?

▲뉴질랜드 박물관 앞 광장 건너엔 써카 극장이 있다. 각종 공연이 활기차게 열리는 장소다. 사진 = 김현주
그러나 뉴질랜드 인구가 언제나 늘어난 것은 아니다. 1970년대 국제 양모 가격 하락, 1990년대 오일쇼크로 인한 세계 경제 위축으로 뉴질랜드는 이민자 유입보다 유출이 더 많았다. 뉴질랜드가 세계 각 분쟁 지역의 난민을 인종을 가리지 않고 받아들인 기록이 사진 및 정착자들의 생생한 증언과 함께 소개된다.
지난 50년 가까이 연평균 1000명씩 난민을 받아들였는데 별난 사연도 많다. 예컨대 1965년 중국 공산당 정부로부터 종교 탄압을 받은 러시아계 중국인, 1970년 종교와 인종 박해로 핍박받은 중국계 인도네시아인, 1974년 군사독재로 발생한 칠레 난민 등 갖가지 사연으로 모국의 터전을 버리고 방랑길에 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 답답한 자들에게 길을 열어주기에 서슴지 않는 인도주의 국가 뉴질랜드에게 축복 있기를 기원한다.
결코 작지 않은 나라
뉴질랜드의 참전 관련 기록도 전시돼 있다. 아무런 의문 없이 영국을 모국처럼 받들다보니 영국이 벌인 세계 각국의 거의 모든 전쟁터에 군대를 보내다가 2차 대전 이후 주체성을 자각하는 과정이 소개돼 있다. 테 파파 뉴질랜드 국립박물관은 세심, 정성, 창의, 그리고 어린이 배려로 요약되는 아주 인상 깊은 박물관이다. 뉴질랜드가 작지만 결코 간단한 나라가 아님을 확인해 준다.
시민 광장 부근
방향을 돌려 시민 광장(Civic Square)으로 간다. 가는 길에 오페라 하우스(Opera House)와 젊음의 거리 쿠바 스트리트(Cuba Street)를 지난다. 오늘 날씨가 완벽해 어디를 가도 즐거운 노랫소리만 들리는 것 같다. 도서관, 시티 갤러리(City Gallery), 타운 홀(Town Hall)과 함께 각종 조형물이 조화롭게 배치된 멋진 광장은 퀸스 워프까지 이어져 있다. 많은 시민들이 제멋대로 자유로운 복장과 자세로 남국의 여름 태양을 즐긴다.

▲시민 광장(Civic Square)에서 만끽하는 날씨가 완벽하다. 광장을 중심으로 도서관, 갤러리 등이 자리한다. 사진 = 김현주
이어서 케이블카를 타러 램튼 퀴(Lampton Quay)로 갔으나 오늘 운행이 불규칙해 사람들이 발길을 되돌린다. 케이블카를 타고 산정에 올라 카터(Carter) 전망대에서 도시를 조망하는 낭만을 기대했으나 아쉽다. 램튼 퀴를 따라 동쪽으로 걸으니 소위 웰링턴의 골든 마일(Golden Mile)을 오늘 모두 걷는 셈이다. 상가이건 주택이건 교회건 빌딩이건 건축물을 아담하게 지어도 얼마든지 그 자체로 빛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격조 높은 세련된 도시다.
그리고 그 절정은 옛 정부 건물과 현 정부 건물, 의사당, 그리고 성바울 성당(St. Paul Cathedral)이 모여 있는 정부 지역이다. 이제는 결혼식, 장례식, 콘서트 등 여러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올드 세인트 폴(Old St. Paul) 나무 교회 또한 깊은 인상을 남긴다. 겉모습보다 실내 스테인드글라스, 그리고 목조 건축물 구조와 나무로 얼기설기 엮어놓은 아치형 기둥들은 차라리 그로테스크하다. 론리 플래닛(Lonely Planet) 조사에서 배낭 여행자들이 선정한 ‘방문할 가치가 있는 도시’ 4위인 이유가 이제는 충분히 밝혀지고도 남는다.
웰링턴 공항의 여유
특별히 남은 일이 없는 것 같아 일찌감치 공항으로 향한다. 91번 씨티플라이어(Citiflyer) 공항버스(편도, 약 7000원)는 삽시간에 공항에 닿는다. 아주 아담한 공항이다. 공항보다 공항 바로 옆 골프장이 이채롭다. 남섬 크라이스트처치(Christchurch)행 에어 뉴질랜드(Air New Zealand)의 저렴한 항공권은 휴대 수하물 중량을 7kg으로 제한하는데, 절묘하게도 내 가방 무게는 한국을 떠날 때 무게 6.8kg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한적한 공항에서 느긋하게 여행 일지를 기록한다. 한국에서는 도저히 맛볼 수 없는 한적함이 오히려 호사스럽기까지 하다.
쿡 해협 건너
항공기는 예정보다 30분 늦어 웰링턴 공항을 이륙한다. 산언덕 끝까지 기어 올라간 주택들이 보이더니 삽시간에 쿡 해협(Cook Strait)을 건넌다. 북섬의 남쪽 끝 웰링턴(Wellington)과 남섬의 북쪽 끝 픽턴(Picton)을 잇는 인터 아일랜더(Inter Islander) 페리로 세 시간 걸리는 뱃길이다.
남섬 북안(北岸) 피요르드 협곡의 단애(斷崖)가 병풍을 이루며 서 있는 장엄한 풍경이 눈에 들어온다. 항공기는 189마일을 날아 이륙 후 50분이 지난 저녁 8시 50분 크라이스트처치에 도착한다. 남위 45도의 저녁 날씨는 서늘하기까지 하다. 물론 뉴질랜드 남섬의 남쪽 끝 인버카길(Invercargill)은 여기서 또다시 수백 km 떨어진 곳이지만 그래도 남쪽 끝 가까이까지 왔다는 느낌은 1년 전 칠레 푼타아레나스(Punta Arenas)에서 마젤란 해협을 만났을 때만큼 감격스럽다.

▲올드 세인트 폴(Old St. Paul) 나무 교회가 방문객을 반긴다. 겉모습도 인상적이지만 실내 스테인드글라스, 그리고 목조 건축물 구조, 나무로 얼기설기 엮어 놓은 아치형 기둥들도 눈길을 끈다. 사진 = 김현주
공항 터미널 빌딩에는 와이파이가 잘 터진다. 지리적으로는 북반구 문명권에서 머나먼 남쪽 끝 외딴 곳이지만 통신 인프라는 잘돼 있다. 공항에서 버스가 출발한 시각은 밤 9시 40분…. 이제야 해가 진다. 도시는 쥐죽은 듯 조용한 적막강산이다. 공항에서 시내까지 12km, 버스 승객은 나 혼자 뿐이다. 호텔 체크인 후 출출함을 달래려고 가게를 찾지만 주유소에 딸린 편의점 하나가 이 시간 문을 연 유일한 곳이다.
(정리 = 김금영 기자)
- 관련태그
- CNB 씨앤비 시앤비 CNB뉴스 씨앤비뉴스










 제468호
제468호